목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2. 신청기간
3. 구제이익
4.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 구제 내용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Ⅱ.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
1. 가처분(假處分)
2. 본안(本案) 소송
Ⅲ 사법적 구제절차(고소, 고발)
1. 신청인/피신청인
2. 신청기간
3. 구제이익
4.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 구제 내용
5.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Ⅱ. 사법적 구제절차(민사소송)
1. 가처분(假處分)
2. 본안(本案) 소송
Ⅲ 사법적 구제절차(고소, 고발)
본문내용
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하고, 검찰 실무에서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선도위원이 피의자를 선도하여 앞으로 재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라고 한다. ‘혐의 없음(무혐의)’은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의 무고(誣告)함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되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민사상의 채무까지 면해주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데 한번 기소유예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같은 죄로 기소를 하지 않지만 만약 기소유예 후에 또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 기소를 할 수 있고 이는 무혐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만약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다. ‘공소권 없음’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赦免)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그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고, ‘죄가 안됨’은 고소/고발된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 각하는 무익한 고소, 고발의 남용에 의한 피고소/피고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고소/고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보호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소/피고발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공소부제기(公訴不提起)이유서를 발급받아 그 사유를 파악한 후,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만약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고, 만약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형법 §123(직권남용), §124(불법체포, 불법감금), §125(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
[참고] 고소/고발과 무고죄(誣告罪)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156). 무고죄를 저지른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157, §153).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그 보조자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長)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예를 들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포함한다.
고소/고발장 제출도 신고의 방법 중 하나인데,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사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신고된 사실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대법원 96.5.31. 96도771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대법원 98.9.8. 98도1949
객관적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률적인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예를 들어 주거침입을 퇴거불응으로 판단하여 퇴거불응죄라고 적은 경우), 대법원 87.6.9. 87도1029
진실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소/피고발인을 단순히 잘못 적은 경우 대법원 82.4.27. 81도2482
등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 97.3.28. 96도2417
그러므로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7.4. 2000도1908
무고죄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그러한 목적 없이 단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78.8.22. 78도1357
고소/고발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없음(무혐의),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 등의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피고소/피고발인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스스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고소/피고발인이 무고죄로 고소/고발인을 고소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공소부제기(公訴不提起)이유서를 발급받아 그 사유를 파악한 후, 검사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만약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할 수 있고, 만약 재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재항고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로 공무원의 일정한 범죄(형법 §123(직권남용), §124(불법체포, 불법감금), §125(폭행, 가혹행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
[참고] 고소/고발과 무고죄(誣告罪)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156). 무고죄를 저지른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157, §153).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함은 형사처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그 보조자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長)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예를 들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을 포함한다.
고소/고발장 제출도 신고의 방법 중 하나인데, 신고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일부 사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지만 신고된 사실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 대법원 96.5.31. 96도771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대법원 98.9.8. 98도1949
객관적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률적인 평가나 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예를 들어 주거침입을 퇴거불응으로 판단하여 퇴거불응죄라고 적은 경우), 대법원 87.6.9. 87도1029
진실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피고소/피고발인을 단순히 잘못 적은 경우 대법원 82.4.27. 81도2482
등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소/고발인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 97.3.28. 96도2417
그러므로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7.4. 2000도1908
무고죄는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하므로, 그러한 목적 없이 단지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78.8.22. 78도1357
고소/고발에 대해 기소유예, 혐의 없음(무혐의),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각하 등의 사유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에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직권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가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피고소/피고발인은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스스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고소/피고발인이 무고죄로 고소/고발인을 고소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노동쟁의]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결정과 범죄론체계상 지위
[노동쟁의]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결정과 범죄론체계상 지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대한 검토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에 대한 검토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검토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내용 검토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구제방법에 관한여
부당해고와 부당해고 구제방법에 관한여 [경제법, 경제법 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제관련법, 지위남용행위, 경제질서, 공정거래법...
[경제법, 경제법 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경제관련법, 지위남용행위, 경제질서, 공정거래법...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민사소송법과 당사자][손...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절차][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민사소송법과 당사자][손...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개념,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과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개념,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과 권리구제... [사회복지법제론] 산재보험법 - 산재보험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와 산재보험법의 내용(목...
[사회복지법제론] 산재보험법 - 산재보험법의 개요(의의, 입법배경)와 산재보험법의 내용(목... [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
[사회복지법제]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 행위와 차별 금지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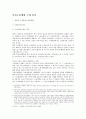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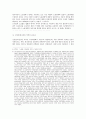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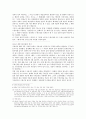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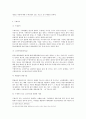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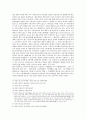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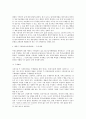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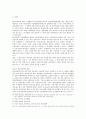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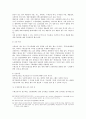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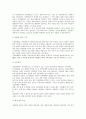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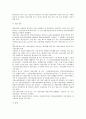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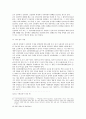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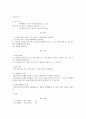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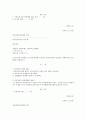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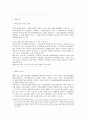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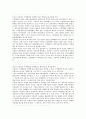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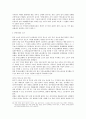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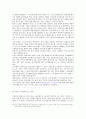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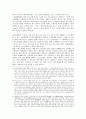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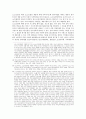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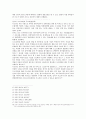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