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농경문화
2. 농경의 기원
⑴ 고든 차일드의 건조설
⑵ 브레이드우드의 핵지구설
⑶ 빈포드의 인구압-주변지구 가설
⑷ 최근의 연구
3. 농경민족
4. 농경방식
5. 고대문명과 농경
6. 신석기시대와 농경
7. 신석기 혁명
8. 농경의 시작이 의의
2. 농경의 기원
⑴ 고든 차일드의 건조설
⑵ 브레이드우드의 핵지구설
⑶ 빈포드의 인구압-주변지구 가설
⑷ 최근의 연구
3. 농경민족
4. 농경방식
5. 고대문명과 농경
6. 신석기시대와 농경
7. 신석기 혁명
8. 농경의 시작이 의의
본문내용
벼농사가 시작된 건 청동기 시대로 보기도 한다.
신석기 후기부터 사람들은 농사짓는 방법을 알게 된다.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채집, 수렵 등과 같이 이동생활에 적합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정착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을이 생기고 움집도 생기게 되었다.
우선 그들은 간석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돌갈판으로 곡식을 갈고 주로 조, 피 등을 재배했다. 참고로 한반도 최초로 한강 유역에서 조 농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농사가 시작되자 남는 농작물이 생기자, 남는 농작물을 저장하게 된다. 잉여작물 저장을 위해 나타난 것이 빗살무늬 토기이다. 빗살무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리에 빗는 빗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
<빗살무늬 토기>
이 외에 농사 시작의 영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전 채집, 수렵 경제 때는 남성들이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다. 그런데 항상 먹을거리가 밖에 풍부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남성들의 힘이 강해질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집에서 간단한 농사를 지으며 먹을 것을 마련했던 여자들의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농사의 의의가 있다면 최초로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에 따라 식생활이 충족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에는 자연이 따라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일이 많았다.
7. 신석기 혁명
\"신석기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호주 출신의 고고학자 V. G. 차일드(1892-1957)가 1925년 초판이 발행된 \"문명의 새벽\"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잘 아는 대로, 신석기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BC 8000년 경) 시작된다. 차일드에 의하면, 이 신석기시대에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데, 농경과 동시에 가축 사육도 병행한다. 이것을 차일드가 \"신석기혁명\"이라 칭한 것은, 이전까지 식량을 수렵 및 채취에 의존하던 생활방식과는 달리, 신석기시대 이후 시작된 농업을 통한 식량생산이 인류의 삶 전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온 까닭이다. 신석기혁명을 \"농업혁명\"(Agricultur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농업은 수렵이나 채취에 비해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잉여식량의 비축까지 허락함으로써, 인구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농업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유랑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신석기혁명으로 사람들은 유랑민에서 정착민으로 변하게 된다. 자연히 농경지 부근에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취락은 처음에는 촌락에 불과했으나, 그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면, 도시가 형성되게 된다.
농업혁명을 통한 잉여식량의 발생은 식량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계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의 분업화가 시작되어, 예컨대, 기술자나 지식인, 상인, 군인, 관리, 제사장 같은 전혀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회의 성원 대부분이 수렵이든, 채취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식량조달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8. 농경의 시작이 의의
신석기 시대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다고 하나 보통 청동기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며 계급의 분류가 시작되고 중앙 집중적인 권력구조가 생기기 시작하여 국가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 동굴생활과 유목생활에서 정착해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의복 도자기 등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산과 다작 즉, 노동력과 풍요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였을 것이다. 지금이야 농기구와 농기계의 발달로 호주와 같은 나라는 넓은 땅을 적은 인력으로 경작을 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모두 사람이 했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질병에도 대비할 수 없었으니깐 풍요를 바랬을 것이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기후를 잘 이용해야 한다.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습도라든지 일광, 온도 등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 흉작은 곧 죽음이므로 많은 인력과 식량, 기후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권력은 경작기술이 좋은 사람이나 씨앗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셔먼 같은 제사장 중심이었다. 이런 것을 모두 갖춘 사람이 최고의 권력가였다. 농사를 짓는 최고의 기술자의 지혜가 모두를 생존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 출처
- 네이버 오픈사전, 백과사전
신석기 후기부터 사람들은 농사짓는 방법을 알게 된다.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채집, 수렵 등과 같이 이동생활에 적합한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점차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정착생활이 시작되었고 마을이 생기고 움집도 생기게 되었다.
우선 그들은 간석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돌괭이로 땅을 일구고 돌갈판으로 곡식을 갈고 주로 조, 피 등을 재배했다. 참고로 한반도 최초로 한강 유역에서 조 농사에 성공했다. 이렇게 농사가 시작되자 남는 농작물이 생기자, 남는 농작물을 저장하게 된다. 잉여작물 저장을 위해 나타난 것이 빗살무늬 토기이다. 빗살무늬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리에 빗는 빗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것이다.
<빗살무늬 토기>
이 외에 농사 시작의 영향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전 채집, 수렵 경제 때는 남성들이 밖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다. 그런데 항상 먹을거리가 밖에 풍부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남성들의 힘이 강해질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집에서 간단한 농사를 지으며 먹을 것을 마련했던 여자들의 힘이 강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농사의 의의가 있다면 최초로 자연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노력에 따라 식생활이 충족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에는 자연이 따라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일이 많았다.
7. 신석기 혁명
\"신석기혁명\"(Neolithic Revolution)이라는 용어는 호주 출신의 고고학자 V. G. 차일드(1892-1957)가 1925년 초판이 발행된 \"문명의 새벽\"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잘 아는 대로, 신석기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BC 8000년 경) 시작된다. 차일드에 의하면, 이 신석기시대에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데, 농경과 동시에 가축 사육도 병행한다. 이것을 차일드가 \"신석기혁명\"이라 칭한 것은, 이전까지 식량을 수렵 및 채취에 의존하던 생활방식과는 달리, 신석기시대 이후 시작된 농업을 통한 식량생산이 인류의 삶 전체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져온 까닭이다. 신석기혁명을 \"농업혁명\"(Agricultur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농업은 수렵이나 채취에 비해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다. 따라서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잉여식량의 비축까지 허락함으로써, 인구의 비약적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농업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유랑생활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신석기혁명으로 사람들은 유랑민에서 정착민으로 변하게 된다. 자연히 농경지 부근에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취락은 처음에는 촌락에 불과했으나, 그 규모가 점차 커지게 되면, 도시가 형성되게 된다.
농업혁명을 통한 잉여식량의 발생은 식량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계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의 분업화가 시작되어, 예컨대, 기술자나 지식인, 상인, 군인, 관리, 제사장 같은 전혀 새로운 사회계층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회의 성원 대부분이 수렵이든, 채취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식량조달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8. 농경의 시작이 의의
신석기 시대에도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다고 하나 보통 청동기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며 계급의 분류가 시작되고 중앙 집중적인 권력구조가 생기기 시작하여 국가의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다. 동굴생활과 유목생활에서 정착해서 생활하기 시작했고 의복 도자기 등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다.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산과 다작 즉, 노동력과 풍요였을 것이다. 그리고 기후였을 것이다. 지금이야 농기구와 농기계의 발달로 호주와 같은 나라는 넓은 땅을 적은 인력으로 경작을 하지만, 농경사회에서는 그런 일을 모두 사람이 했어야 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질병에도 대비할 수 없었으니깐 풍요를 바랬을 것이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기후를 잘 이용해야 한다.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습도라든지 일광, 온도 등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 흉작은 곧 죽음이므로 많은 인력과 식량, 기후가 가장 중요했을 것이다.
권력은 경작기술이 좋은 사람이나 씨앗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셔먼 같은 제사장 중심이었다. 이런 것을 모두 갖춘 사람이 최고의 권력가였다. 농사를 짓는 최고의 기술자의 지혜가 모두를 생존하게끔 했기 때문이다.
* 출처
- 네이버 오픈사전, 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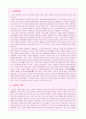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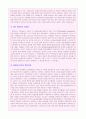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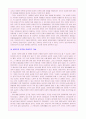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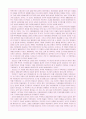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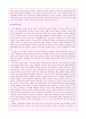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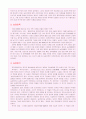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