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기신론소에 나타난 회통사상과 대승에 대한 믿음
1. 대승의 본체와 명의
2. 대승에 대한 신해
3.『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회통사상
4. 노자사상과의 회통
II. 의혹을 제거하고 사집을 버림
1. 의혹을 제거함
a. 법에 대한 의혹의 제거
b. 교문에 대한 의혹의 제거
2. 사집을 버리게 함
III. 믿음의 성취 - 수행실천 -
1. 시 문-재시, 무외시, 법시
2. 계 문
3. 인문
4. 진문
5. 지관문
IV. 결 어
1. 대승의 본체와 명의
2. 대승에 대한 신해
3.『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회통사상
4. 노자사상과의 회통
II. 의혹을 제거하고 사집을 버림
1. 의혹을 제거함
a. 법에 대한 의혹의 제거
b. 교문에 대한 의혹의 제거
2. 사집을 버리게 함
III. 믿음의 성취 - 수행실천 -
1. 시 문-재시, 무외시, 법시
2. 계 문
3. 인문
4. 진문
5. 지관문
IV. 결 어
본문내용
설명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起信論』에서는 이 佛法을 배워서 바른 믿음을 구하고자 하나 그 마음이 겁약하여 퇴전하려는 초학자에게 특별히 퇴전하지 않는 방편을 말한다. 즉 뜻을 오로지 하여 부처를 생각한 인연으로 원에 따라 他方佛土에 나게 되어 항상 부처를 친히 보아서 영원히 惡道를 여의는 것이다.
) 『논』.(『한불전』, p.788下).
이러한 念佛에 의한 수행은 『無量壽經』,『彌勒上生經』,『彌勒下生經』등 淨土系에 대한 元曉의 연구에 의하여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IV. 결 어
이상 元曉의 『大乘起信論 疏·記』 상에서의 信觀을 살핌에 있어 먼저 그의 信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信의 대상인 大乘의 本體와 名義를 밝혔고, 다음으로 大乘의 三大에 대한 信解를 말하였다. II 장에서는 大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法과 敎門에 대한 疑惑과 我執·法執의 두 가지 邪執을 除去하는 것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III 장에서는 大乘에 대한 信解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앞서 I 장에서 밝힌 大乘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수행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不定聚衆生 중의 劣等한 수행자들을 위하여 五門을 상세히 소개하였고, 마지막으로 初學의 겁약자를 위하여 念佛門에 의한 수행을 언급하였다.
결국 『大乘起信論』의 정신은 衆生들로 하여금 大乘을 이해함으로써 大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실제로 이 믿음을 修行實踐함으로써 믿음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信의 완성이란 生死의 바다에서 벗어나 涅槃의 언덕에 나아가 無上道에 이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원효,『대승기신론소 기회본』
은정희 (1991)『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은정희 (1994)「원효의 불교사상」, 은정희 외 5인,
『원효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각주]
1) 몇 가지 예를 들면 전북 완주군의 華岩寺에도 원효가 한때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며, 부안군의 開岩寺에는 유명한 元曉房이 있다.
2)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pp. 16∼37.
3) 中觀사사은 모든 것이 空하다고 본다(一切皆空). 무엇이 있다. 혹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서 모든 집착이 생긴다고 본다. 따라서 무엇이 있다는 생각은 바로 헛된 집착이며, 이 집착을 털어 버려야 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唯識사상은 識의 존재를 인정한다. 여기서 識이라 하면 불성의 경지와도 같은 제9식까지 포함된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부정해버리면 자칫 부정일변도의 허무주의로(惡取空)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9식의 존재를 긍정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사상에서 최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空·有 논쟁이다.
4) 일본에서도 8세기 초반에 『楞嚴經』에 나오는 \'眞性有爲空\'의 해석을 둘러싸고 삼론종과 법상종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 문제는 일본불교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토론이 확대되었으나 결국 뚜렷한 해결은 보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끝났다.
5) 『大乘起信論別記』大正藏 제44권, p.226, 中.
6) 『起信論疏』상권 大正藏 제44권, p. 220, 中.
7) 고익진, 『한국의 불교사상』(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p.182.
8) \'心眞如者 是第九識 全是眞故名心眞如 心生滅者 是第八識 隨緣成妄 攝體從用 攝在心生滅中\'『대승기신론의소』권상 大正藏 제44권, p. 179 下.
9) 殷貞姬,「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설과 法藏說의 比較」,『泰東古典硏究』10집, 한림대부설 태동고전연구소, 1993, 1993, pp. 633∼635.
10) 한국의 사상사에서 보면 불교와 유교간의 이러한 긴장은 고려 때까지는 비교적 심각한 갈등없이 균형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등장과 함께 시행된 억불숭유의 국가정책은 그러한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불간에 내재된 마찰의 소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요소이며 조선조 때 표면화되고 공식화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1) \'水之動是風相 動之濕是水相 水擧體動 故水不離風相 無動非濕 故動不離水相 心亦如是 不生滅心擧體同 故心不離生滅相\' 『起信論疏』(韓國佛敎全書1권, p746 上).
12) 『宋高僧傳』권4,「元曉傳」(大正藏, 50, p. 730).
13) 『三國史記』권46, 「薛聰傳」.
14) 불교에서 삼매(禪定)의 유래는 요가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된다. 요가 수행자들은 집중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조절부터 시작해서 체조, 호흡, 觀法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한다. 삼매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열반경』에 의하면 금강삼매는 능엄삼매와 함께 부처의 경지에 다다른 최고 수준의 삼매라고 한다.
15) 『金剛三昧經論』, 금강의 뜻, p. 17.
16) 水野弘元, 「菩提達磨二入四行說金剛三昧經」, 駒澤大學硏究紀要.
17) 金剛三昧者 能破一切諸法 入無餘涅槃 更不受有 『金剛三昧經論』(『韓佛全』제1권 p. 605下).
18) 위의 책, p. 606 上.
19) 위와 같음, \'佛所入定 破一切法 皆無所得\'.
20) 慧를 동원하여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고 있던 잘못된 견해를 부수는 책이 『中論』이다. 『중론』의 주된 내용은 이러한 법집을 부수는데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은 논리와 지혜로 시종일관 하고 있다. 우리는 『중론』에서 불교적 혜의 전형을 본다.
21) \'三摩地此云等持 等義同前 能制持心 令不馳散 故名等持 又定慧平等 令不相離 故名等持\'『金剛三昧經論』(위의 책 p.606 下).
22)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한 이유도 화엄종과 선종의 통합에 있었다. 화엄과 선이란 바로 혜와 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국사 지눌이 결사운동을 펼치면서 시도한 목표중의 하나가 정혜쌍수에 있었다. 이처럼 정과 혜는 불교사상사에서 물과 불처럼 함께 섞이기 어려운 요소였다. 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앞서서 원효가 정혜평등을 의식하고 있었다 함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의천이 원효를 그처럼 높게 평가한 깊은 뜻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23) \'大禪定 超諸名數…先明世間禪 不離名數 後顯出世禪 超彼名數\'『金剛三昧經論』(韓佛全 1권, p.657 下).
24) 『起信論疏』(韓佛全, p. 734).
25) 『金剛三昧經論』(韓佛全, p. 606).
) 『논』.(『한불전』, p.788下).
이러한 念佛에 의한 수행은 『無量壽經』,『彌勒上生經』,『彌勒下生經』등 淨土系에 대한 元曉의 연구에 의하여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생략하기로 한다.
IV. 결 어
이상 元曉의 『大乘起信論 疏·記』 상에서의 信觀을 살핌에 있어 먼저 그의 信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信의 대상인 大乘의 本體와 名義를 밝혔고, 다음으로 大乘의 三大에 대한 信解를 말하였다. II 장에서는 大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法과 敎門에 대한 疑惑과 我執·法執의 두 가지 邪執을 除去하는 것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III 장에서는 大乘에 대한 信解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앞서 I 장에서 밝힌 大乘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수행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不定聚衆生 중의 劣等한 수행자들을 위하여 五門을 상세히 소개하였고, 마지막으로 初學의 겁약자를 위하여 念佛門에 의한 수행을 언급하였다.
결국 『大乘起信論』의 정신은 衆生들로 하여금 大乘을 이해함으로써 大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실제로 이 믿음을 修行實踐함으로써 믿음을 완성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信의 완성이란 生死의 바다에서 벗어나 涅槃의 언덕에 나아가 無上道에 이르는 것이다.
<참고문헌>
원효,『대승기신론소 기회본』
은정희 (1991)『원효의 대승기신론 소·별기』
은정희 (1994)「원효의 불교사상」, 은정희 외 5인,
『원효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각주]
1) 몇 가지 예를 들면 전북 완주군의 華岩寺에도 원효가 한때 머물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오며, 부안군의 開岩寺에는 유명한 元曉房이 있다.
2)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pp. 16∼37.
3) 中觀사사은 모든 것이 空하다고 본다(一切皆空). 무엇이 있다. 혹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서 모든 집착이 생긴다고 본다. 따라서 무엇이 있다는 생각은 바로 헛된 집착이며, 이 집착을 털어 버려야 해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唯識사상은 識의 존재를 인정한다. 여기서 識이라 하면 불성의 경지와도 같은 제9식까지 포함된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부정해버리면 자칫 부정일변도의 허무주의로(惡取空)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9식의 존재를 긍정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사상에서 최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空·有 논쟁이다.
4) 일본에서도 8세기 초반에 『楞嚴經』에 나오는 \'眞性有爲空\'의 해석을 둘러싸고 삼론종과 법상종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이 문제는 일본불교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토론이 확대되었으나 결국 뚜렷한 해결은 보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로 끝났다.
5) 『大乘起信論別記』大正藏 제44권, p.226, 中.
6) 『起信論疏』상권 大正藏 제44권, p. 220, 中.
7) 고익진, 『한국의 불교사상』(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p.182.
8) \'心眞如者 是第九識 全是眞故名心眞如 心生滅者 是第八識 隨緣成妄 攝體從用 攝在心生滅中\'『대승기신론의소』권상 大正藏 제44권, p. 179 下.
9) 殷貞姬,「大乘起信論에 대한 元曉설과 法藏說의 比較」,『泰東古典硏究』10집, 한림대부설 태동고전연구소, 1993, 1993, pp. 633∼635.
10) 한국의 사상사에서 보면 불교와 유교간의 이러한 긴장은 고려 때까지는 비교적 심각한 갈등없이 균형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의 등장과 함께 시행된 억불숭유의 국가정책은 그러한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유·불간에 내재된 마찰의 소지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요소이며 조선조 때 표면화되고 공식화 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1) \'水之動是風相 動之濕是水相 水擧體動 故水不離風相 無動非濕 故動不離水相 心亦如是 不生滅心擧體同 故心不離生滅相\' 『起信論疏』(韓國佛敎全書1권, p746 上).
12) 『宋高僧傳』권4,「元曉傳」(大正藏, 50, p. 730).
13) 『三國史記』권46, 「薛聰傳」.
14) 불교에서 삼매(禪定)의 유래는 요가의 전통에서부터 시작된다. 요가 수행자들은 집중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음식조절부터 시작해서 체조, 호흡, 觀法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한다. 삼매에도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열반경』에 의하면 금강삼매는 능엄삼매와 함께 부처의 경지에 다다른 최고 수준의 삼매라고 한다.
15) 『金剛三昧經論』, 금강의 뜻, p. 17.
16) 水野弘元, 「菩提達磨二入四行說金剛三昧經」, 駒澤大學硏究紀要.
17) 金剛三昧者 能破一切諸法 入無餘涅槃 更不受有 『金剛三昧經論』(『韓佛全』제1권 p. 605下).
18) 위의 책, p. 606 上.
19) 위와 같음, \'佛所入定 破一切法 皆無所得\'.
20) 慧를 동원하여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하고 있던 잘못된 견해를 부수는 책이 『中論』이다. 『중론』의 주된 내용은 이러한 법집을 부수는데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과 같은 논리와 지혜로 시종일관 하고 있다. 우리는 『중론』에서 불교적 혜의 전형을 본다.
21) \'三摩地此云等持 等義同前 能制持心 令不馳散 故名等持 又定慧平等 令不相離 故名等持\'『金剛三昧經論』(위의 책 p.606 下).
22) 고려 때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한 이유도 화엄종과 선종의 통합에 있었다. 화엄과 선이란 바로 혜와 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국사 지눌이 결사운동을 펼치면서 시도한 목표중의 하나가 정혜쌍수에 있었다. 이처럼 정과 혜는 불교사상사에서 물과 불처럼 함께 섞이기 어려운 요소였다. 그런데 이들보다 훨씬 앞서서 원효가 정혜평등을 의식하고 있었다 함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의천이 원효를 그처럼 높게 평가한 깊은 뜻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23) \'大禪定 超諸名數…先明世間禪 不離名數 後顯出世禪 超彼名數\'『金剛三昧經論』(韓佛全 1권, p.657 下).
24) 『起信論疏』(韓佛全, p. 734).
25) 『金剛三昧經論』(韓佛全, p. 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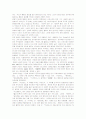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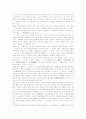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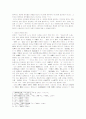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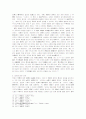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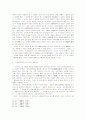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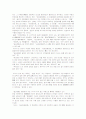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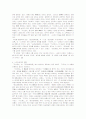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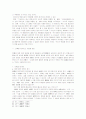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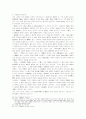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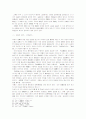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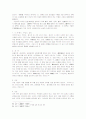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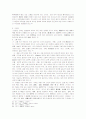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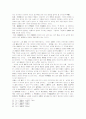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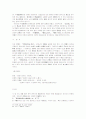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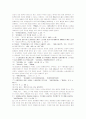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