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이진선의 삶.
3. 사회주의.
4. 아름다운 집.
5. 맺으며
2. 이진선의 삶.
3. 사회주의.
4. 아름다운 집.
5. 맺으며
본문내용
렵지 않나? 바로 이진선이 모스크바 유학시절부터 고민해 왔던 바다.
4. 아름다운 집.
혁명이란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이진선은 미완의 혁명 속에서 교훈을 찾고 인류가 성숙해 가는 기나긴 여정에서 온전한 사회주의를 내와야 한다고 말한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할 것인가. 매순간 삶을 사랑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그의 삶을 사상적 잣대, 혹은 사회적 결과물을 통해 평가할 순 없다. 현대사 속의 남로당이나 박헌영의 지위에 관한 문제, 지도와 대중의 문제, 혁명의 순결성과 품성의 문제 등 삶의 굽이굽이에서 그가 고뇌하고 방황했던 기록들은 식민지를 경험한 분단조국에서 청년으로, 또 이 땅의 지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새삼스레 숭고한 목적의식을 고취시킨다.
“내 생애에 아름답던 시간들을 떠올려본다. 일본에서 귀국해 금강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곳곳마다 조선의 산하를 불지르던 단풍들을 보며 민족해방을 다짐하는 순간들. 밤하늘 아래 그 하늘과 이어진 바다 저 멀리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위로 촘촘히 빛나는 별무리를 보며 울컥 흐느끼던 순간들. 5월의 대동강변에서 저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의 눈부심에 후두두 눈물을 쏟았던 순간들. 대자연 앞에, 우주 앞에 경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연이어 떠오른다.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혁명가들의 뜨거운 삶을 대신해 지금의 내가, 혹은 무관심한 우리가 얼마나 소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저버리고 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5. 맺으며
우리나라의 근대사엔 많은 애국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일 것이라는 시대적 거리감에 도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살아오지 않은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밀접한 연관성을 방관하지 않고자 역사학을 복수전공하기 시작한 나에게 한국현대사는 객관적인 위선의 거울로써 나의 근시안에 안경을 씌우는 짐, 혹은 탈피를 안겨주었다. 이진선의 삶과 존재는 픽션일 테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풍경은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셨던 젊음을 해후시키며 당위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탄생한 현실에 혁명적인 선동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우린 혁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세 속에서 ‘방관하는 자’만큼은 되지 말아야 하겠다.
4. 아름다운 집.
혁명이란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이진선은 미완의 혁명 속에서 교훈을 찾고 인류가 성숙해 가는 기나긴 여정에서 온전한 사회주의를 내와야 한다고 말한다.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는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말할 것인가. 매순간 삶을 사랑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이들을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그의 삶을 사상적 잣대, 혹은 사회적 결과물을 통해 평가할 순 없다. 현대사 속의 남로당이나 박헌영의 지위에 관한 문제, 지도와 대중의 문제, 혁명의 순결성과 품성의 문제 등 삶의 굽이굽이에서 그가 고뇌하고 방황했던 기록들은 식민지를 경험한 분단조국에서 청년으로, 또 이 땅의 지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새삼스레 숭고한 목적의식을 고취시킨다.
“내 생애에 아름답던 시간들을 떠올려본다. 일본에서 귀국해 금강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르는 곳곳마다 조선의 산하를 불지르던 단풍들을 보며 민족해방을 다짐하는 순간들. 밤하늘 아래 그 하늘과 이어진 바다 저 멀리서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위로 촘촘히 빛나는 별무리를 보며 울컥 흐느끼던 순간들. 5월의 대동강변에서 저마다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의 눈부심에 후두두 눈물을 쏟았던 순간들. 대자연 앞에, 우주 앞에 경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 연이어 떠오른다. 삶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혁명가들의 뜨거운 삶을 대신해 지금의 내가, 혹은 무관심한 우리가 얼마나 소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저버리고 있는지 반성해볼 일이다.
5. 맺으며
우리나라의 근대사엔 많은 애국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들을 접할 때마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일 것이라는 시대적 거리감에 도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내가 살아오지 않은 시대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밀접한 연관성을 방관하지 않고자 역사학을 복수전공하기 시작한 나에게 한국현대사는 객관적인 위선의 거울로써 나의 근시안에 안경을 씌우는 짐, 혹은 탈피를 안겨주었다. 이진선의 삶과 존재는 픽션일 테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풍경은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사셨던 젊음을 해후시키며 당위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탄생한 현실에 혁명적인 선동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가? 적어도 우린 혁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세 속에서 ‘방관하는 자’만큼은 되지 말아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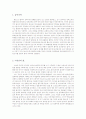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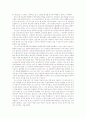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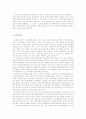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