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장승업의 삶
1절 - 출생(出生)과 생애(生涯)
2절 - 여러 인물과의 관계
제3장 영모도 대련(翎毛圖 對聯)
1절 - 조선말기(朝鮮末期)의 시대상황(時代狀況)
2절 - 오원의 화조영모화(花鳥翎毛畵)
3절 - 「영모도 대련(翎毛圖 對聯)」
4절 - 「호취도(豪鷲圖)」감상
제4장 오원의 회화사적 의미
1절 - 장승업의 전과 후
2절 - 장승업의 회화사적 의미
제5장 맺음말
제2장 장승업의 삶
1절 - 출생(出生)과 생애(生涯)
2절 - 여러 인물과의 관계
제3장 영모도 대련(翎毛圖 對聯)
1절 - 조선말기(朝鮮末期)의 시대상황(時代狀況)
2절 - 오원의 화조영모화(花鳥翎毛畵)
3절 - 「영모도 대련(翎毛圖 對聯)」
4절 - 「호취도(豪鷲圖)」감상
제4장 오원의 회화사적 의미
1절 - 장승업의 전과 후
2절 - 장승업의 회화사적 의미
제5장 맺음말
본문내용
으므로 장승업도 매양 주목하여 오던바 숙업(宿業)처럼 문득 깨달음이 있어 신(神)이 모이고 뜻이 통하였다. 평생에 붓대도 쥘 줄 몰랐는데 하루는 문득 붓을 잡고서 손이 내키는 대로 휘려(揮濾)하여 죽(竹). 란(蘭). 매(梅). 국 (菊). 석(石). 산수(山水). 영모(令羽 毛). 절지(折枝). 기명(器皿). 인물(人物)등을 그려보니, 다 자연천성(自然天成)하여 신운(神韻)이 떠돌았다.
주인은 보고 깜짝 놀라며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거냐고]하니 승업은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주인은 [神이 도우는 일이라]고 하며 지본(紙本).필(筆). 묵(墨)등을 장만해주고 그림을 전업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화명(畵名)이 세상에 날려 사방에서 그림을 청하는 이가 줄을 이었고 거마(車馬)가 골목을 메웠다.
성(性)이 술을 즐겨 그로써 성명(性命)을 삼아 마실 적엔 두어 말을 거뜬히 마시되 만취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으며, 취하면 간혹 한 달이 되도록 깰 줄을 몰랐다. 그러한 이유로서 매양 그림 한 축(軸)을 그리려면 가끔 반축(半軸)만을 그리고 걷어치우는 일이 많으며, 따라서 소득의 금전은 다 술집에 맡겨두고 매일 가서 마시되 그 금전이 얼마인지 계산도 하려 들지 아니하였다. 술집에서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나에게 술대접이나 할 따름이지 돈은 물어서 무엇하느냐]고 하였다.
그런데 그 화명이 궁중에까지 들리니 임금은 불러들이라 명령하여 금중(禁中)에 들어오자 한적한 일실(一室)에 두고 어병(禦屛) 십수첩(十數疊)을 그리게 하는데, 미리 찬감(饌監에게 단속하여 많은 술은 주지 못하게 하고 하루 두어 번 이. 삼배(二. 三盃)씩만 주도록 하였다. 열흘이 지나니 승업은 갈증이 심하여 달아날 것을 생각하되 경계가 엄하여 어찌할 수 없으므로 염채(染彩)의 도구를 구하러 간다고 허칭(許稱)하고 문지기를 달래어 밤중에 탈주(脫走)하였다. 임금은 듣고 잡아오라 명령하여 붙들어오매 더욱 계엄(戒嚴)을 더하고 그 그림을 끝내게 하였으나 자기의 의관(衣冠)을 벗어놓고 금졸(禁卒)의 입장(笠裝)을 돌려내어 몰래 입고 달아나기를 재삼차에 이르니 임금은 노하여 포청(捕廳)에 명령해서 잡아 가두도록 하였다.
그때 민충정공(閔忠正公) 영환(泳煥)이 곁에 모셨다가 아뢰되 [臣이 본래 승업과 친하온즉 臣의 집에 가두어 두고 그 그림을 끝내도록 분부하시옵길 간청하옵니다]하니 임금은 허락하므로 민공(閔公)은 바로 사람을 시켜서 그 뜻을 개유(開諭)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의관을 벗겨 감추고 별실 안에 처소를 정해 준 다음 시자(侍者)로 하여금 빈틈없이 감수(監守)하는 동시에 매일 술대접을 잘하되 다만 심취(沈醉)하지 않을 정도로 그치게 하니 승업이 처음에는 민공의 지우(知遇)에 느껴 차차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앉아 회사(繪事)에 전의(專意)할 듯이 하다가 얼마 안 되어 민공은 예궐(詣闕)하고, 감수(監守)가 잠간 빈 사이에 남의 방립(方笠)과 상복(喪服)을 돌려내어 입고 달아나 술집에 피신하였다. 민공은 여러 차례 사람을 시켜 수포(搜捕)하여 그전 같이 잡아 앉혔으나 끝내 그 일을 마치지 못했다. 성(性)이 또 여색(女色)을 좋아하여 노상 그림 그릴 때에는 반드시 미인을 옆에 두고 술을 따르게 해야 득의작(得意作)이 나왔다고 한다.
나이 40여에 비로소 취처(聚妻)하여 하룻밤을 자고서 버린 다음 종신(終身)토록 다시 장가들지 아니하였다. 광무(光武) 정유(丁酉)에 55새로 졸(卒)하였다. 외사씨(外史氏)는 가로되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그림으로 이름난 이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장승업만은 한 말로써 추앙(推仰)하되 [이는 神品이니 배워서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마치 육조(六祖)의 오선(悟禪)이 사수(師受)를 거치지 않고 절로 삼매(三昧)에 달한 것과 같다. 어허, 장승업 같은 이는 선가(禪家)의 숙업인과(宿業因果)라고 할 것 인가? 아깝게도 그 잔호(殘毫)와 유묵(遺墨)이 많이 민멸(泯滅)되고 전한 것이 적으니 슬픈 일이다]
오세창(吳世昌)의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의 장승업(張承業)
자(字)는 경유(景猷), 호(號)는 오원(吾園)이며 대원인(大元人)이다. 헌종(憲宗)9년 계묘(癸卯(1834) 생(生)이다. 화원(畵員)으로 벼슬은 감찰(監察)을 지냈다. 55세로 죽었다. 오원은 그림에 있어서 능(能)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스스로 장담하여 말하기를 신운생동(神韻生動)이라 했는데 실로 헛소리가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문자는 해독치 못했으나 널리 명인(名人)의 진적(眞蹟)을 보고 자세히 기록하여 비록 본지 오랜 것이라도 배모(背模)하여 호발(豪髮)이 틀리지 않았다. 성품이 소탈하였고 술을 즐겼다. 도처에서 술을 차려놓고 그림을 청하면 즉석에서 웃옷을 벗어 제치고 도사리고 앉아 흔히 절지기완(折枝器玩)을 그려 응하였다. 그밖에 산수 인물로서 정치(精緻)한 작품이 더 진귀하다.
▶ 정규, [백지 앞의 류형인 장승업]『인물한국사』제4권, 박문사,1965
▶ 이구열, [전통의 계승, 근대한국화의 개창]『한국근대회화선집』(한국화 1, 안중식) 금성출판사, 1990, PP 83~84
▶ 박노수, [오원 장승업의 예술과 인간]『공간』1970/3, PP 60~66
▶ 이원복, 오원 장승업의 회화세계 간송문화 53』간송미술관 1997 PPㆍ42~64
▶ 이성미, [장승업 회화와 중국회화]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 24권 제2호 (통권83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 25~56
▶ 이성미, [장승업 회화와 중국회화]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 24권 제2호 (통권83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 25~56
▶ 朴恩和 , [張承業의 故事人物畵]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 24권 제2호 (통권83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 83~103
▶ 박영대, [힘 장승업의 호취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그림 백가지』현암사 2000
▶ 김상엽 소치연구회간, [허련과 장승업] 『소치 허련』학연문화사 2002
▶ 최열, [장승업 형식주의자의 낭만과 민족정신] 『화전』청년사 2004
▶ 한국미술오천년편찬위원회, 『朝鮮朝繪畵篇』, 한국사전연구사 1995
주인은 보고 깜짝 놀라며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거냐고]하니 승업은 속이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였다. 주인은 [神이 도우는 일이라]고 하며 지본(紙本).필(筆). 묵(墨)등을 장만해주고 그림을 전업하도록 하였다. 그로부터 화명(畵名)이 세상에 날려 사방에서 그림을 청하는 이가 줄을 이었고 거마(車馬)가 골목을 메웠다.
성(性)이 술을 즐겨 그로써 성명(性命)을 삼아 마실 적엔 두어 말을 거뜬히 마시되 만취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으며, 취하면 간혹 한 달이 되도록 깰 줄을 몰랐다. 그러한 이유로서 매양 그림 한 축(軸)을 그리려면 가끔 반축(半軸)만을 그리고 걷어치우는 일이 많으며, 따라서 소득의 금전은 다 술집에 맡겨두고 매일 가서 마시되 그 금전이 얼마인지 계산도 하려 들지 아니하였다. 술집에서 [돈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나에게 술대접이나 할 따름이지 돈은 물어서 무엇하느냐]고 하였다.
그런데 그 화명이 궁중에까지 들리니 임금은 불러들이라 명령하여 금중(禁中)에 들어오자 한적한 일실(一室)에 두고 어병(禦屛) 십수첩(十數疊)을 그리게 하는데, 미리 찬감(饌監에게 단속하여 많은 술은 주지 못하게 하고 하루 두어 번 이. 삼배(二. 三盃)씩만 주도록 하였다. 열흘이 지나니 승업은 갈증이 심하여 달아날 것을 생각하되 경계가 엄하여 어찌할 수 없으므로 염채(染彩)의 도구를 구하러 간다고 허칭(許稱)하고 문지기를 달래어 밤중에 탈주(脫走)하였다. 임금은 듣고 잡아오라 명령하여 붙들어오매 더욱 계엄(戒嚴)을 더하고 그 그림을 끝내게 하였으나 자기의 의관(衣冠)을 벗어놓고 금졸(禁卒)의 입장(笠裝)을 돌려내어 몰래 입고 달아나기를 재삼차에 이르니 임금은 노하여 포청(捕廳)에 명령해서 잡아 가두도록 하였다.
그때 민충정공(閔忠正公) 영환(泳煥)이 곁에 모셨다가 아뢰되 [臣이 본래 승업과 친하온즉 臣의 집에 가두어 두고 그 그림을 끝내도록 분부하시옵길 간청하옵니다]하니 임금은 허락하므로 민공(閔公)은 바로 사람을 시켜서 그 뜻을 개유(開諭)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의관을 벗겨 감추고 별실 안에 처소를 정해 준 다음 시자(侍者)로 하여금 빈틈없이 감수(監守)하는 동시에 매일 술대접을 잘하되 다만 심취(沈醉)하지 않을 정도로 그치게 하니 승업이 처음에는 민공의 지우(知遇)에 느껴 차차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앉아 회사(繪事)에 전의(專意)할 듯이 하다가 얼마 안 되어 민공은 예궐(詣闕)하고, 감수(監守)가 잠간 빈 사이에 남의 방립(方笠)과 상복(喪服)을 돌려내어 입고 달아나 술집에 피신하였다. 민공은 여러 차례 사람을 시켜 수포(搜捕)하여 그전 같이 잡아 앉혔으나 끝내 그 일을 마치지 못했다. 성(性)이 또 여색(女色)을 좋아하여 노상 그림 그릴 때에는 반드시 미인을 옆에 두고 술을 따르게 해야 득의작(得意作)이 나왔다고 한다.
나이 40여에 비로소 취처(聚妻)하여 하룻밤을 자고서 버린 다음 종신(終身)토록 다시 장가들지 아니하였다. 광무(光武) 정유(丁酉)에 55새로 졸(卒)하였다. 외사씨(外史氏)는 가로되 [우리나라엔 예로부터 그림으로 이름난 이가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이 장승업만은 한 말로써 추앙(推仰)하되 [이는 神品이니 배워서 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다. 마치 육조(六祖)의 오선(悟禪)이 사수(師受)를 거치지 않고 절로 삼매(三昧)에 달한 것과 같다. 어허, 장승업 같은 이는 선가(禪家)의 숙업인과(宿業因果)라고 할 것 인가? 아깝게도 그 잔호(殘毫)와 유묵(遺墨)이 많이 민멸(泯滅)되고 전한 것이 적으니 슬픈 일이다]
오세창(吳世昌)의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의 장승업(張承業)
자(字)는 경유(景猷), 호(號)는 오원(吾園)이며 대원인(大元人)이다. 헌종(憲宗)9년 계묘(癸卯(1834) 생(生)이다. 화원(畵員)으로 벼슬은 감찰(監察)을 지냈다. 55세로 죽었다. 오원은 그림에 있어서 능(能)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그림을 완성할 때마다 스스로 장담하여 말하기를 신운생동(神韻生動)이라 했는데 실로 헛소리가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문자는 해독치 못했으나 널리 명인(名人)의 진적(眞蹟)을 보고 자세히 기록하여 비록 본지 오랜 것이라도 배모(背模)하여 호발(豪髮)이 틀리지 않았다. 성품이 소탈하였고 술을 즐겼다. 도처에서 술을 차려놓고 그림을 청하면 즉석에서 웃옷을 벗어 제치고 도사리고 앉아 흔히 절지기완(折枝器玩)을 그려 응하였다. 그밖에 산수 인물로서 정치(精緻)한 작품이 더 진귀하다.
▶ 정규, [백지 앞의 류형인 장승업]『인물한국사』제4권, 박문사,1965
▶ 이구열, [전통의 계승, 근대한국화의 개창]『한국근대회화선집』(한국화 1, 안중식) 금성출판사, 1990, PP 83~84
▶ 박노수, [오원 장승업의 예술과 인간]『공간』1970/3, PP 60~66
▶ 이원복, 오원 장승업의 회화세계 간송문화 53』간송미술관 1997 PPㆍ42~64
▶ 이성미, [장승업 회화와 중국회화]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 24권 제2호 (통권83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 25~56
▶ 이성미, [장승업 회화와 중국회화]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 24권 제2호 (통권83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 25~56
▶ 朴恩和 , [張承業의 故事人物畵] 정신문화연구 2001 여름호 제 24권 제2호 (통권83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PP 83~103
▶ 박영대, [힘 장승업의 호취도]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그림 백가지』현암사 2000
▶ 김상엽 소치연구회간, [허련과 장승업] 『소치 허련』학연문화사 2002
▶ 최열, [장승업 형식주의자의 낭만과 민족정신] 『화전』청년사 2004
▶ 한국미술오천년편찬위원회, 『朝鮮朝繪畵篇』, 한국사전연구사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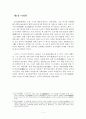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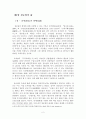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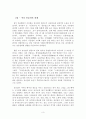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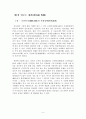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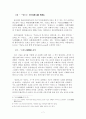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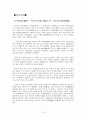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