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경국대전의 편찬
3. 대명률의 수용
4. 맺음말
<참고자료>
2. 경국대전의 편찬
3. 대명률의 수용
4.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논문, 참조.
明律이 道德主義와 寬容主義가 강한 것도 유교적인 정치이념의 영향 때문이었다. 따라서 明과 같은 유교국가였던 조선왕조에서는 「대명률」을 그대로 써도 대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다만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만 고쳐 쓰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법인 律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반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구태어 더 좋은 내용을 창안하지 못할 바에야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기왕에 간행된 「대명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또한 「대명률」의 채택은 尊明事大 정책과도 無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독자적인 律書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못된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經國大典」의 편찬과 「大明律」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 전근대사회에 있어서의 律令이 중국의 律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율령은 한국의 정치 사회 법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신라와 고려는 唐의 율령의 깊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元의 지배를 받던 고려후기에는 元의 율령, 明이 중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부터는 明의 율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律과 令은 상호보완적인 단계에 있었다. 律은 형법인 刑律을, 令은 행정법인 法令을 의미하며 律은 이미 저지른 잘못을 징벌하는 것인데 비하여 令은 잘못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令이 律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律書보다는 法令集, 또는 이 중에서 영구적인 조문을 모은 법전편찬을 먼저 만들고자 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각 部別로 判旨를 모아 놓은 法令集이 「高麗史」 志에 산발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건국초기부터 법전편찬에 열을 올렸다. 우선 태조 3년(1394)에 鄭道傳이 「朝鮮經國典」을 지어 법전편찬의 방향을 제시한 뒤 태조 6년(1397)에 趙浚 등의 「經濟六典」이 편찬되었으며, 태종 7년(1407)에 河崙 등의 「續六典」, 세종 11년(1429)에 李稷 등의 「續六典」, 세종 15년(1433)에 黃喜 등의 「續六典」이 계속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태조조부터 단종조에 이르는 60년간을 「經濟六典」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經濟六典」은 各曹 各司에서 받은 受敎중에서 영구히 준행되어야 할 것만을 모아 놓은 것이요 종합법전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條文마다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세조조부터는 이러한 중복과 모순을 없애고 빠져 있는 내용을 첨가시켜 종합법전을 편찬하려고 애썼다. 「경국대전」의 편찬이 그것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1년(1455)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六典詳定所를 설치한 이후 세조 6년(1460)에 戶典,세조 7년(1461)에 刑典, 세조 12년(1466)에 「丙戌年大典」, 성종 1년(1470)에 「辛卯年大典」, 성종 4년(1473)에 「甲午年大典」, 성종 15년(1484)에 「乙巳年大典」을 각각 편찬하였다. 이 중 「乙巳年大典」이 지금 남아 있는 「경국대전」으로 조선왕조 법령의 기간이 되었다.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도 법전 改修는 계속되었으나 原典은 그대로 두고 바뀐 부분만 添記하는 정도에 그쳤다. 「경국대전」은 세조가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완성되었다. 여기에 「경국대전」의 준비단계인 「經濟六典」 시대를 합친다면 전후 90년이 걸려 「경국대전」이 완성된 셈이다. 「경국대전」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걸려 편찬된 것은 법전편찬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법의 존엄성을 확신한 조선왕조 양반관료들의 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법전은 편찬되었으나 고려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律書는 국가에서 만들지는 않았다. 비록 공양왕 4년(1392)에 鄭夢周가 새로운 高麗律을 만들었다하나 왕조교체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고려시대에는 唐律 12篇 501條를 時宜에 맞도록 13篇 71條로 축소 변통한 高麗律을 썼으며 조선시대에는 일반형률은 「대명률」 자체를, 「대명률」이 時宜에 맞지 않는 부분은 受敎를 정리해 놓은 「經國大典」 刑典을 적용하되 특별법인 형전이 일반법인 「대명률」보다 우선하게 하였다.
「대명률」의 수용은 이미 태조의 즉위교서와 鄭道傳의 「朝鮮經國典」에서 밝힌 바 있다. 정도전은 또한 「대명률」을 吏讀로 풀어 쓴 「大明律直解」의 간행을 주장하여 태조 4년(1395)에 「대명률직해」가 간행되었다. 「대명률」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관리들이 알아 보기 쉽도록 吏讀로 풀어 쓰고 官制 官名 親族名 등은 조선의 명칭으로 바꾸어 썼다. 그런데 이 때에 直解된 「대명률」은 1389년(洪武 22년)에 제 3차로 간행된 「대명률」이 臺本이고 1397년(洪武 30년)에 제 4차로 간행된 「대명률」은 세종 13년(1431)에 번역되었다.
「대명률」을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주저없이 바꾸어 썼다. 流刑의 里數와 刑量, 官名 親族名 制度 尺度 뿐 아니라 奴婢法 財産相續法 印信僞造法 五服制度 등 특수한 것은 대폭 수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대명률」이 時宜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쓴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명률」은 유교주의의 원칙하에 이루어진 律書이기 때문에 유교이념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명률」이 法보다 禮를 더 중시하고 行刑에 寬容主義를 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같은 유교국가인 조선왕조에서는 구태여 힘들여 새로운 律을 만들 것 없이 「대명률」을 그대로 수용하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만 고쳐 쓰는 것이 편리하게 생각될 수 있었다. 「대명률」은 중국의 형률을 집대성한 포괄적이고 정리된 律書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고 「대명률」을 그대로 쓰는 것은 조선왕조의 尊明事大 정책과도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떻든 조선왕조가 종합법전은 편찬하였으면서도 독자적인 律書를 만들지 않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편집부 편, 1993, 경국대전, 한국법제연구원
이성무, 1990,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 125, 역사학회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明律이 道德主義와 寬容主義가 강한 것도 유교적인 정치이념의 영향 때문이었다. 따라서 明과 같은 유교국가였던 조선왕조에서는 「대명률」을 그대로 써도 대체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다. 다만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만 고쳐 쓰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형법인 律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반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었다. 구태어 더 좋은 내용을 창안하지 못할 바에야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기왕에 간행된 「대명률」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른다. 또한 「대명률」의 채택은 尊明事大 정책과도 無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왕조가 독자적인 律書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못된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經國大典」의 편찬과 「大明律」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 전근대사회에 있어서의 律令이 중국의 律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율령은 한국의 정치 사회 법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특히 신라와 고려는 唐의 율령의 깊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리고 元의 지배를 받던 고려후기에는 元의 율령, 明이 중국의 지배권을 확보한 뒤부터는 明의 율령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律과 令은 상호보완적인 단계에 있었다. 律은 형법인 刑律을, 令은 행정법인 法令을 의미하며 律은 이미 저지른 잘못을 징벌하는 것인데 비하여 令은 잘못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令이 律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律書보다는 法令集, 또는 이 중에서 영구적인 조문을 모은 법전편찬을 먼저 만들고자 한 것이다. 고려시대에 법전을 편찬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다만 각 部別로 判旨를 모아 놓은 法令集이 「高麗史」 志에 산발적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에서는 건국초기부터 법전편찬에 열을 올렸다. 우선 태조 3년(1394)에 鄭道傳이 「朝鮮經國典」을 지어 법전편찬의 방향을 제시한 뒤 태조 6년(1397)에 趙浚 등의 「經濟六典」이 편찬되었으며, 태종 7년(1407)에 河崙 등의 「續六典」, 세종 11년(1429)에 李稷 등의 「續六典」, 세종 15년(1433)에 黃喜 등의 「續六典」이 계속적으로 편찬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태조조부터 단종조에 이르는 60년간을 「經濟六典」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經濟六典」은 各曹 各司에서 받은 受敎중에서 영구히 준행되어야 할 것만을 모아 놓은 것이요 종합법전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條文마다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세조조부터는 이러한 중복과 모순을 없애고 빠져 있는 내용을 첨가시켜 종합법전을 편찬하려고 애썼다. 「경국대전」의 편찬이 그것이다. 「경국대전」은 세조 1년(1455) 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六典詳定所를 설치한 이후 세조 6년(1460)에 戶典,세조 7년(1461)에 刑典, 세조 12년(1466)에 「丙戌年大典」, 성종 1년(1470)에 「辛卯年大典」, 성종 4년(1473)에 「甲午年大典」, 성종 15년(1484)에 「乙巳年大典」을 각각 편찬하였다. 이 중 「乙巳年大典」이 지금 남아 있는 「경국대전」으로 조선왕조 법령의 기간이 되었다. 「경국대전」 반포 이후에도 법전 改修는 계속되었으나 原典은 그대로 두고 바뀐 부분만 添記하는 정도에 그쳤다. 「경국대전」은 세조가 편찬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완성되었다. 여기에 「경국대전」의 준비단계인 「經濟六典」 시대를 합친다면 전후 90년이 걸려 「경국대전」이 완성된 셈이다. 「경국대전」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걸려 편찬된 것은 법전편찬의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법의 존엄성을 확신한 조선왕조 양반관료들의 법정신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법전은 편찬되었으나 고려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律書는 국가에서 만들지는 않았다. 비록 공양왕 4년(1392)에 鄭夢周가 새로운 高麗律을 만들었다하나 왕조교체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반면에 고려시대에는 唐律 12篇 501條를 時宜에 맞도록 13篇 71條로 축소 변통한 高麗律을 썼으며 조선시대에는 일반형률은 「대명률」 자체를, 「대명률」이 時宜에 맞지 않는 부분은 受敎를 정리해 놓은 「經國大典」 刑典을 적용하되 특별법인 형전이 일반법인 「대명률」보다 우선하게 하였다.
「대명률」의 수용은 이미 태조의 즉위교서와 鄭道傳의 「朝鮮經國典」에서 밝힌 바 있다. 정도전은 또한 「대명률」을 吏讀로 풀어 쓴 「大明律直解」의 간행을 주장하여 태조 4년(1395)에 「대명률직해」가 간행되었다. 「대명률」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관리들이 알아 보기 쉽도록 吏讀로 풀어 쓰고 官制 官名 親族名 등은 조선의 명칭으로 바꾸어 썼다. 그런데 이 때에 直解된 「대명률」은 1389년(洪武 22년)에 제 3차로 간행된 「대명률」이 臺本이고 1397년(洪武 30년)에 제 4차로 간행된 「대명률」은 세종 13년(1431)에 번역되었다.
「대명률」을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주저없이 바꾸어 썼다. 流刑의 里數와 刑量, 官名 親族名 制度 尺度 뿐 아니라 奴婢法 財産相續法 印信僞造法 五服制度 등 특수한 것은 대폭 수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대명률」이 時宜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쓴 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명률」은 유교주의의 원칙하에 이루어진 律書이기 때문에 유교이념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명률」이 法보다 禮를 더 중시하고 行刑에 寬容主義를 택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같은 유교국가인 조선왕조에서는 구태여 힘들여 새로운 律을 만들 것 없이 「대명률」을 그대로 수용하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만 고쳐 쓰는 것이 편리하게 생각될 수 있었다. 「대명률」은 중국의 형률을 집대성한 포괄적이고 정리된 律書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그리고 「대명률」을 그대로 쓰는 것은 조선왕조의 尊明事大 정책과도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떻든 조선왕조가 종합법전은 편찬하였으면서도 독자적인 律書를 만들지 않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참고자료>
편집부 편, 1993, 경국대전, 한국법제연구원
이성무, 1990, 경국대전의 편찬과 대명률, 역사학보 125, 역사학회
윤국일, 1986, 경국대전 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추천자료
 문화재 조사(인천 도호부 청사)
문화재 조사(인천 도호부 청사) 조선시대 감사행정과 사헌부
조선시대 감사행정과 사헌부 조선전기의 병역제도
조선전기의 병역제도 나의 본관과 시조 계촌법과 호칭(呼稱)
나의 본관과 시조 계촌법과 호칭(呼稱) 조선시대 교육 - 시대적 배경, 관학과 사학, 교육 법규
조선시대 교육 - 시대적 배경, 관학과 사학, 교육 법규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 한국의 일제강점이전의 복지발달사
한국의 일제강점이전의 복지발달사 조선
조선 인사평가의 의의
인사평가의 의의  4편 근세 관료국가 요약 - 조선 간단 요약
4편 근세 관료국가 요약 - 조선 간단 요약 한국건축의 역사 8장 지방사림의 대두와 사대부건축의 전개
한국건축의 역사 8장 지방사림의 대두와 사대부건축의 전개 조선시대 상설구빈기관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서술 하시오.
조선시대 상설구빈기관들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 서술 하시오. [정부정책관리(政府政策管理)의 의의와 기초] 정부의 정책관리, 정책의 정의와 유형
[정부정책관리(政府政策管理)의 의의와 기초] 정부의 정책관리, 정책의 정의와 유형 한국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지역사회복지 중 관심분야 중 하나를 택하여 현황과 문...
한국지역사회복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지역사회복지 중 관심분야 중 하나를 택하여 현황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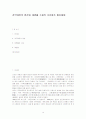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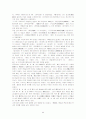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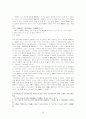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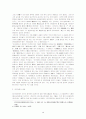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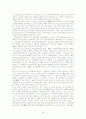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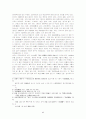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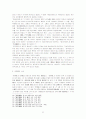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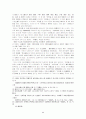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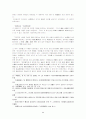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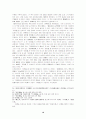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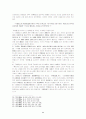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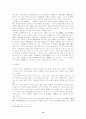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