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도병마사
(1)도병마사의 설치
(2)도병마사의 구성
(3)도병마사의 기능
(4)도평의사사로의 개편
(5)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6)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식목도감
(1)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2)식목도감의 기능
(3)식목도감의 변질
어사대와 낭사
(1)대간의 설치
(2)대간의 조직
(3)대간의 직능
(4)대간의 정치적 지위
한림원과 문한관
(1)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2)한림원의 기능
(3)한림원의 지위
사와 도감
(1)제사와 조직
(2)도감의 구성과 기능
도병마사
(1)도병마사의 설치
(2)도병마사의 구성
(3)도병마사의 기능
(4)도평의사사로의 개편
(5)도평의사사 기구의 확대
(6)도평의사사의 기능 확충
식목도감
(1)식목도감의 설치와 구성
(2)식목도감의 기능
(3)식목도감의 변질
어사대와 낭사
(1)대간의 설치
(2)대간의 조직
(3)대간의 직능
(4)대간의 정치적 지위
한림원과 문한관
(1)한림원의 설치와 조직
(2)한림원의 기능
(3)한림원의 지위
사와 도감
(1)제사와 조직
(2)도감의 구성과 기능
본문내용
사실이다. 그러나 당의 9시가 고려에서 그대로 채용된 것 같지 않다. 당의 9시가 아니라 7시로 축소되어 설치되었음이 달랐던 것이다.
고려의 寺는 때에 따라 그 명칭의 변화가 많아 어떤 고정된 수를 말하기 어렵지만 7시가 원형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이들 고려의 7시는 어떤 관부로 구성되었을까. 백관지의 기록으로는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太常寺衛尉寺太僕寺禮賓省大府寺司農寺司宰寺를 들기도 한다.
寺와 동격인 기구로 監省이 있다. 감으로서는 國子監小府監將作監軍器監司天監太醫監이 있고 성에는 秘書省殿中省이 있었으나 그 장관도 監이었다.
이들 시감성 밑에는 署와 局이 딸려 있었다. 백관지에는 이들 관부의 예속관계가 명기된 것이 없지만 당의 관제는 일목요연하게 상하 계통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지는 않지만 고려에서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고려의 비서성에 局長인 著作郞이 고려 후기에 비서감에 속해 있었으며 태사국은 고려 후기에는 서운관에 병속되었으나 그전에는 이에 속했을 것이다.
다음의 중요한 과제는 백관지 서문과 같이 6부가 寺監倉庫를 통할하였느냐의 문제이다. 당의 6부에는 각각 그 자체에 4司씩 있어 모두 24司로 구성되고 있었으나 다른 관부를 예속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의 6부도 7寺諸監을 관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7시의 장관 품질이 높았으므로 시감은 그 관부의 독립성이 엿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시감이 6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 기능상 6부의 감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고려의 寺監省은 독립관청이지만 그 기능에 따라 해당 6부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의 시감과 서국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였다고 짐작된다.
(2)도감의 구성과 기능
고려에는 寺監署局 등 諸司 외에 따로이 비정규 관부가 있었다. <<高麗史>> 백관지에서는 이들 특수 관부를 중앙관제 말미에 부록형식으로 <諸司圖鑑各色>이란 조항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서술된 기구는 제감을 주축으로 한 고려 독자적인 임시관부로 잡다한 내용이 혼잡하게 수록되어 있다. 여기 諸司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百僚 庶司, 즉 百司와는 다른 것이다.
실제로 <제사도감각색>에 司가 붙은 관부명은 제일 앞에 있는 도평의사사와 尙瑞司典牧司光軍司의 4司 밖에 없으며 또한 도평의사사를 제외하면 그리 중요한 관부도 아니다. 아마 諸司의 명칭이 앞에 붙여진 이유는 고려 후기 최고 정무기관인 도평의사사가 제일 먼저 立項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사를 앞에 쓴 것은 사의 수나 비중, 그리고 백사와의 혼동으로 적절한 표현은 못된다고 느껴진다.
실제로 <제사도감각색>의 내용은 제사가 아니라 도감과 各色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수록된 관부는 총 109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도감이 58개, 각색이 10개가 되어 특히 도감의 수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관지 서문에 도감각색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설치하고 그 일이 끝나면 폐지하였지만 그 중에는 그대로 존속시킨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감각색이 임시적인 비정규 관부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무인들이 많이 설치하였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제사도감각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도감은 都評議使司 다음에 기술한 式目都監이다.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은 국가 내외의 중요사를 재추들이 회의 결정하는 중대 기구였는데 따라서 식목도감을 도평의사사 다음 항목으로 세우게 된 것은 타당하다.
식목도감 다음으로 항목이 설정된 도감은 8번째의 會議都監과 9번째의 迎送都監이다. 따라서 회의도감과 영송도감도 도감으로서는 중요 관부임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3官 또는 3都監의 명칭이 자주 보인다. 3관이란 식목도감도병마사영송도감의 관원을 표시하였다.
3도감은 바로 이들 3관이 있는 세 관부 즉 식목도감도병마사영송도감을 표시하였다. 이 때 식목도감과 영송도감은 엄연한 도감이지만 도병마사를 3도강에 포함시키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 기구는 항상 한데 묶여 금내 3관이 되었으므로 3도감이라 통칭되었던 것 같다.
영송도감이 식목도감도병마사와 함께 금내 3도감이 되고 그 녹사가 3관에 포함될 정도로 그 지위가 높았으므로 도감으로서는 식목도감회의도감에 이어 세 번째로 올라서게 되었다. 영송도감은 외국 사신의 영송을 담당한 중요 기구였으므로 금내 3관에 포함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 식목도감 다음의 도감인 회의도감은 어떤 기구였을까. 고려 후기에는 재추에 직사자가 아닌 상의가 임명되어 도당에 참여하는 재추의수가 증가하였다. 이 상의는 같은 재추로서 도당에 합좌하였을 뿐 서명권이 없었으나 뒤에는 이들도 합의된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들 직사를 갖지 못한 재추의 상의가 정식으로 상의회의도감사 였다고 생각된다. 모든 재추직에 상의가 있었으며 그들은 도당이나 식목도감에서 회의하는회원이란 뜻의 상의회의도감사를 겸하였던 것이다. 회의도감이란 정식 관부가 아니라 앞의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가의 회의기관의 회의원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도병마사도 도감에 속하는 관부이고 식목도감영송도감과 함께 금내 3도감의 중요한 관부였으며, 회의도감은 하나의 독립관부가 아니라 합좌기관인 도병마사식목도감의 회의원을 나타내는 관직명이었다. 이 밖에도 55개나 되는 많은 도감이 있었으나 거의 모두 일시적인 관부로 곧 폐지된 경우가 많았다.
도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各色이다. 각색은 모두 10개나 되어 조항명에 붙여지게 된 것이다. 色이란 담당직을 나타낸 것으로 비교적 하위 직원을 가리키며 고려시대의 직사 담당자의 뜻으로 관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 백관지의 <제사도감각색>의 내용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여기 관부 가운데 도평의사사나 식목도감 등 고려 정치제도 가운데 아주 중대한 기관이 포함되었으나 그것이 고려 독자적인 관부라는 점에서 부록형식에 집어넣었다. 특히 편찬자는 이들 관부를 비하시켰는데, 그것은 중국 관제와 다른 데서 나온 표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여러 관부가 고려 정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고려의 寺는 때에 따라 그 명칭의 변화가 많아 어떤 고정된 수를 말하기 어렵지만 7시가 원형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면 이들 고려의 7시는 어떤 관부로 구성되었을까. 백관지의 기록으로는 가려내기가 어려운데 太常寺衛尉寺太僕寺禮賓省大府寺司農寺司宰寺를 들기도 한다.
寺와 동격인 기구로 監省이 있다. 감으로서는 國子監小府監將作監軍器監司天監太醫監이 있고 성에는 秘書省殿中省이 있었으나 그 장관도 監이었다.
이들 시감성 밑에는 署와 局이 딸려 있었다. 백관지에는 이들 관부의 예속관계가 명기된 것이 없지만 당의 관제는 일목요연하게 상하 계통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지는 않지만 고려에서도 그러하였을 것이다.
고려의 비서성에 局長인 著作郞이 고려 후기에 비서감에 속해 있었으며 태사국은 고려 후기에는 서운관에 병속되었으나 그전에는 이에 속했을 것이다.
다음의 중요한 과제는 백관지 서문과 같이 6부가 寺監倉庫를 통할하였느냐의 문제이다. 당의 6부에는 각각 그 자체에 4司씩 있어 모두 24司로 구성되고 있었으나 다른 관부를 예속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고려의 6부도 7寺諸監을 관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7시의 장관 품질이 높았으므로 시감은 그 관부의 독립성이 엿보인다. 그렇지만 이들 시감이 6부와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 기능상 6부의 감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고려의 寺監省은 독립관청이지만 그 기능에 따라 해당 6부의 지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밑의 시감과 서국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였다고 짐작된다.
(2)도감의 구성과 기능
고려에는 寺監署局 등 諸司 외에 따로이 비정규 관부가 있었다. <<高麗史>> 백관지에서는 이들 특수 관부를 중앙관제 말미에 부록형식으로 <諸司圖鑑各色>이란 조항으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에 서술된 기구는 제감을 주축으로 한 고려 독자적인 임시관부로 잡다한 내용이 혼잡하게 수록되어 있다. 여기 諸司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百僚 庶司, 즉 百司와는 다른 것이다.
실제로 <제사도감각색>에 司가 붙은 관부명은 제일 앞에 있는 도평의사사와 尙瑞司典牧司光軍司의 4司 밖에 없으며 또한 도평의사사를 제외하면 그리 중요한 관부도 아니다. 아마 諸司의 명칭이 앞에 붙여진 이유는 고려 후기 최고 정무기관인 도평의사사가 제일 먼저 立項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사를 앞에 쓴 것은 사의 수나 비중, 그리고 백사와의 혼동으로 적절한 표현은 못된다고 느껴진다.
실제로 <제사도감각색>의 내용은 제사가 아니라 도감과 各色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 수록된 관부는 총 109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도감이 58개, 각색이 10개가 되어 특히 도감의 수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관지 서문에 도감각색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설치하고 그 일이 끝나면 폐지하였지만 그 중에는 그대로 존속시킨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감각색이 임시적인 비정규 관부임을 나타내는 동시에 무인들이 많이 설치하였음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제사도감각색>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도감은 都評議使司 다음에 기술한 式目都監이다.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감은 국가 내외의 중요사를 재추들이 회의 결정하는 중대 기구였는데 따라서 식목도감을 도평의사사 다음 항목으로 세우게 된 것은 타당하다.
식목도감 다음으로 항목이 설정된 도감은 8번째의 會議都監과 9번째의 迎送都監이다. 따라서 회의도감과 영송도감도 도감으로서는 중요 관부임을 알 수 있다. 고려 후기에는 3官 또는 3都監의 명칭이 자주 보인다. 3관이란 식목도감도병마사영송도감의 관원을 표시하였다.
3도감은 바로 이들 3관이 있는 세 관부 즉 식목도감도병마사영송도감을 표시하였다. 이 때 식목도감과 영송도감은 엄연한 도감이지만 도병마사를 3도강에 포함시키는 데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 기구는 항상 한데 묶여 금내 3관이 되었으므로 3도감이라 통칭되었던 것 같다.
영송도감이 식목도감도병마사와 함께 금내 3도감이 되고 그 녹사가 3관에 포함될 정도로 그 지위가 높았으므로 도감으로서는 식목도감회의도감에 이어 세 번째로 올라서게 되었다. 영송도감은 외국 사신의 영송을 담당한 중요 기구였으므로 금내 3관에 포함되었던 것 같다.
그러면 식목도감 다음의 도감인 회의도감은 어떤 기구였을까. 고려 후기에는 재추에 직사자가 아닌 상의가 임명되어 도당에 참여하는 재추의수가 증가하였다. 이 상의는 같은 재추로서 도당에 합좌하였을 뿐 서명권이 없었으나 뒤에는 이들도 합의된 문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 이들 직사를 갖지 못한 재추의 상의가 정식으로 상의회의도감사 였다고 생각된다. 모든 재추직에 상의가 있었으며 그들은 도당이나 식목도감에서 회의하는회원이란 뜻의 상의회의도감사를 겸하였던 것이다. 회의도감이란 정식 관부가 아니라 앞의 도평의사사와 식목도가의 회의기관의 회의원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도병마사도 도감에 속하는 관부이고 식목도감영송도감과 함께 금내 3도감의 중요한 관부였으며, 회의도감은 하나의 독립관부가 아니라 합좌기관인 도병마사식목도감의 회의원을 나타내는 관직명이었다. 이 밖에도 55개나 되는 많은 도감이 있었으나 거의 모두 일시적인 관부로 곧 폐지된 경우가 많았다.
도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各色이다. 각색은 모두 10개나 되어 조항명에 붙여지게 된 것이다. 色이란 담당직을 나타낸 것으로 비교적 하위 직원을 가리키며 고려시대의 직사 담당자의 뜻으로 관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이상 백관지의 <제사도감각색>의 내용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여기 관부 가운데 도평의사사나 식목도감 등 고려 정치제도 가운데 아주 중대한 기관이 포함되었으나 그것이 고려 독자적인 관부라는 점에서 부록형식에 집어넣었다. 특히 편찬자는 이들 관부를 비하시켰는데, 그것은 중국 관제와 다른 데서 나온 표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여러 관부가 고려 정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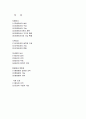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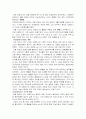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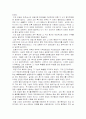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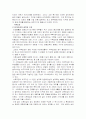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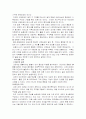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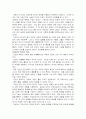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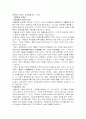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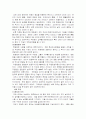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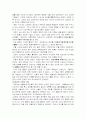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