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論
Ⅱ. 郡縣制
① 郡縣制의 槪念
② 村落의 구조
Ⅲ. 郡縣制의 變動
Ⅳ. 鄕村社會의 내부구조
① 구성원
② 郡縣制의 特徵과 原因
Ⅴ. 結論
Ⅱ. 郡縣制
① 郡縣制의 槪念
② 村落의 구조
Ⅲ. 郡縣制의 變動
Ⅳ. 鄕村社會의 내부구조
① 구성원
② 郡縣制의 特徵과 原因
Ⅴ. 結論
본문내용
주민을 포함한 잡적층도 기본적으로 양인 신분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사환권이 양인신분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었다. 고려시대 관료층과 중간계층 사이에는 계선이 분명하게 존재하면서도, 관료층의 하부와 중간계층의 상부가 서로 중첩되어 연결되었던 점이 밝혀지는데, 비록 별도의 신분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양인신분 내에서도 중간계층과 그 이하 계층 사이의 계선이 부각된다.
고려전기 양인층 내부에서 현실적인 경제력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에 대한 역부담의 구분으로 발전하고, 계층적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되어갔던 모습은 丁戶層과 白丁層의 구분으로 찾아볼 수 있다. 정호층은 고려전기 백정보다 우세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부강한 계층이었고, 정호층이 변방수비와 농지개간이라는 이중목적을 위한 변방 徙民의 대상으로 差定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정호층의 부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백정층은 직역을 담당하는 정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 가호로서 役을 제공하는 계층으로 편제되었다. 백정층이 지는 요역은 고려전기 일반민이 부담하는 기본 세목인 租布役으로 이루어진 3稅 중의 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백정층이 일반민의 근간을 이루는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호층과 백정층은 계서화되어 있었는데, 정호층은 국가에 職役을 지면서 전시과제도에 의해 군인전, 외역전 등의 분급대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지배계층 범주의 下限을 이루었던 중간계층들이었다. 그에 반해 백정층은 일정한 직역과 전정을 받음이 없이 다만 국가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는 피지배층이었다. 정호와 백정의 구분은 본관의 격에 관계없이 존재하였으며, 정호와 백정층 각각의 내부에는 그 존재형태가 다양하였다. 한편 정호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직역의 종류와 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는 가문의 우열을 따라서 차이가 났으며, 영역간의 계서적 지배방식하에서 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② 村落의 내부구조
일반 군현의 내부에는 최소의 행정단위로서 村落이 편제되어 군현의 하부구조로서 존재하였다. 국가는 지배의 편의를 위해서 村落民의 생활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自然村을 서너 개 묶어서 地域村으로 편제하여 호적작성과 賦稅 수취를 비롯한 촌락 행정의 기초 단위로 삼았다. 촌락 행정의 기초 단위가 되는 촌락을 연구자에 따라서는 行政村으로 부르기도 한다.
村主, 村長, 村典, 里正 등으로 불리는 계층이 촌락행정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군현의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인 鄕吏의 지휘를 받았다. 향리 역시 향촌지배의 권한을 위임받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장관인 수령, 그리고 수령을 보조하는 임무를 지닌 屬官의 행정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았다. 당시 지역촌은 戶籍의 작성, 호적을 토대로 행해지는 노동력의 징발, 貢物 수취와 踏驗損實과 같은 특정부세수취에 있어서 기본단위가 되었다. 그리고 刑律의 준행과 관련해서도 지역촌은 행정단위로서의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촌락은 국가의 향촌지배력이 직접 미치는 현장이고 부세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기초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이므로, 국가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촌락의 내부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香徒와 契의 기능에 주목하기도 했으나, 향도와 계는 향촌사회의 자율적 조직이므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차피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촌락 내부에 건설된 공적 조직으로서 隣保조직의 존재와 기능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고려 인보조직의 본보기가 된 것은 唐의 인보조직이지만, 그렇다고 고려에서 이를 단순 모방한 것은 아니었고 독자적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수용하였다. 늦어도 顯宗代까지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인보조직은 이웃하는 다섯 家戶를 하나의 保로 묶어 연대책임의 단위로 삼은 것이다. 인보조직은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세와 軍役의 수취에 있어서도 서로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인보로서의 책임을 지는 존재는 家戶의 戶主이고, 같은 인보조직으로 묶인 다섯 가호에게 공동적으로 부과된 연대책임에 대한 행정상의 지휘와 감독은 지역촌의 행정 담당자가 수행하였다.
인보조직의 이같은 기능을 중시한다면, 인보조직은 당시의 사회구조에서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창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인보조직은 신라통일기의 촌락문서에서 각종 부세를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 국가에서 인신을 편제한 孔烟과 計烟을 잇는 것이고, 조선시대에 이르면 面里制 하의 五家作統制로 이어진다.
Ⅶ. 結論
지금까지 중앙의 지방지배를 위한 대민통치제도로의 군현체제와 그 체제하에 존재하는 향촌사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의 군현제가 고려왕조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군현의 승격이나 강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힘이 강한 지방호족세력의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한 변화는 불가결한 결과였다. 그 산물로 부곡제와 속관제라는 고려시대만의 특이한 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 다원적인 제도하에 향촌사회에서 지배층의 중심을 이룬 향리층이 제도상의 통제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히 강력한 권위를 내세워 향촌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러한 군현제는 초기에는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통치체제로 확립하게 되지만 앞에서 주지했듯이 다원적 통치체제로의 구조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는 12세기 이후 외적의 침입과 국내의 정쟁에 의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로 인해 민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민의 유망과 항쟁으로 인해 군현제는 크게 변모하게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향의 개편이 결국 조선시대 군현제의 토대가 되었다.
◆참고문헌◆
1. 朴宗基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2. 한국중세사학회 편 『고려시대사강의』늘함께, 1997
3.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의 통치조직」『한국사』13, 1993
4. 李義權 「고려의 군현제도와 지방통치정책」『고려사의 제문제』삼영사, 1986
5. 金甲童 「고려왕조의 성립과 군현제의 변화」『국사관논총』35, 1992
6. 국사편찬위원회 「정치조직의 변화」『한국사』19, 1996
고려전기 양인층 내부에서 현실적인 경제력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국가에 대한 역부담의 구분으로 발전하고, 계층적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되어갔던 모습은 丁戶層과 白丁層의 구분으로 찾아볼 수 있다. 정호층은 고려전기 백정보다 우세한 조건을 가지고 있던 부강한 계층이었고, 정호층이 변방수비와 농지개간이라는 이중목적을 위한 변방 徙民의 대상으로 差定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정호층의 부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반면, 백정층은 직역을 담당하는 정호를 제외한 나머지의 일반 가호로서 役을 제공하는 계층으로 편제되었다. 백정층이 지는 요역은 고려전기 일반민이 부담하는 기본 세목인 租布役으로 이루어진 3稅 중의 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백정층이 일반민의 근간을 이루는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호층과 백정층은 계서화되어 있었는데, 정호층은 국가에 職役을 지면서 전시과제도에 의해 군인전, 외역전 등의 분급대상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지배계층 범주의 下限을 이루었던 중간계층들이었다. 그에 반해 백정층은 일정한 직역과 전정을 받음이 없이 다만 국가에 대해 조세를 부담하는 피지배층이었다. 정호와 백정의 구분은 본관의 격에 관계없이 존재하였으며, 정호와 백정층 각각의 내부에는 그 존재형태가 다양하였다. 한편 정호의 경우에는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직역의 종류와 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또는 가문의 우열을 따라서 차이가 났으며, 영역간의 계서적 지배방식하에서 그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였다.
② 村落의 내부구조
일반 군현의 내부에는 최소의 행정단위로서 村落이 편제되어 군현의 하부구조로서 존재하였다. 국가는 지배의 편의를 위해서 村落民의 생활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自然村을 서너 개 묶어서 地域村으로 편제하여 호적작성과 賦稅 수취를 비롯한 촌락 행정의 기초 단위로 삼았다. 촌락 행정의 기초 단위가 되는 촌락을 연구자에 따라서는 行政村으로 부르기도 한다.
村主, 村長, 村典, 里正 등으로 불리는 계층이 촌락행정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군현의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인 鄕吏의 지휘를 받았다. 향리 역시 향촌지배의 권한을 위임받고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장관인 수령, 그리고 수령을 보조하는 임무를 지닌 屬官의 행정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았다. 당시 지역촌은 戶籍의 작성, 호적을 토대로 행해지는 노동력의 징발, 貢物 수취와 踏驗損實과 같은 특정부세수취에 있어서 기본단위가 되었다. 그리고 刑律의 준행과 관련해서도 지역촌은 행정단위로서의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촌락은 국가의 향촌지배력이 직접 미치는 현장이고 부세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기초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이므로, 국가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촌락의 내부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에는 香徒와 契의 기능에 주목하기도 했으나, 향도와 계는 향촌사회의 자율적 조직이므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차피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촌락 내부에 건설된 공적 조직으로서 隣保조직의 존재와 기능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고려 인보조직의 본보기가 된 것은 唐의 인보조직이지만, 그렇다고 고려에서 이를 단순 모방한 것은 아니었고 독자적 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수용하였다. 늦어도 顯宗代까지는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인보조직은 이웃하는 다섯 家戶를 하나의 保로 묶어 연대책임의 단위로 삼은 것이다. 인보조직은 범죄의 예방과 퇴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세와 軍役의 수취에 있어서도 서로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인보로서의 책임을 지는 존재는 家戶의 戶主이고, 같은 인보조직으로 묶인 다섯 가호에게 공동적으로 부과된 연대책임에 대한 행정상의 지휘와 감독은 지역촌의 행정 담당자가 수행하였다.
인보조직의 이같은 기능을 중시한다면, 인보조직은 당시의 사회구조에서 지방행정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창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인보조직은 신라통일기의 촌락문서에서 각종 부세를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 국가에서 인신을 편제한 孔烟과 計烟을 잇는 것이고, 조선시대에 이르면 面里制 하의 五家作統制로 이어진다.
Ⅶ. 結論
지금까지 중앙의 지방지배를 위한 대민통치제도로의 군현체제와 그 체제하에 존재하는 향촌사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라의 군현제가 고려왕조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군현의 승격이나 강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힘이 강한 지방호족세력의 이해관계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기 위한 변화는 불가결한 결과였다. 그 산물로 부곡제와 속관제라는 고려시대만의 특이한 제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 다원적인 제도하에 향촌사회에서 지배층의 중심을 이룬 향리층이 제도상의 통제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당히 강력한 권위를 내세워 향촌사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이러한 군현제는 초기에는 중앙집권화가 진행되면서 지방통치체제로 확립하게 되지만 앞에서 주지했듯이 다원적 통치체제로의 구조상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 제도는 12세기 이후 외적의 침입과 국내의 정쟁에 의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됨에 따라 이로 인해 민에 대한 수탈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민의 유망과 항쟁으로 인해 군현제는 크게 변모하게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향의 개편이 결국 조선시대 군현제의 토대가 되었다.
◆참고문헌◆
1. 朴宗基 『고려시대 부곡제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2. 한국중세사학회 편 『고려시대사강의』늘함께, 1997
3. 국사편찬위원회 「지방의 통치조직」『한국사』13, 1993
4. 李義權 「고려의 군현제도와 지방통치정책」『고려사의 제문제』삼영사, 1986
5. 金甲童 「고려왕조의 성립과 군현제의 변화」『국사관논총』35, 1992
6. 국사편찬위원회 「정치조직의 변화」『한국사』19,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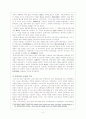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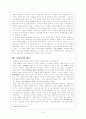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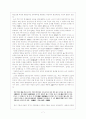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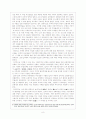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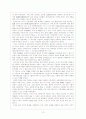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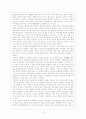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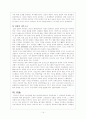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