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제1장 민족, 그 새로운 초월적인 존재의 출현
1). 민족에 대한 원초적 질문
2).종교와 이념의 벽을 넘어서다.
3). 민족, 그 신성한 기호의 출현
4).민족 그 벽을 넘어서
제2장 우리 나라의 역사교육의 변천사와 반성
1)도구로 전락한 역사교육
2) 역사교육의 쇠퇴기
3) 역사교육의 반성
결론
참고문헌
제1장 민족, 그 새로운 초월적인 존재의 출현
1). 민족에 대한 원초적 질문
2).종교와 이념의 벽을 넘어서다.
3). 민족, 그 신성한 기호의 출현
4).민족 그 벽을 넘어서
제2장 우리 나라의 역사교육의 변천사와 반성
1)도구로 전락한 역사교육
2) 역사교육의 쇠퇴기
3) 역사교육의 반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다. 1980년대 민중사학론 역시 그에 대한 반성 이였고 1994년 국사교육 준거안 파동 1980년대 중반 역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의 위치, 강역, 발전 정도 등을 비롯하여 주로 고대사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국사 교과서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를 비롯한 교과서 전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대사17항목을 비롯한 35개 항목의 편찬 준거안을 마련하였다.
역시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이 주최로국사의 해체를 향하여란 공개토론회와 같은 크고 작은 반성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온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반성들 역시 그들의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물론 이러한 변증법적인 사고들이 새로운 틀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역사교육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
나는 여기서 국사폐지논쟁의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입장의 설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양비론자라는 비난을 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문제 삼는 건 역사에 내재되어있는 그릇된 민족주의적인 틀이 기존의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조장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판하는 지금의 문제는 그것이 한쪽은 편협된 시각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그런 이분법적인 잣대로 다시 접근한다면 바뀌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것임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틀이 아니라 왜라는 원초적인 질문이고, 길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내적 동력이라는 것이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가듯이. 물론 그것이 순연한 첫사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온통 역설과 아이러니로 뒤범벅된 ‘원체험’들이라고 인정한다. 이것들과 대면하는 것은 기쁨보다는 고통을 수반할 처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 일그러진 초상들을 투상 할 때, 비로써 우리는 정녕 그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가지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의 서정시인.
미국의 서정시인 프로스트는 우리는 삶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많은 선택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
참고자료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김한종.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고미숙.
<오만과 편견> 임지현,사카이 나오키.
<만들어진 고대> 이성시
<역사란 무엇인가> E.H.카아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이나미.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임지현.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lovinglaewon.do?Redirect=Log&logNo=40001410852
http://www.moe.go.kr/ 교육 인적자원부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404/04/yonhap/v6416856.html
역시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비판과 연대를 위한 동아시아 역사포럼이 주최로국사의 해체를 향하여란 공개토론회와 같은 크고 작은 반성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온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반성들 역시 그들의 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물론 이러한 변증법적인 사고들이 새로운 틀을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역사교육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론.
나는 여기서 국사폐지논쟁의 찬성과 반대 어느 한쪽의 입장의 설 생각은 전혀 없다. 물론 양비론자라는 비난을 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문제 삼는 건 역사에 내재되어있는 그릇된 민족주의적인 틀이 기존의 이해관계의 정당성을 조장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비판하는 지금의 문제는 그것이 한쪽은 편협된 시각만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그런 이분법적인 잣대로 다시 접근한다면 바뀌는 것은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를 가지는 것임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틀이 아니라 왜라는 원초적인 질문이고, 길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내적 동력이라는 것이다. 영화 <박하사탕>에서 주인공이 기차를 타고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가듯이. 물론 그것이 순연한 첫사랑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온통 역설과 아이러니로 뒤범벅된 ‘원체험’들이라고 인정한다. 이것들과 대면하는 것은 기쁨보다는 고통을 수반할 처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그 일그러진 초상들을 투상 할 때, 비로써 우리는 정녕 그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 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가지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미국의 서정시인.
미국의 서정시인 프로스트는 우리는 삶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많은 선택들...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
참고자료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교육> 김한종.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고미숙.
<오만과 편견> 임지현,사카이 나오키.
<만들어진 고대> 이성시
<역사란 무엇인가> E.H.카아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이나미.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임지현.
참고 사이트
http://blog.naver.com/lovinglaewon.do?Redirect=Log&logNo=40001410852
http://www.moe.go.kr/ 교육 인적자원부
http://news.media.daum.net/culture/art/200404/04/yonhap/v641685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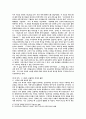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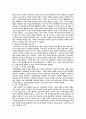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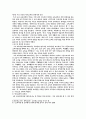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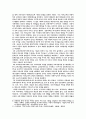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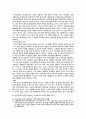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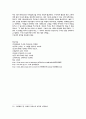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