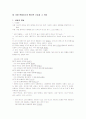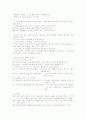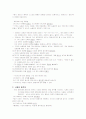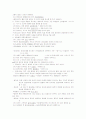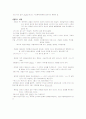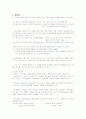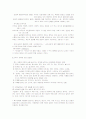목차
1. 사동과 피동
2. 시제와 동작상
3. 높임법
2. 시제와 동작상
3. 높임법
본문내용
낮춤과 아주낮춤에 두루 쓰인다. 그리하여 해요체를 두루높임, 해체를 두루낮춤이라 한다.
ㆍ인쇄물이나 구호에서 쓰이는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하라체가 있다. 하라체는 아주낮춤의 뜻이 없다. 어느 특정한 개인을 듣는이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독립된 문체라 하겠다. 명령형은 ‘하라, 먹으라, 보라...’
ㆍ여러등급의 상대높임법은 종결어미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그들을 다시 존대와 비존대로 나눈다.
격식체: 존대→ 합쇼체, 하오체 비격식체: 존대→ 해요체
비존대→하게체, 해라체 비존대→ 해체
ㆍ의례적 용법(격식체의 용법): 주어진 사회규범에 의해 어느 특정한 등급의 의미를 쓰게 되어 말하는 이의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의 용법.
정감적 용법(비격식체의 용법): 상배방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 개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 문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
ㆍ격식체와 비격식체
격식체: 표현이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 어미는 대체로 수가 적고, 네가지 문장종결법을 표 시할 수 있다.
비격식체: 부드럽고 비단정적이며 주관적, 더 많은 어미가 포함. 의호그 추측, 감탄등 여러 가지 느낌 표현.
ㆍ듣는이 높임법에 있어서도 존대의 근본적인 의미는 말하는 이와 듣는이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에 있는것이며, 어느 특정한 등급의 존대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비록 사회적 규범에 의하는 것이지마는, 개인적 친화를 위한 정감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ㆍ상대 높임의 종결어미 외에 ‘-(으)옵/으오-’, ‘-삽/사옵’와 같은 활용어미가 있어서 말듣는 이에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예) 평안히 가시옵소서.
→ ‘-(으)옵-’이 ‘-(으)시-’와 함께 쓰였다. 이때는 누구의 행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라기 보다는 말하는 이의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3.3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
ㆍ특수 어휘에 의하여 남을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편을 존대하는 방법.
① 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진지, 치아, 약주, 댁, 가친, 주무시다, 뵙다 등.
② 비존대: 밥, 이, 술. 집.아버지, 자다, 보다등.
③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어서 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어휘: 아버님, 선생님, 소생등.
- 저, 소생등은 자기를 낮추어 겸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나머지는 모두 높임말이다.
④ ‘선생님, 가친, 아버님’과 같이 듣는 이나 주체로서 높여야 할 대상인물을 직접 높이는 말과 ‘진지, 치아’와 같이 높여야 할 대상과 관계있는 인물이나 소유물, 사물을 높임으 로 써 간접적으로 상대편을 높이는 말들로 구분.
⑤ 주체를 높이는 말: 주무시다, 잡수시다, 계시다등
⑥ 객체를 높이는 말: 드리다, 뵙다, 여쭙다등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인물.
(1) 선생님께서는 아직 진지를 잡수시지 않았다.
(2) 선생님은 밥을 짓는 솜씨가 좋으시다고 한다.
→(2)에서 ‘밥’은 ‘선생님’이 직접 지은, ‘선생님’의 행위에 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진지’가 아닌 ‘밥’이 쓰였다. 말하는 이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이 먹을 밥만 ‘진지’라고 높여서 이른다. (1)의 ‘진지’는 ‘밥’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특수어휘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말하는이, 듣는이, 주어, 객어 네 요소 사이의 높고 낮음의 상호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객체존대는 본래 객체가 말하는 이보다 존귀해야 하고 동시에 주체보다 존귀해야 한다.
(1)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안경을 드렸습니다.
→ 듣는 이는 객체보다 낮은 이인 경우이고, 만약 듣는 이가 객체보다도 존귀하다면 ‘주다’ 가 쓰일 수 있게 된다.
(2) 할아버지, 형이 아버지한테 뭔가 주었습니다.
→ 듣는 이가 고려되어 듣는 이를 대우하는 입장을 취한다.
(3) 이 물건을 너희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 듣는 이가 동시에 주어인 경우로서, 말하는 이가 객체보다 존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듣 는 이를 대우해서 이렇게 객체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 국어의 높임법은 존자와 비자(卑者)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상대편에 의한 각별한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위치의 확인이며, 상대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에 근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여진다.
주체높임에서는 말하는 이와 주체, 그리고 객체 사이의 존비관계가 제일차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를 고려하는 것은 국어의 높임법이 상대편을 대우하는 넓은 폭이 있음을 보여 준다.
ㆍ인쇄물이나 구호에서 쓰이는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하라체가 있다. 하라체는 아주낮춤의 뜻이 없다. 어느 특정한 개인을 듣는이로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임과 낮춤이 중화된 독립된 문체라 하겠다. 명령형은 ‘하라, 먹으라, 보라...’
ㆍ여러등급의 상대높임법은 종결어미를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고, 그들을 다시 존대와 비존대로 나눈다.
격식체: 존대→ 합쇼체, 하오체 비격식체: 존대→ 해요체
비존대→하게체, 해라체 비존대→ 해체
ㆍ의례적 용법(격식체의 용법): 주어진 사회규범에 의해 어느 특정한 등급의 의미를 쓰게 되어 말하는 이의 개인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의 용법.
정감적 용법(비격식체의 용법): 상배방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 개인적인 태도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 문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
ㆍ격식체와 비격식체
격식체: 표현이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 어미는 대체로 수가 적고, 네가지 문장종결법을 표 시할 수 있다.
비격식체: 부드럽고 비단정적이며 주관적, 더 많은 어미가 포함. 의호그 추측, 감탄등 여러 가지 느낌 표현.
ㆍ듣는이 높임법에 있어서도 존대의 근본적인 의미는 말하는 이와 듣는이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에 있는것이며, 어느 특정한 등급의 존대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비록 사회적 규범에 의하는 것이지마는, 개인적 친화를 위한 정감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ㆍ상대 높임의 종결어미 외에 ‘-(으)옵/으오-’, ‘-삽/사옵’와 같은 활용어미가 있어서 말듣는 이에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예) 평안히 가시옵소서.
→ ‘-(으)옵-’이 ‘-(으)시-’와 함께 쓰였다. 이때는 누구의 행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라기 보다는 말하는 이의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3.3 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법
ㆍ특수 어휘에 의하여 남을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편을 존대하는 방법.
① 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진지, 치아, 약주, 댁, 가친, 주무시다, 뵙다 등.
② 비존대: 밥, 이, 술. 집.아버지, 자다, 보다등.
③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어서 존대나 겸양을 나타내는 어휘: 아버님, 선생님, 소생등.
- 저, 소생등은 자기를 낮추어 겸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나머지는 모두 높임말이다.
④ ‘선생님, 가친, 아버님’과 같이 듣는 이나 주체로서 높여야 할 대상인물을 직접 높이는 말과 ‘진지, 치아’와 같이 높여야 할 대상과 관계있는 인물이나 소유물, 사물을 높임으 로 써 간접적으로 상대편을 높이는 말들로 구분.
⑤ 주체를 높이는 말: 주무시다, 잡수시다, 계시다등
⑥ 객체를 높이는 말: 드리다, 뵙다, 여쭙다등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는 인물.
(1) 선생님께서는 아직 진지를 잡수시지 않았다.
(2) 선생님은 밥을 짓는 솜씨가 좋으시다고 한다.
→(2)에서 ‘밥’은 ‘선생님’이 직접 지은, ‘선생님’의 행위에 의한 결과이긴 하지만, ‘진지’가 아닌 ‘밥’이 쓰였다. 말하는 이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이 먹을 밥만 ‘진지’라고 높여서 이른다. (1)의 ‘진지’는 ‘밥’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특수어휘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말하는이, 듣는이, 주어, 객어 네 요소 사이의 높고 낮음의 상호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객체존대는 본래 객체가 말하는 이보다 존귀해야 하고 동시에 주체보다 존귀해야 한다.
(1)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안경을 드렸습니다.
→ 듣는 이는 객체보다 낮은 이인 경우이고, 만약 듣는 이가 객체보다도 존귀하다면 ‘주다’ 가 쓰일 수 있게 된다.
(2) 할아버지, 형이 아버지한테 뭔가 주었습니다.
→ 듣는 이가 고려되어 듣는 이를 대우하는 입장을 취한다.
(3) 이 물건을 너희 아버지께 갖다 드려라.
→ 듣는 이가 동시에 주어인 경우로서, 말하는 이가 객체보다 존귀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듣 는 이를 대우해서 이렇게 객체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 국어의 높임법은 존자와 비자(卑者)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며, 상대편에 의한 각별한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인 만큼, 개인적 인간관계에서의 자기 위치의 확인이며, 상대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에 근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보여진다.
주체높임에서는 말하는 이와 주체, 그리고 객체 사이의 존비관계가 제일차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를 고려하는 것은 국어의 높임법이 상대편을 대우하는 넓은 폭이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