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회를 이용하여 당시 가장 큰 수장가였던 松江의 顧正誼에게 서화를 빌려 임모하고, 嘉興 項元의 수장품과, 杭州 高深甫의 수장품을 감상하고, 蘇州 韓世能의 집에 이르러 진계유와 같이 명화를 감상하였다. 이러한 공무의 기간동안 그는 사실 王羲之, 顔眞卿 등 晉唐의 서예명작과 또 郭忠恕가 임모한 왕유의 《輞川圖》, 王詵의 《瀛山圖》, 李公麟의 《白蓮社圖》, 王蒙의 《山水》 등 宋元의 명작들을 감상하게 되며, 심지어는 黃公望의 《富春山居圖卷》, 江參의 《千里江山圖卷》 등을 구매하게 된다. 당시의 이러한 수확은 후에 그의 남북종론의 수립과 왕유의 회화양식 탐색에 영향을 미치며, 《婉草堂圖》의 창작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婉草堂圖》는 1597년 음력 10월, 동기창이 江西 南昌으로부터 松江으로 돌아온 다음 진계유의 은거를 방문하면서 그려진다. 이 여행에서 그의 표면상의 공무는 남창에서 향시를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는 8월말에 남창에 도착하여 9월 상순에 남창을 떠나서 9월 21일에 浙江 龍游縣 蘭溪에 도착한다. 이 기간동안 그는 배 위에서 李成의 《寒林歸晩圖》와 江參의 《千里江山》과 夏珪의 《錢塘觀潮》에 跋을 쓰며, 9월 말에 杭州의 高深甫의 집에 도착하여 郭忠恕가 임모한 《輞川圖》를 감상한다. 아울러 高深甫가 소장하고 있던 開皇刻本 《蘭亭詩序》에 跋을 쓴다. 동기창은 高深甫의 집에 머물다가 10월 초에 상해 華亭일대를 돌아 10월 말에 진계유가 있는 소곤산의 婉草堂에 도착한다. 그는 진계유를 위해 《婉草堂圖》를 그리고 이 기간동안 董源의 《龍宿郊民》과 李成의 《煙巒蕭寺》, 郭熙의 《溪山秋霽》등 북송의 중요한 명작들을 수집하며, 馮開之 소장의 왕유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江山雪霽》卷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일련의 회화 감식여행을 통해 동기창은 회화에 있어서 그가 이상으로 여기는 남종화의 이상적 경계인 왕유양식 탐색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밑바탕으로 《婉草堂圖》를 창작하게 된다.
이 중 특히 그의 남종화법의 이상형의 탐색 결과로써 《婉草堂圖》 창작에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은 왕유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江山雪霽》卷과 더불어 1597년 음력 9월말 항주에서 본 郭忠恕가 임모한 왕유의 《輞川圖》이다. 동기창은 확실히 이 두권의 그림이 자신이 찾고 있었던 왕유의 진적이나 혹은 진적의 필치를 이어받았다고 여긴 듯 하다. 동기창은 1595년 馮開之에게 보낸 편지에서 왕유 회화의 양식적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簡淡”이고 다른 하나는 “細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簡淡”은 준법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고, “細勤”은 郭忠恕가 임모한 왕유의 《輞川圖》처럼 이사훈의 그림 양식과 비슷한 세밀하고 충실히 묘사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江山雪霽》卷에서 동기창이 찾은 단서는 “簡淡”, 즉 간략한 준법이었으며, 여기에서 동기창은 남종화풍의 전형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전에 보았던 왕유양식은 項元家의 《雪江圖》와 趙令穰이 임모했던 《林塘消夏》였으며, 이 그림들은 모두 《輞川圖》처럼 윤곽선은 있지만 染이 없는 그림이었다. 染이 없는 그림으로 남종화풍의 전형을 삼는 것에 대해 동기창은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없었으며, 당연히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왕유 그림의 참된 모습을 모두 드러낼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馮開之 소장의 《江山雪霽》에서 그는 그의 심증에 관한 초보적인 실증을 얻는다. 요약하면, 동기창은 1596년 이전에 왕유의 양식을 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 비록 趙令穰, 趙孟 등의 작품과 왕유 양식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몇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동기창에게 결정적으로 왕유양식의 筆墨이라고 인정하게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기본적으로 《江山雪霽》와 《輞川圖》의 임모본 이었다.
동기창은 《江山雪霽》와 《輞川圖》 임모본의 연구를 통해서 왕유양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왕유 필법의 의도를 통해 동기창 자신의 새로운 필법을 창작하는 기반을 세운다. 이를 통해 동기창은 《輞川圖》의 임모본을 본 후 3개월만에 《婉草堂圖》를 그리며, 《婉草堂圖》는 그가 《江山雪霽》와 《輞川圖》를 통해 발견해 낸 왕유양식의 실천의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江山雪霽》의 발견은 동기창으로 하여금 남종화이론을 다시 수립하게 한다. 동기창에 의하면 남종적 특징인 간략한 준법은 왕유에게서 시작하여, 董源을 거쳐 원 4대가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동기창은 《江山雪霽》에서 보이는 간략한 준법은 북송을 거치면서 披麻으로 발전하며, 피마준은 남종화 전통을 관통하는 주요한 기법양식이라고 보았다. 동기창은 1595년 왕유 《江山雪霽》의 제발에서 “무릇 諸家의 준법은 唐에서부터 宋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는 마치 禪家에 五家宗派가 있는 것과 같으며, 단편적인 언사만 들어도 어느 문파의 자손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婉草堂圖》상의 준법과 《江山雪霽圖》는 다르다. 당연히 이것은 동기창이 왕유의 필법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筆意를 통해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江山雪霽》의 바위기법은 강렬한 명암의 대비가 있으나, 그 그림이 雪景이어서 눈에 덮혀 빛나는 면이 비교적 크다. 단지 바위의 하부와 안쪽의 일부분만이 드러나 음영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江山雪霽》의 암석들의 표면은 몇가닥 구륵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細들이 결여되어 있다. 陰暗處도 묵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婉草堂圖》와 같은 이 중첩되어 있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婉草堂圖》는 평행로 길게 이어지는 이 면을 확장하여 먹색이 비교적 진한데, 이로써 이 없는 곳과 비교적 강렬한 명암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이 두 그림이 필묵으로 나타내려 하는 효과는 비슷하다. 모두 바위를 간단하게 평행으로 중첩해서 평면적 명암대비의 효과를 강렬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의 응용은 동기창이 古代의 화풍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取勢”의 관념으로 양식을 이해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기창은 북송의 그림에 대한 감상을 통하여 얻은 신념을 바탕으로 남종양식의 형식적 완결을 《婉草堂圖》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으며, 남북종론의 타당한 근거로 여겼던 것이다.
《婉草堂圖》는 1597년 음력 10월, 동기창이 江西 南昌으로부터 松江으로 돌아온 다음 진계유의 은거를 방문하면서 그려진다. 이 여행에서 그의 표면상의 공무는 남창에서 향시를 주관하는 것이었다. 그는 8월말에 남창에 도착하여 9월 상순에 남창을 떠나서 9월 21일에 浙江 龍游縣 蘭溪에 도착한다. 이 기간동안 그는 배 위에서 李成의 《寒林歸晩圖》와 江參의 《千里江山》과 夏珪의 《錢塘觀潮》에 跋을 쓰며, 9월 말에 杭州의 高深甫의 집에 도착하여 郭忠恕가 임모한 《輞川圖》를 감상한다. 아울러 高深甫가 소장하고 있던 開皇刻本 《蘭亭詩序》에 跋을 쓴다. 동기창은 高深甫의 집에 머물다가 10월 초에 상해 華亭일대를 돌아 10월 말에 진계유가 있는 소곤산의 婉草堂에 도착한다. 그는 진계유를 위해 《婉草堂圖》를 그리고 이 기간동안 董源의 《龍宿郊民》과 李成의 《煙巒蕭寺》, 郭熙의 《溪山秋霽》등 북송의 중요한 명작들을 수집하며, 馮開之 소장의 왕유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江山雪霽》卷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일련의 회화 감식여행을 통해 동기창은 회화에 있어서 그가 이상으로 여기는 남종화의 이상적 경계인 왕유양식 탐색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밑바탕으로 《婉草堂圖》를 창작하게 된다.
이 중 특히 그의 남종화법의 이상형의 탐색 결과로써 《婉草堂圖》 창작에 중요한 단서가 된 것은 왕유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江山雪霽》卷과 더불어 1597년 음력 9월말 항주에서 본 郭忠恕가 임모한 왕유의 《輞川圖》이다. 동기창은 확실히 이 두권의 그림이 자신이 찾고 있었던 왕유의 진적이나 혹은 진적의 필치를 이어받았다고 여긴 듯 하다. 동기창은 1595년 馮開之에게 보낸 편지에서 왕유 회화의 양식적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簡淡”이고 다른 하나는 “細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簡淡”은 준법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고, “細勤”은 郭忠恕가 임모한 왕유의 《輞川圖》처럼 이사훈의 그림 양식과 비슷한 세밀하고 충실히 묘사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江山雪霽》卷에서 동기창이 찾은 단서는 “簡淡”, 즉 간략한 준법이었으며, 여기에서 동기창은 남종화풍의 전형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전에 보았던 왕유양식은 項元家의 《雪江圖》와 趙令穰이 임모했던 《林塘消夏》였으며, 이 그림들은 모두 《輞川圖》처럼 윤곽선은 있지만 染이 없는 그림이었다. 染이 없는 그림으로 남종화풍의 전형을 삼는 것에 대해 동기창은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없었으며, 당연히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왕유 그림의 참된 모습을 모두 드러낼 수 없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馮開之 소장의 《江山雪霽》에서 그는 그의 심증에 관한 초보적인 실증을 얻는다. 요약하면, 동기창은 1596년 이전에 왕유의 양식을 찾기 위한 노력 속에서 비록 趙令穰, 趙孟 등의 작품과 왕유 양식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몇가지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동기창에게 결정적으로 왕유양식의 筆墨이라고 인정하게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기본적으로 《江山雪霽》와 《輞川圖》의 임모본 이었다.
동기창은 《江山雪霽》와 《輞川圖》 임모본의 연구를 통해서 왕유양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왕유 필법의 의도를 통해 동기창 자신의 새로운 필법을 창작하는 기반을 세운다. 이를 통해 동기창은 《輞川圖》의 임모본을 본 후 3개월만에 《婉草堂圖》를 그리며, 《婉草堂圖》는 그가 《江山雪霽》와 《輞川圖》를 통해 발견해 낸 왕유양식의 실천의 결과였다. 다시 말하면, 《江山雪霽》의 발견은 동기창으로 하여금 남종화이론을 다시 수립하게 한다. 동기창에 의하면 남종적 특징인 간략한 준법은 왕유에게서 시작하여, 董源을 거쳐 원 4대가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동기창은 《江山雪霽》에서 보이는 간략한 준법은 북송을 거치면서 披麻으로 발전하며, 피마준은 남종화 전통을 관통하는 주요한 기법양식이라고 보았다. 동기창은 1595년 왕유 《江山雪霽》의 제발에서 “무릇 諸家의 준법은 唐에서부터 宋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는 마치 禪家에 五家宗派가 있는 것과 같으며, 단편적인 언사만 들어도 어느 문파의 자손인지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婉草堂圖》상의 준법과 《江山雪霽圖》는 다르다. 당연히 이것은 동기창이 왕유의 필법을 기계적으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筆意를 통해 새롭게 해석한 것이다. 《江山雪霽》의 바위기법은 강렬한 명암의 대비가 있으나, 그 그림이 雪景이어서 눈에 덮혀 빛나는 면이 비교적 크다. 단지 바위의 하부와 안쪽의 일부분만이 드러나 음영의 효과를 더하고 있다. 《江山雪霽》의 암석들의 표면은 몇가닥 구륵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면 細들이 결여되어 있다. 陰暗處도 묵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婉草堂圖》와 같은 이 중첩되어 있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婉草堂圖》는 평행로 길게 이어지는 이 면을 확장하여 먹색이 비교적 진한데, 이로써 이 없는 곳과 비교적 강렬한 명암대비를 이룬다. 그러나 이 두 그림이 필묵으로 나타내려 하는 효과는 비슷하다. 모두 바위를 간단하게 평행으로 중첩해서 평면적 명암대비의 효과를 강렬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의 응용은 동기창이 古代의 화풍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取勢”의 관념으로 양식을 이해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기창은 북송의 그림에 대한 감상을 통하여 얻은 신념을 바탕으로 남종양식의 형식적 완결을 《婉草堂圖》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으며, 남북종론의 타당한 근거로 여겼던 것이다.
추천자료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방안과 현상태.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방안과 현상태.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법제정비방안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법제정비방안 남북협력확대와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방안
남북협력확대와 통일에 대비한 북한지역 근로자들의 직업훈련방안 남북전쟁과 흑인 문제
남북전쟁과 흑인 문제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남북관계의 조명
남북관계의 조명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 영향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동북아시아에 영향 미국남북전쟁 ppt자료
미국남북전쟁 ppt자료 [남북한언어][남북한언어정책][북한어][남북어][언어정책]남북한의 언어차이, 남북한 언어정...
[남북한언어][남북한언어정책][북한어][남북어][언어정책]남북한의 언어차이, 남북한 언어정... [한민족공동경제권][공동경제권][남북한][남한과 북한][남북관계][남북통일]한민족 공동경제...
[한민족공동경제권][공동경제권][남북한][남한과 북한][남북관계][남북통일]한민족 공동경제... [도마 안중근의사][이토히로부미살해][의거기념남북협력사업]도마 안중근의사의 역사적 의의,...
[도마 안중근의사][이토히로부미살해][의거기념남북협력사업]도마 안중근의사의 역사적 의의,... 남북 외교 현황 - ( 근 10년 )
남북 외교 현황 - ( 근 10년 ) 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와 ...
남북 정치교류와 통치구조의 쟁점 - 남북한 정치교류의 현황과 평가, 바람직한 정치공동체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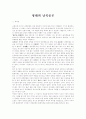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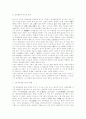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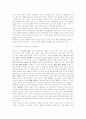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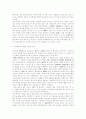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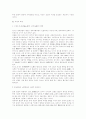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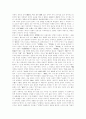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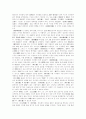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