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第 1 項 (제1항) 序論(서론)
第 2 項(제2항) 法律(법률)行爲(행위)의 目的(목적)의 可能(가능)
第 3 項(제3항)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適法(적법)
第 4 項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社會的(사회적)妥當(타당)
第 2 項(제2항) 法律(법률)行爲(행위)의 目的(목적)의 可能(가능)
第 3 項(제3항)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適法(적법)
第 4 項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의 社會的(사회적)妥當(타당)
본문내용
는 見解(견해)와 暴利(폭리)行爲(행위)者(자)와 한 給付(급부)는 無效(무효)로서 返還(반환)을 請求(청구)할 수 있지만 暴利(폭리)行爲(행위)의 相對方(상대방)에게 한 給付(급부)行爲(행위)는 有效(유효)로 返還(반환)을 請求(청구)할 수 없다는 見解(견해)가 對立(대립)되어있다.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 - 目的(목적)의 確定(확정)
1. 意義(의의)
(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을 明白(명백)히 確定(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表示行爲(표시행위)가 客觀的(객관적)으로 가지는 意味(의미)의 判斷(판단)이라고 해야한다.
2. 解釋(해석)의 標準(표준)
(1)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經濟的(경제적)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
當事者(당사자)가 達成(달성)하려고 한 經濟的(경제적) 또는 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을 捕捉(포착)하여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全內容(전내용)을 이 目的(목적)에 適合(적합)하도록 解釋(해석)하는 것이 法律行爲(법률행위)의 첫째 標準(표준)이다.
(2) 事實(사실)인 慣習(관습)
(가) 意義(의의)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社會(사회)의 이른바 法的確信(법적확신)에 支持(지지)되어서 法(법)으로서의 價値(가치)를 가지게 된 慣習(관습), 즉 慣習法(관습법)에 對應(대응)하는 觀念(관념)이다.
(나) 第 106 條 (제106조) 適用(적용)의 要件(요건)
① 强行規定(강행규정)에 委叛(위반)하지 않고 또한 任意(임의)規定(규정)과는 다른 慣習(관습)이 있을 것
②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가 明確(명확)하지 않을 것
③ 事實(事實(사실))인 慣習(관습)과 慣習法(관습법)
(a) 兩者(양자)는 社會(사회)의 法的(법적)確信(확신)의 支持(지지)與否(여부)에 따라 區別(구별).
(b)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를 解釋(해석)하는 標準(표준)이 됨으로써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되고 이 때에 비로소 效力(효력)을 가진다.
慣習法(관습법)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와는 關係(관계)없이 당연히 法規(법규)로서의 效力(효력)을 가진다.
(c) 慣習法(관습법)은 補充的(보충적)效力(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法律(법률)에 規定(규정)이 있는 事項(사항)에 관하여는 存在(존재) 할 수 없다.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을 통하여 任意(임의)規定(규정)을 開發(개발)하는 效力(효력)을 가진다.
(3) 任意(임의)糾正(규정)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明白(명백)히 任意(임의)規定(규정)과 다른 때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排斥(배척)되나, 그 이외의 境遇(경우)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이것과 다른 慣習(관습)보다는 뒤 順位(순위)이지만 역시 法律行爲(법률행위) 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된다.
法律行爲(법률행위)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되는 任意規定(임의규정)에는, 表示內容(표시내용)의 欠缺(흠결)을 補充(보충)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과 表示內容(표시내용)의 不明瞭(불명료) 한 점을 一定(일정)한 意味(의미)로 解釋(해석)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兩者(양자) 모두 法律行爲(법률행위)의 不明確(불명확) 한 점을 明確(명확)하게 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고, 兩者(양자)를 特別(특별)히 區別(구별)할 實益(실익)은 없다.
(4)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目的(목적)慣習(관습)任意規定(임의규정)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內容(내용)을 明確(명확)히 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는 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에 의하여 解釋(해석)할 수 밖에 없다.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 - 目的(목적)의 確定(확정)
1. 意義(의의)
(1) 法律行爲(법률행위)의 目的(목적)을 明白(명백)히 確定(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表示行爲(표시행위)가 客觀的(객관적)으로 가지는 意味(의미)의 判斷(판단)이라고 해야한다.
2. 解釋(해석)의 標準(표준)
(1)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經濟的(경제적)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
當事者(당사자)가 達成(달성)하려고 한 經濟的(경제적) 또는 社會的目的(사회적목적)을 捕捉(포착)하여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全內容(전내용)을 이 目的(목적)에 適合(적합)하도록 解釋(해석)하는 것이 法律行爲(법률행위)의 첫째 標準(표준)이다.
(2) 事實(사실)인 慣習(관습)
(가) 意義(의의)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社會(사회)의 이른바 法的確信(법적확신)에 支持(지지)되어서 法(법)으로서의 價値(가치)를 가지게 된 慣習(관습), 즉 慣習法(관습법)에 對應(대응)하는 觀念(관념)이다.
(나) 第 106 條 (제106조) 適用(적용)의 要件(요건)
① 强行規定(강행규정)에 委叛(위반)하지 않고 또한 任意(임의)規定(규정)과는 다른 慣習(관습)이 있을 것
②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가 明確(명확)하지 않을 것
③ 事實(事實(사실))인 慣習(관습)과 慣習法(관습법)
(a) 兩者(양자)는 社會(사회)의 法的(법적)確信(확신)의 支持(지지)與否(여부)에 따라 區別(구별).
(b)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를 解釋(해석)하는 標準(표준)이 됨으로써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되고 이 때에 비로소 效力(효력)을 가진다.
慣習法(관습법)은 當事者(당사자)의 意思(의사)와는 關係(관계)없이 당연히 法規(법규)로서의 效力(효력)을 가진다.
(c) 慣習法(관습법)은 補充的(보충적)效力(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法律(법률)에 規定(규정)이 있는 事項(사항)에 관하여는 存在(존재) 할 수 없다.
事實(사실)인 慣習(관습)은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解釋(해석)을 통하여 任意(임의)規定(규정)을 開發(개발)하는 效力(효력)을 가진다.
(3) 任意(임의)糾正(규정)
意思表示(의사표시)의 內容(내용)이 明白(명백)히 任意(임의)規定(규정)과 다른 때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排斥(배척)되나, 그 이외의 境遇(경우)에는 任意(임의)規定(규정)은 이것과 다른 慣習(관습)보다는 뒤 順位(순위)이지만 역시 法律行爲(법률행위) 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된다.
法律行爲(법률행위)解釋(해석)의 標準(표준)이 되는 任意規定(임의규정)에는, 表示內容(표시내용)의 欠缺(흠결)을 補充(보충)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과 表示內容(표시내용)의 不明瞭(불명료) 한 점을 一定(일정)한 意味(의미)로 解釋(해석)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 있는데 兩者(양자) 모두 法律行爲(법률행위)의 不明確(불명확) 한 점을 明確(명확)하게 하는 作用(작용)을 하는 것이고, 兩者(양자)를 特別(특별)히 區別(구별)할 實益(실익)은 없다.
(4)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
當事者(당사자)가 企圖(기도)하는 目的(목적)慣習(관습)任意規定(임의규정)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法律行爲(법률행위)의 內容(내용)을 明確(명확)히 할 수 없는 境遇(경우)에는 信義誠實(신의성실)의 原則(원칙)에 의하여 解釋(해석)할 수 밖에 없다.
추천자료
 게르만의 등기 제도와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게르만의 등기 제도와 로마법, 우리 민법과의 관계 [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과 판례
[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이론과 판례 [민법총칙]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 이론과 판례
[민법총칙]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 이론과 판례 [채권법]채권자지체(수령지체, 민법 제400조)에 대한 검토
[채권법]채권자지체(수령지체, 민법 제400조)에 대한 검토 타인 토지 매매 - 민법 사례 연구
타인 토지 매매 - 민법 사례 연구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내용과 특징 및 효력에 관한 논의(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내용과 특징 및 효력에 관한 논의(민법총칙) [법학과 - 민법총칙]16- C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법학과 - 민법총칙]16- C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A형)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A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D형)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민법총칙D형) (민사실체법)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
(민사실체법) 채권관리를 위한 민법총칙 졸업시험 1차 민법 대비
졸업시험 1차 민법 대비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총칙 중간고사답안지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총칙 중간고사답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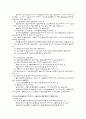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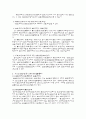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