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의동승의 의의
Ⅱ. 호의동승의 특징
1. 비계약성
2. 무상성
3. 호의성
4. 비운전성
Ⅲ. 호의동승과 무상동승과의 관계
Ⅳ. 호의동승에서의 문제
Ⅴ.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
1. 호의동승과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2. 배상책임의 감경
Ⅵ.호의동승 판례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손해배상(자)
2.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3.27. 선고 90다13284 손해배상(자)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1.15. 선고 90다13710 손해배상(자)
4.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다14461 손해배상(자)
5.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 4.25. 선고 90다카3062 손해배상(자)
6.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7.12. 선고 91다8418 채무부존재확인
7.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손해배상(자)
8.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손해배상(자)
9.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10.12. 선고 93다31078 손해배상(자)
10.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손해배상(자)
Ⅶ. 결론
Ⅱ. 호의동승의 특징
1. 비계약성
2. 무상성
3. 호의성
4. 비운전성
Ⅲ. 호의동승과 무상동승과의 관계
Ⅳ. 호의동승에서의 문제
Ⅴ.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
1. 호의동승과 자동차보유자의 책임에 관한 문제점
2. 배상책임의 감경
Ⅵ.호의동승 판례
1.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손해배상(자)
2.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3.27. 선고 90다13284 손해배상(자)
3.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1.15. 선고 90다13710 손해배상(자)
4.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다14461 손해배상(자)
5.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0. 4.25. 선고 90다카3062 손해배상(자)
6.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7.12. 선고 91다8418 채무부존재확인
7.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0586 손해배상(자)
8.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24561 손해배상(자)
9.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5.10.12. 선고 93다31078 손해배상(자)
10.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손해배상(자)
Ⅶ. 결론
본문내용
자인 피고들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은 85%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책임감경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책임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감경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현저하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당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기주가 위 망 박현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사고 전날 동인과 함께 잠을 잤으며 사고 당일 동인을 출근시키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기주가 박현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기주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피해자측 과실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박현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 박현미가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박현미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비추어 동인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8(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박현미의 선행 사인은 골반 골절,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임을 알 수 있어 박현미는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골반 부위에 하중을 받아 골반이 골절되고 그 부위에서 과다한 출혈이 있게 됨으로써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가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박현미의 골반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는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박현미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를 하여 보기 전에는 박현미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혹은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Ⅶ. 결론
자배법에는 호의동승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 결과 그 법은 일응 호의동승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동법 제3조도 마찬가지이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상해에 대한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언제나, 그리고 피해자가 승객 아닌 자인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과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상 호의동승자는「승객아닌 자」에 해당할 것이다. 승객은 유상계약에 의하여 운송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의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 및 그 제1호에 의하여 추상적 과실이 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배법은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제도를 두고 있으나 모든 손해(무한적인 손해)에 대하여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범위에서만 철저하게 손해를 전보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의동승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이 있는 한 그 범위에서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운행자는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책임보험금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설사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거기에는 구체적과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3조, 제39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호의동승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과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동승자, 혹은 그 유족이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나(당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동승자 혹은 그 유족들이 그 동승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은 오로지 동승 차량 운행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요건에 해당할 뿐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이기주가 위 망 박현미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사고 전날 동인과 함께 잠을 잤으며 사고 당일 동인을 출근시키다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기주가 박현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기주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피해자측 과실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망 박현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고 당시 박현미가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와 박현미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에 비추어 동인이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8(사망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박현미의 선행 사인은 골반 골절,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임을 알 수 있어 박현미는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골반 부위에 하중을 받아 골반이 골절되고 그 부위에서 과다한 출혈이 있게 됨으로써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가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승객을 좌석에 고정시켜 충격을 방지하는 등으로 승객의 피해를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위 화물트럭과 전신주와의 충돌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박현미의 골반 부위에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는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 경위와 부상 부위, 사망이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박현미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를 하여 보기 전에는 박현미의 안전띠 미착용 사실과 사망이라는 손해 발생 혹은 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Ⅶ. 결론
자배법에는 호의동승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그 결과 그 법은 일응 호의동승에도 적용된다고 하여야 한다. 동법 제3조도 마찬가지이다.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상해에 대한 자동차의 운행자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닌 한 언제나, 그리고 피해자가 승객 아닌 자인 경우에는 운행자와 운전자가 과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상 호의동승자는「승객아닌 자」에 해당할 것이다. 승객은 유상계약에 의하여 운송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의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자배법 제3조 및 그 제1호에 의하여 추상적 과실이 있는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자배법은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제도를 두고 있으나 모든 손해(무한적인 손해)에 대하여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이 강제되는 범위에서만 철저하게 손해를 전보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호의동승의 경우에도 책임보험이 있는 한 그 범위에서는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운행자는 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책임보험금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설사 임의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거기에는 구체적과실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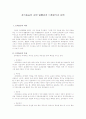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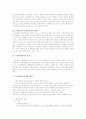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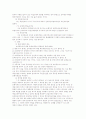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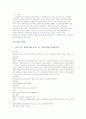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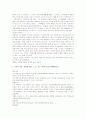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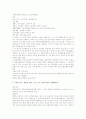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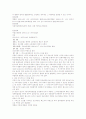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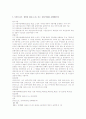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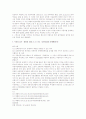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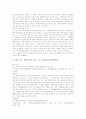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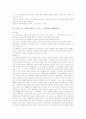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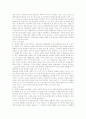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