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대리권이론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독일민법상 외관대리와 묵인대리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정
1. ROHG의 판례
2. RG의 판례
(1) 개설
(2) 묵시적 수권론에 의한 구성
(3) 외관이론에 의한 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1) 개설
(2) 묵인대리
(3) 외관대리
Ⅳ. 학설의 전개 및 동향
1. 초기의 학설
(1) 묵시적 대리권수여론
(2) 외관이론
2. 현재의 학설
(1) 묵인대리에 관한 학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Ⅴ. 맺는 말
Ⅱ. 대리권이론
1. 대리권의 의의
2.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독일민법상 외관대리와 묵인대리에 관한 판례의 발전과정
1. ROHG의 판례
2. RG의 판례
(1) 개설
(2) 묵시적 수권론에 의한 구성
(3) 외관이론에 의한 구성
(4) 적용범위
3. BGH의 판례
(1) 개설
(2) 묵인대리
(3) 외관대리
Ⅳ. 학설의 전개 및 동향
1. 초기의 학설
(1) 묵시적 대리권수여론
(2) 외관이론
2. 현재의 학설
(1) 묵인대리에 관한 학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않고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v.Craushaar는 묵인대리를 민법 제171조 이하 및 상법 제56조를 유추하여 추단적인 표명으로 파악하고, 단지 구체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는 묵인대리에 있어 본인에의 효과귀속을 본인의 귀책 또는 본인의 인식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신뢰가 위협을 받는다는 데서 찾는다. 때문에 그는 묵인대리의 모든 경우에 착오에 의한 취소가능성을 일체 배제한다.
한편, Frotz는 본인의 행동이 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그것이 자기에 대한 대리권의 통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그것이 부인될 때는 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지 민법 제179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적극적 채권침해, 불법행위 등에 의한 해결이 남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통지행위의 외관은 있으나 통지의사가 결여된 경우에 이를 의사표시로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한 것에 대한 책임문제로 해결한다. Schramm은 민법 제170조 내지 173조의 규정들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나 특별한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한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묵인대리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묵인대리의 기초는 본인의 인식하에 형성된 대리권의 외관에 대한 외관책임이라고 한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가)다수설은 외관대리를 표현대리의 한 종류로 파악한다. 다만, 그 유효성의 근거를 학자에 따라서는 관습법으로 고양된 오랜 판례에서 찾기도 하고, 민법 제242조 또는 민법 제170조 이하,제370조 및 상법 제56조의 유추
)BGB-RGRK/Steffen, 167Rdnr.12;Westermann,주106),s.1ff.;Ermann/Westermann, 167 Rdnr.10.
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견해나 거래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권리외관이 문제로 되는 데서 도출된다. 본인의 귀책이 요구되느냐 아니면 본인의 위험영역에서의 그밖의 유발로 족하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한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냐에 관혀는 일치하여 이를 부정한다. (나)위와 같은 다수설과는 달리 Fabricius는 본인이 자칭대리인의 행동을 알고 묵인한 사례와 본인이 자칭대리인의 행동을 알지 못한 사례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는 조직의 권한을 가진 자는 조직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자칭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
Flume는 묵인대리와 마찬가지로 외관대리도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판례가 인정하는 외관대리에 기한 본인의 책임은 자기결정에 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私的 自治의 원칙에 모순되고, 특별히 그러한 카테고리를 따로 세울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외관대리이론은 그 타당성을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독일 법질서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의식없이 창출된 대리권의 외관을 방임하고 있는 자는 자기결정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외관대리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있고 그것이 본인의 의무위반에 기한 경우라든가, 본인이 자칭대리인의 과실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 및 자기의 의무이행에 사용한 자의 과실에 관하여 자기의 과실과 동일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면 족하고, 이것은 계약체결상의 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된다고 한다. 결국 그는 외관대리의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유권대리의 문제로 처리하고, 이를 가지고 구제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Flume에 의하여 이 범위에서 전쟁 前의 이론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lume의 견해를 따르는 Medicus는 계약체결행위에 있어 의사표시 및 귀책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가테고리를 뒤섞을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외관대리의 경우에 법에 반하여 이행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Canaris 또한 Flume의 견해에 동조한다. 그는 묵인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인식된 외관의 창출이 아닌 단순히 과실에 의한 외관의 창출은 권리외관론에 기한 책임을 지우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그는 외관대리의 경우에는 그밖에 통지의 인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민법 제171조1항이나 172조 1항을 유추하여 이행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다. 다만, 민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상인의 영업활동의 특수성을 이유로 상거래에서는 외관대리를 인정한다.
Bader 역시 마찬가지이다
)Bader,주1),s.199.
. 그는 외관대리에는 민법 제171조1항이나 172조 1항 또는 상법 제56조를 유추할 수 없다고 하고, 외관대리의 사례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Larenz도 외관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본인이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단지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킬 뿐이라고 한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독일에서의 묵인대리와 외관대리를 판례,학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결국 묵인대리 및 외관대리의 이론은 대리제도에 있어서의 선의자 보호에 관한 실정법상의 규정이 미흡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판례가 선도하고 학설이 이를 뒷받침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이와 같은 제도를 살펴 봄에 있어 자료수집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필자 자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 자체가 애당초 필자에게는 능력 밖의 것이었다. 다행히 서울시립대학교의 金學東교수께서 일찍이 묵인대리와 외관대리를 포함한 독일의 표현대리를 광범위하고도 자세하게 다룬 글을 발표하신 일이 있어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 외국법이론의 소개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이 글을 맺는다.
한편, Frotz는 본인의 행동이 거래 상대방에 의하여 그것이 자기에 대한 대리권의 통지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그것이 부인될 때는 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지 민법 제179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적극적 채권침해, 불법행위 등에 의한 해결이 남을 뿐이라고 한다. 그는 통지행위의 외관은 있으나 통지의사가 결여된 경우에 이를 의사표시로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해한 것에 대한 책임문제로 해결한다. Schramm은 민법 제170조 내지 173조의 규정들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나 특별한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한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묵인대리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묵인대리의 기초는 본인의 인식하에 형성된 대리권의 외관에 대한 외관책임이라고 한다.
(2) 외관대리에 관한 학설
(가)다수설은 외관대리를 표현대리의 한 종류로 파악한다. 다만, 그 유효성의 근거를 학자에 따라서는 관습법으로 고양된 오랜 판례에서 찾기도 하고, 민법 제242조 또는 민법 제170조 이하,제370조 및 상법 제56조의 유추
)BGB-RGRK/Steffen, 167Rdnr.12;Westermann,주106),s.1ff.;Ermann/Westermann, 167 Rdnr.10.
에서 찾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견해나 거래상대방의 선의를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는 권리외관이 문제로 되는 데서 도출된다. 본인의 귀책이 요구되느냐 아니면 본인의 위험영역에서의 그밖의 유발로 족하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한편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냐에 관혀는 일치하여 이를 부정한다. (나)위와 같은 다수설과는 달리 Fabricius는 본인이 자칭대리인의 행동을 알고 묵인한 사례와 본인이 자칭대리인의 행동을 알지 못한 사례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는 조직의 권한을 가진 자는 조직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자칭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의사표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한다.
Flume는 묵인대리와 마찬가지로 외관대리도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판례가 인정하는 외관대리에 기한 본인의 책임은 자기결정에 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私的 自治의 원칙에 모순되고, 특별히 그러한 카테고리를 따로 세울 필요는 없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외관대리이론은 그 타당성을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독일 법질서에 있어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의식없이 창출된 대리권의 외관을 방임하고 있는 자는 자기결정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외관대리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있고 그것이 본인의 의무위반에 기한 경우라든가, 본인이 자칭대리인의 과실에 대하여 \"채무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 및 자기의 의무이행에 사용한 자의 과실에 관하여 자기의 과실과 동일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민법 제278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면 족하고, 이것은 계약체결상의 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된다고 한다. 결국 그는 외관대리의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유권대리의 문제로 처리하고, 이를 가지고 구제할 수 없는 것에 한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Flume에 의하여 이 범위에서 전쟁 前의 이론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lume의 견해를 따르는 Medicus는 계약체결행위에 있어 의사표시 및 귀책에 관하여 두 개의 서로 다른가테고리를 뒤섞을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외관대리의 경우에 법에 반하여 이행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
Canaris 또한 Flume의 견해에 동조한다. 그는 묵인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인식된 외관의 창출이 아닌 단순히 과실에 의한 외관의 창출은 권리외관론에 기한 책임을 지우기에 부족하다고 한다. 그는 외관대리의 경우에는 그밖에 통지의 인식조차도 없기 때문에 민법 제171조1항이나 172조 1항을 유추하여 이행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다. 다만, 민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법적 안정성의 요구와 상인의 영업활동의 특수성을 이유로 상거래에서는 외관대리를 인정한다.
Bader 역시 마찬가지이다
)Bader,주1),s.199.
. 그는 외관대리에는 민법 제171조1항이나 172조 1항 또는 상법 제56조를 유추할 수 없다고 하고, 외관대리의 사례들은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Larenz도 외관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지울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본인이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단지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킬 뿐이라고 한다.
Ⅴ. 맺는 말
이상에서 독일에서의 묵인대리와 외관대리를 판례,학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결국 묵인대리 및 외관대리의 이론은 대리제도에 있어서의 선의자 보호에 관한 실정법상의 규정이 미흡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판례가 선도하고 학설이 이를 뒷받침한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독일의 이와 같은 제도를 살펴 봄에 있어 자료수집의 한계와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필자 자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 자체가 애당초 필자에게는 능력 밖의 것이었다. 다행히 서울시립대학교의 金學東교수께서 일찍이 묵인대리와 외관대리를 포함한 독일의 표현대리를 광범위하고도 자세하게 다룬 글을 발표하신 일이 있어 다소나마 안심이 된다. 외국법이론의 소개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며 이 글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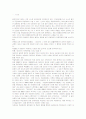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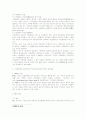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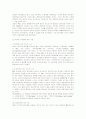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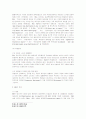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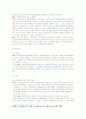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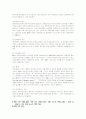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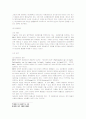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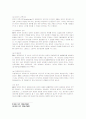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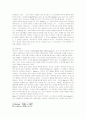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