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본원사 목포별원(東本願寺 木浦別院)
(2)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
(3) 일본영사관(현 목포문화원)
(4) 구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
(5) 정명여학교(木浦貞明女學校)
(6) 오포대(午砲臺)
(7) 동명왕상(不動明王像)과 홍법대사상(弘法大師像)
(8) 이훈동 정원
(2) 무안감리서(務安監理署)
(3) 일본영사관(현 목포문화원)
(4) 구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植株式會社)
(5) 정명여학교(木浦貞明女學校)
(6) 오포대(午砲臺)
(7) 동명왕상(不動明王像)과 홍법대사상(弘法大師像)
(8) 이훈동 정원
본문내용
원은 일정치하에 일본인에 의하여 조영된 소규모 정원이었으나 50년이 지나는 동안 이훈동씨의 독창적 수목관리와 시성이 규모확장을 통해서 지금에 와서는 입구정원, 안뜰정원, 임천정원, 후원으로 이루어져 일보 진전한 한국식 정원으로 변모되었으며 다양한 식물 내용 때문에 교육적 연구자료로서 가치 있는 자원이 되고 있다. 이 곳에 심어진 나무는 우리 나라의 야생종 38종과 일본종 37종, 중국종 26종, 기타 13종으로 함께 117종에 이르나 그루수로 본다면 일본종이 단연 우세하다.
이훈동씨 정원수 중 가장 가치 있는 나무는 현관 앞에 있는 암수 한 쌍의 향나무로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심은 나무가 아닌 자생목이라고 하며, 일본의 화산 폭발 때 씨가 목포까지 날아와서 자생했을 것이라고 전한다.
400여 그루의 관수목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단 하나뿐인 흑사리 나무와 씨앗이 떨어져 자연적으로 성장했다는 암수 향나무 등 희귀종의 수종들로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8년 3월 16일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자료 제16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지금은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되며 개인 주택이라 사생활 보장으로 일반인들 관람은 어렵다. 그렇다면 주말이나 일요일 시간을 정하여 개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위와 같이 결코 그것들이 자랑스런 역사의 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목포에 의연히 남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해방 이후에 목포의 발전이 정체되어 왔다는 점이다. 일개 무안반도의 끄트머리 소 촌에 불과하던 목포란 마을이 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개항되면서부터이다. 그러던 목포가 해방과 더불어 발전이 정체되어 버림에 따라 자연히 일제 식민지배의 시설과 흔적들은 철거될 여유를 갖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고 우리들 머리 속에 멀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해방 이후에 목포의 ‘일본인 거리’가 침체되었다는 점이다. 일제시기에 목포의 시가지는 ‘일본인 거리’와 ‘조선인 거리’로 엄격히 구분되어 조성되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마련된 일본인 거리는 근대적 도로시설을 갖춘 계획된 거리였던 데 반해 조선인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계획적인 거리였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무질서하게 보이던 조선인 거리는 도시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반면에 일본인이 빠져나간 일본인 거리는 썰렁한 침체의 거리로 빠져들었고 지금은 다른 시가지와 다를 바 없는 작은 시에 불과하다. 악랄한 착취의 상징이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이 남긴 생활을 비교해 보고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개항과 더불어 그들은 목포를 우리 나라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지금도 선창 구도심을 주변으로 그러한 건물이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유적들이 일제 잔재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근대사의 자료가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다. 우리는 골동품이나 귀하다는 물건의 개념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자기·조선 백자·정선의 그림, 추사의 글씨로만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근대사문화자료라는 것은 박물관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귀한 물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서남권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당시에 사용되었던 생활문화자료의 수집에도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부각시키는 대표적 건조물을 보전하고 시민의 역사교육장 및 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원형을 복원하며 역사공간 체험의 장으로 추진하여 후손들이 목포 근대사를 알고 또 일본인 관광객들이 과거의 잘못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훈동씨 정원수 중 가장 가치 있는 나무는 현관 앞에 있는 암수 한 쌍의 향나무로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이 심은 나무가 아닌 자생목이라고 하며, 일본의 화산 폭발 때 씨가 목포까지 날아와서 자생했을 것이라고 전한다.
400여 그루의 관수목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단 하나뿐인 흑사리 나무와 씨앗이 떨어져 자연적으로 성장했다는 암수 향나무 등 희귀종의 수종들로 그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88년 3월 16일 전라남도 지방문화재 자료 제165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지금은 지방문화재로 지정 보호되며 개인 주택이라 사생활 보장으로 일반인들 관람은 어렵다. 그렇다면 주말이나 일요일 시간을 정하여 개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위와 같이 결코 그것들이 자랑스런 역사의 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목포에 의연히 남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해방 이후에 목포의 발전이 정체되어 왔다는 점이다. 일개 무안반도의 끄트머리 소 촌에 불과하던 목포란 마을이 일대 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개항되면서부터이다. 그러던 목포가 해방과 더불어 발전이 정체되어 버림에 따라 자연히 일제 식민지배의 시설과 흔적들은 철거될 여유를 갖지 못하고 훼손되고 있고 우리들 머리 속에 멀어지고 있다. 또 하나는 해방 이후에 목포의 ‘일본인 거리’가 침체되었다는 점이다. 일제시기에 목포의 시가지는 ‘일본인 거리’와 ‘조선인 거리’로 엄격히 구분되어 조성되었다. 개항장을 중심으로 마련된 일본인 거리는 근대적 도로시설을 갖춘 계획된 거리였던 데 반해 조선인 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계획적인 거리였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무질서하게 보이던 조선인 거리는 도시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반면에 일본인이 빠져나간 일본인 거리는 썰렁한 침체의 거리로 빠져들었고 지금은 다른 시가지와 다를 바 없는 작은 시에 불과하다. 악랄한 착취의 상징이지만 일본인과 조선인이 남긴 생활을 비교해 보고 우리는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개항과 더불어 그들은 목포를 우리 나라 근대사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로 만들었다.
지금도 선창 구도심을 주변으로 그러한 건물이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러한 유적들이 일제 잔재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근대사의 자료가 된다는 인식을 갖지 못했다. 우리는 골동품이나 귀하다는 물건의 개념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자기·조선 백자·정선의 그림, 추사의 글씨로만 생각하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근대사문화자료라는 것은 박물관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귀한 물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서남권을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당시에 사용되었던 생활문화자료의 수집에도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부각시키는 대표적 건조물을 보전하고 시민의 역사교육장 및 도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원형을 복원하며 역사공간 체험의 장으로 추진하여 후손들이 목포 근대사를 알고 또 일본인 관광객들이 과거의 잘못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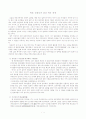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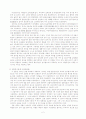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