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사로국의 진한 제소국 통합과정과 백제와의 교전
3. 이사금시기의 복속지역 통제방식
4. 마립간시기 말기 지방통치방식의 실상
1) 금석문에 반영된 6세기 초의 촌락 상황
2) 마립간시기의 지방관 파견과 그 배경
5. 결 론
참고문헌
1. 서 론
2. 사로국의 진한 제소국 통합과정과 백제와의 교전
3. 이사금시기의 복속지역 통제방식
4. 마립간시기 말기 지방통치방식의 실상
1) 금석문에 반영된 6세기 초의 촌락 상황
2) 마립간시기의 지방관 파견과 그 배경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냉수비」에서 확인되는 \'탐수도사(耽須道使)\'는 바로 이같은 배경하에서 등장한 \'본격적인\' 지방관으로 판단된다.
) 물론 도사는 재지수장층의 도움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수장층의 지역사회에서의 현실적 위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상은 이제 필연적으로 격하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중고기 초 지방의 유력인사들에 대해 \'外位\'의 지급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을 국가의 공식 지배체제내에 흡수하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들의 위상을 \'지방관\'에 못미치는 것으로 떨어뜨리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들이 비록 \'○干支\'를 칭하더라도 낮은 경위를 지닌 지방관보다 저급한 위상을 가졌다는 것은 「남산신성비」나 「명활산성비」 등의 중고기의 축성관계 금석문에 잘 나타나 있다. 흔히 『三國史記』 권40 職官下에 보이는 외위 관련 기사 가운데 京位와의 대응을 설정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그러한 대응관계가 본래부터 있었을 것으로 상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통일전쟁과정을 거치면서 지방민의 활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도사가 효율적인 조세 수취를 위해 각 지역에 파견되었지만, 어차피 촌락사회와 직접 접촉하게 된 마당에, 그 방면에만 국가통치력을 관철시켰을 리는 없다. 군사지휘관이 이미 실행시키고 있던 역역 동원에서의 직접지배를 도사가 분담하게 되었을 것은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촌락의 내부사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된 도사가 그러한 일을 맡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도사는 자기가 관할하는 몇개 촌락의 인원만으로도 가능한 소규모 토목공사, 예컨대 조그마한 수리시설의 축조 등에서는 군사지휘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동력을 징발 운용하였을 것이며, 자신의 관할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큰 지역단위의 공사, 즉 산성의 신 개축 등의 대규모 공사에는 상급의 군사지휘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촌락민을 동원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군사지휘관과 도사의 관계는 상호병렬적(相互竝列的)이면서도 상하영속적(上下領屬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마립간시기 후반에 성립된 신라의 지방통치체제는 거점지역 군사지휘관의 지방관화와 행정적 측면의 임무가 강조된 새로운 지방관의 파견을 통해 짜임새를 갖추게 되었다.
) 道使가 처음 파견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단 「냉수비」가 세워진 503년 이전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냉수비」 단계에서는, 「봉평비」의 \'使人\'처럼 지방민으로서 도사의 임무를 보좌하는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등, 「봉평비」 단계에 비해 아직 지방통치체제가 덜 짜여진 모습이 간취된다. 이것은 곧 도사의 최초 파견이 503년에서 그다지 멀리 소급되지는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혹시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9년조에 보이는 \"命群官 擧才堪牧民者 各一人\"이라는 기사가 도사의 최초 파견과 관련되는 것일지 모르겠다. 朱甫暾, 1998 앞의 책, 62∼63쪽에서는 이 기사를 도사 파견시기의 下限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최말단 지방행정 단위를 맡게 된 본격적인 지방관으로서의 후자 즉 도사(道使)는 조세의 수취와 소규모 노동력 징발의 면에서는 직접 중앙과 연결되고, 대규모 역역 동원이나 군사활동에 있어서는 전자 곧 군주(軍主)나 중고기 금석문상의 당주(幢主)의 휘하에 일정하게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봉평비」에 보이는 \'실지군주(悉支軍主)\'와 \'실지도사(悉支道使)\'는 바로 이러한 관계 위에서 함께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사금시기 후반 진한 통합의 완료 후 한동안 미루어왔던 직접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5. 결 론
신라가 3∼4세기에 진한의 여타 소국들을 모두 복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는 3성 족단 체제의 성립에 따른 내적 역량의 증대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백제의 침입이었고, 신라는 백제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주위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소국들을 하나씩 정복해갔다.
신라는 이렇게 하여 복속시킨 지역에 대해 처음에는 \'거점지배\'와 \'간접지배\'의 형태로 지배력을 관철시켰다. 거점지배는 군사적 요충지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 군사력을 통해 주위의 복속지역을 감시·통제하는 것이었고, 간접지배는 중앙에서 민정(民政)을 책임지는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여 복속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구래의 수장층을 이용하여 공물을 수취하거나 노동력을 동원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사금시기에 통용된 이러한 지배방식은 마립간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직접지배의 형태로 바뀌어갔다. 그것은 우선 각 지역의 군사 지휘관이 민정관의 성격을 아울러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거기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산성방어체계의 구축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한편 5세기를 거치면서 철제 농기구의 확산과 우경의 보급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는 바, 이로 인해 기층사회의 공동체에 분해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신라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수장층을 통한 간접지배에 연연하지 않고, 조세 수취와 역역 징발 등을 전담하는 새로운 성격의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냉수비」 등에 나타난 \'도사(道使)\'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등장한 지방관이다. 이후 신라의 지방통치방식은 직접지배의 틀을 보다 정교히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였으며, 중고기의 이른바 \'주군제(州郡制)\'는 그 구성작업이 일단락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김철준, 1952.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 <<력사학보>> 1, 2.
김태식, 2003. <초기 고대국가론>,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노중국, 1994. <삼국의 통치체제>, <<한국사>> 3, 한길사.
노태돈, 1975. <삼국시대의 부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
노태돈, 1989. <울진봉평신라비와 신라의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2.
노태돈, 1994. <고조선의 변천>,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 물론 도사는 재지수장층의 도움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수장층의 지역사회에서의 현실적 위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상은 이제 필연적으로 격하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중고기 초 지방의 유력인사들에 대해 \'外位\'의 지급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을 국가의 공식 지배체제내에 흡수하겠다는 의미와 더불어, 그들의 위상을 \'지방관\'에 못미치는 것으로 떨어뜨리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들이 비록 \'○干支\'를 칭하더라도 낮은 경위를 지닌 지방관보다 저급한 위상을 가졌다는 것은 「남산신성비」나 「명활산성비」 등의 중고기의 축성관계 금석문에 잘 나타나 있다. 흔히 『三國史記』 권40 職官下에 보이는 외위 관련 기사 가운데 京位와의 대응을 설정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그러한 대응관계가 본래부터 있었을 것으로 상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통일전쟁과정을 거치면서 지방민의 활약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편 도사가 효율적인 조세 수취를 위해 각 지역에 파견되었지만, 어차피 촌락사회와 직접 접촉하게 된 마당에, 그 방면에만 국가통치력을 관철시켰을 리는 없다. 군사지휘관이 이미 실행시키고 있던 역역 동원에서의 직접지배를 도사가 분담하게 되었을 것은 쉽게 상정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촌락의 내부사정을 확실하게 파악하게 된 도사가 그러한 일을 맡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도사는 자기가 관할하는 몇개 촌락의 인원만으로도 가능한 소규모 토목공사, 예컨대 조그마한 수리시설의 축조 등에서는 군사지휘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동력을 징발 운용하였을 것이며, 자신의 관할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큰 지역단위의 공사, 즉 산성의 신 개축 등의 대규모 공사에는 상급의 군사지휘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촌락민을 동원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군사지휘관과 도사의 관계는 상호병렬적(相互竝列的)이면서도 상하영속적(上下領屬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마립간시기 후반에 성립된 신라의 지방통치체제는 거점지역 군사지휘관의 지방관화와 행정적 측면의 임무가 강조된 새로운 지방관의 파견을 통해 짜임새를 갖추게 되었다.
) 道使가 처음 파견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단 「냉수비」가 세워진 503년 이전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냉수비」 단계에서는, 「봉평비」의 \'使人\'처럼 지방민으로서 도사의 임무를 보좌하는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등, 「봉평비」 단계에 비해 아직 지방통치체제가 덜 짜여진 모습이 간취된다. 이것은 곧 도사의 최초 파견이 503년에서 그다지 멀리 소급되지는 않을 것을 시사한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혹시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19년조에 보이는 \"命群官 擧才堪牧民者 各一人\"이라는 기사가 도사의 최초 파견과 관련되는 것일지 모르겠다. 朱甫暾, 1998 앞의 책, 62∼63쪽에서는 이 기사를 도사 파견시기의 下限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최말단 지방행정 단위를 맡게 된 본격적인 지방관으로서의 후자 즉 도사(道使)는 조세의 수취와 소규모 노동력 징발의 면에서는 직접 중앙과 연결되고, 대규모 역역 동원이나 군사활동에 있어서는 전자 곧 군주(軍主)나 중고기 금석문상의 당주(幢主)의 휘하에 일정하게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봉평비」에 보이는 \'실지군주(悉支軍主)\'와 \'실지도사(悉支道使)\'는 바로 이러한 관계 위에서 함께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사금시기 후반 진한 통합의 완료 후 한동안 미루어왔던 직접지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5. 결 론
신라가 3∼4세기에 진한의 여타 소국들을 모두 복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근원적으로는 3성 족단 체제의 성립에 따른 내적 역량의 증대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그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백제의 침입이었고, 신라는 백제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전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주위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소국들을 하나씩 정복해갔다.
신라는 이렇게 하여 복속시킨 지역에 대해 처음에는 \'거점지배\'와 \'간접지배\'의 형태로 지배력을 관철시켰다. 거점지배는 군사적 요충지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 군사력을 통해 주위의 복속지역을 감시·통제하는 것이었고, 간접지배는 중앙에서 민정(民政)을 책임지는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여 복속지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구래의 수장층을 이용하여 공물을 수취하거나 노동력을 동원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사금시기에 통용된 이러한 지배방식은 마립간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직접지배의 형태로 바뀌어갔다. 그것은 우선 각 지역의 군사 지휘관이 민정관의 성격을 아울러 갖게 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거기에는 고구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산성방어체계의 구축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한편 5세기를 거치면서 철제 농기구의 확산과 우경의 보급 등으로 농업생산력이 향상되었는 바, 이로 인해 기층사회의 공동체에 분해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신라의 지배층으로 하여금 더 이상 수장층을 통한 간접지배에 연연하지 않고, 조세 수취와 역역 징발 등을 전담하는 새로운 성격의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게 한 요인이 되었다. 「냉수비」 등에 나타난 \'도사(道使)\'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등장한 지방관이다. 이후 신라의 지방통치방식은 직접지배의 틀을 보다 정교히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전하였으며, 중고기의 이른바 \'주군제(州郡制)\'는 그 구성작업이 일단락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김철준, 1952. <신라 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 <<력사학보>> 1, 2.
김태식, 2003. <초기 고대국가론>, <<강좌 한국고대사>>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노중국, 1988.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노중국, 1994. <삼국의 통치체제>, <<한국사>> 3, 한길사.
노태돈, 1975. <삼국시대의 부에 관한 연구>, <<한국사론>> 2.
노태돈, 1989. <울진봉평신라비와 신라의 관등제>, <<한국고대사연구>> 2.
노태돈, 1994. <고조선의 변천>, <<단군 -그 이해와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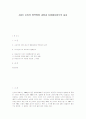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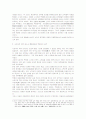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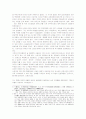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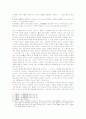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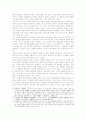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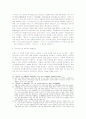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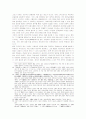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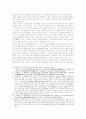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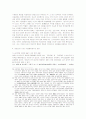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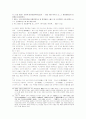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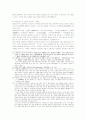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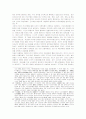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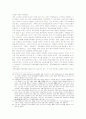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