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시간 : 천 년을 열장에
1. 현대소설에서의 시간문제
2. 이중시간
3. 기계적 시간 ↔ 체험된 시간
4. 내면적 시간. 회상
5. 동시성
1. 현대소설에서의 시간문제
2. 이중시간
3. 기계적 시간 ↔ 체험된 시간
4. 내면적 시간. 회상
5. 동시성
본문내용
性)도 고려해야 한다.
● \'음악적\' 종합구조를 통해 서사적 연속성을 극복하려는 집요함은 직접적으로 언어적 연 속성을 붙잡으려는 노력, 즉 의미의 최소단위인 문장을 동시성의 부분구조로서 구축하 려는 노력에서도 그 유사성이 엿보인다.
<브로흐>
“문장의 역동성은 한편으로 동사를 통해서……시간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목적어 관계에 의해 문장 내부로 제한되며 정적인 구조로 다시 뒤바뀐다. 그 결과 이같은 관계는 비록 그것이 동사의 역동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문장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지양되는 관계, 즉 주어와 목적어가 동시성의 상태에 놓여지는 관계로 나타난다.”
“한문장이 가능한 한 단절 없이, 생각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지속되게끔”하기 위하여 ‘문장론적인 통일과 인식적인 통일’의 정확한 일치를 요구.
‘생각, 동기, 문장’이라는 원칙. 하나의 문장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시간의 지양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문제원칙은『베르길의 죽음』에서 무절제한 문장들을 야기 시킴.
또한 그런 복합사고들에게서 수반되는 무수한 연상, 부수적 생각들, 배음(倍音)들의 동시적 현재화는 시간을 늘어뜨리는 거대한 문장들에 의해서 강제될 수 있는 것이며, 담론적 문장연속에 적합할지도 모를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갈라진 복합 사고들이기 때문에 정상적 차원을 뛰어넘는 문장론은 의식내용과 회상의 재현을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 ‘브로흐’에 의해 기술된 문장 내부의 시간지양은 독일어의 문장론 및 그것에 고유한 ‘밀 착포용(Umklammerung)의 법칙’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것과 연관해 프루스트가 프랑스어가 갖는 직선적 흐름의 고전적 원칙에 반해서 흔 히 다양하게 독일어의 문장과 비교되는 두드러진 복합문을 선호했다는 것이 특히 이 채를 띠는 점이다.
프루스트의 문장 : 부문장화(副文章化)나 도치법, 괄호형태, 동격이나 관련어 앞에 긴 삽입구 같은 것을 두는 형식 등
※ 이와 같은 문체는 밀려드는 사고내용들 전체를 가능한 한 거의 빠짐없이 동시적으로 재 현하려는 노력에 부합되는 것이며, 동일한 동기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연상이나 회 상부분들은 미로같은 단 하나의 문장이 지닌 종합적인 동시성에 종속되는 것이다.
● 동시성이 한편으로 서술시간의 일정한 규약으로 이해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소설에 서의 종합적인 시간관계를 특징지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술시간은 피서술시간의 본질 적인 특징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공통분모를 묘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술시간이 동시성을 열망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무발전성이나 순간성의 개념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피서술시간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허구의 영역 : 시간은 정지상태의 경향을 띰.
구성기법의 영역 : 다소간에 지속적인 동시성이 전개됨.
서술시간은 피서술시간의 본질에 보다 명확한 표현을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피서술시간은 분열되어 나타나고 외부의 시간과 내면의 시간은 상호갈등관계에 놓 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공통성이라고 할 정지상태는 제3의 요인을 통해 대변되 는데,그것이 서술시간이다.
소설은 시간예술(Zeitkunst)이기 때문에 서술시간의 속성에 상응하는 연속성의 원 칙자체가 동시성의 수행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무발전성, 즉 시간의 부정 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동시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는 임의의 매순간마다 한 작품이 지니고 있는 외 부및 내면적 세계상에 완벽한 현재를 부여해주는 데 들어있다. 즉, 서술시간을 영 속적인 ‘정지된 현재(nunc stans)’로 옮겨놓는 것이다.
● 더 이상 소설이 앞으로 진행해나가는 줄거리인 ‘우화(Fabel)’에 기초하지 않고부터는 한 때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이라고 할 서사적 시간은 무엇보다 구성기법의 수단 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 현대소설에서는 직선적인 발전관계의 자리에 동시적인 지시관계가 들어선 것이다.
<무질>
자신의 소설주인공에 대한 성찰에서 ‘원초적인 서사성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인생(울리히의) 및 소설(무질의)은 더 이상 서술의 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교직(交織)된 평면 속에서 전개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뷔토르(Butor)>
“서술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한 수의 선, 점, 혹은 특정한 군집을 분리 해 낼 수 있는 표면이다.”
● 서사적 시간이 선에서 교직된 평면으로 바뀌고 줄거리의 줄기에서 동시성의 구조로 변하 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관계가 본질적으로 더 이상 허구의 지평에서(피서술시간을 통해 서)가 아니라 구성기법의 지평(서술시간을 통해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술시간이 형식적(연속성의 원칙으로서)으로 종합적인 서사문학에 기본이 된다고 해
도, 그것은 현대소설에서야 비로소 독립된 역할을 수행한다.
피서술시간에 대한 서술시간의 상대적 독립성은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분열로
부터 파생되었다.
※ 시간의 분열(객관적, 주관적 시간의 분열)이 주관적으로 체험된 시간에 비중을 두는 동 안, 외부적인 발전이나 인과율의 줄거리 연속은 저지되고 그 자리에 부동(不動)의 상태 가 된다. 또한 이러한 정지상태가 피서술시간의 지속(서술의 끈)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콘텍스트를 창조하는 힘으로서의 시간은 피서술시간을 ‘교직된 평면’으로 만들어내는 데 서 효과를 발휘한다.
● 허구적 현실에 대한 관계에서 소설의 인물들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변화를 창조하는 시간을 상실하고 내면적으로 체험된 시간의 의미충족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충하는 것과 같이, 독자도 작품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줄거리를 지향하는 (본래 서사적이라고 할) 피서술시간을 포기하고 ‘음악적’으로 조직된 서술시간의 의미관계로 눈을 돌리도록 유도된다.
∴ 흐름의 속성을 지닌 역동적인 성격의 상실과 분열, 이것이야말로 현대소설에서 시간 이 갖는 두가지 기본적인, 서로를 규정하는 특성, 즉, 연속성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 는 의식시간(BewuBtseinszeit)의 우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동시성(Simultaneitat)은 현대소설의 시간관계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 로 간주 될 수 있다.
● \'음악적\' 종합구조를 통해 서사적 연속성을 극복하려는 집요함은 직접적으로 언어적 연 속성을 붙잡으려는 노력, 즉 의미의 최소단위인 문장을 동시성의 부분구조로서 구축하 려는 노력에서도 그 유사성이 엿보인다.
<브로흐>
“문장의 역동성은 한편으로 동사를 통해서……시간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목적어 관계에 의해 문장 내부로 제한되며 정적인 구조로 다시 뒤바뀐다. 그 결과 이같은 관계는 비록 그것이 동사의 역동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적어도 문장 내부적으로는 시간이 지양되는 관계, 즉 주어와 목적어가 동시성의 상태에 놓여지는 관계로 나타난다.”
“한문장이 가능한 한 단절 없이, 생각이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지속되게끔”하기 위하여 ‘문장론적인 통일과 인식적인 통일’의 정확한 일치를 요구.
‘생각, 동기, 문장’이라는 원칙. 하나의 문장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시간의 지양은
효과를 발휘한다.
이러한 문제원칙은『베르길의 죽음』에서 무절제한 문장들을 야기 시킴.
또한 그런 복합사고들에게서 수반되는 무수한 연상, 부수적 생각들, 배음(倍音)들의 동시적 현재화는 시간을 늘어뜨리는 거대한 문장들에 의해서 강제될 수 있는 것이며, 담론적 문장연속에 적합할지도 모를 사고의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갈라진 복합 사고들이기 때문에 정상적 차원을 뛰어넘는 문장론은 의식내용과 회상의 재현을 위해 발생하는 것이다.
● ‘브로흐’에 의해 기술된 문장 내부의 시간지양은 독일어의 문장론 및 그것에 고유한 ‘밀 착포용(Umklammerung)의 법칙’에 특히 효과적이다.
이것과 연관해 프루스트가 프랑스어가 갖는 직선적 흐름의 고전적 원칙에 반해서 흔 히 다양하게 독일어의 문장과 비교되는 두드러진 복합문을 선호했다는 것이 특히 이 채를 띠는 점이다.
프루스트의 문장 : 부문장화(副文章化)나 도치법, 괄호형태, 동격이나 관련어 앞에 긴 삽입구 같은 것을 두는 형식 등
※ 이와 같은 문체는 밀려드는 사고내용들 전체를 가능한 한 거의 빠짐없이 동시적으로 재 현하려는 노력에 부합되는 것이며, 동일한 동기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연상이나 회 상부분들은 미로같은 단 하나의 문장이 지닌 종합적인 동시성에 종속되는 것이다.
● 동시성이 한편으로 서술시간의 일정한 규약으로 이해된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소설에 서의 종합적인 시간관계를 특징지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술시간은 피서술시간의 본질 적인 특징을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공통분모를 묘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서술시간이 동시성을 열망한다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무발전성이나 순간성의 개념을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피서술시간의 특성을 강화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허구의 영역 : 시간은 정지상태의 경향을 띰.
구성기법의 영역 : 다소간에 지속적인 동시성이 전개됨.
서술시간은 피서술시간의 본질에 보다 명확한 표현을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피서술시간은 분열되어 나타나고 외부의 시간과 내면의 시간은 상호갈등관계에 놓 여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공통성이라고 할 정지상태는 제3의 요인을 통해 대변되 는데,그것이 서술시간이다.
소설은 시간예술(Zeitkunst)이기 때문에 서술시간의 속성에 상응하는 연속성의 원 칙자체가 동시성의 수행자가 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무발전성, 즉 시간의 부정 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동시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는 임의의 매순간마다 한 작품이 지니고 있는 외 부및 내면적 세계상에 완벽한 현재를 부여해주는 데 들어있다. 즉, 서술시간을 영 속적인 ‘정지된 현재(nunc stans)’로 옮겨놓는 것이다.
● 더 이상 소설이 앞으로 진행해나가는 줄거리인 ‘우화(Fabel)’에 기초하지 않고부터는 한 때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인(動因)이라고 할 서사적 시간은 무엇보다 구성기법의 수단 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 현대소설에서는 직선적인 발전관계의 자리에 동시적인 지시관계가 들어선 것이다.
<무질>
자신의 소설주인공에 대한 성찰에서 ‘원초적인 서사성이 사라지고 나서부터’ 인생(울리히의) 및 소설(무질의)은 더 이상 서술의 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교직(交織)된 평면 속에서 전개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뷔토르(Butor)>
“서술은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한 수의 선, 점, 혹은 특정한 군집을 분리 해 낼 수 있는 표면이다.”
● 서사적 시간이 선에서 교직된 평면으로 바뀌고 줄거리의 줄기에서 동시성의 구조로 변하 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관계가 본질적으로 더 이상 허구의 지평에서(피서술시간을 통해 서)가 아니라 구성기법의 지평(서술시간을 통해서)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술시간이 형식적(연속성의 원칙으로서)으로 종합적인 서사문학에 기본이 된다고 해
도, 그것은 현대소설에서야 비로소 독립된 역할을 수행한다.
피서술시간에 대한 서술시간의 상대적 독립성은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의 분열로
부터 파생되었다.
※ 시간의 분열(객관적, 주관적 시간의 분열)이 주관적으로 체험된 시간에 비중을 두는 동 안, 외부적인 발전이나 인과율의 줄거리 연속은 저지되고 그 자리에 부동(不動)의 상태 가 된다. 또한 이러한 정지상태가 피서술시간의 지속(서술의 끈)을 단절시키기 때문에 콘텍스트를 창조하는 힘으로서의 시간은 피서술시간을 ‘교직된 평면’으로 만들어내는 데 서 효과를 발휘한다.
● 허구적 현실에 대한 관계에서 소설의 인물들이 객관적이고 역사적이며 변화를 창조하는 시간을 상실하고 내면적으로 체험된 시간의 의미충족을 통해서 스스로를 보충하는 것과 같이, 독자도 작품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줄거리를 지향하는 (본래 서사적이라고 할) 피서술시간을 포기하고 ‘음악적’으로 조직된 서술시간의 의미관계로 눈을 돌리도록 유도된다.
∴ 흐름의 속성을 지닌 역동적인 성격의 상실과 분열, 이것이야말로 현대소설에서 시간 이 갖는 두가지 기본적인, 서로를 규정하는 특성, 즉, 연속성의 질서를 극복할 수 있 는 의식시간(BewuBtseinszeit)의 우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동시성(Simultaneitat)은 현대소설의 시간관계에 대한 포괄적 개념으 로 간주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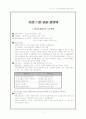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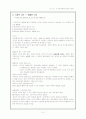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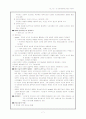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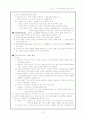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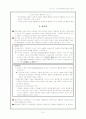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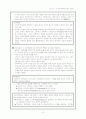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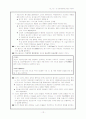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