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시리>가 실려있는 책
2) 내용 살펴보기
(1) 형태 분석
(2) 어구 해석
3) 문학과 음악사이에 있는 <가시리>
(1) 문학적 측면
(2) 음악적 측면
4) ‘이별의 정한(情恨)'의 흐름
5) '가시리'의 여인상(女人像) 연구
6) '가시리'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
3. 결론
2. 본론
1) <가시리>가 실려있는 책
2) 내용 살펴보기
(1) 형태 분석
(2) 어구 해석
3) 문학과 음악사이에 있는 <가시리>
(1) 문학적 측면
(2) 음악적 측면
4) ‘이별의 정한(情恨)'의 흐름
5) '가시리'의 여인상(女人像) 연구
6) '가시리'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
3. 결론
본문내용
런 감정을 억제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고매한 인격의 면모를 보여 준다. \'진달래꽃\'의 여인은 언제까지나 이별의 슬픔을 인내하겠다는 태도인데 비해 \'가시리\'의 여인은, 임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긍정적(肯定的)인 자세를 나타낸다.
6) \'가시리\'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
악장가사에서는 가시리라고만 하며 전문을 소개하고, 사용향악보에서는 귀호곡이라고도 일컫고 한 대목만 내어놓았다. 이 노래는 길이를 본다면 짧은 노래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을 나누는 표시가 분명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장과 장 사이에 여음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서경별곡이나 청산별곡과 다름이 없다.
보내고 싶지 않은 님을 보내야 하는 설정을 소박하게 나타내기만 했으나, 너무 감탄한 나머지 지나친 평가를 할 것은 아니고, 수준 높게 다듬은 표현이 없다고 해서 낮추어 볼 필요도 없다. 어느 대목이든 쉽게 이해되지만, 나타난 말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숨은 사연을 생각하게 한다. 서러운 님을 보내니 가는 듯이 돌아오라고 한 대목은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노래하는 여자를 서럽게 하는 님에게 하소연하는 말이기도 하고, 무언가 드러나 있지 않은 곡절 때문에 서럽게 떠나야 하는 님이기에 그렇게 당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어느 쪽이거나 이런 노래는 원래 민요였으리라고 생각되고, 후대의 아리랑과 상통하는 사연을 지녔다 하겠다. 그런데 그 곡조가 들을 만한 것이었음인지 궁중 속악으로 채택되었고, 거기 따르는 변모도 겪었겠다. 나난이라는 말이 노래 한 줄이 끝날 때마다 붙는 것은 민요 자체에서 유래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기를 버리고 간다는 사정을 강조하자는 말이다. 하지만, 태평성대를 들먹이는 여음은 사설이 나타내는 것과 반대가 되는 느낌을 준다. 궁중 속악은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구가하는 노래라야 어울리기에, 사설은 바꾸어 놓지 않았어도 여음은 그런 분위기에 맞도록 갖추었을 수 있다.
3. 결론
악곡(樂曲)으로야 그에 대해 문외한(門外漢)이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지만, 이 <가시리>는 어법(語法)으로는 <청산별곡(靑山別曲)>과 방불함이 있고, 악장(樂章)의 가사의 구성으로는 3음보 3행, 2장의 중첩 1연이란 점에서는 <정석가>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비애(悲哀)의정조(情調)라는 면에서도 공통된다. 이 <가시리>는 어쩌면 가장 고아(古雅)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제1연은 사랑을 맹세하는 천언(千言) 만사(萬辭)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 믿음을 굳이 들먹이지 않는다. 제2연에서는 가야만 하는 님이지만 철석(鐵石)같이 믿는 님이기에 조금도 의려(疑慮)함이 없이 보낸다. 그러니 이별(離別)임에 서러워함을 어이하랴. 이것마저 빼앗을 자는 없으니 서러워하는 내가 서러워 하는 님을 보내지만 이 세상이 ‘가도록 만든’ 것처럼 기필코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원한다. “제발 태평성대(太平聖代)나 맞이했으면” 하는 기원도 또 그렇지 않아 님을 앗아감에 대한 원망도 가락과 음색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처럼<가시리>는 4장의 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한시(漢詩)의 구성법인 ‘기(起)승(承)전(轉)결(結)’로 짜여진 것도 아니고, 전, 후2연의 가사로 구성되었는데, 전연은 반복으로 그래도 유장(悠長)히 침착을 나타내었으나, 후연은 앞장과 뒷장의 층절(層折)로 정서의 급박함을 나타내는 3음보 3행의 고아(古雅)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청산별곡(靑山別曲)>의 어법(語法)표현(表現)과 상사(相似)함으로 봐서 <청산별곡>의 서정자아를 보내면서 이 <가시리>를 불렀던 것이나 아닐까 하고 상상해본다.
6) \'가시리\'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
악장가사에서는 가시리라고만 하며 전문을 소개하고, 사용향악보에서는 귀호곡이라고도 일컫고 한 대목만 내어놓았다. 이 노래는 길이를 본다면 짧은 노래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을 나누는 표시가 분명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장과 장 사이에 여음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서경별곡이나 청산별곡과 다름이 없다.
보내고 싶지 않은 님을 보내야 하는 설정을 소박하게 나타내기만 했으나, 너무 감탄한 나머지 지나친 평가를 할 것은 아니고, 수준 높게 다듬은 표현이 없다고 해서 낮추어 볼 필요도 없다. 어느 대목이든 쉽게 이해되지만, 나타난 말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숨은 사연을 생각하게 한다. 서러운 님을 보내니 가는 듯이 돌아오라고 한 대목은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노래하는 여자를 서럽게 하는 님에게 하소연하는 말이기도 하고, 무언가 드러나 있지 않은 곡절 때문에 서럽게 떠나야 하는 님이기에 그렇게 당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어느 쪽이거나 이런 노래는 원래 민요였으리라고 생각되고, 후대의 아리랑과 상통하는 사연을 지녔다 하겠다. 그런데 그 곡조가 들을 만한 것이었음인지 궁중 속악으로 채택되었고, 거기 따르는 변모도 겪었겠다. 나난이라는 말이 노래 한 줄이 끝날 때마다 붙는 것은 민요 자체에서 유래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자기를 버리고 간다는 사정을 강조하자는 말이다. 하지만, 태평성대를 들먹이는 여음은 사설이 나타내는 것과 반대가 되는 느낌을 준다. 궁중 속악은 태평성대의 즐거움을 구가하는 노래라야 어울리기에, 사설은 바꾸어 놓지 않았어도 여음은 그런 분위기에 맞도록 갖추었을 수 있다.
3. 결론
악곡(樂曲)으로야 그에 대해 문외한(門外漢)이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지만, 이 <가시리>는 어법(語法)으로는 <청산별곡(靑山別曲)>과 방불함이 있고, 악장(樂章)의 가사의 구성으로는 3음보 3행, 2장의 중첩 1연이란 점에서는 <정석가>와 흡사함을 알 수 있다. 비애(悲哀)의정조(情調)라는 면에서도 공통된다. 이 <가시리>는 어쩌면 가장 고아(古雅)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제1연은 사랑을 맹세하는 천언(千言) 만사(萬辭)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다. 믿음을 굳이 들먹이지 않는다. 제2연에서는 가야만 하는 님이지만 철석(鐵石)같이 믿는 님이기에 조금도 의려(疑慮)함이 없이 보낸다. 그러니 이별(離別)임에 서러워함을 어이하랴. 이것마저 빼앗을 자는 없으니 서러워하는 내가 서러워 하는 님을 보내지만 이 세상이 ‘가도록 만든’ 것처럼 기필코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원한다. “제발 태평성대(太平聖代)나 맞이했으면” 하는 기원도 또 그렇지 않아 님을 앗아감에 대한 원망도 가락과 음색에 담겨 있을 것이다.
이처럼<가시리>는 4장의 악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여 한시(漢詩)의 구성법인 ‘기(起)승(承)전(轉)결(結)’로 짜여진 것도 아니고, 전, 후2연의 가사로 구성되었는데, 전연은 반복으로 그래도 유장(悠長)히 침착을 나타내었으나, 후연은 앞장과 뒷장의 층절(層折)로 정서의 급박함을 나타내는 3음보 3행의 고아(古雅)한 형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청산별곡(靑山別曲)>의 어법(語法)표현(表現)과 상사(相似)함으로 봐서 <청산별곡>의 서정자아를 보내면서 이 <가시리>를 불렀던 것이나 아닐까 하고 상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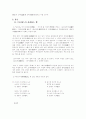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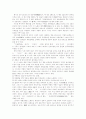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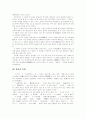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