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기녀 12인이 좌우 2대로 편을 갈라 노래하고 춤추며 차례로 공을 던지는데, 구멍에 넣으면 상으로 꽃을 주고 넣지 못하면 벌로 얼굴에 먹점을 찍어준다. 이 춤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성행하였다.
<그림17> 무고
향악정재의 하나로, 고려 때는 북을 하나 놓고 두 사람이 추었으나, 조선 성종 때에는 춤추는 사람의 수효대로 북의 수효도 맞춰 4고무(四鼓舞) ·8고무(八鼓舞) 등으로 발전하였다. 요즈음은 여덟 사람이 북 하나를 놓고 추되, 네 사람은 원무(元舞)라 하여 양 손에 북채를 들고 시종 북을 에워싸며 북을 어르거나 두드리며, 나머지 네 사람은 협무(挾舞)라 하여 삼지화(三枝花)라는 꽃방망이를 두 손에 들고, 가에서 방위(方位)를 짜고 돌거나 춤을 춘다. 한편 이 춤에 쓰는 북은 교방고(敎坊鼓)를 약간 작게 만든 것으로, 세 기둥 위에 북통을 세로로 올려놓았다. 북통의 둘레는 청홍백흑으로 아름답게 그렸다.
<그림18> 선유락
곱게 단장한 채선(彩船) 둘레에 여러 여기(女妓)가 패를 나누어 서서 배 가는 시늉을 하며, 《이선가(離船歌)》와 《어부사(漁父詞)》에 맞추어 추는 무용이다. 동기(童妓) 2명이 배에 올라 돛대 앞뒤로 갈라서 닻과 돛을 각각 잡으면, 여기 2명이 앞에서 호령 집사(執事)하고, 여기 10명이 뱃전 좌우로 줄지어 뱃줄을 잡고 내무(內舞)한다. 그 둘레를 여기 32명이 역시 뱃줄을 잡고 외무(外舞)하며, 행선령(行船令)에 따라 징소리가 세 번 크게 울리면 배가 떠난다. 《어부사》를 부르며 배를 빙빙 끌어 돌리면서 뱃놀이 흉내를 내다가 징소리가 다시 세 번 울리면 춤을 멈춘다.
<그림19> 채선
<그림20> 관동무
1580년(선조 13)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강원도의 관찰사로 있을 때 관동절(關東節)을 맞이하여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어 무기(舞妓)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한 데서 비롯된 조선 후기 향악정재(鄕樂呈才)이다.
복식(服飾)을 갖춘 8명의 무기가 2대(隊)로 나뉘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빙빙 돌기도 하며 《관동별곡》을 병창(倂唱)하면서 춤춘다.
<그림21> 검기무
<그림22> 처용무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 유래된 가면무용(假面舞踊)이다. 구나의(驅儺儀) 뒤에 추던 무용으로, 대개는 《처용만기(處容慢機:鳳凰吟一機)》와 《봉황음(鳳凰吟:鳳凰吟中機)》에 맞추어 춤추었다. 《악학궤범》에는 “섣달 그믐날 나례에 두 번씩 처용무를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격식은 다음과 같다.
5명의 무원(舞員)이 5방위(五方位)에 따른 청(東) ·홍(南) ·황(中央) ·백(西) ·흑(北)색의 옷을 각각 입고 처용의 탈을 쓴 다음 한 사람씩 무대에 나가 한 줄로 선 채 ‘처용가’를 일제히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선 자리에서 5명이 두 팔을 올렸다 내리고 서로 등지고 선다. 다음에는 발돋움춤으로 3보 전진하여 4방으로 흩어져 서로 등을 지고 추는 상배무(相背舞), 왼쪽으로 돌며 추는 회무(廻舞)를 마친 뒤, 중무(中舞)가 4방의 무원(舞員)과 개별적으로 대무(對舞)하는 오방수양수무(五方垂揚手舞)를 춘다. 이 춤이 처용무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어서 일렬로 북향하고 《봉황음》을 제창한 다음 잔도드리[細還入] 곡조에 따라 낙화유수무(落花流水舞)를 추면서 한 사람씩 차례차례 오른쪽으로 돌아 퇴장한다.
<그림23> 하황은
당악정재의 하나로, 1419년(세종 1) 변계량(卞季良)이 태종(太宗)의 명에 따라 만든 춤이다. 태종이 국가를 권섭(權攝)하고 천명(天命)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무원(舞員)은 죽간자(竹竿子) 2명, 족자(簇子) 1명, 선모(仙母) 1명, 좌우협무(左右挾舞) 6명으로 구성되며, 춤의 절차는 다른 당악무와 같다. 춤의 절차 중 선모와 좌우협무 6명은 하황은사(荷皇恩詞)를 부른다.
<그림24> 향발
향발이라는 작은 타악기를 두 손에 하나씩 들고 치면서 추는 춤으로, 에스파냐의 캐스터네츠를 치면서 추는 춤을 연상케 한다. 고려 때부터 전해지며 조선시대의 각종 진찬(進饌) ·진연(進宴)에서 무고(舞鼓)와 더불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춤이었다. 조선 후기까지 전해졌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림25> 아박
동동(動動) ·동동무(動動舞)라고도 한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는 ‘동동’이라 하여 속악정재(俗樂呈才)로 전하고, 《악학궤범(樂學軌範)》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鄕樂呈才圖儀)>에는 아박(牙拍:아박무)이라 하여 향악정재로 전한다.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대무(對舞)하는 춤이다.
먼저 무기(舞妓) 두 명이 좌우로 나뉘어 춤추며 나아가서 꿇어앉아 아박을 들어다놓은 다음 일어나 염수(斂手) ·족도(足蹈)하면 ‘동동만기(動動慢機)’를 아뢴다. 무악(舞樂)에 맞추어 두 기녀(妓女)가 ‘동동사(動動詞)’의 기구(起句)를 부른 뒤 아박을 허리띠 사이에 꽂고 족도하고 ‘동동정월사(動動正月詞)’를 부른다. 이어서 ‘동동중기(動動中機)’에 맞추며 2월사부터 12월사까지 노래한다. 춤은 월사(月詞)에 따라 북향무(北向舞) ·배무(背舞) ·대무 등으로 변한다. ‘동동’의 춤 이름은 동동사를 부른 데서 연유하며, 원래 이 춤은 고려시대에 중국 송(宋)나라 것을 본뜬 것이라 한다.
<그림26> 춘앵전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순종숙황후(純宗肅皇后)의 보령(寶齡) 40세를 경축하기 위하여 창제한 정재(呈才)이다. 어느 봄날 아침, 버들가지에서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에 도취되어 이를 무용화한 것이라고도 한다. 향악무(鄕樂舞)의 양식을 빌었으며, 무동(舞童)이나 여기(女妓) 혼자서 추는 독무(獨舞)이다. 무의(舞衣)는 무동일 경우는 복건(幅巾)에 앵삼(鶯衫), 여기일 경우는 화관(花冠)에 앵삼인데, 앵삼은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이다.
길이 6자 가량의 화문석(花紋席)에서 비리(飛履) ·탑탑고(塔塔高) ·타원앙장(打鴦場) ·화전태(花前態) ·낙화유수(落花流水) ·여의풍(如意風) 등의 춤사위를 연출하는데, 특히 화전태는 흰 이를 보여 곱게 웃음짓는 미롱(媚弄)으로 이 춤의 백미이다. 반주음악은 《평조회상(平調會相)》 전곡을 사용한다.
<그림17> 무고
향악정재의 하나로, 고려 때는 북을 하나 놓고 두 사람이 추었으나, 조선 성종 때에는 춤추는 사람의 수효대로 북의 수효도 맞춰 4고무(四鼓舞) ·8고무(八鼓舞) 등으로 발전하였다. 요즈음은 여덟 사람이 북 하나를 놓고 추되, 네 사람은 원무(元舞)라 하여 양 손에 북채를 들고 시종 북을 에워싸며 북을 어르거나 두드리며, 나머지 네 사람은 협무(挾舞)라 하여 삼지화(三枝花)라는 꽃방망이를 두 손에 들고, 가에서 방위(方位)를 짜고 돌거나 춤을 춘다. 한편 이 춤에 쓰는 북은 교방고(敎坊鼓)를 약간 작게 만든 것으로, 세 기둥 위에 북통을 세로로 올려놓았다. 북통의 둘레는 청홍백흑으로 아름답게 그렸다.
<그림18> 선유락
곱게 단장한 채선(彩船) 둘레에 여러 여기(女妓)가 패를 나누어 서서 배 가는 시늉을 하며, 《이선가(離船歌)》와 《어부사(漁父詞)》에 맞추어 추는 무용이다. 동기(童妓) 2명이 배에 올라 돛대 앞뒤로 갈라서 닻과 돛을 각각 잡으면, 여기 2명이 앞에서 호령 집사(執事)하고, 여기 10명이 뱃전 좌우로 줄지어 뱃줄을 잡고 내무(內舞)한다. 그 둘레를 여기 32명이 역시 뱃줄을 잡고 외무(外舞)하며, 행선령(行船令)에 따라 징소리가 세 번 크게 울리면 배가 떠난다. 《어부사》를 부르며 배를 빙빙 끌어 돌리면서 뱃놀이 흉내를 내다가 징소리가 다시 세 번 울리면 춤을 멈춘다.
<그림19> 채선
<그림20> 관동무
1580년(선조 13)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강원도의 관찰사로 있을 때 관동절(關東節)을 맞이하여 《관동별곡(關東別曲)》을 지어 무기(舞妓)들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게 한 데서 비롯된 조선 후기 향악정재(鄕樂呈才)이다.
복식(服飾)을 갖춘 8명의 무기가 2대(隊)로 나뉘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고, 빙빙 돌기도 하며 《관동별곡》을 병창(倂唱)하면서 춤춘다.
<그림21> 검기무
<그림22> 처용무
신라 헌강왕(憲康王) 때 〈처용설화(處容說話)〉에서 유래된 가면무용(假面舞踊)이다. 구나의(驅儺儀) 뒤에 추던 무용으로, 대개는 《처용만기(處容慢機:鳳凰吟一機)》와 《봉황음(鳳凰吟:鳳凰吟中機)》에 맞추어 춤추었다. 《악학궤범》에는 “섣달 그믐날 나례에 두 번씩 처용무를 추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격식은 다음과 같다.
5명의 무원(舞員)이 5방위(五方位)에 따른 청(東) ·홍(南) ·황(中央) ·백(西) ·흑(北)색의 옷을 각각 입고 처용의 탈을 쓴 다음 한 사람씩 무대에 나가 한 줄로 선 채 ‘처용가’를 일제히 부르고, 노래가 끝나면 선 자리에서 5명이 두 팔을 올렸다 내리고 서로 등지고 선다. 다음에는 발돋움춤으로 3보 전진하여 4방으로 흩어져 서로 등을 지고 추는 상배무(相背舞), 왼쪽으로 돌며 추는 회무(廻舞)를 마친 뒤, 중무(中舞)가 4방의 무원(舞員)과 개별적으로 대무(對舞)하는 오방수양수무(五方垂揚手舞)를 춘다. 이 춤이 처용무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어서 일렬로 북향하고 《봉황음》을 제창한 다음 잔도드리[細還入] 곡조에 따라 낙화유수무(落花流水舞)를 추면서 한 사람씩 차례차례 오른쪽으로 돌아 퇴장한다.
<그림23> 하황은
당악정재의 하나로, 1419년(세종 1) 변계량(卞季良)이 태종(太宗)의 명에 따라 만든 춤이다. 태종이 국가를 권섭(權攝)하고 천명(天命)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 기쁨을 표현하였다. 무원(舞員)은 죽간자(竹竿子) 2명, 족자(簇子) 1명, 선모(仙母) 1명, 좌우협무(左右挾舞) 6명으로 구성되며, 춤의 절차는 다른 당악무와 같다. 춤의 절차 중 선모와 좌우협무 6명은 하황은사(荷皇恩詞)를 부른다.
<그림24> 향발
향발이라는 작은 타악기를 두 손에 하나씩 들고 치면서 추는 춤으로, 에스파냐의 캐스터네츠를 치면서 추는 춤을 연상케 한다. 고려 때부터 전해지며 조선시대의 각종 진찬(進饌) ·진연(進宴)에서 무고(舞鼓)와 더불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춤이었다. 조선 후기까지 전해졌으나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림25> 아박
동동(動動) ·동동무(動動舞)라고도 한다. 《고려사(高麗史)》 <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는 ‘동동’이라 하여 속악정재(俗樂呈才)로 전하고, 《악학궤범(樂學軌範)》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鄕樂呈才圖儀)>에는 아박(牙拍:아박무)이라 하여 향악정재로 전한다. 타악기의 일종인 아박을 두 손에 놓고 박자를 맞추어 대무(對舞)하는 춤이다.
먼저 무기(舞妓) 두 명이 좌우로 나뉘어 춤추며 나아가서 꿇어앉아 아박을 들어다놓은 다음 일어나 염수(斂手) ·족도(足蹈)하면 ‘동동만기(動動慢機)’를 아뢴다. 무악(舞樂)에 맞추어 두 기녀(妓女)가 ‘동동사(動動詞)’의 기구(起句)를 부른 뒤 아박을 허리띠 사이에 꽂고 족도하고 ‘동동정월사(動動正月詞)’를 부른다. 이어서 ‘동동중기(動動中機)’에 맞추며 2월사부터 12월사까지 노래한다. 춤은 월사(月詞)에 따라 북향무(北向舞) ·배무(背舞) ·대무 등으로 변한다. ‘동동’의 춤 이름은 동동사를 부른 데서 연유하며, 원래 이 춤은 고려시대에 중국 송(宋)나라 것을 본뜬 것이라 한다.
<그림26> 춘앵전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孝明世子)가 순종숙황후(純宗肅皇后)의 보령(寶齡) 40세를 경축하기 위하여 창제한 정재(呈才)이다. 어느 봄날 아침, 버들가지에서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에 도취되어 이를 무용화한 것이라고도 한다. 향악무(鄕樂舞)의 양식을 빌었으며, 무동(舞童)이나 여기(女妓) 혼자서 추는 독무(獨舞)이다. 무의(舞衣)는 무동일 경우는 복건(幅巾)에 앵삼(鶯衫), 여기일 경우는 화관(花冠)에 앵삼인데, 앵삼은 꾀꼬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이다.
길이 6자 가량의 화문석(花紋席)에서 비리(飛履) ·탑탑고(塔塔高) ·타원앙장(打鴦場) ·화전태(花前態) ·낙화유수(落花流水) ·여의풍(如意風) 등의 춤사위를 연출하는데, 특히 화전태는 흰 이를 보여 곱게 웃음짓는 미롱(媚弄)으로 이 춤의 백미이다. 반주음악은 《평조회상(平調會相)》 전곡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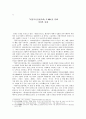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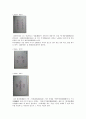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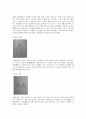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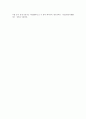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