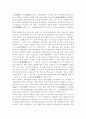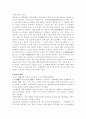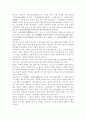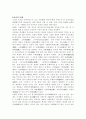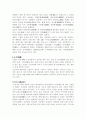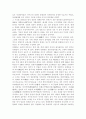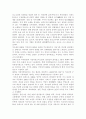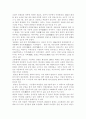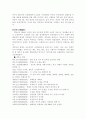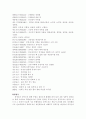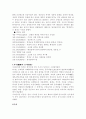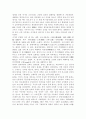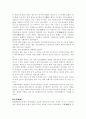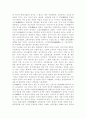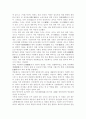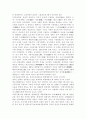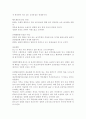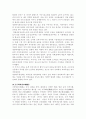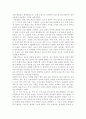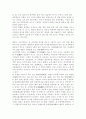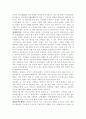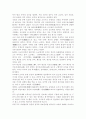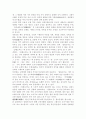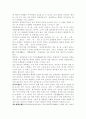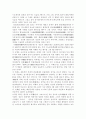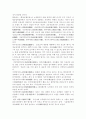목차
1. 서론
2. 궁중유물의 성격
3. 과학기술(科學技術)
4. 교육과 의학
5. 궁중의 오례
6. 궁궐(宮闕)
1) 덕수궁(德壽宮)
2) 경복궁(景福宮)
3) 경희궁(慶喜宮)
4) 창덕궁
5) 창경궁
7. 복식(服飾)과 음식(飮食)
1) 복식
2) 음식(飮食)
8. 어진,어보,어책
9. 궁중공예(宮中工藝)
10. 궁중회화(宮中繪畵)
11. 결론
2. 궁중유물의 성격
3. 과학기술(科學技術)
4. 교육과 의학
5. 궁중의 오례
6. 궁궐(宮闕)
1) 덕수궁(德壽宮)
2) 경복궁(景福宮)
3) 경희궁(慶喜宮)
4) 창덕궁
5) 창경궁
7. 복식(服飾)과 음식(飮食)
1) 복식
2) 음식(飮食)
8. 어진,어보,어책
9. 궁중공예(宮中工藝)
10. 궁중회화(宮中繪畵)
11. 결론
본문내용
(洛南軒養老宴圖),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어 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이다. 웅장한 화면구성과 정교한 세부 묘사가 뛰어나며, 온화하고 안정감있는 색채를 사용하여 궁중행사도의 품위를 더하고 있다.
<華城陵幸圖屛(화성능행도병)>은 정조가 1795년(정조 19,을인(乙印))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화성에 있는 부친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묘소인 수원에 행행하였을 때에 거행한 주요 행사를 그린 8첩 병풍이다.
이 도병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양식상의 특징 뿐만아니라 제작 관행에 있어서 19세기의 궁중행사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華城陵行圖屛(화성능행도병)> 역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園幸乙印 理儀軌(원행을인 리의궤)』라는 문헌기록의 존재이다. 원행(園行)의 준비과정부터 의궤(儀軌)의 인출(印出)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총 10권 8책의 『園幸乙印 儀軌(원행을인의궤)』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병풍의 제작배경과 그림의 내용분석, 도상해석 등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 자료인 것이다.
이 의궤는 전통적인 의궤의 편집체제와 인출(印出)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임시관청으로서 정리소(整理所)가 설치되는 등 행사 자체가 도감(都監)을 설하는 예와 다른 것이므로 기존 의궤의 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전교(傳敎)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인출방식에 있어서 '백세문헌(百世文獻)'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필사(筆寫)하는 방식을 떠나 새로 정리자를 주조하여 활자로 출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의궤의 초기는 1795년 당년에 편성되었으나 교정을 거쳐 완전한 모습으로 출간된 것은 2년이 지난 1797년 3월 18일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인쇄된 의궤는 혜경궁에게 진상된 것 외에 궁중에 31건이 내입되고 화성행궁과 다른곳에 38건이 보관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형식의 도식(圖式)이 그려지게 된 것은 정조의 전교(傳敎)에 의한 것이었다. 정조는 화성에서 명하기를 일련의 의식을 회화로 그려서 의궤에 싣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감독을 김홍도에게 전적으로 맡기도록 명령하였다고 전하나 김홍도가 그 많은 의궤도의 서본을 직접 그렸다기 보다는 동원된 화원들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본형식을 제시하고 제작과정을 감독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존하는 <화성능행도병>은 소장본마다 여덟 장면의 배열 순서가 모두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최근에 새로이 장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어색한 모양새가 되었으며 궁중유물전시관본은 후대에 모사된 것으로서 어떤 도병을 모델로 한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생긴다. 궁중유물전시관 소장본의 그림순서는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 순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반면에 호암미술관본의 그림 순서는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로 되어있다.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는 을묘년의 현륭원 행행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혜경궁홍씨의 일주갑(一周甲)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진찬(進饌)이었다. <봉수당진찬도>의 정조 어좌 부분의 묘사에서 각각 다른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 원래 어좌 뒤에는 원래 십장생병풍을 쳤는데 화면에는 각각 다르게 묘사되었다. 어좌를 향해 엎드린 두 명의 명부가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처럼 아래 위로 묘사되어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나머지 두 소장본의 명부는 서로 자세는 다르지만 비교적 자연스럽게 공간 속에 놓여 있다. ,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는 양로연(養老宴)은 진찬례를 치룬 다음날인 윤2월 14일 신시에 낙남헌에서 베풀어졌다. 낙남헌 뜰아래에서 잔치가 벌어진 장면을 담았으며 인물의 수를 극히 줄여 꼭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는 현륭원 전배를 마치고 돌아온 정조는 황성성곽의 서장대에서 군사를 조련하는 성조식(城操式)을 관람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야조식에도 참석하였다. 그림에는 해가 진 뒤 행해진 야조식(夜操式)의 광경이 묘사되어있다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정조는 14일 기로연(耆老宴)을 끝내고 신시(申時)에 어사대(御史臺)가 있는 득중정(得中亭)에서 활을 쏘고 불꽃놀이를 즐겼는데 이 불꽃놀이의 광경을 그린 것이 바로 <득중정어사도도>이다.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는 화성행궁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치러진 의식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는 정조는 성묘 전배를 마치고 유생들을 시취한 뒤 낙남헌에서 거행된 방접(傍接)에도 친림(親臨)하였는데 이 그림은 이때의 광경을 그린 것이다.
환어 행렬도(還御行列圖) 조선시대 궁중행사도의 백미로 꼽히는 이 그림은 윤2월 15일 화성에서 제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창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흥행궁에서 경숙(經宿) 하기 위해 들어오는 어가(御駕)행렬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는 16일 노량진에 설치된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 창덕궁으로 돌아가는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11.결론
개인적으로 의궤를 공부하는것 보다 궁중 유물이 훨씬 흥미가 있었는데 왕실의 생활상과 국가정책등을 엿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쉬운 것은 짧지 않은 조선왕조의 역사가 많은 문화유산을 배출 했을 거라 짐작하는데 그 많은 유물이 어디로 소실되었는지 대부분이 모사본이거나 재현해 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유교이념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당시 왕실의 과학정책,교육,경제 정치 모든 면의 다양한 가치관을 들여다 보면서 조선왕조의 국가관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문헌에 비해 극히 적은 현존하는 물적 증거를 보면서 유물의 보존과 재현에 대한 연구도 이루져야 한다고 본다.
<華城陵幸圖屛(화성능행도병)>은 정조가 1795년(정조 19,을인(乙印)) 윤2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에 걸쳐 화성에 있는 부친 사도세자(思悼世子)(1735-1762)의 묘소인 수원에 행행하였을 때에 거행한 주요 행사를 그린 8첩 병풍이다.
이 도병은 조선시대 궁중행사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양식상의 특징 뿐만아니라 제작 관행에 있어서 19세기의 궁중행사도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 <華城陵行圖屛(화성능행도병)> 역사적 가치와 미술사적 의의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園幸乙印 理儀軌(원행을인 리의궤)』라는 문헌기록의 존재이다. 원행(園行)의 준비과정부터 의궤(儀軌)의 인출(印出)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한 총 10권 8책의 『園幸乙印 儀軌(원행을인의궤)』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성이 인정되지만 이 병풍의 제작배경과 그림의 내용분석, 도상해석 등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 자료인 것이다.
이 의궤는 전통적인 의궤의 편집체제와 인출(印出)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임시관청으로서 정리소(整理所)가 설치되는 등 행사 자체가 도감(都監)을 설하는 예와 다른 것이므로 기존 의궤의 격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전교(傳敎)에 의해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인출방식에 있어서 '백세문헌(百世文獻)'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필사(筆寫)하는 방식을 떠나 새로 정리자를 주조하여 활자로 출간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의궤의 초기는 1795년 당년에 편성되었으나 교정을 거쳐 완전한 모습으로 출간된 것은 2년이 지난 1797년 3월 18일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인쇄된 의궤는 혜경궁에게 진상된 것 외에 궁중에 31건이 내입되고 화성행궁과 다른곳에 38건이 보관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형식의 도식(圖式)이 그려지게 된 것은 정조의 전교(傳敎)에 의한 것이었다. 정조는 화성에서 명하기를 일련의 의식을 회화로 그려서 의궤에 싣도록 지시하였던 것이다. 감독을 김홍도에게 전적으로 맡기도록 명령하였다고 전하나 김홍도가 그 많은 의궤도의 서본을 직접 그렸다기 보다는 동원된 화원들이 밑그림을 그리는데 기본형식을 제시하고 제작과정을 감독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존하는 <화성능행도병>은 소장본마다 여덟 장면의 배열 순서가 모두 다르다. 국립중앙박물관본은 최근에 새로이 장황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어색한 모양새가 되었으며 궁중유물전시관본은 후대에 모사된 것으로서 어떤 도병을 모델로 한 것인지 의심의 여지가 생긴다. 궁중유물전시관 소장본의 그림순서는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 순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반면에 호암미술관본의 그림 순서는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로 되어있다.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는 을묘년의 현륭원 행행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혜경궁홍씨의 일주갑(一周甲)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진찬(進饌)이었다. <봉수당진찬도>의 정조 어좌 부분의 묘사에서 각각 다른 차이를 찾을 수 있는데, 원래 어좌 뒤에는 원래 십장생병풍을 쳤는데 화면에는 각각 다르게 묘사되었다. 어좌를 향해 엎드린 두 명의 명부가 마치 색종이를 오려 붙인 것처럼 아래 위로 묘사되어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반해 나머지 두 소장본의 명부는 서로 자세는 다르지만 비교적 자연스럽게 공간 속에 놓여 있다. ,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는 양로연(養老宴)은 진찬례를 치룬 다음날인 윤2월 14일 신시에 낙남헌에서 베풀어졌다. 낙남헌 뜰아래에서 잔치가 벌어진 장면을 담았으며 인물의 수를 극히 줄여 꼭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操圖)는 현륭원 전배를 마치고 돌아온 정조는 황성성곽의 서장대에서 군사를 조련하는 성조식(城操式)을 관람하고 저녁식사 후에는 야조식에도 참석하였다. 그림에는 해가 진 뒤 행해진 야조식(夜操式)의 광경이 묘사되어있다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정조는 14일 기로연(耆老宴)을 끝내고 신시(申時)에 어사대(御史臺)가 있는 득중정(得中亭)에서 활을 쏘고 불꽃놀이를 즐겼는데 이 불꽃놀이의 광경을 그린 것이 바로 <득중정어사도도>이다.
화성성묘전배도(華城聖廟展拜圖)는 화성행궁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치러진 의식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는 정조는 성묘 전배를 마치고 유생들을 시취한 뒤 낙남헌에서 거행된 방접(傍接)에도 친림(親臨)하였는데 이 그림은 이때의 광경을 그린 것이다.
환어 행렬도(還御行列圖) 조선시대 궁중행사도의 백미로 꼽히는 이 그림은 윤2월 15일 화성에서 제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창덕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흥행궁에서 경숙(經宿) 하기 위해 들어오는 어가(御駕)행렬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는 16일 노량진에 설치된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 창덕궁으로 돌아가는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11.결론
개인적으로 의궤를 공부하는것 보다 궁중 유물이 훨씬 흥미가 있었는데 왕실의 생활상과 국가정책등을 엿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쉬운 것은 짧지 않은 조선왕조의 역사가 많은 문화유산을 배출 했을 거라 짐작하는데 그 많은 유물이 어디로 소실되었는지 대부분이 모사본이거나 재현해 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유교이념이 많은 영향을 끼쳤던 당시 왕실의 과학정책,교육,경제 정치 모든 면의 다양한 가치관을 들여다 보면서 조선왕조의 국가관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문헌에 비해 극히 적은 현존하는 물적 증거를 보면서 유물의 보존과 재현에 대한 연구도 이루져야 한다고 본다.
추천자료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정치학의 학문적 성격 상담을 위한 성격이론 고찰
상담을 위한 성격이론 고찰 과거 행정법의 서독행정법의 성격과 문제
과거 행정법의 서독행정법의 성격과 문제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성격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성격이론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
교육심리학의 학문적 성격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분석(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별)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분석(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별) 고고학 자료의 성격과 분석
고고학 자료의 성격과 분석 건전하게 적응하는 성격적 특징을 올포트의 성숙한 인간상과 마스로우의 자기실현으로 설명
건전하게 적응하는 성격적 특징을 올포트의 성숙한 인간상과 마스로우의 자기실현으로 설명 [보육과정] 보육과정의 자연탐구영역 (자연탐구의 성격과 자연탐구의 목표, 자연탐구영역의 ...
[보육과정] 보육과정의 자연탐구영역 (자연탐구의 성격과 자연탐구의 목표, 자연탐구영역의 ... 정신과 입원 환자의 성격적 강점 인식 (Psychiatric Inpatients’ Awareness of Character Str...
정신과 입원 환자의 성격적 강점 인식 (Psychiatric Inpatients’ Awareness of Character Str...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성격 이론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성격 이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성격이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적 성격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