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중국의 선종과 선사상
1. 들어가며
2. 중국선종의 등장
3. 혜능의 선사상과 돈오선
4. 공안
5. 선종사상의 전성기
6. 선의 폐단과 문제점
7. 선의 존재의의
8. 나오며
9. 참고자료
1. 들어가며
2. 중국선종의 등장
3. 혜능의 선사상과 돈오선
4. 공안
5. 선종사상의 전성기
6. 선의 폐단과 문제점
7. 선의 존재의의
8. 나오며
9. 참고자료
본문내용
명제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면 선이 제창하는 명상은 지각하고 느끼는 사물을 그대로 파악하여 사물 속에서 투철해 들어가 마침내는 사물 그 자체속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다.
가끔 선은 정신의 謀殺, 화가 치밀 만큼 몽상, 신비적 자기도취의 뜻으로 비판된다. 그러나 실제로 선에는 모살되지 않으면 안될 ‘정신’이란 없으며 따라서 ‘정신의 모살’이란 있을 수도 없다. 더욱이 선은 안전지대로서 도망쳐 들어갈 만한 자아도 갖고 있지 않아 우리들이 도취할 만한 ‘自我’도 없는 것이다. 비평가는 또 이렇게 말한다. 선에 의해서 정신은 일종의 忘我상태가 되어 잠들어 되게 거기에서 불교도의 得意의 空의 교설이 체험되며 바로 이 상태에서 주관은 망막한 공무에 몰입하여 객관세계 및 자기 스스로까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한걸음 더 비약하여 망막한 공무를 극복해야 한다. 주관은 망아의 상태에서 깨어나 자기도취를 放棄하고 醉漢이 자기 내면의 자아에 눈뜨게 될 때에 비로소 선은 얻어지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꿈에서 깨어난다. 죽음에서 일어난다. 너 취한들아!
선은 이렇게 부르짖는다. 따라서 눈을 가린 채로 선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어떤 선장은 선이란 무엇이냐고 질문 받았을 때 평상심이라고 말했다. 통상의 신비주의가 변덕스러운 들뜬 마음의 산물이며, 너무나 이상 생활로부터 유리된 것에 비하여 선은 실제적, 일상적인 것이며 동시에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어 인간 정신을 질서있게 훈련시킨다. 선은 시시각각으로 위대한 진리를 향해 인간의 눈을 뜨게 하며 그것은 아무런 교설의 도움없이 단지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리를 직하에 잡아냄으로 해서 달성케 되는 것이다. 선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는 一指를 세워 보이기도 했으며, 공[毬]을 차기도 하고, 묻는 사람의 얼굴을 쥐어박는 이도 있었다. 이것은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나 보는 방식에 의해서 靈苗한 의미부여가 된 창조적인 생각이 충만한 것이 된다. 우리들이 인습적인 개념에 속박된 생활 가운데 있고 선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선의 존재의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나오며
이상 선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수행의 목적은 사물의 본질을 철견하는 새로운 눈을 얻는데 있다. 즉 깨달음이 곧 선의 목적인 것이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탄생인 셈이다. 지성면에서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 된다. 깨달음은 존재이유이며 깨달음 없이는 선은 이미 선이 아닌 것이다.
융성기의 선의 사회적 배경을 살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은 그것이 서양의 신교의 발생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이었다. 구교의 부정 부패한 상황 속에서 Protestant들에 의한 종교 개혁으로 신교가 발생하였듯이 선종도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다. 단지 신교도들의 구교와의 격렬한 싸움을 벌여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받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친데 비해 중국에서는 비록 종파간의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전쟁과 같은 대량살상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불교의 특색있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칼빈이 노동, 직업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선종도 다른 불교 종파와는 달리 노동하는 생활을 가치있게 여김으로써 또하나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상반되는 점을 본다면 신교가 성서 중심주의를 주장하여 성서 해석에 열을 올린 것과는 반대로 선종은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주장하여 경전을 배척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후에 공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다소 변질되는데 나는 이 공안에 대하여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된다. 바로 인간의 내부 활동에서 나온 선이 아닌 한은 그러한 선은 선의 본래 면목인 순수한 창조적 생명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물에 대한 초월적인 관념을 요구하는 선에 있어서 先師의 문자화된 일화란 오히려 모방을 조장할 뿐 진정한 깨달음을 갖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공안의 등장 이후 선종의 쇠퇴가 바로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깨달음은 완전히 정상인 정신 상태 속에서 나온 것이다. 진정 선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활기를 소생시키는 물건이 있는 것이다. 인생이 보다 즐거운 것이 되고 생이 더욱 확충되어 우주 그 자체도 포함해 버릴 때 깨달음에는 뭔가 참으로 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9. 참고자료
木村, 중국불교사상사, 민족사
김태완, 조사의 선의 실천과 사상, 장경각
사토 시케끼, 새롭게 쓴 선종사, 불교시대사
가끔 선은 정신의 謀殺, 화가 치밀 만큼 몽상, 신비적 자기도취의 뜻으로 비판된다. 그러나 실제로 선에는 모살되지 않으면 안될 ‘정신’이란 없으며 따라서 ‘정신의 모살’이란 있을 수도 없다. 더욱이 선은 안전지대로서 도망쳐 들어갈 만한 자아도 갖고 있지 않아 우리들이 도취할 만한 ‘自我’도 없는 것이다. 비평가는 또 이렇게 말한다. 선에 의해서 정신은 일종의 忘我상태가 되어 잠들어 되게 거기에서 불교도의 得意의 空의 교설이 체험되며 바로 이 상태에서 주관은 망막한 공무에 몰입하여 객관세계 및 자기 스스로까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한걸음 더 비약하여 망막한 공무를 극복해야 한다. 주관은 망아의 상태에서 깨어나 자기도취를 放棄하고 醉漢이 자기 내면의 자아에 눈뜨게 될 때에 비로소 선은 얻어지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꿈에서 깨어난다. 죽음에서 일어난다. 너 취한들아!
선은 이렇게 부르짖는다. 따라서 눈을 가린 채로 선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어떤 선장은 선이란 무엇이냐고 질문 받았을 때 평상심이라고 말했다. 통상의 신비주의가 변덕스러운 들뜬 마음의 산물이며, 너무나 이상 생활로부터 유리된 것에 비하여 선은 실제적, 일상적인 것이며 동시에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어 인간 정신을 질서있게 훈련시킨다. 선은 시시각각으로 위대한 진리를 향해 인간의 눈을 뜨게 하며 그것은 아무런 교설의 도움없이 단지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진리를 직하에 잡아냄으로 해서 달성케 되는 것이다. 선이 무엇인지를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이는 一指를 세워 보이기도 했으며, 공[毬]을 차기도 하고, 묻는 사람의 얼굴을 쥐어박는 이도 있었다. 이것은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나 보는 방식에 의해서 靈苗한 의미부여가 된 창조적인 생각이 충만한 것이 된다. 우리들이 인습적인 개념에 속박된 생활 가운데 있고 선이 이 진리를 가르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선의 존재의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8. 나오며
이상 선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수행의 목적은 사물의 본질을 철견하는 새로운 눈을 얻는데 있다. 즉 깨달음이 곧 선의 목적인 것이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탄생인 셈이다. 지성면에서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이 된다. 깨달음은 존재이유이며 깨달음 없이는 선은 이미 선이 아닌 것이다.
융성기의 선의 사회적 배경을 살피면서 문득 생각난 것은 그것이 서양의 신교의 발생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이었다. 구교의 부정 부패한 상황 속에서 Protestant들에 의한 종교 개혁으로 신교가 발생하였듯이 선종도 그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다. 단지 신교도들의 구교와의 격렬한 싸움을 벌여 자신들의 종교를 인정받기 위한 적극적 활동을 펼친데 비해 중국에서는 비록 종파간의 갈등은 있었을지라도 전쟁과 같은 대량살상은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불교의 특색있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칼빈이 노동, 직업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선종도 다른 불교 종파와는 달리 노동하는 생활을 가치있게 여김으로써 또하나 비슷한 면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상반되는 점을 본다면 신교가 성서 중심주의를 주장하여 성서 해석에 열을 올린 것과는 반대로 선종은 불립문자, 교외별전을 주장하여 경전을 배척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은 후에 공안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다소 변질되는데 나는 이 공안에 대하여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된다. 바로 인간의 내부 활동에서 나온 선이 아닌 한은 그러한 선은 선의 본래 면목인 순수한 창조적 생명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물에 대한 초월적인 관념을 요구하는 선에 있어서 先師의 문자화된 일화란 오히려 모방을 조장할 뿐 진정한 깨달음을 갖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공안의 등장 이후 선종의 쇠퇴가 바로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깨달음은 완전히 정상인 정신 상태 속에서 나온 것이다. 진정 선을 얻는다는 것은 뭔가 활기를 소생시키는 물건이 있는 것이다. 인생이 보다 즐거운 것이 되고 생이 더욱 확충되어 우주 그 자체도 포함해 버릴 때 깨달음에는 뭔가 참으로 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9. 참고자료
木村, 중국불교사상사, 민족사
김태완, 조사의 선의 실천과 사상, 장경각
사토 시케끼, 새롭게 쓴 선종사, 불교시대사
추천자료
 한국대중문화와 중국대중문화
한국대중문화와 중국대중문화 현 중국의 정치, 문화, 경제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
현 중국의 정치, 문화, 경제가 세계시장에 미치는 영향 [중국사상사] 인간본성을 통해 예를 강조한 순자
[중국사상사] 인간본성을 통해 예를 강조한 순자 [중국 사상] 노장사상의 다원성과 복합성
[중국 사상] 노장사상의 다원성과 복합성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모택동과 중국공산당 한국과 중국의 현대사 비교(역사적인 관점으로 본)
한국과 중국의 현대사 비교(역사적인 관점으로 본)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한권으로 이해하는 중국 고대 중국에서의 중화사상과 화이관
고대 중국에서의 중화사상과 화이관 인도, 중국, 한국의 선사상
인도, 중국, 한국의 선사상 경제개혁개방으로본 중국과 북한의 관계
경제개혁개방으로본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의 근대화운동] 양무운동(洋務運動), 변법자강운동(變法自彊運動), 신해혁명(辛亥革命)
[중국의 근대화운동] 양무운동(洋務運動), 변법자강운동(變法自彊運動), 신해혁명(辛亥革命)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를 읽고 -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_ 기시모토 ...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를 읽고 - 일국사를 넘어선 동아시아 읽기 _ 기시모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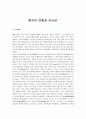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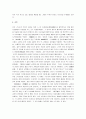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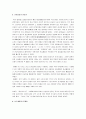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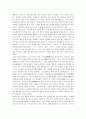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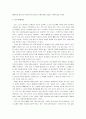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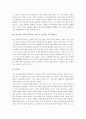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