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훈민정음의 창제
옛 소리 추정
1)「ㅸ」
2)「ㆆ」
3)「ㅿ」
4)「·」,「ㆎ」
5) 병서와 「ㅅ」끝소리
6) 「ㅇ」와 「ㆁ」
7) 「ㅓ」(ㅕ, ㅝ)
8) 「ㅚ, ㅐ, ㅟ, ㅔ, ㅒ, ㅖ, ㆉ, ㆌ, ㅙ, ㅞ, ㆎ」
9) 「ㅅ(ㅆ), ㅈ(ㅉ), ㅊ」
10) 「ㄹ」의 사용법
총정리
-쓰이지 않는 글자
-소리 바뀐 글자
-지금과 같은 소리
참고문헌
옛 소리 추정
1)「ㅸ」
2)「ㆆ」
3)「ㅿ」
4)「·」,「ㆎ」
5) 병서와 「ㅅ」끝소리
6) 「ㅇ」와 「ㆁ」
7) 「ㅓ」(ㅕ, ㅝ)
8) 「ㅚ, ㅐ, ㅟ, ㅔ, ㅒ, ㅖ, ㆉ, ㆌ, ㅙ, ㅞ, ㆎ」
9) 「ㅅ(ㅆ), ㅈ(ㅉ), ㅊ」
10) 「ㄹ」의 사용법
총정리
-쓰이지 않는 글자
-소리 바뀐 글자
-지금과 같은 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소리는 ‘하늘, 땅, 사람’의 삼재(三才)를 상형한 것이다. 삼재는 이 우주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하늘이 먼저 열리고, 다음으로 땅이 만들어지고, 다음으로는 사람이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겨났다. ‘、’는 하늘을 본떠 둥글게 하고, ‘ㅡ’는 땅을 본떠서 평평하게 하고, ‘ㅣ’는 사람을 본뜨되 그 서 있는 모양으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 종류의 기본 글자를 만들어 냈다.
이 세 글자를 바탕으로 하늘인 ‘、’에서는 ‘ㅗ, ㅏ’를, 땅인 ‘ㅡ’에서는 ‘ㅜ, ㅓ’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인 ‘ㅣ’가 관여하여 ‘ㅛ, ㅑ, ㅠ, ㅕ’를 만들어 11자를 완성하였다.
종성은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방법을 고안해 냄으로써 문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훈민정음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28자를 만들어 내고 난 뒤,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한 음절을 적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정하였으며, 두세 글자가 겹쳐지는 병서(竝書)글자도 만들었다. ‘ㄲ ㄸ ㅃ ㅆ ㅉ’와 같이 같은 글자를 이어 쓰는 것을 각자병서라 하고, ‘ㅺㅼㅽㅄㅴ’등과 같이 서로 다른 글자를 이어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 한다. 한편 ‘ㅇ’을 이용한 연서(連書)글자도 만들었다. 순경음자 ‘ㅸ’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자음 글자 및 모음 글자 외에도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도 만들어, 운소를 표기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하였다.
이처럼 한글은 현대 언어학의 과점에서 바라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문자이다. 중국의 성운학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되, 각 문자와 그것이 표시하는 음소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대부분의 다른 문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과학적인 문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옛 소리 추정
1)「ㅸ」
훈민정음 제자해에, “「ㅇ」을 입술소리 밑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는 입술을 잠깐 가볍게 합쳐서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 하여 이 소리의 발음법을 대체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로써 알 수 있는 것은, [ㅸ]는 [ㅂ]와 같은 입술소리인데, 다만 입술이 가볍게 닫혀서 목소리가 많은 점이 다를 뿐이란 것이다.
그리고 최세진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한층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입술을 닫아서 소리를 내면 [ㅂ]가 되니 입술 무거운 소리라 한다. [ㅂ]를 낼 때에 장차 (입술을) 닫으려다가 입술을 닫지 말고, 공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면 [ㅸ]가 되니 입술 가벼운 소리라 한다. 글자를 만듦에 동그라미를 [ㅂ] 밑에 붙이는 것은 곧 입술을 비워서 (붙이지 않고서)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곧 입술을 합치면 [ㅂ] 소리가 되는데, [ㅂ] 소리를 낼 때에, 입술을 합치려다가 합치지 않고 숨을 불어 내면 [ㅸ] 소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여 우리는 [ㅸ]의 발음법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으니, 이 소리는 두 입술소리로서, [ㅂ]와 같이 입술을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닫음이 좀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ㅂ]가 공깃길 영도인데 대해서, [ㅸ]는 공깃길 1도 정도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ㅸ] 소리의 두 입술 조음 방법은 대체로 추측할 수 있게 되나, 이것이 울림소리였느냐, 안울림소리였느냐는 전혀 알 도리가 없다.
[ㅸ] 글자는 중국말과 우리말 소리 적기에 두루 쓰였는데, [ㅸ]으로 적혔던 소리는 대체로 [f]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성통해 자모도에 의하면 [ㅸ]은 ‘전청 전청: 훈민정음 또는 동국정운(東國正韻) 초성(初聖) 체계 중 ‘ㄱ’·‘ㄷ’·‘ㅂ’·‘ㅅ’·‘ㅈ’·‘ㅎ’등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
이 세 글자를 바탕으로 하늘인 ‘、’에서는 ‘ㅗ, ㅏ’를, 땅인 ‘ㅡ’에서는 ‘ㅜ, ㅓ’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사람인 ‘ㅣ’가 관여하여 ‘ㅛ, ㅑ, ㅠ, ㅕ’를 만들어 11자를 완성하였다.
종성은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방법을 고안해 냄으로써 문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훈민정음이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28자를 만들어 내고 난 뒤, 초성, 중성, 종성을 합하여 한 음절을 적는 데 필요한 방법을 정하였으며, 두세 글자가 겹쳐지는 병서(竝書)글자도 만들었다. ‘ㄲ ㄸ ㅃ ㅆ ㅉ’와 같이 같은 글자를 이어 쓰는 것을 각자병서라 하고, ‘ㅺㅼㅽㅄㅴ’등과 같이 서로 다른 글자를 이어 쓰는 것을 합용병서라 한다. 한편 ‘ㅇ’을 이용한 연서(連書)글자도 만들었다. 순경음자 ‘ㅸ’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자음 글자 및 모음 글자 외에도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도 만들어, 운소를 표기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하였다.
이처럼 한글은 현대 언어학의 과점에서 바라보아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훌륭한 문자이다. 중국의 성운학을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되, 각 문자와 그것이 표시하는 음소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대부분의 다른 문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과학적인 문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옛 소리 추정
1)「ㅸ」
훈민정음 제자해에, “「ㅇ」을 입술소리 밑에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가 되는 것은, 가벼운 소리는 입술을 잠깐 가볍게 합쳐서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 하여 이 소리의 발음법을 대체로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로써 알 수 있는 것은, [ㅸ]는 [ㅂ]와 같은 입술소리인데, 다만 입술이 가볍게 닫혀서 목소리가 많은 점이 다를 뿐이란 것이다.
그리고 최세진의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한층 구체적인 설명이 있다. “입술을 닫아서 소리를 내면 [ㅂ]가 되니 입술 무거운 소리라 한다. [ㅂ]를 낼 때에 장차 (입술을) 닫으려다가 입술을 닫지 말고, 공기를 불어서 소리를 내면 [ㅸ]가 되니 입술 가벼운 소리라 한다. 글자를 만듦에 동그라미를 [ㅂ] 밑에 붙이는 것은 곧 입술을 비워서 (붙이지 않고서) 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곧 입술을 합치면 [ㅂ] 소리가 되는데, [ㅂ] 소리를 낼 때에, 입술을 합치려다가 합치지 않고 숨을 불어 내면 [ㅸ] 소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의하여 우리는 [ㅸ]의 발음법을 대체로 짐작할 수 있으니, 이 소리는 두 입술소리로서, [ㅂ]와 같이 입술을 완전히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닫음이 좀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곧 [ㅂ]가 공깃길 영도인데 대해서, [ㅸ]는 공깃길 1도 정도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와 같이, [ㅸ] 소리의 두 입술 조음 방법은 대체로 추측할 수 있게 되나, 이것이 울림소리였느냐, 안울림소리였느냐는 전혀 알 도리가 없다.
[ㅸ] 글자는 중국말과 우리말 소리 적기에 두루 쓰였는데, [ㅸ]으로 적혔던 소리는 대체로 [f]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성통해 자모도에 의하면 [ㅸ]은 ‘전청 전청: 훈민정음 또는 동국정운(東國正韻) 초성(初聖) 체계 중 ‘ㄱ’·‘ㄷ’·‘ㅂ’·‘ㅅ’·‘ㅈ’·‘ㅎ’등에 공통되는 음성적 특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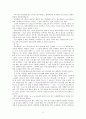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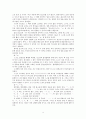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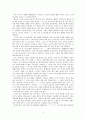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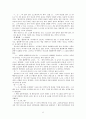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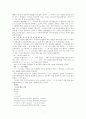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