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1. 서 론
1. 모피아의 정의
2. 한국에서의 모피아
3. 모피아와 사회자본
2. 사회 자본
1. 사회 자본 정의
2. 사회 자본 지표
3. 사회 자본과 공공재 - 비공공재
4. 비 사회자본
3. 모피아와 사회자본
1. 한국적 관료 엘리트의 특성
2. 관치경영
4. 결 론
1. 서 론
1. 모피아의 정의
2. 한국에서의 모피아
3. 모피아와 사회자본
2. 사회 자본
1. 사회 자본 정의
2. 사회 자본 지표
3. 사회 자본과 공공재 - 비공공재
4. 비 사회자본
3. 모피아와 사회자본
1. 한국적 관료 엘리트의 특성
2. 관치경영
4. 결 론
본문내용
관(금감원, 기획재정부, 금융의)의 감독에 대한 민간 기업의 대응하는 직잭에 자리를 잡는 다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곳에서 은퇴를 하여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던 피 감독기관에 재 입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의 감독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방어이며 이러한 방어의 핵심 원동력은 바로 “기획재정부 사람들의 비사회자본”이다.
이렇듯 정책당국과 금융시장과 감독관이 같은 인맥과 같은 사고와 같은 이해를 가진 집단에 장악된 상태에서, 누가 시스템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 “국민의 정부 최대실수는 모피아 해체 못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간 국민의 정부가 펼친 경제 정책중 가장 큰 실수는 경제관료에 대한 인사 실패이며 특히 외환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소위 “모피아”를 해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하였다. 안국신 교수는 “국민의 정부가 관치금융과 도덕적 헤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낳은 온상인 모피아를 경제부처 요직에 배치한 점은 실책”이라며 “경제 관료에 의한 인사실패는 합리화 될 수 없는 결정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임기응변에 능한 관료들이 “당장에는 달지만, 장기적인 개혁에는 독”이라는 것이 안 교수의 지적이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행정엘리트이면서 시장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이같은 사회자본은 민간에 대한 불합리적인 취업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비사회적 자본 형성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4. 결 론
장수찬은 신생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행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화하기 보다는 “엘리트 부패 - 제도신뢰의 하락 - 사적공간으로의 후퇴 - 정치적 참여하락”이라는 사회적 함정(Social trap)에 갇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하였다. 장수찬은 신생 민주주의 사회적 함정은 엘리트 계급의 부패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패이고, 특히 서민들에 의한 생활 속의 부패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엘리트 들의 부패는 끈질긴 영속성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엘리트 들의 부패는 신생민주주의에서 관찰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하락과 대인 신뢰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하락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들은 공적 공간으로부터 사적공간으로 후퇴하게 되고 엘리트 과두정이 정착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신생민주중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치적 관심의 하락” “정치적 참여 축소”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축소” 등은 신생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함정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2008년 김수찬 “신생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 엘리트계급의 부패와 사회적 신뢰구축의 실패” 27~30p
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처럼 모피아와 같이 한 사회의 엘리트가 사회적 책임을 소흘히 하고 자족적이고 폐쇠적 체계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역할은 앞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대중이나 민중에게 위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 고 자 료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박희봉(2005)
“조직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연구” 오홍석(2002)
“사회자본과 지속가능한 발전” 김성권(2004)
“한국 권위주의의 실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임형백(1995)
“신생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엘리트계급의 부패와 사회 신뢰구축 실패” 김수찬(2008)
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곳에서 은퇴를 하여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던 피 감독기관에 재 입사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의 감독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방어이며 이러한 방어의 핵심 원동력은 바로 “기획재정부 사람들의 비사회자본”이다.
이렇듯 정책당국과 금융시장과 감독관이 같은 인맥과 같은 사고와 같은 이해를 가진 집단에 장악된 상태에서, 누가 시스템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 “국민의 정부 최대실수는 모피아 해체 못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간 국민의 정부가 펼친 경제 정책중 가장 큰 실수는 경제관료에 대한 인사 실패이며 특히 외환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소위 “모피아”를 해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하였다. 안국신 교수는 “국민의 정부가 관치금융과 도덕적 헤이,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낳은 온상인 모피아를 경제부처 요직에 배치한 점은 실책”이라며 “경제 관료에 의한 인사실패는 합리화 될 수 없는 결정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임기응변에 능한 관료들이 “당장에는 달지만, 장기적인 개혁에는 독”이라는 것이 안 교수의 지적이였다
이와 같이 국가의 행정엘리트이면서 시장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이같은 사회자본은 민간에 대한 불합리적인 취업과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비사회적 자본 형성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4. 결 론
장수찬은 신생민주주의가 민주화 이행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로 진화하기 보다는 “엘리트 부패 - 제도신뢰의 하락 - 사적공간으로의 후퇴 - 정치적 참여하락”이라는 사회적 함정(Social trap)에 갇혀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하였다. 장수찬은 신생 민주주의 사회적 함정은 엘리트 계급의 부패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패이고, 특히 서민들에 의한 생활 속의 부패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되면서 급속히 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다량 소유하고 있는 엘리트 들의 부패는 끈질긴 영속성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엘리트 들의 부패는 신생민주주의에서 관찰되고 있는 정부신뢰의 하락과 대인 신뢰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하락과 타인에 대한 믿음이 하락함에 따라 개인들은 공적 공간으로부터 사적공간으로 후퇴하게 되고 엘리트 과두정이 정착되는 경향성도 발견하였다. 신생민주중의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치적 관심의 하락” “정치적 참여 축소” 그리고 “사회적 참여의 축소” 등은 신생 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함정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2008년 김수찬 “신생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 엘리트계급의 부패와 사회적 신뢰구축의 실패” 27~30p
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처럼 모피아와 같이 한 사회의 엘리트가 사회적 책임을 소흘히 하고 자족적이고 폐쇠적 체계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역할은 앞으로 적극적인 의미의 대중이나 민중에게 위임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참 고 자 료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박희봉(2005)
“조직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연구” 오홍석(2002)
“사회자본과 지속가능한 발전” 김성권(2004)
“한국 권위주의의 실패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임형백(1995)
“신생민주주의의 사회적 함정, 엘리트계급의 부패와 사회 신뢰구축 실패” 김수찬(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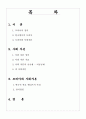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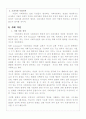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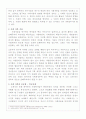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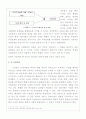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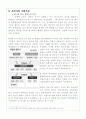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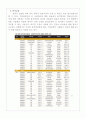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