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경제적 위기의 배경과 원인
3. 시장경제 지향의 경제 개혁과 사회주의의 후퇴
4. 정치개혁과 일당독점체제
5. 쿠바의 사회주의는 어디로 가는가-타협, 고립 혹은 붕괴?
2. 경제적 위기의 배경과 원인
3. 시장경제 지향의 경제 개혁과 사회주의의 후퇴
4. 정치개혁과 일당독점체제
5. 쿠바의 사회주의는 어디로 가는가-타협, 고립 혹은 붕괴?
본문내용
진 각종 교란작전 및 내정개입등은 당연히 쿠바정권에게 위협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조건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위기가 계속된다 해도 미국의 봉쇄정책이 계속되는 한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의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본다. 외부의 압력이 거세질 수록 카스트로정권은 더욱 방어적이기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엘리사도 산체스 같은 쿠바내의 반체제인사도 미국이 금수조치를 해제하고 카스트로의 권력장악을 일단 현실로 인정해야만 평화로운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미국신문에 발표하기도 했다.
. Elizardo Sanchez, \"Let Castro Lead the Way,\" New York Times, August 26, 1993.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쿠바는 일당중심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주의틀안에서의 비판적 의견과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간을 부여하면서 베트남식, 중국식의 시장경제 개혁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첫째, 미국의 봉쇄와 압력의 지속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는 데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미국의 직간접적 압력에 대한 유럽, 일본등 선진자본주의국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러시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의 지원 없이는 어떠한 경제개혁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국제시장에서의 설탕과 니켈 가격도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의 석유가 쿠바에서 채굴되는냐 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정부와 카스트로정부가 협상을 통하여 금수조치해제와 부분적인 정치개혁안에 합의하는 길도 있다. 미국내에서 금수조치해제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높아가는 가운데 쿠바 이민집단에서의 쿠바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금기였던 쿠바망명자들과 카스트로 정권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어 봉쇄 정책에 대한 의견의 분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기업들은 쿠바와의 무역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미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1992년의 존홉킨스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금수해제시 약 13억-20억불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양국간의 거래는 해제이후 몇년안에 65억불의 수준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 San Francisco Bay Guardian, April 20, 1994.
미국이 자유선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쿠바가 미국의 금수조치해제를 조건으로 지난 1959-1962년사이에 동결된 50억불에 이르는 미국재산의
. Andrew Zimbalist, \"Liberate Cuba. Liberate Us. Lift the Embargo, Now,\" New York
Times, Feburary 17 1994. 미국 국무성에 의하면 5911명의 북미주인들이 당시 시가로 약 18억불의 재산을 잃었다. Cuba Update, No. 3-4, 1993, p. 2 참조.
반환이나 보상과 정치범석방을 약속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쿠바는 이 보상문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과거에 소위 \'마리엘 쿠바난민 사건\'등으로 주지사 재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클린톤이 외교 정책문제에 있어서 여론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험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그러나 클린톤행정부의 여러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쿠바와의 협상 의도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미국 정치 판도의 변화, 즉 클린톤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다면 미국정부는 30여년의 벽을 무너뜨리는 획기적 조치를 시도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카스트로는 클린톤정부에 대해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작년말부터 미국정부도 자신들의 군사작전을 미리 통고하고 질병문제에 관한 공동노력을 위해 의료연구진을 쿠바에 파견하는등 간헐적으로 비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29, 1993.
그러나 클린톤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과 여론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있고 아이티 군사정권문제, 북한과의 핵협상문제등 다른 외교문제와 의료보험안 통과등 국내문제가 산적해있어 당분간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만약 미국이 완강하게 봉쇄 해제를 거부하면서 쿠바의 정치적 개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경우 카스트로는 과거에 12만명의 난민 탈출을 허용하여 카터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것처럼 난민 대량 탈출 허용이라는 카드를 정면으로 쓸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난민 탈출의 문제는 제1세계의 저임 불법노동력의 흡수현상이기도 하고 최근 몇년의 쿠바경제의 악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쿠바의 끊임 없는 난민탈출은 한편으로는 합법적 이민은 제한하면서 불법적 탈출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미국거주와 정착의 적극적 후원을 허용하는 미국의 법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쿠바정부의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가지 방향, 즉 봉쇄속의 개혁 혹은 봉쇄 해제에 동반되는 개혁 그 어떤 쪽으로 개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실패한 중앙계획적 국유화경제 중심의 사회주의 모델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개혁에 의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시장경제의 힘은 이미 그자체의 관성에 의해 쿠바사회를 계속해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개혁은 불가피하다. 물론 단기적으로 커다란 정치개혁 없이 일당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방과 개혁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의 모델을 따르며 성공할 수도 있다. 한국, 대만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당이 맡았던 개발독재의 역할을 공산당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처럼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자본주의지향의 경제개혁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다. 쿠바도 이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 Elizardo Sanchez, \"Let Castro Lead the Way,\" New York Times, August 26, 1993.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 때 쿠바는 일당중심 체제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회주의틀안에서의 비판적 의견과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공간을 부여하면서 베트남식, 중국식의 시장경제 개혁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첫째, 미국의 봉쇄와 압력의 지속을 전제로 할 때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는 데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미국의 직간접적 압력에 대한 유럽, 일본등 선진자본주의국가,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러시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의 지원 없이는 어떠한 경제개혁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또 국제시장에서의 설탕과 니켈 가격도 중요하다. 또한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얼마만큼의 석유가 쿠바에서 채굴되는냐 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정부와 카스트로정부가 협상을 통하여 금수조치해제와 부분적인 정치개혁안에 합의하는 길도 있다. 미국내에서 금수조치해제에 대한 여론의 압력이 높아가는 가운데 쿠바 이민집단에서의 쿠바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금기였던 쿠바망명자들과 카스트로 정권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있어 봉쇄 정책에 대한 의견의 분화가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기업들은 쿠바와의 무역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미국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1992년의 존홉킨스대학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금수해제시 약 13억-20억불의 상품을 수출할 수 있으며 양국간의 거래는 해제이후 몇년안에 65억불의 수준에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 San Francisco Bay Guardian, April 20, 1994.
미국이 자유선거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쿠바가 미국의 금수조치해제를 조건으로 지난 1959-1962년사이에 동결된 50억불에 이르는 미국재산의
. Andrew Zimbalist, \"Liberate Cuba. Liberate Us. Lift the Embargo, Now,\" New York
Times, Feburary 17 1994. 미국 국무성에 의하면 5911명의 북미주인들이 당시 시가로 약 18억불의 재산을 잃었다. Cuba Update, No. 3-4, 1993, p. 2 참조.
반환이나 보상과 정치범석방을 약속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쿠바는 이 보상문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과거에 소위 \'마리엘 쿠바난민 사건\'등으로 주지사 재선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클린톤이 외교 정책문제에 있어서 여론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험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그러나 클린톤행정부의 여러 성향으로 미루어 볼 때 쿠바와의 협상 의도는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미국 정치 판도의 변화, 즉 클린톤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한다면 미국정부는 30여년의 벽을 무너뜨리는 획기적 조치를 시도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카스트로는 클린톤정부에 대해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작년말부터 미국정부도 자신들의 군사작전을 미리 통고하고 질병문제에 관한 공동노력을 위해 의료연구진을 쿠바에 파견하는등 간헐적으로 비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Christian Science Monitor, December 29, 1993.
그러나 클린톤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과 여론의 신뢰를 회복하는데는 많은 장애가 있고 아이티 군사정권문제, 북한과의 핵협상문제등 다른 외교문제와 의료보험안 통과등 국내문제가 산적해있어 당분간 획기적인 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만약 미국이 완강하게 봉쇄 해제를 거부하면서 쿠바의 정치적 개혁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경우 카스트로는 과거에 12만명의 난민 탈출을 허용하여 카터행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것처럼 난민 대량 탈출 허용이라는 카드를 정면으로 쓸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난민 탈출의 문제는 제1세계의 저임 불법노동력의 흡수현상이기도 하고 최근 몇년의 쿠바경제의 악화로 인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쿠바의 끊임 없는 난민탈출은 한편으로는 합법적 이민은 제한하면서 불법적 탈출자에게는 무조건적인 미국거주와 정착의 적극적 후원을 허용하는 미국의 법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협이 미국으로부터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쿠바정부의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가지 방향, 즉 봉쇄속의 개혁 혹은 봉쇄 해제에 동반되는 개혁 그 어떤 쪽으로 개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실패한 중앙계획적 국유화경제 중심의 사회주의 모델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개혁에 의하여 움직이기 시작한 시장경제의 힘은 이미 그자체의 관성에 의해 쿠바사회를 계속해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개혁은 불가피하다. 물론 단기적으로 커다란 정치개혁 없이 일당체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개방과 개혁이 \'권위주의 체제하에서의 경제성장\'의 모델을 따르며 성공할 수도 있다. 한국, 대만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당이 맡았던 개발독재의 역할을 공산당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처럼 공산당의 일당지배와 자본주의지향의 경제개혁은 본질적으로 모순이다. 쿠바도 이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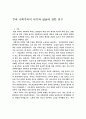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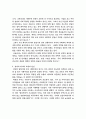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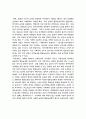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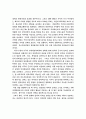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