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와 이론
<토마스 홉스 Thomas Hobbs>
1.생애와 저서
2.Hobbs 이론의 배경
3. 홉스이론의 개관
4. 주권적 권리의 개념
<몽테스키외 Montesquieu>
1.생애와 저서
2. 법이론
<루소 J.J. Rousseau>
1.생애와 저서
2.자연상태와 사회계약
<일반의사와 법이론>
<토마스 홉스 Thomas Hobbs>
1.생애와 저서
2.Hobbs 이론의 배경
3. 홉스이론의 개관
4. 주권적 권리의 개념
<몽테스키외 Montesquieu>
1.생애와 저서
2. 법이론
<루소 J.J. Rousseau>
1.생애와 저서
2.자연상태와 사회계약
<일반의사와 법이론>
본문내용
집합적으로 결합한 전체며 정부란 이러한 주권조직의 종속된 집행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전체인 주권자는 바로 법이 실질적 연원이다. 즉, 시민은 주권조직의 일부인 동시에 법의 실질적 연원인 법인격체의 구성원이다. 개인은 개별적 의사를 갖고 있겠지만 일반의사에 합치시키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다.
일반의사란 주권자의 의사다. 이 의사는 쪼갤 수없다. 쪼개 놓으면 개별의사만이 있게 되며 주권자의 의사일 수 없다. 주권을 여러 개의 권력으로 나눌수 없는 것처럼 주권자의 의사인 일반 의사도 쪼갤수 없는 것이다. 일반의사는 일반이기 때문에 공동선만을 추구한다. 폭군의 의사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일반의사는 항상 올바르며 공공의 유용성만을 추구한다. 이것은 민중의 결정에서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그의 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무엇이 선인지를 반드시 아는 것은 아니다. 민중을 부패시킬수는 없다. 다만 속일 수 있다. 일반의사는 공동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비하여 전체의사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개별의사를 합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개별적 의사에서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을 제거하고 차이를 다듬으면 일반의사가 된다. 일반의사의 본질은 만장일치다. 다수와 소수의 분열은 우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에 부분사회가 없어야 하며, 시민개인은 국가에 따라서만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의사로서의 주권, 즉 일반의사는 자연적으로 올바르며 양도할 수없고 불가분이며 절대적이다. 일반의사의 본질은 만장 일치다. 다수와 소수의 분열은 우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에 부분사회가 없어야 한며, 시민개인은 국가에 따라서만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의사로서의 주권, 즉 일반의사는 자연적으로 올바르며 양도할 수 없고 불가분이며 절대적이다. 일 일반의사는 일반적 법규로 표시된다. 루소에 의하면 법규는 일반의사의 객관화를 실현한다. 루소는 법규의 필요성에 이렇게 설명한다. \"선하고 질서에 합치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의해 그런 것이며 인간의 계약과는 아무 상관 없다. 모든 정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느님만이 정의의 원천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의를 높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일 줄 안다면 정부도 필요없고 법규도 필요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은 이성으로부터만 나오는 보편적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사실을 고찰해 볼 때 자연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정의의 법규는 인간들에게는 소용없다. 이런 법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악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것을 지키는 의인에게는 손해를 줄 뿐이다. 그러므로 권리를 의무에 결부시키고 정의를 그 목적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계약과 법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자연상태에서는 내가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아무 의무도 없고 나에게 나에게는 무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민상태에서는 모든 권리가 법규에 의해 확정된다.
일반의사가 주권자이며 법규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해도 모든 전문적 업무에 직접 종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정부가 제기된다. 정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권자와 구별되며 주권자에 종속된다. 정부는 국민과 법규의 임무를 위임받은 수임자(受任者)다. 정부는 항상 법규에 따라 법규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규의 정부며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규의 집행자다. 주권자 자신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루소에 있어서 정부는 권력이 아니라 직무다. 국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합법적 권력이나 합법성이 없다. 주권은 오직 일반의사에 있고 국민전체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 법규는 법규가 아니다.
일반의사란 주권자의 의사다. 이 의사는 쪼갤 수없다. 쪼개 놓으면 개별의사만이 있게 되며 주권자의 의사일 수 없다. 주권을 여러 개의 권력으로 나눌수 없는 것처럼 주권자의 의사인 일반 의사도 쪼갤수 없는 것이다. 일반의사는 일반이기 때문에 공동선만을 추구한다. 폭군의 의사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과 다르다. 일반의사는 항상 올바르며 공공의 유용성만을 추구한다. 이것은 민중의 결정에서잘못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인간은 그의 선을 추구한다. 그러나 무엇이 선인지를 반드시 아는 것은 아니다. 민중을 부패시킬수는 없다. 다만 속일 수 있다. 일반의사는 공동이익만을 추구하는데 비하여 전체의사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며, 개별의사를 합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개별적 의사에서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을 제거하고 차이를 다듬으면 일반의사가 된다. 일반의사의 본질은 만장일치다. 다수와 소수의 분열은 우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에 부분사회가 없어야 하며, 시민개인은 국가에 따라서만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의사로서의 주권, 즉 일반의사는 자연적으로 올바르며 양도할 수없고 불가분이며 절대적이다. 일반의사의 본질은 만장 일치다. 다수와 소수의 분열은 우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에 부분사회가 없어야 한며, 시민개인은 국가에 따라서만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의사로서의 주권, 즉 일반의사는 자연적으로 올바르며 양도할 수 없고 불가분이며 절대적이다. 일 일반의사는 일반적 법규로 표시된다. 루소에 의하면 법규는 일반의사의 객관화를 실현한다. 루소는 법규의 필요성에 이렇게 설명한다. \"선하고 질서에 합치하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의해 그런 것이며 인간의 계약과는 아무 상관 없다. 모든 정의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느님만이 정의의 원천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의를 높은 곳으로부터 받아들일 줄 안다면 정부도 필요없고 법규도 필요없을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은 이성으로부터만 나오는 보편적 정의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상호적이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사실을 고찰해 볼 때 자연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정의의 법규는 인간들에게는 소용없다. 이런 법규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악인에게는 이익이 되고 그것을 지키는 의인에게는 손해를 줄 뿐이다. 그러므로 권리를 의무에 결부시키고 정의를 그 목적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계약과 법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자연상태에서는 내가 약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는 아무 의무도 없고 나에게 나에게는 무익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민상태에서는 모든 권리가 법규에 의해 확정된다.
일반의사가 주권자이며 법규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해도 모든 전문적 업무에 직접 종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정부가 제기된다. 정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권자와 구별되며 주권자에 종속된다. 정부는 국민과 법규의 임무를 위임받은 수임자(受任者)다. 정부는 항상 법규에 따라 법규를 집행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법규의 정부며 일반의사의 표현인 법규의 집행자다. 주권자 자신은 국민이다. 그러므로 루소에 있어서 정부는 권력이 아니라 직무다. 국민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합법적 권력이나 합법성이 없다. 주권은 오직 일반의사에 있고 국민전체에 있다. 그러므로 국민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 법규는 법규가 아니다.
추천자료
 [인문과학]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인문과학] 프랑스 혁명의 지적 기원 음악교육의 철학적 배경
음악교육의 철학적 배경 고독한 산책자에 나타난 18세기 프랑스 사회 양상
고독한 산책자에 나타난 18세기 프랑스 사회 양상 동서의 문화차이
동서의 문화차이 20세기 교육사상의 전개(진보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본질주의)
20세기 교육사상의 전개(진보주의, 항존주의, 재건주의, 본질주의) 신인문주의와 페스탈로치
신인문주의와 페스탈로치 프뢰벨의_교육_사상
프뢰벨의_교육_사상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에 대해
초절주의(Transcendentalism)에 대해 [중국현대문학A+]노쉰의 아큐정전(아Q정전)작품분석과 시대적,사상적 배경분석 및 김수영 치...
[중국현대문학A+]노쉰의 아큐정전(아Q정전)작품분석과 시대적,사상적 배경분석 및 김수영 치... [윤리][신문윤리][기업윤리][의학윤리][환경윤리][행정윤리][광고윤리][경제윤리][시민윤리]...
[윤리][신문윤리][기업윤리][의학윤리][환경윤리][행정윤리][광고윤리][경제윤리][시민윤리]... 성숙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의 배경, 기본전제, 대표적 이론가의 주장을 소개하고 두 이론을 비...
성숙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의 배경, 기본전제, 대표적 이론가의 주장을 소개하고 두 이론을 비... [독후감]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진정으로 승리한 것일까 :『공산당 선언』을 읽고
[독후감]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진정으로 승리한 것일까 :『공산당 선언』을 읽고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vol3. - 루소와 낭만주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vol3. - 루소와 낭만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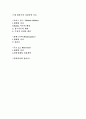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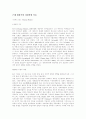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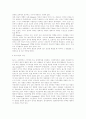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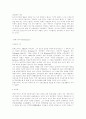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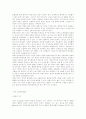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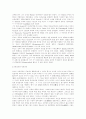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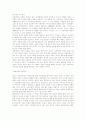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