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역사발전의 중심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하였다. 맑스는 사회에는 경제, 노동, 생산과 같은 하부구조와 정치, 종교, 사상과 같은 상부구조로 이루져 있다고 하였다. 그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여 유물론적 사상을 가졌다.
3. 자본주의 위기와 프롤레탈리아 혁명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내적 모순으로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내적모순이란
생산력과 생산양태간의 불일치를 말한다. 즉, 생산력은 노동자이고 생산양태는 생산수단을 활용한 생산양태를 뜻한다. 맑스는 고대에서는 자영농이 자경지를 자기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나 중세 봉건제시에 독일 북부지방에서 길드시스템의 발달로 다양한 공정에 기계화가 되면서 필요없는 공정이 생겼다. 이후로, 생산력을 가진 사람과 생산양태가 불일치되고 길드시스템 또한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서게 되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생상양태는 정치경제문화를 변화시킨다. 대량생산은 세계시장이 필요하게 되고, 세계시장은 대도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모습은 맑스가 본 당시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해서, 봉건제가 길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생산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렀고, 결국에는 자본주의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의 효율적인 사회화, 자본가들의 사적 착취착복으로 인한 적대관계등 모순되는 지점이 발달하게 된다. 여기서 생산의 사회화란 공장산업체제에서 PT는 모두가 전문화된 사람들이, 즉 한 가지만 하는 단순노동으로 인해 어느 한 개인도 자급자족할 수 없고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노동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생산은 협동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산이 사회화된 것을 맑스는 the blind forces of the market에 의해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맑스는 자본가들은 오직 사적이익만을 위해 동기부여를 받아 움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궁극적인 동인은 자본가의 사적이익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중세가 자본주의로 발전한 것처럼 자본주의도 생산의 사회화된 수단들(PT계급)과 사적인 생산양태의 모순이 결정적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에 생산에 관한 지속적 기속력을 갖는 사회적 권장이나 규제가 없다면 자본가들은 생산물에 대한 지속적 욕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끝없는 이윤추구의 열망을 갖게 되고,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가용자산에 투자하고, 모험을 한다. 결국 자본은 이윤이 많은 곳으로 빠져든다. 의료보험, 교육서비스 등은 종종 사회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은 영역은 점점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윤이 많은 곳은 공급과잉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이윤이 감소하게 되고, 다시 자본은 또 다른 이윤을 쫓아 유출되고, 다시 과소공급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자본이 유입되는 등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의 사이클의 반복, inflation과 deflation의 반복으로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는 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맑스는 자본주의는 발작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착취에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노동자들은 일정량의 급료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잉여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이익이 되며, 자본가들은 소비자가 아닌 노동자를 착취하게 된다.
이렇게 착취 받는 노동자들은 총체적 소외를 뼈저리게, 철저히 느끼게 된다. 자본가 역시 부분적으로는 소외를 경험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또 프롤레탈리아들은 계급의식을 갖게 되고 생산수단과 함께 노동하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것에 의해 맑스는 의회주의나 노조운동 같은 온건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총체적 혁명이나 고통해소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부르주아 혁명이 단지 지배 계급이 다른 형태의 지배 계급으로 바뀐 형태에 불과한 부분적인 것이었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총체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
맑스는 목적이 숭고하여도 폭력혁명도 불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으로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자본주의 모순, 개선여지 부분을 살펴보는 도구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유의미한,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대안적 귀감은 아니다.
3. 자본주의 위기와 프롤레탈리아 혁명
맑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내적 모순으로 위기에 빠진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내적모순이란
생산력과 생산양태간의 불일치를 말한다. 즉, 생산력은 노동자이고 생산양태는 생산수단을 활용한 생산양태를 뜻한다. 맑스는 고대에서는 자영농이 자경지를 자기의 농기구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일치하였으나 중세 봉건제시에 독일 북부지방에서 길드시스템의 발달로 다양한 공정에 기계화가 되면서 필요없는 공정이 생겼다. 이후로, 생산력을 가진 사람과 생산양태가 불일치되고 길드시스템 또한 무너지게 된다. 이러면서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서게 되고 자본주의가 도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된 생상양태는 정치경제문화를 변화시킨다. 대량생산은 세계시장이 필요하게 되고, 세계시장은 대도시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모습은 맑스가 본 당시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해서, 봉건제가 길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생산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렀고, 결국에는 자본주의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의 효율적인 사회화, 자본가들의 사적 착취착복으로 인한 적대관계등 모순되는 지점이 발달하게 된다. 여기서 생산의 사회화란 공장산업체제에서 PT는 모두가 전문화된 사람들이, 즉 한 가지만 하는 단순노동으로 인해 어느 한 개인도 자급자족할 수 없고 의존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간의 노동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생산은 협동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산이 사회화된 것을 맑스는 the blind forces of the market에 의해서 되었다고 인식하였다.
맑스는 자본가들은 오직 사적이익만을 위해 동기부여를 받아 움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궁극적인 동인은 자본가의 사적이익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중세가 자본주의로 발전한 것처럼 자본주의도 생산의 사회화된 수단들(PT계급)과 사적인 생산양태의 모순이 결정적이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에 생산에 관한 지속적 기속력을 갖는 사회적 권장이나 규제가 없다면 자본가들은 생산물에 대한 지속적 욕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끝없는 이윤추구의 열망을 갖게 되고,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가용자산에 투자하고, 모험을 한다. 결국 자본은 이윤이 많은 곳으로 빠져든다. 의료보험, 교육서비스 등은 종종 사회의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대적으로 이윤이 적은 영역은 점점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윤이 많은 곳은 공급과잉되고, 그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이윤이 감소하게 되고, 다시 자본은 또 다른 이윤을 쫓아 유출되고, 다시 과소공급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자본이 유입되는 등 과잉생산과 과소생산의 사이클의 반복, inflation과 deflation의 반복으로 자본주의는 위기를 맞는 다고 보았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맑스는 자본주의는 발작적으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는 생존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착취에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노동자들은 일정량의 급료보다도 더 많은 노동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잉여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이익이 되며, 자본가들은 소비자가 아닌 노동자를 착취하게 된다.
이렇게 착취 받는 노동자들은 총체적 소외를 뼈저리게, 철저히 느끼게 된다. 자본가 역시 부분적으로는 소외를 경험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또 프롤레탈리아들은 계급의식을 갖게 되고 생산수단과 함께 노동하지만 소유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것에 의해 맑스는 의회주의나 노조운동 같은 온건한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총체적 혁명이나 고통해소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즉.부르주아 혁명이 단지 지배 계급이 다른 형태의 지배 계급으로 바뀐 형태에 불과한 부분적인 것이었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총체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
맑스는 목적이 숭고하여도 폭력혁명도 불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으로서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맑스주의는 자본주의 모순, 개선여지 부분을 살펴보는 도구로서는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유의미한,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대안적 귀감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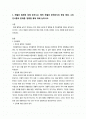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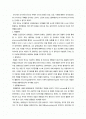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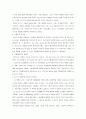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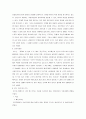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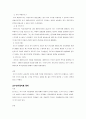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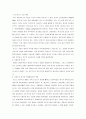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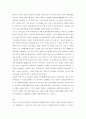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