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로이트 소개 - 프로이트의 이론 -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과 프로이트의 이론
본문내용
산물이기 때문에 성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의 본능 또한 강력한 힘의 원동력이다. 이 죽음의 본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파괴적 행동이 나타난다. 죽음의 본능이 내부로 향하면 자살이나 자학이 되고 밖으로 향하면 공격, 즉 밖으로 향한 죽음의 본능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표출될 때 이것은 전쟁이나 살인이 된다.
이 그림에서 타나토스는 폭력을 표현한다. 폭력으로 찢겨져 버린 인간의 육체를 나타내고 있다. 절규하는 듯한 인간의 얼굴 표정은 폭력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삶은 콩은 단백질이 내포된 식물체를 나타낸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의 단백질 이외에 식물의 단백질도 섭취하는 동물성을 내포하고 있는 타나토스적 존재임을 나타낸다. 그림의 왼쪽에 아주 작은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인간은 이성으로 가장했으나 타나토스에 의해 아주 무의미한 존재로 보이는 현대인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타나토스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여성의 젖가슴을 잡아당기는 표현인데 여성의 젖가슴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젖가슴은 인간의 생명과 풍요를 뜻하는데 이러한 젖가슴을 잡아당기며 찢어 버리는 인간의 폭력성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타나토스적 리비도, 죽음의 성본능인 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이성, 특히 도덕적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 아님을 주장한다. 인간의 본질이 도덕적 선의 이성이라면 전쟁은 잃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파괴적 속성, 즉 타나토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우울한 게임(1929)>이라는 작품이다. 이 그림에서는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 그림은 거세당한 남자, 그리고 거세가 두려워 팬티에 오물을 흘리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자, 눈을 감은 동상이 프로이트의 성적 발달 이론 중에서 거세 공포를 잘 표현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성적 욕망, 리비도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성욕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지만 리비도는 지배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달리의 그림에서는 그림에 표현된 대상들은 무의식의 성욕들이 갈등과 대립, 그리고 억압에서 해방으로 승화되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리적 소모는 일시적 기분 풀이의 수단이다. 그런데 성적 억압은 예술 창조의 바탕이 된다. 축적과 좌절은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승화의 과정으로 이끈다. 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은 모두 예술작품 속에서 승화된다.” - 보스께 알랭 [달리와의 대화] 중에서
세 번째 그림은 달리의 대표작 <기억의 영속(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이다.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의 작업에 임하는 방법을 편집광적인 비판방법(Paramonia-critical Method)이라고 한다. 달리에게 비판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판단 중지에서 지속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병적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자신이 상상력을 구체화시켜서 이를 그림으로 구체화 시킨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상력에 몰두함을 말한다. 우연하게 떠오른 꿈이나 상상력의 이미지를 계속 집중시키고 투사하여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그림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의 우연적 이미지가 없으면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말하는 편집광적 비판 방법은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동시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의미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하여 강박관념, 무의식에 대해서 의식적, 체계적, 정신착란적인 해석을 하고 이를 초현실적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그의 회화는 꿈과 현실이 융합된 초현실세계, 일상의 단일한 장면이 환상과 꿈에서 복합되어 보이듯 화면을 이중노출의 방법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한 편집광적 비판 방법에 의한 그림이 기억의 영속이다. 녹아내리는 시계들은 달리가 시간과 맺고 있는 환상적 관계, 즉 그가 현실과 맺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본질적인 것은 기억 속에 있다고 믿는 신념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편집광적 비판방법에 의해서 이미지를 조직화하고 이를 확신하면 자신의 외부에 있는 진정한 현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조직화하여 현실세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미지의 조직화는 이미지를 사진처럼 초사실적으로 조직화하여 무의식 세계에 있는 구체적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착란을 조직화하고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영상이 느껴지는 그림 등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 정신 이외의 모든 것은 허무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은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달리에게 일생 동안 지속된 강박의 하나는 현실 세계의 인간들이 시간의 엄격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에 얽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계를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으로 달리는 무의식에 대한 억압, 사회의 구속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시간의 상징인 시계들에 대한 달리의 감정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기계적 사물은 나의 가장 최악의 적이 될 것이다. 또한 시계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부드러워져야 하거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6. 결론
달리는 일생동안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이론을 신봉하며 가장 충실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초현실주의 화가다. 하지만 달리 역시 합리적 사고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정신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무의식의 효과를 의식적으로 고안한 그 어떤 시도도 그 전제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그는 프로이트 심리학의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까지 프로이트의 이론은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무의식의 이론이 사물의 순수한 실재성을 드러내고 이것을 다시 회화를 통해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한 왜곡과 환상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바도르 달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완성하여 초현실주의에 획을 그을만한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그림에서 타나토스는 폭력을 표현한다. 폭력으로 찢겨져 버린 인간의 육체를 나타내고 있다. 절규하는 듯한 인간의 얼굴 표정은 폭력을 즐기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삶은 콩은 단백질이 내포된 식물체를 나타낸다. 이것은 인간이 동물의 단백질 이외에 식물의 단백질도 섭취하는 동물성을 내포하고 있는 타나토스적 존재임을 나타낸다. 그림의 왼쪽에 아주 작은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인간은 이성으로 가장했으나 타나토스에 의해 아주 무의미한 존재로 보이는 현대인을 표현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타나토스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여성의 젖가슴을 잡아당기는 표현인데 여성의 젖가슴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젖가슴은 인간의 생명과 풍요를 뜻하는데 이러한 젖가슴을 잡아당기며 찢어 버리는 인간의 폭력성이 프로이트가 말하는 타나토스적 리비도, 죽음의 성본능인 것이다. 이 작품은 인간의 이성, 특히 도덕적 이성은 인간의 본질이 아님을 주장한다. 인간의 본질이 도덕적 선의 이성이라면 전쟁은 잃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이 파괴적 속성, 즉 타나토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우울한 게임(1929)>이라는 작품이다. 이 그림에서는 프로이트의 성적 욕망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많이 표현되고 있다. 이 그림은 거세당한 남자, 그리고 거세가 두려워 팬티에 오물을 흘리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보는 남자, 눈을 감은 동상이 프로이트의 성적 발달 이론 중에서 거세 공포를 잘 표현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성적 욕망, 리비도가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 성욕은 무의식의 세계에 있지만 리비도는 지배적인 힘으로 나타난다. 달리의 그림에서는 그림에 표현된 대상들은 무의식의 성욕들이 갈등과 대립, 그리고 억압에서 해방으로 승화되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생리적 소모는 일시적 기분 풀이의 수단이다. 그런데 성적 억압은 예술 창조의 바탕이 된다. 축적과 좌절은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승화의 과정으로 이끈다. 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은 모두 예술작품 속에서 승화된다.” - 보스께 알랭 [달리와의 대화] 중에서
세 번째 그림은 달리의 대표작 <기억의 영속(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이다. 살바도르 달리는 자신의 작업에 임하는 방법을 편집광적인 비판방법(Paramonia-critical Method)이라고 한다. 달리에게 비판은 어떠한 대상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판단 중지에서 지속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즉, 병적일 정도로 지속적으로 자신이 상상력을 구체화시켜서 이를 그림으로 구체화 시킨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상력에 몰두함을 말한다. 우연하게 떠오른 꿈이나 상상력의 이미지를 계속 집중시키고 투사하여 긴장상태를 지속하고 그림을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의 우연적 이미지가 없으면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말하는 편집광적 비판 방법은 적극적으로 상상력을 발동시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의미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하여 강박관념, 무의식에 대해서 의식적, 체계적, 정신착란적인 해석을 하고 이를 초현실적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그래서 그의 회화는 꿈과 현실이 융합된 초현실세계, 일상의 단일한 장면이 환상과 꿈에서 복합되어 보이듯 화면을 이중노출의 방법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
이러한 편집광적 비판 방법에 의한 그림이 기억의 영속이다. 녹아내리는 시계들은 달리가 시간과 맺고 있는 환상적 관계, 즉 그가 현실과 맺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본질적인 것은 기억 속에 있다고 믿는 신념을 묘사하고 있다. 그는 편집광적 비판방법에 의해서 이미지를 조직화하고 이를 확신하면 자신의 외부에 있는 진정한 현실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조직화하여 현실세계를 파괴하게 된다. 이미지의 조직화는 이미지를 사진처럼 초사실적으로 조직화하여 무의식 세계에 있는 구체적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다. 착란을 조직화하고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영상이 느껴지는 그림 등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 정신 이외의 모든 것은 허무이며, 모든 물질적인 것은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달리에게 일생 동안 지속된 강박의 하나는 현실 세계의 인간들이 시간의 엄격성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에 얽혀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시계를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으로 달리는 무의식에 대한 억압, 사회의 구속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시간의 상징인 시계들에 대한 달리의 감정은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기계적 사물은 나의 가장 최악의 적이 될 것이다. 또한 시계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부드러워져야 하거나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6. 결론
달리는 일생동안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이론을 신봉하며 가장 충실하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초현실주의 화가다. 하지만 달리 역시 합리적 사고에 숨어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정신의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을 수단으로 사용했다. 즉 “무의식의 효과를 의식적으로 고안한 그 어떤 시도도 그 전제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그는 프로이트 심리학의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까지 프로이트의 이론은 큰 영향력을 가지는 만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어쩌면 이러한 무의식의 이론이 사물의 순수한 실재성을 드러내고 이것을 다시 회화를 통해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한 왜곡과 환상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살바도르 달리가 프로이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방법을 완성하여 초현실주의에 획을 그을만한 작품을 만들어 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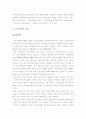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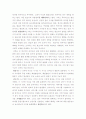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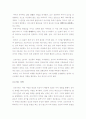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