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강변에 살던 그들 모두에 대해서 조금도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애정을 가지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발칸반도 특유의 역사적인 상황 상 갈등은 항시 존재했으나, 인종이 어떠하든 종교가 어떠하든 그들 모두 드리나 강의 다리를 건너다닌 너무나 친숙한 이웃들인 것이다. 각각의 종교와 인종에 따른 저 마다의 독특한 생활문화에 대한 자연스럽고 세밀한 묘사는 정말 섬세하게 느껴졌다. 장면, 장면에 따라 작가는 세르비아인이 되기도 하고 터키계 무슬림이 되기도 하고 유태인이 되기도 하며 스쳐지나가는 이방인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다리의 건설에서부터 1914년의 비극적인 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을 지치지도 않고 써내려가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대단원은 압권이었다. 이 기나길고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다양한 감상을 모두 적을 수는 없지만 가장 간결하고 가슴에 남는 인상 적인 문구가 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약점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한 치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데 있었다. 인간은 재주도 많고 기술과 지식도 많았지만 앞을 내다보는 능력만은 도무지 없었다.\' 이 문구 하나만 보아도 이 소설은 단지 단순한 역사소설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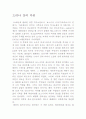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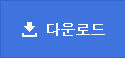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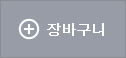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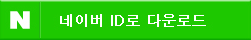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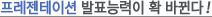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