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백제초기
1) 우보(右輔) 2) 좌보(左輔) 3) 좌장(左將) 4) 북문두(北門頭)
2. 백제의 관등&관직명
1) 좌평(佐平) 2) 솔(率)계 관등 3) 덕(德)계 관등 4) 독(督)계 관등 5)무관(武官)계 관등
Ⅲ. 결론
Ⅱ. 본론
1. 백제초기
1) 우보(右輔) 2) 좌보(左輔) 3) 좌장(左將) 4) 북문두(北門頭)
2. 백제의 관등&관직명
1) 좌평(佐平) 2) 솔(率)계 관등 3) 덕(德)계 관등 4) 독(督)계 관등 5)무관(武官)계 관등
Ⅲ. 결론
본문내용
“겨울 10월, 나솔 득문과 나솔 기마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기를, ‘하내직 이나사 마도 등의 일을 보고한 바, 그에 대한 칙이 없었다’고 하였다.”
- 《일본서기》 권 제 19
나솔에 대한 사료는 부족하여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었다. 정원수는 나와있는 바가 없다.
⇒ 이들 솔(率) 계통의 관등은 주로 정치, 행정, 군사 분야의 지휘관 내지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비시대에 제대로 정비된 것이다.
별도로 칙을 받들어 박사(博士) 시덕(施德) 왕도량(王道良), 역박사(曆博士) 고덕(固德) 왕보손(王保孫), 의박사(醫博士) 나솔(奈率) 왕유시타(王有陀), 채약사(採藥師) 시덕(施德) 반량풍(潘量豊), 고덕(固德) 정유타(丁有陀), 악인(樂人) 시덕(施德) 삼근(三斤), 계덕(季德) 기마차(己麻次), 계덕(季德) 진노(進奴), 대덕(對德) 진타(進陀)를 바쳐 모두 요청에 따라 대체시켰다.
3월 정해달, 백제(百濟) 사인(使人) 중부(中部) 목리(木) 시덕(施德) 문차(文次) 등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다.
- 《일본서기》 권 제 19
위의 사료들은 좌평과 솔 계통의 관등을 제외한 나머지 11관등명이 나타나있는 것이다. 자료가 적어서 일본서기의 사료만을 첨부한다.
3) 덕(德)계 관등
여기에는 장덕(將德), 시덕(施德), 고덕(固德), 계덕(季德), 대덕(對德)이라는 이름으로 5관등으로 구성되어있다.
4) 독(督)계 관등
여기에는 문독(文督)과 무독(武督) 이렇게 2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독(督)은 감독과 독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문독은 문(文)관계 업무를 감찰하는 성격의 관등으로 짐작되고 무독은 무(武)관계 업무를 독찰하는 성격의 관등으로 짐작된다. 또한 문독과 무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무의 구별을 나타내주는 관등이다.
5) 무관(武官)계 관등
여기에는 좌군(佐軍), 진무(振武), 극우(剋虞)로 구성되어있다. 좌평의 경우 병관좌평과 위사좌평만이 군사적 업무를 관장하였지만 다른 좌평들도 출전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13품 무독, 15품 진무, 16품 극우와 같이 좌군의 관등명이 무관직 호칭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소관 업무와는 별도로 일정한 군사적인 의무나 역할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部)를 대표하는 세력들은 부병으로 좌군, 진무, 극우와 같은 하부조직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중앙조직으로서의 좌군은 하급의 군인류에서 파생된 관등으로 추정된다.
Ⅲ. 결론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중국의 고대 사서들 및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같은 일본의 옛기록을 종합해 보면 대게 백제는 “16관등제”를 채택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시대에 정비되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삼국지(三國志)」동이전과 같은 사료들 간의 차이가 있어 16관등의 성립시기에 대해 《삼국사기》는 고이왕 2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6좌평·16관등제가 고이왕대에 완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李鍾旭, 〈백제의 좌평〉, 《진단학보》, 1976).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에서 미루어 볼 때 3세기 중엽경의 고이왕대에 백제가 16관등제라고 하는 정연한 관등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백제가 건국함과 동시에 16관등제가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있어서도 설명이 더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비교함에 있어 자료의 부족함과 상이함이 따라서, 백제의 관등명 및 관직명에 대한 깊은 비교고찰은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번 주제와 더불어 더 많은 분야에 있어 좀 더 많은 조사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일본서기》 권 제 19
나솔에 대한 사료는 부족하여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었다. 정원수는 나와있는 바가 없다.
⇒ 이들 솔(率) 계통의 관등은 주로 정치, 행정, 군사 분야의 지휘관 내지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비시대에 제대로 정비된 것이다.
별도로 칙을 받들어 박사(博士) 시덕(施德) 왕도량(王道良), 역박사(曆博士) 고덕(固德) 왕보손(王保孫), 의박사(醫博士) 나솔(奈率) 왕유시타(王有陀), 채약사(採藥師) 시덕(施德) 반량풍(潘量豊), 고덕(固德) 정유타(丁有陀), 악인(樂人) 시덕(施德) 삼근(三斤), 계덕(季德) 기마차(己麻次), 계덕(季德) 진노(進奴), 대덕(對德) 진타(進陀)를 바쳐 모두 요청에 따라 대체시켰다.
3월 정해달, 백제(百濟) 사인(使人) 중부(中部) 목리(木) 시덕(施德) 문차(文次) 등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다.
- 《일본서기》 권 제 19
위의 사료들은 좌평과 솔 계통의 관등을 제외한 나머지 11관등명이 나타나있는 것이다. 자료가 적어서 일본서기의 사료만을 첨부한다.
3) 덕(德)계 관등
여기에는 장덕(將德), 시덕(施德), 고덕(固德), 계덕(季德), 대덕(對德)이라는 이름으로 5관등으로 구성되어있다.
4) 독(督)계 관등
여기에는 문독(文督)과 무독(武督) 이렇게 2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독(督)은 감독과 독찰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문독은 문(文)관계 업무를 감찰하는 성격의 관등으로 짐작되고 무독은 무(武)관계 업무를 독찰하는 성격의 관등으로 짐작된다. 또한 문독과 무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무의 구별을 나타내주는 관등이다.
5) 무관(武官)계 관등
여기에는 좌군(佐軍), 진무(振武), 극우(剋虞)로 구성되어있다. 좌평의 경우 병관좌평과 위사좌평만이 군사적 업무를 관장하였지만 다른 좌평들도 출전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때, 13품 무독, 15품 진무, 16품 극우와 같이 좌군의 관등명이 무관직 호칭이라고 짐작된다. 따라서 소관 업무와는 별도로 일정한 군사적인 의무나 역할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部)를 대표하는 세력들은 부병으로 좌군, 진무, 극우와 같은 하부조직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로써 중앙조직으로서의 좌군은 하급의 군인류에서 파생된 관등으로 추정된다.
Ⅲ. 결론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중국의 고대 사서들 및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같은 일본의 옛기록을 종합해 보면 대게 백제는 “16관등제”를 채택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시대에 정비되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삼국지(三國志)」동이전과 같은 사료들 간의 차이가 있어 16관등의 성립시기에 대해 《삼국사기》는 고이왕 2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6좌평·16관등제가 고이왕대에 완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李鍾旭, 〈백제의 좌평〉, 《진단학보》, 1976).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에서 미루어 볼 때 3세기 중엽경의 고이왕대에 백제가 16관등제라고 하는 정연한 관등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백제가 건국함과 동시에 16관등제가 수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있어서도 설명이 더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비교함에 있어 자료의 부족함과 상이함이 따라서, 백제의 관등명 및 관직명에 대한 깊은 비교고찰은 다소 어려운 점이 많았다.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위해서는 이번 주제와 더불어 더 많은 분야에 있어 좀 더 많은 조사와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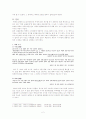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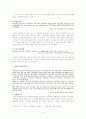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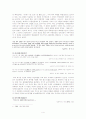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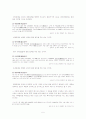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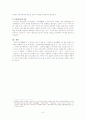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