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 주요 단어 정의
(1-1) 매스미디어(대중매체)
(1-2) 매스컴(대중언론, 대중전달)
2. 매체 및 대중매체의 특성
3. 대중매체와 권력
본론
1. 문제제기
2. 현대시 중 대중매체와 그에 관여하는 자본과 권력을 다룬 시
(2-1) 광고의 허위성(상업 자본의 영향)을 다룬 시
(2-2)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여 진실을 알려야 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무마하고 있음을 알리는 시
소결론
결론
1. 주요 단어 정의
(1-1) 매스미디어(대중매체)
(1-2) 매스컴(대중언론, 대중전달)
2. 매체 및 대중매체의 특성
3. 대중매체와 권력
본론
1. 문제제기
2. 현대시 중 대중매체와 그에 관여하는 자본과 권력을 다룬 시
(2-1) 광고의 허위성(상업 자본의 영향)을 다룬 시
(2-2) 권력이 대중매체를 장악하여 진실을 알려야 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무마하고 있음을 알리는 시
소결론
결론
본문내용
진실을 알려야 할 상황을 의도적으로 무마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고 본다.
소결론
위에서 해석한 시를 토대로 본다면, 자본과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해 대중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을 무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의 나라’에 등장하는 광고와 제품들은 모두 훌륭하고 세련된 제품이라고 소개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독자는 이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텔레비전III’에서는 민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적으로 재생산된 정보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물론 모든 매스컴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라는 매체의 속성은 다른 어떤 소통보다도, 권력과 결탁하기 쉽고 자본의 영향을 받기 쉽다. 즉 누군가가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성질 외에도 매스미디어 자체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소통을 저해하는 장르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주제를 정하고 조사하는 동안 한 가지 얻은 사실은, 오히려 문학이 진정한 소통의 매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고의 나라’에서 보여준 아이러니와, ‘텔레비전III’에서 보여준 ‘말할 수 없음’의 기법 등은, 시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항하는 항체로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라는 장르의 특성은 진정성에 기인한다. 시인이라는 인간의 사명감에서 오는 힘으로 인해 충분히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시했던 시를 완성하기 위해, 시인은 현실을 통찰하고 거기서 문제의식을 발현하여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했을 것이다.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표현과 양식을 채택해야할 지도 고려했을 것이다.
물론 시인의 의도와 표현양식이 시라는 매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인의 능력이 모자랐거나 또는 독자의 해독능력 문제이지, 시라는 장르의 문제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 앞에서, 문학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대중매체를 접하는 것보다는 더 진실 되고 선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대중매체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외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직체로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시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상의 부정적 면모를 보이고 있고, 시는 나아가 문학은, 진솔한 예술 양식으로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힘을 제공한다고 본다.
소결론
위에서 해석한 시를 토대로 본다면, 자본과 국가권력의 개입을 통해 대중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을 무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고의 나라’에 등장하는 광고와 제품들은 모두 훌륭하고 세련된 제품이라고 소개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독자는 이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텔레비전III’에서는 민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통제적으로 재생산된 정보 외엔 아무것도 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
물론 모든 매스컴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라는 매체의 속성은 다른 어떤 소통보다도, 권력과 결탁하기 쉽고 자본의 영향을 받기 쉽다. 즉 누군가가 독점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성질 외에도 매스미디어 자체적으로 진실을 감추고 소통을 저해하는 장르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다.
주제를 정하고 조사하는 동안 한 가지 얻은 사실은, 오히려 문학이 진정한 소통의 매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고의 나라’에서 보여준 아이러니와, ‘텔레비전III’에서 보여준 ‘말할 수 없음’의 기법 등은, 시가 대중매체의 부정적인 면모에 대항하는 항체로 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라는 장르의 특성은 진정성에 기인한다. 시인이라는 인간의 사명감에서 오는 힘으로 인해 충분히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장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시했던 시를 완성하기 위해, 시인은 현실을 통찰하고 거기서 문제의식을 발현하여 진정한 소통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했을 것이다. 또 그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어떠한 표현과 양식을 채택해야할 지도 고려했을 것이다.
물론 시인의 의도와 표현양식이 시라는 매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시인의 능력이 모자랐거나 또는 독자의 해독능력 문제이지, 시라는 장르의 문제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시 앞에서, 문학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대중매체를 접하는 것보다는 더 진실 되고 선한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대중매체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외의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직체로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유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시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상의 부정적 면모를 보이고 있고, 시는 나아가 문학은, 진솔한 예술 양식으로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하는 힘을 제공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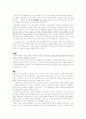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