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1
2. 본론
1) 언어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잔재‥‥‥‥‥‥‥‥‥‥‥‥‥‥‥‥2
(1)거의 모든 업종에 퍼져 버린 일본말‥‥‥‥‥‥‥‥‥‥‥‥‥‥‥2
(2)지리 용어에 남아있는 일본식표현‥‥‥‥‥‥‥‥‥‥‥‥‥‥‥‥3
(3)인식하지 못하는 일본식 한자말‥‥‥‥‥‥‥‥‥‥‥‥‥‥‥‥‥4
(4)일본어순화를 위한 노력 ‥‥‥‥‥‥‥‥‥‥‥‥‥‥‥‥‥‥‥‥5
2) 법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6
(1)사법제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6
(2)형사법제도에 숨어있는 잔재 ‥‥‥‥‥‥‥‥‥‥‥‥‥‥‥‥‥‥7
3) 놀이에 남아있는 일제잔재‥‥‥‥‥‥‥‥‥‥‥‥‥‥‥‥‥‥‥8
(1)화투 속에 숨어있는 일본 ‥‥‥‥‥‥‥‥‥‥‥‥‥‥‥‥‥‥‥8
(2)대신할 놀이문화 탐색‥‥‥‥‥‥‥‥‥‥‥‥‥‥‥‥‥‥‥‥‥9
3. 결론‥‥‥‥‥‥‥‥‥‥‥‥‥‥‥‥‥‥‥‥‥‥‥‥‥‥‥‥‥10
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1
2. 본론
1) 언어생활 속에 남아있는 일제잔재‥‥‥‥‥‥‥‥‥‥‥‥‥‥‥‥2
(1)거의 모든 업종에 퍼져 버린 일본말‥‥‥‥‥‥‥‥‥‥‥‥‥‥‥2
(2)지리 용어에 남아있는 일본식표현‥‥‥‥‥‥‥‥‥‥‥‥‥‥‥‥3
(3)인식하지 못하는 일본식 한자말‥‥‥‥‥‥‥‥‥‥‥‥‥‥‥‥‥4
(4)일본어순화를 위한 노력 ‥‥‥‥‥‥‥‥‥‥‥‥‥‥‥‥‥‥‥‥5
2) 법제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6
(1)사법제도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6
(2)형사법제도에 숨어있는 잔재 ‥‥‥‥‥‥‥‥‥‥‥‥‥‥‥‥‥‥7
3) 놀이에 남아있는 일제잔재‥‥‥‥‥‥‥‥‥‥‥‥‥‥‥‥‥‥‥8
(1)화투 속에 숨어있는 일본 ‥‥‥‥‥‥‥‥‥‥‥‥‥‥‥‥‥‥‥8
(2)대신할 놀이문화 탐색‥‥‥‥‥‥‥‥‥‥‥‥‥‥‥‥‥‥‥‥‥9
3. 결론‥‥‥‥‥‥‥‥‥‥‥‥‥‥‥‥‥‥‥‥‥‥‥‥‥‥‥‥‥10
본문내용
라는 일본말이며 민화투에서 점수가 되는 ‘약’은 일본어의 세금, 부역 등을 의미하는 ‘役’을 일본식(야쿠)으로 발음한 것이다. ‘기리’는 자른다는 뜻의 일본어. 무산됐다는 일본어 ‘나가레’에서 온 ‘나가리’, 풀을 뜻하는 일본어에서 온 ‘쿠사’를 비롯해 ‘고리뗀다’에서 ‘고리’는 금품을 받는다는 일본어 ‘고오리끼’에서 온 것이다. 돈을 내지 않고 미뤄두는 ‘가리’는 빚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이밖에 ‘도리짓고 땡’, ‘장땡’, ‘구삥’, ‘가보’ 같은 말은 물론 ‘땡잡았다’ ‘삥땅치다’ 등의 용어는 아예 관용어처럼 사용되는 등 화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화투는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 반영한다. 화투는 19세기말경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쓰시마섬 상인들이 장사차 왕래하면서 퍼뜨렸다는 설도 있지만 누가 어떻게 들여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화투가 왜색문화를 급속히 조선에 전파한 것만은 사실이다. 화투는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급속히 전파돼 사회 상층부 사람들까지도 화투를 가지고 노는 풍조에 휩쓸렸으며 심지어 왕까지 화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일제가 화투를 일본문화 전파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급속도로 화투가 전파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화투는 그림의 내용이 일본 풍속을 따르고 있는데다 그림의 도안이나 색채도 전적으로 왜색이다. 일본문화 자체인 셈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던 일제강점기 말기와 8·15 이후 몇 해 동안은 화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본이 화투를 왜색문화 전파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에 실패하면서 화투가 우리들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을 놓고 화투의 역사를 해방 후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와 대비시키는 것은 과도한 짜 맞추기일까.
한국인들은 일본의 전통문화에 녹아들고 있다. 48장의 화투 속에 담겨있는 그림들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화투를 치는 대부분 사람들은 화투패에 담겨있는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른다. 화투패중 왜 1월, 3월, 8월, 11월, 12월에만 광이 있는 이유를 아는지. 이 다섯 달은 일본의 대표적인 명절이 들어있는 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설날(1월)을 비롯해 벚꽃축제(3월), 오봉제 및 달구경(7, 8월), 어린이 명절(11월), ‘도시꼬시 소바’라는 국수를 나눠먹는 세모(12월)가 그것이다. 1월의 소나무는 설날부터 1주일간 집 앞에 꽂아두고 조상신과 복을 맞는다는 일본의 세시풍속을 그린 것이고, 9월 국진의 국화는 헤이안 시대부터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전통의 반영이다. 술잔에 목숨 수자가 적혀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화는 또 일본왕가의 문양이기도 하다. 비광의 갓 쓴 사람은 오노노도후라는 일본 귀족으로 10세기의 유명한 서예가이다. 한국 화투는 갓 모양만 변형돼 있으며 옷은 일본옷 그대로이다. 특히 개구리를 그려 넣은 것은 개구리가 버드나무에 뛰어오르기 위해 수없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오노의 전설을 그린 것으로 일본의 예전 교과서에 실리던 유명한 설화다. 국진, 오동의 10점짜리는 다른 종류의 패를 대신할 수 있는 만능 패로 쓰인다. 이는 국화가 왕가의 문양이고 오동은 에도 막부의 문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투 패는 한 장도 빠짐없이 일본 문화 기호로 가득 찬 일본 고유 그림책이자 일본 전통문화교본인 것이다.
(2) 화투 대신할 놀이문화
일본이라면 화투를 이용해 놀이도 하고 문화공부도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화투를 통해 일본 전통문화를 공부할 이유는 없다. 물론 노름 자체도 문제이지만 노름도 나름대로 놀이문화의 한 형태라고 보면 ‘놀이로서의 화투’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고스톱이 노인들의 치매예방에 좋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화투가 온통 왜색문화 일색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 화투를 쥐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전을 부활시켜야 한다든지, 골패나 윷놀이만 고집한다든지 하는 것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3. 결론
해방 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아래 힘들게 현재까지 달려왔다. 사람들은 풍족해진 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민족의 정체성이란 단어는 점점 잊어가고 있으며 현재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이름아래에 희생을 해왔다는 사람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잔재청산은 단지 현재 쓰고 있는 말들을 조금 바꾸거나 우리가 하는 놀이나 행동에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단지 국가에서 고시를 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국책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인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민족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민족정신이 바탕 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정신을 일깨워야한다. 위의 본론의 경우뿐 만아니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기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 굳이 국가차원의 정책이 아니라도 사람들의 개인 개인의 인식들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어떻게 본다면 일제잔재청산은 혹독한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이며 후세에 우리말과 우리의 문화를 배워나갈 후세에 대한 책임이다. 그 누구도 해줄 수없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여야하고 바꿔 나가야할 우리의 과업이다.
참고문헌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박숙희 1996
(주) 내일신문 “해방60 생활속의 일본” 이경기 2005
[박숙희]님의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1996,
(주) 내일신문 “해방60 생활속의 일본” 이경기 2005
화투는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 반영한다. 화투는 19세기말경 일본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쓰시마섬 상인들이 장사차 왕래하면서 퍼뜨렸다는 설도 있지만 누가 어떻게 들여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화투가 왜색문화를 급속히 조선에 전파한 것만은 사실이다. 화투는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급속히 전파돼 사회 상층부 사람들까지도 화투를 가지고 노는 풍조에 휩쓸렸으며 심지어 왕까지 화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일제가 화투를 일본문화 전파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급속도로 화투가 전파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화투는 그림의 내용이 일본 풍속을 따르고 있는데다 그림의 도안이나 색채도 전적으로 왜색이다. 일본문화 자체인 셈이다. 일제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던 일제강점기 말기와 8·15 이후 몇 해 동안은 화투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본이 화투를 왜색문화 전파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반증한다. 해방 후 일제잔재 청산에 실패하면서 화투가 우리들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점을 놓고 화투의 역사를 해방 후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와 대비시키는 것은 과도한 짜 맞추기일까.
한국인들은 일본의 전통문화에 녹아들고 있다. 48장의 화투 속에 담겨있는 그림들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 화투를 치는 대부분 사람들은 화투패에 담겨있는 그림의 의미를 잘 모른다. 화투패중 왜 1월, 3월, 8월, 11월, 12월에만 광이 있는 이유를 아는지. 이 다섯 달은 일본의 대표적인 명절이 들어있는 달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설날(1월)을 비롯해 벚꽃축제(3월), 오봉제 및 달구경(7, 8월), 어린이 명절(11월), ‘도시꼬시 소바’라는 국수를 나눠먹는 세모(12월)가 그것이다. 1월의 소나무는 설날부터 1주일간 집 앞에 꽂아두고 조상신과 복을 맞는다는 일본의 세시풍속을 그린 것이고, 9월 국진의 국화는 헤이안 시대부터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전통의 반영이다. 술잔에 목숨 수자가 적혀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화는 또 일본왕가의 문양이기도 하다. 비광의 갓 쓴 사람은 오노노도후라는 일본 귀족으로 10세기의 유명한 서예가이다. 한국 화투는 갓 모양만 변형돼 있으며 옷은 일본옷 그대로이다. 특히 개구리를 그려 넣은 것은 개구리가 버드나무에 뛰어오르기 위해 수없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오노의 전설을 그린 것으로 일본의 예전 교과서에 실리던 유명한 설화다. 국진, 오동의 10점짜리는 다른 종류의 패를 대신할 수 있는 만능 패로 쓰인다. 이는 국화가 왕가의 문양이고 오동은 에도 막부의 문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투 패는 한 장도 빠짐없이 일본 문화 기호로 가득 찬 일본 고유 그림책이자 일본 전통문화교본인 것이다.
(2) 화투 대신할 놀이문화
일본이라면 화투를 이용해 놀이도 하고 문화공부도 한다는 명분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화투를 통해 일본 전통문화를 공부할 이유는 없다. 물론 노름 자체도 문제이지만 노름도 나름대로 놀이문화의 한 형태라고 보면 ‘놀이로서의 화투’를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고스톱이 노인들의 치매예방에 좋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화투가 온통 왜색문화 일색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 화투를 쥐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투전을 부활시켜야 한다든지, 골패나 윷놀이만 고집한다든지 하는 것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람들 간의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를 만드는 것일 것이다
3. 결론
해방 후 우리는 많은 시간을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아래 힘들게 현재까지 달려왔다. 사람들은 풍족해진 생활에 만족을 느끼며 민족의 정체성이란 단어는 점점 잊어가고 있으며 현재가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민족이라는 이름아래에 희생을 해왔다는 사람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일제의 잔재청산은 단지 현재 쓰고 있는 말들을 조금 바꾸거나 우리가 하는 놀이나 행동에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단지 국가에서 고시를 하고 관련 법규를 제정한다고 하여 모든 것이 국책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인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민족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민족정신이 바탕 되었기 때문이다. 점점 약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정신을 일깨워야한다. 위의 본론의 경우뿐 만아니라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에서 일제의 잔재가 청산되기 못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점점 무뎌지게 된다. 굳이 국가차원의 정책이 아니라도 사람들의 개인 개인의 인식들의 변화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어떻게 본다면 일제잔재청산은 혹독한 일제강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도리이며 후세에 우리말과 우리의 문화를 배워나갈 후세에 대한 책임이다. 그 누구도 해줄 수없기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여야하고 바꿔 나가야할 우리의 과업이다.
참고문헌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 박숙희 1996
(주) 내일신문 “해방60 생활속의 일본” 이경기 2005
[박숙희]님의 \'반드시 바꿔 써야 할 우리말 속 일본말\',1996,
(주) 내일신문 “해방60 생활속의 일본” 이경기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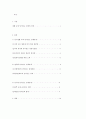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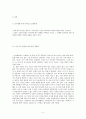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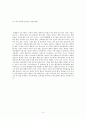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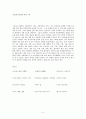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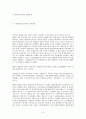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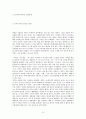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