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금에 절인 김치 - 고대인의 식생활
신석기 시대 이후 농경이 시작되었다. 농경의 시작은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주식이 되는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때는 조, 피, 수수 등의 잡곡류가 주식이었다.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늘날에도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쌀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삼국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벼농사를 장려했으며 많은 저수지를 축조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쌀보다는 잡곡류를 주로 생산했으며, 신라, 백제의 경우도 쌀은 일반 백성들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은 아니었다. 쌀은 지배층이 먹는 귀한 곡식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보리, 조, 콩, 수수 등을 주식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곡식을 섞어 잡곡밥을 해서 먹었는데,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솥, 시루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흙으로 만든 토기 솥이나 시루도 사용했지만, 쇠솥도 일반에까지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 쇠솥은 중요한 재산의 하나였다.
반찬류로는 간장, 된장, 젓갈류 등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소금을 널리 이용했으므로 이러한 양념류의 조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 식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김치도 물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김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 우리 나라에 전해졌다. 그러므로 이때의 김치는 채소류를 소금이나 젓갈에 절인 정도였을 것이다. 백제의 김치류가 일본에 전해져 단무지가 되었다고 하니, 삼국 시대 김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외 물고기나 조개류 등을 반찬으로 사용했다. 흥미롭게도 백제와 신라에서는 회를 즐겨 먹었다고도 한다. 고기류로는 돼지와 닭을 식용으로 널리 사육했다. 소는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이었던 만큼, 오늘날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귀족을 비롯한 지배층은 일반 백성보다는 훨씬 호화스러운 식생활을 하였는데, 『삼국유사』에는 손님 접대에 50여 가지 반찬을 내놓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그 외 당시의 음식류로는 술은 물론이고 약밥, 떡, 말린 고기, 꿀 등이 있고, 조미료로 참기름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박물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큰 가마솥, 항아리, 도가니, 질그릇, 시루, 술잔, 컵모양 토기, 다리 달린 주발, 수저 등 식생활과 관련된 유물들은, 당시의 식생활 문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온돌의 등장 - 고대인의 주생활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 지어진 최초의 집은 움집이었다.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땅을 60센티미터에서 1미터 정도 파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는 모양이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움의 깊이가 낮아지면서 벽면이 생겨나고 지붕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삼국 시대에는 완전한 지상 가옥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움집이나 반움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여의 부소산성에는 백제의 병사들이 기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움집을 복원해 놓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의 주거 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집은 내부를 나눌 수 없어 방이 하나인 셈이므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한가족이 한방에서 생활하였다.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집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었다. 방의 크기나 담장의 높이 그리고 건축 재료나 장식물 등이 신분에 따라 규제되었다. 백성들은 중국식 기와를 얹을 수 없었고, 담장도 6자 이상 높이 쌓거나 회를 바를 수 없었다. 그리고 방의 길이나 너비도 15자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은 이 규정에도 훨씬 못 미치는 주거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 시대의 집모양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집모양 토기가 있으며, 또한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집모양 토기를 통해서 당시의 집의 외형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와 지붕의 집모양 토기는 당시 지배층의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이었다. 가운데 부엌이 있고 양옆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 구조이다.
왕이나 대 귀족의 주거 생활은 몹시 화려했다. 궁궐이나 사찰 그리고 귀족의 주택에는 화려한 기와 및 장식물을 사용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 보면 대 귀족의 대 저택에는 부엌, 우물, 수레 창고, 고기 창고, 방앗간, 외양간, 마구간을 따로 갖추고 있었다. 방은 화려한 커튼이나 휘장으로 장식을 하고 침상에서 생활하였으며, 거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는 주거 생활이었다. 난방은 화로나 난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성들의 난방 방법도 발전하였다. 신석기 시대의 움집의 경우, 가운데 화덕을 만들고 불을 피워 추위를 피했다. 그러나 움의 깊이가 낮아지고 지상 가옥으로 발전하면서 삼국 시대에 온돌이 등장하였다. 불을 피우는 화덕이 부엌에 설치되고 방 한쪽으로 구들을 놓아 온기를 통과시키는 초보적인 형식이다. 방바닥은 흙을 다지고 거적과 같은 깔개를 까는 정도였다. 삼국 시대에는 온돌이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온돌 난방법은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쉬어가기) 삼국 시대의 군대 생활
군대에 가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대개는 남성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국 시대에는 대개 15세 이상의 남자들은 신체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군대에 갔다. 신라의 경우 건강한 남자들은 군에 입대하여 봉화병, 국경 수비병 또는 순라군 등 역할에 따라 복무하였다. 복무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일생에 3년 정도는 국경 수비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국경 수비에 나가는 것을 방추라 하였는데, 오늘날 휴전선을 지키는 일과 유사한 일을 말한다. 3년은 대체로 지켜졌지만 전쟁시에는 늘어나기도 하였다. 3년의 방추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오늘날의 예비군처럼 상당 기간을 군인으로 복무하였다. 농번기에는 농사짓고 농한기에는 훈련하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병사들의 계급은 없었던 것 같다. 귀족이나 지배층은 신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관등으로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그러나 평민 출신의 병졸들은 연령이나 평시의 혈연 관계에 따라 군대내 질서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는 나이에 따른 질서가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신석기 시대 이후 농경이 시작되었다. 농경의 시작은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주었다. 주식이 되는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이때는 조, 피, 수수 등의 잡곡류가 주식이었다.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늘날에도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쌀을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삼국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벼농사를 장려했으며 많은 저수지를 축조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지리적 특성상 쌀보다는 잡곡류를 주로 생산했으며, 신라, 백제의 경우도 쌀은 일반 백성들이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곡식은 아니었다. 쌀은 지배층이 먹는 귀한 곡식이었고, 일반 백성들은 보리, 조, 콩, 수수 등을 주식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곡식을 섞어 잡곡밥을 해서 먹었는데,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솥, 시루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흙으로 만든 토기 솥이나 시루도 사용했지만, 쇠솥도 일반에까지 널리 보급되었는데, 이 쇠솥은 중요한 재산의 하나였다.
반찬류로는 간장, 된장, 젓갈류 등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소금을 널리 이용했으므로 이러한 양념류의 조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 식단의 가장 기초가 되는 김치도 물론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김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추는 임진왜란 이후 우리 나라에 전해졌다. 그러므로 이때의 김치는 채소류를 소금이나 젓갈에 절인 정도였을 것이다. 백제의 김치류가 일본에 전해져 단무지가 되었다고 하니, 삼국 시대 김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외 물고기나 조개류 등을 반찬으로 사용했다. 흥미롭게도 백제와 신라에서는 회를 즐겨 먹었다고도 한다. 고기류로는 돼지와 닭을 식용으로 널리 사육했다. 소는 농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이었던 만큼, 오늘날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귀족을 비롯한 지배층은 일반 백성보다는 훨씬 호화스러운 식생활을 하였는데, 『삼국유사』에는 손님 접대에 50여 가지 반찬을 내놓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그 외 당시의 음식류로는 술은 물론이고 약밥, 떡, 말린 고기, 꿀 등이 있고, 조미료로 참기름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박물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큰 가마솥, 항아리, 도가니, 질그릇, 시루, 술잔, 컵모양 토기, 다리 달린 주발, 수저 등 식생활과 관련된 유물들은, 당시의 식생활 문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온돌의 등장 - 고대인의 주생활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 지어진 최초의 집은 움집이었다. 신석기 시대의 움집은 땅을 60센티미터에서 1미터 정도 파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는 모양이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움의 깊이가 낮아지면서 벽면이 생겨나고 지붕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삼국 시대에는 완전한 지상 가옥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가난한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움집이나 반움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여의 부소산성에는 백제의 병사들이 기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움집을 복원해 놓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의 주거 생활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집은 내부를 나눌 수 없어 방이 하나인 셈이므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한가족이 한방에서 생활하였다.
신라에서는 신분에 따라 집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었다. 방의 크기나 담장의 높이 그리고 건축 재료나 장식물 등이 신분에 따라 규제되었다. 백성들은 중국식 기와를 얹을 수 없었고, 담장도 6자 이상 높이 쌓거나 회를 바를 수 없었다. 그리고 방의 길이나 너비도 15자를 넘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수의 백성들은 이 규정에도 훨씬 못 미치는 주거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 시대의 집모양을 보여주는 유물로는 집모양 토기가 있으며, 또한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집모양 토기를 통해서 당시의 집의 외형이 최근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와 지붕의 집모양 토기는 당시 지배층의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이었다. 가운데 부엌이 있고 양옆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 구조이다.
왕이나 대 귀족의 주거 생활은 몹시 화려했다. 궁궐이나 사찰 그리고 귀족의 주택에는 화려한 기와 및 장식물을 사용했다. 고구려의 고분 벽화를 통해서 보면 대 귀족의 대 저택에는 부엌, 우물, 수레 창고, 고기 창고, 방앗간, 외양간, 마구간을 따로 갖추고 있었다. 방은 화려한 커튼이나 휘장으로 장식을 하고 침상에서 생활하였으며, 거실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는 주거 생활이었다. 난방은 화로나 난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성들의 난방 방법도 발전하였다. 신석기 시대의 움집의 경우, 가운데 화덕을 만들고 불을 피워 추위를 피했다. 그러나 움의 깊이가 낮아지고 지상 가옥으로 발전하면서 삼국 시대에 온돌이 등장하였다. 불을 피우는 화덕이 부엌에 설치되고 방 한쪽으로 구들을 놓아 온기를 통과시키는 초보적인 형식이다. 방바닥은 흙을 다지고 거적과 같은 깔개를 까는 정도였다. 삼국 시대에는 온돌이 널리 보급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온돌 난방법은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쉬어가기) 삼국 시대의 군대 생활
군대에 가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대개는 남성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국 시대에는 대개 15세 이상의 남자들은 신체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군대에 갔다. 신라의 경우 건강한 남자들은 군에 입대하여 봉화병, 국경 수비병 또는 순라군 등 역할에 따라 복무하였다. 복무 기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일생에 3년 정도는 국경 수비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 국경 수비에 나가는 것을 방추라 하였는데, 오늘날 휴전선을 지키는 일과 유사한 일을 말한다. 3년은 대체로 지켜졌지만 전쟁시에는 늘어나기도 하였다. 3년의 방추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오늘날의 예비군처럼 상당 기간을 군인으로 복무하였다. 농번기에는 농사짓고 농한기에는 훈련하는 형식이었을 것이다.
병사들의 계급은 없었던 것 같다. 귀족이나 지배층은 신분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관등으로 위계질서를 갖추었다. 그러나 평민 출신의 병졸들은 연령이나 평시의 혈연 관계에 따라 군대내 질서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는 나이에 따른 질서가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추천자료
 한국 다(茶)문화의 역사
한국 다(茶)문화의 역사 고전문학
고전문학 국악전수관에 다녀와서
국악전수관에 다녀와서 우리옛질그릇 (빛깔고운책들)
우리옛질그릇 (빛깔고운책들) 한국 주거의 개론 및 역사
한국 주거의 개론 및 역사 고분을 통해 본 백제 한성도읍시기
고분을 통해 본 백제 한성도읍시기 [한국사요약, 한국사] 한국사 A+ 완벽정리 서브노트 - 초기국가의 성장, 문화의융성, 발해의 ...
[한국사요약, 한국사] 한국사 A+ 완벽정리 서브노트 - 초기국가의 성장, 문화의융성, 발해의 ... 국악(한국전통음악)의 의미와 용어, 국악(한국전통음악)과 국악기(한국전통악기), 국악(한국...
국악(한국전통음악)의 의미와 용어, 국악(한국전통음악)과 국악기(한국전통악기), 국악(한국... 신라 특유의 적석목곽분
신라 특유의 적석목곽분 태권도의 근대~현대 발전과정과 역사
태권도의 근대~현대 발전과정과 역사 인천문화권,국제도시인천,세계도시,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
인천문화권,국제도시인천,세계도시,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 한국 식생활문화의 변천과정(우리나라 식생활문화 발전과정, 역사, 발달과정)
한국 식생활문화의 변천과정(우리나라 식생활문화 발전과정, 역사, 발달과정) 2017년 2학기 한국복식문화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한국복식문화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7년 2학기 한국복식문화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2017년 2학기 한국복식문화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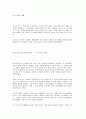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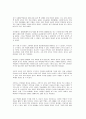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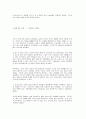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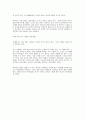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