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음날 나는 서둘러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만 하셨다. 할머니는 하루 사이 더 늙은 것처럼 보였다. 서울에 온 후 나 자신조차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대학생활을 이어갔다. 하루는 대학친구를 불러 포장마차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술을 계속 마셔도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다. 조금씩 얼큰한 술기운이 오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아니 기분이 좋아졌다.
“임마, 그만 마셔. 너 무슨 일 있는 거냐?”
“오늘은 술이 받나 보다. 더 마셔 더. 킥킥……킥킥킥.”
“야, 너 왜 그래?”
“나. 나 말이야. 나란 놈은 너무 매정한 놈인가 보다. 2주전에 그 사람 아니 울 아버지 세상 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하나도 안 나더라. 울 아버지 죽었는데, 죽었는데 말야 나 눈물이 한 방울도, 단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 불쌍한 인간. 지 아들놈이 울어주지도 않는데 왜 죽냔 말이야. 왜 그렇게 초라하게 죽냔 말이야.”
친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위로 받고 싶었다. 그러나 대신 동정을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팽겨쳐질 것 같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다. 데려다 주겠다는 친구를 뿌리치고 홀로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하더니 구역질이 났다. 어디로 가면 이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무작정 걸었다. 말 그대로 무작정 걸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낯선 주택가에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주택들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빽빽하게 들어선 그 거대한 주택들이 위협적인 몸짓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어둠 속에선 수백, 혹은 수천의 눈동자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조건 도망치기 위해 저만치 보이는 가로등의 불빛을 향해 열심히 내달렸다. 등불은 희미해지더니 이내 밝아지고 또다시 희미해지더니 결국엔 꺼져버렸다. 홀로 어둠 속에 둘러싸여 가로등을 붙잡고 주저앉아 버렸다.
“킥킥. 미친놈. 킥킥킥”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만 홀로 주위를 맴돌았다. 그 때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지나치던 그 누군가의 것이었으리라. 갑자기 잠에서 확 깬 듯한 기분이 들면서 안도감이 온 몸을 휩쓸었다. 나를 조여오던 공기들은 이제 마음껏 내 몸을 부비며 내 안을 드나들고 있었다. 꺼진 줄 알았던 가로등은 내 옆에 우두커니 서서 작열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집 근처 골목이었다. 낯익은 낮은 집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한 달 뒤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고향 뒷산에 소주 한 병을 들고 혼자 찾아갔다. 무덤은 아직 풀이 나지 않아 마치 민둥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말년의 그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우선 나는 절부터 한 다음 소주병을 따서 반쯤을 봉분에 뿌리고 그 앞에 앉았다. 무언가 얘기하려 했지만 몇 년간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은데다가 무덤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아 그냥 앉아 있다가 반쯤 남은 술을 안주도 없이 마셔버렸다.
‘아부지, 좋은데 가이소.’
햇빛은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이제는 날씨가 제법 더워지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봄이 끝나감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손을 깍지껴 머리에 대고 잔디에 누웠다.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나 평화롭게 구름이 흘러갔고, 세상도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며 노래가 흘러나왔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나알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다음날 나는 서둘러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만 하셨다. 할머니는 하루 사이 더 늙은 것처럼 보였다. 서울에 온 후 나 자신조차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대학생활을 이어갔다. 하루는 대학친구를 불러 포장마차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술을 계속 마셔도 취하지는 않고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졌다. 조금씩 얼큰한 술기운이 오르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아니 기분이 좋아졌다.
“임마, 그만 마셔. 너 무슨 일 있는 거냐?”
“오늘은 술이 받나 보다. 더 마셔 더. 킥킥……킥킥킥.”
“야, 너 왜 그래?”
“나. 나 말이야. 나란 놈은 너무 매정한 놈인가 보다. 2주전에 그 사람 아니 울 아버지 세상 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하나도 안 나더라. 울 아버지 죽었는데, 죽었는데 말야 나 눈물이 한 방울도, 단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 불쌍한 인간. 지 아들놈이 울어주지도 않는데 왜 죽냔 말이야. 왜 그렇게 초라하게 죽냔 말이야.”
친구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위로 받고 싶었다. 그러나 대신 동정을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내팽겨쳐질 것 같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았다. 데려다 주겠다는 친구를 뿌리치고 홀로 집으로 향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 하더니 구역질이 났다. 어디로 가면 이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무작정 걸었다. 말 그대로 무작정 걸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니 낯선 주택가에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주택들과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빽빽하게 들어선 그 거대한 주택들이 위협적인 몸짓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진다. 어둠 속에선 수백, 혹은 수천의 눈동자들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무조건 도망치기 위해 저만치 보이는 가로등의 불빛을 향해 열심히 내달렸다. 등불은 희미해지더니 이내 밝아지고 또다시 희미해지더니 결국엔 꺼져버렸다. 홀로 어둠 속에 둘러싸여 가로등을 붙잡고 주저앉아 버렸다.
“킥킥. 미친놈. 킥킥킥”
어둠 속에서 내 목소리만 홀로 주위를 맴돌았다. 그 때 어디선가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지나치던 그 누군가의 것이었으리라. 갑자기 잠에서 확 깬 듯한 기분이 들면서 안도감이 온 몸을 휩쓸었다. 나를 조여오던 공기들은 이제 마음껏 내 몸을 부비며 내 안을 드나들고 있었다. 꺼진 줄 알았던 가로등은 내 옆에 우두커니 서서 작열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 집 근처 골목이었다. 낯익은 낮은 집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한 달 뒤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고향 뒷산에 소주 한 병을 들고 혼자 찾아갔다. 무덤은 아직 풀이 나지 않아 마치 민둥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말년의 그 같아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우선 나는 절부터 한 다음 소주병을 따서 반쯤을 봉분에 뿌리고 그 앞에 앉았다. 무언가 얘기하려 했지만 몇 년간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은데다가 무덤에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아 그냥 앉아 있다가 반쯤 남은 술을 안주도 없이 마셔버렸다.
‘아부지, 좋은데 가이소.’
햇빛은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이제는 날씨가 제법 더워지고 있었다. 산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봄이 끝나감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손을 깍지껴 머리에 대고 잔디에 누웠다. 하늘을 바라보니 너무나 평화롭게 구름이 흘러갔고, 세상도 예전과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며 노래가 흘러나왔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나알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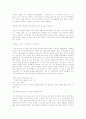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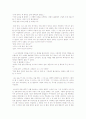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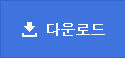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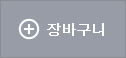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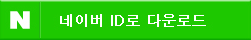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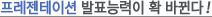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