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례 및 관련조문 ………………………………………………………………………… 2
1. 사례 ………………………………………………………………………… 2
2. 관련조문 ………………………………………………………………………… 2
Ⅱ. 문제의 제기 ………………………………………………………………………… 3
Ⅲ. 문제의 검토 ………………………………………………………………………… 3
1. 명예훼손의 일반론 ……………………………………………………………… 3
2. 甲의 첫 번째 행위 ……………………………………………………………… 4
⑴ 사실의 적시 ……………………………………………………………… 4
⑵ 공연성 ……………………………………………………………… 4
⑶ 제307조 제1항의 죄인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인가 ……… 6
⑷ 소결 ……………………………………………………………… 6
3. 甲의 두 번째 행위 ……………………………………………………………… 6
⑴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 ……………………………………………… 7
⑵ 소결 ……………………………………………………………… 7
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 8
⑴ 제310조의 적용요건 ……………………………………………… 8
⑵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9
⑶ 소결 ……………………………………………………………… 9
Ⅳ. 문제의 해결 ………………………………………………………………………… 9
참고목록
질문내용 보완
1. 사례 ………………………………………………………………………… 2
2. 관련조문 ………………………………………………………………………… 2
Ⅱ. 문제의 제기 ………………………………………………………………………… 3
Ⅲ. 문제의 검토 ………………………………………………………………………… 3
1. 명예훼손의 일반론 ……………………………………………………………… 3
2. 甲의 첫 번째 행위 ……………………………………………………………… 4
⑴ 사실의 적시 ……………………………………………………………… 4
⑵ 공연성 ……………………………………………………………… 4
⑶ 제307조 제1항의 죄인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죄인가 ……… 6
⑷ 소결 ……………………………………………………………… 6
3. 甲의 두 번째 행위 ……………………………………………………………… 6
⑴ 출판물 등의 명예훼손 ……………………………………………… 7
⑵ 소결 ……………………………………………………………… 7
4.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 8
⑴ 제310조의 적용요건 ……………………………………………… 8
⑵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9
⑶ 소결 ……………………………………………………………… 9
Ⅳ. 문제의 해결 ………………………………………………………………………… 9
참고목록
질문내용 보완
본문내용
즉 개인이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는 한 번 훼손되었을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판례를 따르면, 甲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사례
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③그 장면들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수지 김 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드라마(‘제5공화국’)의 공익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진실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상당성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가 당시 안기부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수지 김 사건’은 그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안기부의 전 부처가 총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상당성의 근거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드라마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의 법리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20. 선고 2005가합79818]
Ⅳ. 문제의 해결 甲은 무죄이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제2행위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에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이다.…형법이 요구하는 공연성의 요구를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평가를 무시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 이재상, 318면.
甲은 유죄이다.
甲은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
甲의 첫 번째 행위는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적시하였으므로 착오론의 일반이론에 의해 제307조 제2항의 죄가 아니라 동조 제1항의 죄가 적용된다.
甲의 두 번째 행위에서 인쇄한 50여 매의 유인물은 제309조에서 인정하는 출판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적시하였으므로 착오론의 일반이론에 의해 제307조 제2항의 죄가 아니라) 다만 307조 제1항에 해당할 뿐이다.
甲이 비록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니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한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2가지 행위에서 2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참고목록 -
참고판례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90
대법원 1984. 2.28. 선고 83도891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2037
대법원 1986. 3.25. 선고 85도1143
대법원 1994. 5.10. 선고 93다21750
대법원 1994.10.20. 선고 94도2186
대법원 1997. 4.11. 선고 97도88
대법원 1997. 8.26. 선고 97도133
대법원 2000. 2.11. 선고 99도3048
대법원 2000. 2.25. 선고98도2188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도709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대법원 2005. 7.15. 선고 2004도1388
대법원 2005.12. 9. 선고 2004도2880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도1239
대법원 2008. 2.14. 선고 2007도8155
참고사이트
로앤비 http://www.lawnb.com
DBPIA http://www.dbpia.c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20. 선고 2005가합79818
참고문헌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박재윤, 「주석 형법」 형법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2.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연습」, 신조사, 2006.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7.
김숙자,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The Legal Study on Defamation of Character in Civil Law)”, 「사회과학논총」 제19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손동권, “실행공범자에 의한 객체착오의 효과/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의 취급”, 「고시계」 통권 제524호, 고시계사, 2000.
신영준, “제1차시험 예상논점정리와 예제/刑法(17)-從犯/名譽毁損罪의 제310조 違法性阻却”, 「고시계」 통권 제588호, 고시계사, 2006.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통권 제196호, 고시연구사, 1990.
①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압력을 가하여 단체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반복해서 불특정다수의 행인을 상대로 소리치면서 거리행진을 함으로써 위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③그 장면들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수지 김 사건’을 묵인한데서 나아가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드라마(‘제5공화국’)의 공익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진실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나아가 상당성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논픽션의 성격을 가진 드라마에 있어서는 일반의 청취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내용을 방송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이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원고가 당시 안기부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수지 김 사건’은 그 중요도를 고려할 때 안기부의 전 부처가 총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상당성의 근거를 들고 있으나, 앞서 본 드라마에 있어서 상당성 판단의 법리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20. 선고 2005가합79818]
Ⅳ. 문제의 해결 甲은 무죄이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제2행위는 적시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甲은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착오하였고 그것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이므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할 때에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처벌규정도 없기 때문이다.…형법이 요구하는 공연성의 요구를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여 무의미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평가를 무시하는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 이재상, 318면.
甲은 유죄이다.
甲은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
甲의 첫 번째 행위는 전파성의 이론에 의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적시하였으므로 착오론의 일반이론에 의해 제307조 제2항의 죄가 아니라 동조 제1항의 죄가 적용된다.
甲의 두 번째 행위에서 인쇄한 50여 매의 유인물은 제309조에서 인정하는 출판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이라고 오인하고 적시하였으므로 착오론의 일반이론에 의해 제307조 제2항의 죄가 아니라) 다만 307조 제1항에 해당할 뿐이다.
甲이 비록 공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더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 아니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한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2가지 행위에서 2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참고목록 -
참고판례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도1569
대법원 1970. 5.26. 선고 70도704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190
대법원 1984. 2.28. 선고 83도891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2037
대법원 1986. 3.25. 선고 85도1143
대법원 1994. 5.10. 선고 93다21750
대법원 1994.10.20. 선고 94도2186
대법원 1997. 4.11. 선고 97도88
대법원 1997. 8.26. 선고 97도133
대법원 2000. 2.11. 선고 99도3048
대법원 2000. 2.25. 선고98도2188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1도709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3912
대법원 2005. 7.15. 선고 2004도1388
대법원 2005.12. 9. 선고 2004도2880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도1239
대법원 2008. 2.14. 선고 2007도8155
참고사이트
로앤비 http://www.lawnb.com
DBPIA http://www.dbpia.c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20. 선고 2005가합79818
참고문헌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5.
박재윤, 「주석 형법」 형법각칙(4),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2.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이재상, 「형법연습」, 신조사, 2006.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정웅석,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2007.
김숙자,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The Legal Study on Defamation of Character in Civil Law)”, 「사회과학논총」 제19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손동권, “실행공범자에 의한 객체착오의 효과/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한 착오의 취급”, 「고시계」 통권 제524호, 고시계사, 2000.
신영준, “제1차시험 예상논점정리와 예제/刑法(17)-從犯/名譽毁損罪의 제310조 違法性阻却”, 「고시계」 통권 제588호, 고시계사, 2006.
이영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명예의 개념”, 「고시연구」, 통권 제196호, 고시연구사,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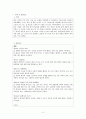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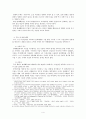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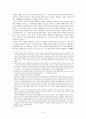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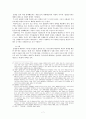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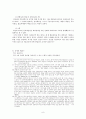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