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제강점 이전의 관찬기관
2.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사서편찬
3.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치
4. 조선사편수회
가. 조선사편수회의 설치
나. 조선사편수회의 구성
다. 조선사편수회의 활동
라.『조선사』의 성격
5. 현대의 관찬기관
2.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사서편찬
3. 조선사편찬위원회의 설치
4. 조선사편수회
가. 조선사편수회의 설치
나. 조선사편수회의 구성
다. 조선사편수회의 활동
라.『조선사』의 성격
5. 현대의 관찬기관
본문내용
가 축적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헌들을 전부 흡수하여 志를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었고, 더욱이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일천한 일본학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는 문헌사료의 양이 많지 않은 대만에서 1922년 계획된 사서의 체제가 기전체이었던 것과 비교된다.
들째,『조선사』의 편찬동기 중의 하나가 왜곡된 한국사를 시정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조선사』가 “공명정확한 학술적 사서”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일제의 표방에 가장 적합한 편찬체제가 편년체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역사적 사실은 연차순으로 기술하는 편년체에 原史料를 게재하여 사료집적 성격을 갖춤으로써『조선사』의 객관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이는『반도사』와 같이 서술형의 사서로 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개별적 사실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편년체 채택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단군조선을 수록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역사적 사실의 발생연도가 확실해야 하는 편년체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인의 단군수록요구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표4> 『朝鮮史』時期區分의 조직별 변화
조직
편별
중 추 원
편찬위원회 설치 이전
편찬위원회
편 수 회
1 편
上古三韓
三國以前
三國以前
新羅統一以前
2 편
三國
新羅
三國時代
新羅統一時代
3 편
統一後의 新羅
高麗
新羅時代
高麗時代
4 편
高麗
朝鮮前期
高麗時代
朝鮮前期
(태조~선조)
5 편
朝鮮
朝鮮後期
朝鮮前期
(태조~선조)
朝鮮中期
(광해군~정조)
6 편
朝鮮最近史
朝鮮中期
(광해군~영조)
朝鮮後期
(순조~갑오개혁)
7 편
朝鮮後期
(정조~갑오개혁)
위 <표4>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기구분의 기점문제이다. 편찬위원회와 편수회의 고대사 시기구분은 ‘삼국이전’, ‘신라통일이전’ 등으로 삼국시대에 기점을 설정하여 그 이전의 역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삼국 이전의 역사를 삼국시대에 부수되는 종속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시대가 한국사의 독자적인 성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편수회 당시의 시기구분에서 더욱 심하게 드러나는데 고대사의 구분 자체가 편찬위원회 때에 비하여 더욱 단순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기점도 삼국에서 신라통일올 하향 조정되었다.
편찬의 하한에서도 중추원의『반도사』는 병탄까지 서술할 계획이었으나 편찬위원회와 편수회에서는 갑오개혁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위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심어주는 한편 갑오개혁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된 일제의 한국침략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속셈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
5. 현대의 관찬기관
국사편찬위원회는 애초에 “국사관”으로 출발하였다. 일제가 미국에 항복한 이후 미군정하에서 민족사료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민족사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사관’은 1946년 일제 시대 중추원 내에 있던 조선사편수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국사관은 1948년 혼란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체제정비를 이루었고, 1949년 3월 역사 편찬 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편집부 옮김,『朝鮮史編修會事業槪要』, 시인사, 1986
2. 김성민,「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국민대 대학원, 1993
3. 조동걸,『韓國 民族主義의 發展과 獨立運動史硏究』, 지신산업사, 1993
4. 조동걸 외 공저,『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1994
5.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http://historyworld.org)
6. 국사편찬위원회(http://www.nhcc.go.kr)
들째,『조선사』의 편찬동기 중의 하나가 왜곡된 한국사를 시정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제는『조선사』가 “공명정확한 학술적 사서”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일제의 표방에 가장 적합한 편찬체제가 편년체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역사적 사실은 연차순으로 기술하는 편년체에 原史料를 게재하여 사료집적 성격을 갖춤으로써『조선사』의 객관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이는『반도사』와 같이 서술형의 사서로 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개별적 사실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편년체 채택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단군조선을 수록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역사적 사실의 발생연도가 확실해야 하는 편년체를 채택함으로써 한국인의 단군수록요구를 회피하고자 하였다.
<표4> 『朝鮮史』時期區分의 조직별 변화
조직
편별
중 추 원
편찬위원회 설치 이전
편찬위원회
편 수 회
1 편
上古三韓
三國以前
三國以前
新羅統一以前
2 편
三國
新羅
三國時代
新羅統一時代
3 편
統一後의 新羅
高麗
新羅時代
高麗時代
4 편
高麗
朝鮮前期
高麗時代
朝鮮前期
(태조~선조)
5 편
朝鮮
朝鮮後期
朝鮮前期
(태조~선조)
朝鮮中期
(광해군~정조)
6 편
朝鮮最近史
朝鮮中期
(광해군~영조)
朝鮮後期
(순조~갑오개혁)
7 편
朝鮮後期
(정조~갑오개혁)
위 <표4>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기구분의 기점문제이다. 편찬위원회와 편수회의 고대사 시기구분은 ‘삼국이전’, ‘신라통일이전’ 등으로 삼국시대에 기점을 설정하여 그 이전의 역사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는 삼국 이전의 역사를 삼국시대에 부수되는 종속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이 시대가 한국사의 독자적인 성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편수회 당시의 시기구분에서 더욱 심하게 드러나는데 고대사의 구분 자체가 편찬위원회 때에 비하여 더욱 단순화되었을 뿐 아니라 그 기점도 삼국에서 신라통일올 하향 조정되었다.
편찬의 하한에서도 중추원의『반도사』는 병탄까지 서술할 계획이었으나 편찬위원회와 편수회에서는 갑오개혁까지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소위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심어주는 한편 갑오개혁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된 일제의 한국침략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속셈하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
5. 현대의 관찬기관
국사편찬위원회는 애초에 “국사관”으로 출발하였다. 일제가 미국에 항복한 이후 미군정하에서 민족사료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민족사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국사관’은 1946년 일제 시대 중추원 내에 있던 조선사편수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국사관은 1948년 혼란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적인 체제정비를 이루었고, 1949년 3월 역사 편찬 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를 조직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참 고 문 헌 】
1. 편집부 옮김,『朝鮮史編修會事業槪要』, 시인사, 1986
2. 김성민,「朝鮮史編修會의 組織과 運用」, 국민대 대학원, 1993
3. 조동걸,『韓國 民族主義의 發展과 獨立運動史硏究』, 지신산업사, 1993
4. 조동걸 외 공저,『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1994
5.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http://historyworld.org)
6. 국사편찬위원회(http://www.nhc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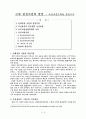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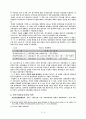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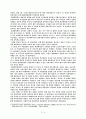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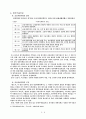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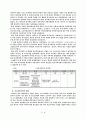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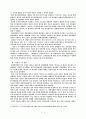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