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농촌극에 나타난 이향(離鄕)과 귀향(歸鄕)
-1930년대 희곡작품을 중심으로-
1. 1930년대의 농촌과 연극
2. 이향(離鄕)의 계층화
① 소작농의 이향(離鄕)
② 여성의 이향(離鄕)
③ 지식인의 이향(離鄕)
3. 고향으로의 회귀에 소외된 계층
4. 고향현실의 이질적 존재, 지식인
《참고목록》
-1930년대 희곡작품을 중심으로-
1. 1930년대의 농촌과 연극
2. 이향(離鄕)의 계층화
① 소작농의 이향(離鄕)
② 여성의 이향(離鄕)
③ 지식인의 이향(離鄕)
3. 고향으로의 회귀에 소외된 계층
4. 고향현실의 이질적 존재, 지식인
《참고목록》
본문내용
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드라마적 공간으로써의 ‘농촌’이다.
으로 설정한 고향으로써의 농촌과는 거리가 멀다. 당대 희곡 작품에 풍경화 된 농촌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고향으로써의 ‘농촌’ 역시 목가적이고 전원적이며 옛 향수를 자아내는 그리움의 이미지는 퇴색된 채 현실적 암울함을 더욱 심화시킨다.
명서: 앗다. 밤이건 낫이건 이왕 이리된 팔자에 世上이 무서워 못할 일이 어듸잇단 말인가.
경선: 아니야 다가치비러머거도 좀더 자유스런데가 로잇다. 여긔는 너무 사람의 눈에 만코 오랜 인습이 엉켜서 하로를 부지할수가업다. 고행이란 결국 밥술이나 어더머글에는 시한 양지가태도 우리가치 잠자리조차 걱정하는 처지에는 데이려 갑한 감옥일세 그려. 유치진, 토막,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4, 아세아문화사, 1989, p417.
(밑줄강조-필자)
시골 토막(土幕) 집에 살고 있는 명서와 경선 경선은 이미 이향을 경험한 인물이다. 자신의 집과 살림이 빚 때문에 모두 빼앗긴 이후에 말 그래도 도망친다. 하지만 첫번째 이향은 극에서 그저 도망을 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정도로만 제시될 뿐 이향을 한 이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는 막연하다. 그러다가 고향에 남겨둔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이향하기 위해서 잠깐 찾아오는데 첫 번째 이향은 남겨진 처자식의 처참한 생활을 강조하기 위한 극적 장치라면 두 번째 이향에서야 비로소 등장인물의 고향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은 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당대 식민지 조선농민들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에게 있어 고향의 동질성에 따른 인간적 유대감은 오히려 거북한 시선으로 작용하고 오래된 인습은 악습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농촌은 자신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감옥”이며 “무덤”이고 “쓰레기통”인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향은 상실되었으며, 본유적인 의미에 있어 고향을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은 의식주가 해결된 가진 자들만의 몫이다.
경선: 그러니. 結局 우리조선사람의 할만한 직업이란 인제는 등짐장사인줄아네. 미상불 가 지도록 농사지어노흐면 앗다 일홈조흔 수리조합이니 소작료니해서 요리조리 다 앗기고 멍충이가치 굶고안젓는 소작인 노릇 하기보다야 몃갑절나신지 몰르네. 정말이네. 제일편한 것은 이러타저러타 남의게 호령바들것업시 거리에서 일하며 별미테서 잠자리하는 말성업는걸세. 가진 것이 업스니 앗길념려가업고 앗길 렴려가업스니 줄창 마음은 푸군하고 푸군한 마음에는 언제주겨도 유언할 필요가 업스니 말이야. 이르케 희한한 사람사리가 어듸에 잇겟는가. 유치진, 앞의 작품, p416.
경선과 같이 당대의 소작농에게는 고향에서 농사짓기보다는 차라리 타향살이를 하는 편이 더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일이다. 이처럼 1930년대 고향인 농촌의 모습은 풍년보다는 흉년이 낫고 농사지은 것을 남의 손에 내어쥬고는 보고 못먹는 처럼 바라보기만 허는 것보담은 슝년이들어 한럭도 못어더먹는게 오히려 낫지(C 생, 죠고만한 決議,《농민》7호, 1930, 11.)
, 고향에서 ‘머뭄’보다는 타향으로 ‘떠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돌모: 그야 대봉이 너이겟나 사정이 하긴 하지만은 그레도 죽으나사나 정들고 낫익은 고향이 낫지 안켓나 가면 어데로 가늬
철수: 허허(선우슴을치며) 차돌어머니도 참합니다 어늬 누가 정든 고향을 나고십허 나겟슴니가 허는 수업스니 그러케 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만 이곳을 나 어데던지 가바리는 수밧게 업슬가마요 김상명, 봄, 《신조선》13호, 1935, 12.
“남부녀대하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어데던지살아갈 곳이업슬가 는 류리걸식이라도 해가며 그날그날의 여러식구들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정처업시 나가는 사람들의 수효가 해마다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향(離鄕)의 풍경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고향은 유토피아적이며 낭만적인 공간이 아닌 자신들에게 이향을 조성하는 공간일 뿐이다. 이처럼 소작농에게 있어 이향은 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로, 표면적으로는 자의적 선택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회 제도의 모순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② 여성의 이향(離鄕)
소작농의 이향이 비참한 현실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면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의 이향이다. 이서구의 향토극(鄕土劇) 동백 이서구, 동백,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4, pp257~266. 이하 인용문은 페이지만 표시.
에 등장하는 홍단은 어머니의 병환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팔려간다. 이렇게 청루(靑樓)에 팔려가는 여성은 비단 홍단뿐만이 아니며,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단: 나는 이왕 팔녀가는 몸이니 너이들이나 잘잇거라 작년지도 이 동백가지에 열매를 며 갓치 놀앗것만은 이제부터는 너이들의 고흔 손으로 서 보내는 동백기름을 발너가며 청루에 우슴파는 가련한 신세가 되얏단다.(262쪽)
고향에서의 순수함과 깨끗한 이미지를 고수하던 홍단은 도시로의 이향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순수성이 소멸됨을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고향에서 갖던 ‘동백꽃’의 순결함이 동백기름으로 변질되어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그 의미 또한 퇴색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홍단에게 있어 고향은 세상물정 모르는 “숙맥”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南쪽 어느 섬’이라는 극중 배경을 통해 당위성을 얻는다. 즉, 섬이라는 공간은 타지에 쉽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고립성을 지닌다. 그래서 고향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면에만 해당된다. 반면에 그 고립성은 현실적 감각을 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외향적으로 보이는 고향의 순수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안분지족(安分知足)적인 삶의 일면으로, 홍단과 같은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홍단: 우리네의 아바지 하라바지가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섬속에 파뭇처 태평가나 부르든 탓이란다. 그러니 너이들은 언문한자라도 지성 배와서 신문한장 잡지한줄이라도 읽어가며 남에게 뒤지지안는 사람이 되야다오 이 동백 곱게 피는 평화의
으로 설정한 고향으로써의 농촌과는 거리가 멀다. 당대 희곡 작품에 풍경화 된 농촌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식민지 시대라는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고향으로써의 ‘농촌’ 역시 목가적이고 전원적이며 옛 향수를 자아내는 그리움의 이미지는 퇴색된 채 현실적 암울함을 더욱 심화시킨다.
명서: 앗다. 밤이건 낫이건 이왕 이리된 팔자에 世上이 무서워 못할 일이 어듸잇단 말인가.
경선: 아니야 다가치비러머거도 좀더 자유스런데가 로잇다. 여긔는 너무 사람의 눈에 만코 오랜 인습이 엉켜서 하로를 부지할수가업다. 고행이란 결국 밥술이나 어더머글에는 시한 양지가태도 우리가치 잠자리조차 걱정하는 처지에는 데이려 갑한 감옥일세 그려. 유치진, 토막,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4, 아세아문화사, 1989, p417.
(밑줄강조-필자)
시골 토막(土幕) 집에 살고 있는 명서와 경선 경선은 이미 이향을 경험한 인물이다. 자신의 집과 살림이 빚 때문에 모두 빼앗긴 이후에 말 그래도 도망친다. 하지만 첫번째 이향은 극에서 그저 도망을 가 생사를 알 수 없는 정도로만 제시될 뿐 이향을 한 이후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는 막연하다. 그러다가 고향에 남겨둔 자식과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이향하기 위해서 잠깐 찾아오는데 첫 번째 이향은 남겨진 처자식의 처참한 생활을 강조하기 위한 극적 장치라면 두 번째 이향에서야 비로소 등장인물의 고향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은 하루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당대 식민지 조선농민들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에게 있어 고향의 동질성에 따른 인간적 유대감은 오히려 거북한 시선으로 작용하고 오래된 인습은 악습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농촌은 자신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감옥”이며 “무덤”이고 “쓰레기통”인 것이다. 즉,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향은 상실되었으며, 본유적인 의미에 있어 고향을 향유할 수 있는 혜택은 의식주가 해결된 가진 자들만의 몫이다.
경선: 그러니. 結局 우리조선사람의 할만한 직업이란 인제는 등짐장사인줄아네. 미상불 가 지도록 농사지어노흐면 앗다 일홈조흔 수리조합이니 소작료니해서 요리조리 다 앗기고 멍충이가치 굶고안젓는 소작인 노릇 하기보다야 몃갑절나신지 몰르네. 정말이네. 제일편한 것은 이러타저러타 남의게 호령바들것업시 거리에서 일하며 별미테서 잠자리하는 말성업는걸세. 가진 것이 업스니 앗길념려가업고 앗길 렴려가업스니 줄창 마음은 푸군하고 푸군한 마음에는 언제주겨도 유언할 필요가 업스니 말이야. 이르케 희한한 사람사리가 어듸에 잇겟는가. 유치진, 앞의 작품, p416.
경선과 같이 당대의 소작농에게는 고향에서 농사짓기보다는 차라리 타향살이를 하는 편이 더 마음에 위안을 주는 일이다. 이처럼 1930년대 고향인 농촌의 모습은 풍년보다는 흉년이 낫고 농사지은 것을 남의 손에 내어쥬고는 보고 못먹는 처럼 바라보기만 허는 것보담은 슝년이들어 한럭도 못어더먹는게 오히려 낫지(C 생, 죠고만한 決議,《농민》7호, 1930, 11.)
, 고향에서 ‘머뭄’보다는 타향으로 ‘떠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돌모: 그야 대봉이 너이겟나 사정이 하긴 하지만은 그레도 죽으나사나 정들고 낫익은 고향이 낫지 안켓나 가면 어데로 가늬
철수: 허허(선우슴을치며) 차돌어머니도 참합니다 어늬 누가 정든 고향을 나고십허 나겟슴니가 허는 수업스니 그러케 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지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만 이곳을 나 어데던지 가바리는 수밧게 업슬가마요 김상명, 봄, 《신조선》13호, 1935, 12.
“남부녀대하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어데던지살아갈 곳이업슬가 는 류리걸식이라도 해가며 그날그날의 여러식구들의 생명을 이어가려고 정처업시 나가는 사람들의 수효가 해마다 늘어가는” 현실에서 이향(離鄕)의 풍경은 결코 낯설지 않다. 이제 더 이상 고향은 유토피아적이며 낭만적인 공간이 아닌 자신들에게 이향을 조성하는 공간일 뿐이다. 이처럼 소작농에게 있어 이향은 살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로, 표면적으로는 자의적 선택이지만 그 내면에는 사회 제도의 모순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② 여성의 이향(離鄕)
소작농의 이향이 비참한 현실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다면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의 이향이다. 이서구의 향토극(鄕土劇) 동백 이서구, 동백, 한국근대희곡작품자료집4, pp257~266. 이하 인용문은 페이지만 표시.
에 등장하는 홍단은 어머니의 병환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로 팔려간다. 이렇게 청루(靑樓)에 팔려가는 여성은 비단 홍단뿐만이 아니며, 그 다음에는 또 누가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단: 나는 이왕 팔녀가는 몸이니 너이들이나 잘잇거라 작년지도 이 동백가지에 열매를 며 갓치 놀앗것만은 이제부터는 너이들의 고흔 손으로 서 보내는 동백기름을 발너가며 청루에 우슴파는 가련한 신세가 되얏단다.(262쪽)
고향에서의 순수함과 깨끗한 이미지를 고수하던 홍단은 도시로의 이향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의 순수성이 소멸됨을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고향에서 갖던 ‘동백꽃’의 순결함이 동백기름으로 변질되어 도시로 유입됨으로써 그 의미 또한 퇴색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홍단에게 있어 고향은 세상물정 모르는 “숙맥”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南쪽 어느 섬’이라는 극중 배경을 통해 당위성을 얻는다. 즉, 섬이라는 공간은 타지에 쉽게 영향을 받지 못하는 고립성을 지닌다. 그래서 고향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면에만 해당된다. 반면에 그 고립성은 현실적 감각을 망각하게 만든다. 따라서 외향적으로 보이는 고향의 순수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닌 안분지족(安分知足)적인 삶의 일면으로, 홍단과 같은 여성들이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홍단: 우리네의 아바지 하라바지가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섬속에 파뭇처 태평가나 부르든 탓이란다. 그러니 너이들은 언문한자라도 지성 배와서 신문한장 잡지한줄이라도 읽어가며 남에게 뒤지지안는 사람이 되야다오 이 동백 곱게 피는 평화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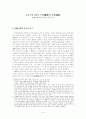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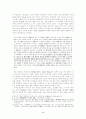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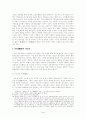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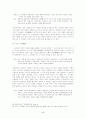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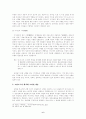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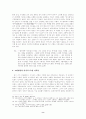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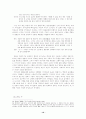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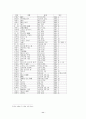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