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6세기 금석문의 특징에 대해서◀◀◀
1. 迎日 冷水里碑
2. 蔚珍 鳳坪碑
3. 永川 菁堤碑
4. 丹陽 赤城碑
5. 昌寧 眞興王拓境碑
6. 北漢山 眞興王巡狩碑
7. 黃草嶺 眞興王巡狩
8. 磨雲嶺 眞興王巡狩碑
▶▶▶맺음말◀◀◀
<참고문헌>
1. 迎日 冷水里碑
2. 蔚珍 鳳坪碑
3. 永川 菁堤碑
4. 丹陽 赤城碑
5. 昌寧 眞興王拓境碑
6. 北漢山 眞興王巡狩碑
7. 黃草嶺 眞興王巡狩
8. 磨雲嶺 眞興王巡狩碑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라금석문 맛보기(6세기 중고기 중심으로)
▶▶▶6세기 금석문의 특징에 대해서◀◀◀
1. 6세기에는 금문을 찾기가 어렵고 석문이 그 주류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물론 5세기까지 아울러보면 몇몇 금문의 사례가 확인된다. 하지만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그 구체적 사실을 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아마도 주술적인 성격의 전대 금석상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잔재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들 5세기 금문들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을 소지하는 개인에게 국한된 내용이거나 소지자 또는 제작자 이름ㅁ이 나타난다. 하지만 6세기 석문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보일 목적에서 제작된다. 이는 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없다가 6세기때 정치, 사회적 변화로 그럴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5세기때 전혀 보이지 않던 석문의 활발한 작성은 6세기 때부터 생겨난 새로운 유행으로 볼 수 있다.
금문은 본디 그 성질상 많은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사실을 기록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석문이 작성된 것이다. 즉 많은 내용을 담는 석문이 필요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러 석문 가운데서도 비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울주천전리서석 같은 석각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건 비문류이다. 즉 비문이 주류를 이루는 사실은 아마도 그 내용을 일반민에게 전달하려는 방법이 새로이 강구된 시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율령의 반포를 비롯하여 영역의 확장에 따른 율령의 전반적인 확대시행 및 이와 관련한 새로운 시기의 도래와 관계깊다.
3. 이 시기 비문들은 아직 아직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신 외에 귀부와 이수를 갖춘 정형화된 양식은 7세기 후반에 이르러야 비로소 나타난다. 6세기에는 비를 세우면서도 특별한 격식이 없었음이 시대적 특징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았았던 6세기 금석문은 내용상의 분식도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6세기 금석문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비문이 주류적인 흐름을 차지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경향으로 토기에 명문을 새기거나 묵서한 사례 및 목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토기명문이나 목간의 작성시기가 한층 소급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자료에 따르는 한 6세기 중엽을 그리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듯하다. 이는 어쩌면 7세기에 이르러 비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과도
▶▶▶6세기 금석문의 특징에 대해서◀◀◀
1. 6세기에는 금문을 찾기가 어렵고 석문이 그 주류를 이룬다는 사실이다. 물론 5세기까지 아울러보면 몇몇 금문의 사례가 확인된다. 하지만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그 구체적 사실을 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는 아마도 주술적인 성격의 전대 금석상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잔재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들 5세기 금문들은 특정한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것을 소지하는 개인에게 국한된 내용이거나 소지자 또는 제작자 이름ㅁ이 나타난다. 하지만 6세기 석문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다수의 사람에게 보일 목적에서 제작된다. 이는 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없다가 6세기때 정치, 사회적 변화로 그럴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5세기때 전혀 보이지 않던 석문의 활발한 작성은 6세기 때부터 생겨난 새로운 유행으로 볼 수 있다.
금문은 본디 그 성질상 많은 내용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사실을 기록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석문이 작성된 것이다. 즉 많은 내용을 담는 석문이 필요한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러 석문 가운데서도 비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울주천전리서석 같은 석각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류를 이루는건 비문류이다. 즉 비문이 주류를 이루는 사실은 아마도 그 내용을 일반민에게 전달하려는 방법이 새로이 강구된 시대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율령의 반포를 비롯하여 영역의 확장에 따른 율령의 전반적인 확대시행 및 이와 관련한 새로운 시기의 도래와 관계깊다.
3. 이 시기 비문들은 아직 아직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신 외에 귀부와 이수를 갖춘 정형화된 양식은 7세기 후반에 이르러야 비로소 나타난다. 6세기에는 비를 세우면서도 특별한 격식이 없었음이 시대적 특징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러한 면을 생각할 때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았았던 6세기 금석문은 내용상의 분식도 행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이 6세기 금석문의 사료적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비문이 주류적인 흐름을 차지하는 가운데서도 새로운 경향으로 토기에 명문을 새기거나 묵서한 사례 및 목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토기명문이나 목간의 작성시기가 한층 소급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의 자료에 따르는 한 6세기 중엽을 그리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을 듯하다. 이는 어쩌면 7세기에 이르러 비문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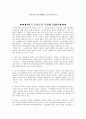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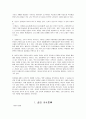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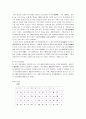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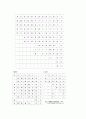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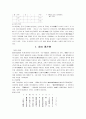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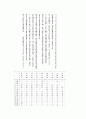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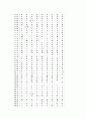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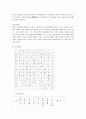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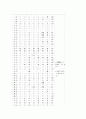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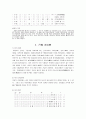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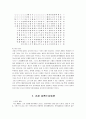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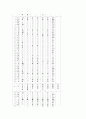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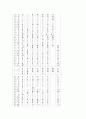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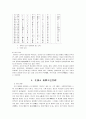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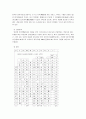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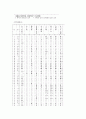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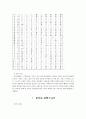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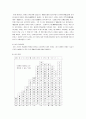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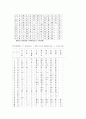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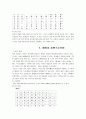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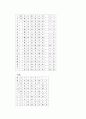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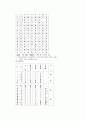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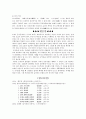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