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책을 그 뒤에 보니 이 문제가 주요한 화두였다. 일본시가 전체적으로 동인들끼리 즐기는 수공업예술의 수준으로 전락 왜소화한 가장 큰 원인은 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절규성의 상실에 있다는 지적이 있고, 한국시에는 아직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활기찬 문학이 되고 있다는 진단도 있었다. 최근에 나온 진보적 문학지 『신일본문학』에서도 눈에 띄는 시에 있어 절규성이란, 여러 사람의 말을 종합해보건대 문자 그대로 시는 본질적으로 부르짖음, 외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 같았다. 가령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에 봉착했을 때 못 견디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더없는 기쁨에 처했을 때 환호하는 그런 기능과 성격이 시에는 있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기도 하고 기쁨을 즐기게도 하는 것이 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일본 특유의 탐미주의와 사소한 것에 대한 편집광적 집착으로 사회성이 사상되면서 일본시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일본시 쪽의 이 진단은 일본시에 관한 한 옳은 것이겠으나 한국시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90년대 들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절규적인 성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절규성이라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시가 억지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말장난에 시종하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시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모두 절규성의 상실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시가 안이하고 느슨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물론 우리가 막 들어선 싸이버 디지털 시대에 시가 옛날과 같은 형태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체로 활자매체에 의존해온 시에게 탈활자매체시대의 도래는 분명히 새로운 위기이다. 하지만 기계화와 대량생산이라는 산업혁명의 폭풍 속에서 시는 왕자의 자리를 산문에 넘겨주기는 했지만, 민중언어의 발견에 의해서 오히려 그 영역을 확대하지 않았던가. 사람을 극단적으로 개인화하고 파편화하리라 예상했던 인터넷이 오히려 전지구화하면서 국가간, 계급간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연결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도 암시하는 바 크다. 시는 어차피 이상주의자의 길에 피는 꽃이다. 억지로 만드는 데서 벗어나 좀더 자연스러워지면서, 잃어버린 절규성을 회복하고, 왜소해짐으로써 놓친 큰 울림을 되찾는다는 일은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우리 시가 한번 시도해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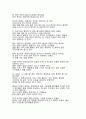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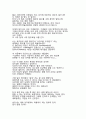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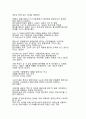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