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Ⅰ. 은총의 교리 분석, 및 전개과정
1. 루터의 신학적 혁파
2.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3. 은총론과 종교개혁
Ⅱ. 나가며 - 은총의 교리에 대한 현대적 비판
Ⅰ. 은총의 교리 분석, 및 전개과정
1. 루터의 신학적 혁파
2. 개혁파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
3. 은총론과 종교개혁
Ⅱ. 나가며 - 은총의 교리에 대한 현대적 비판
본문내용
던 것이다.
그들은 고뇌를 거듭한 끝에, 결국 고뇌를 포기한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 ‘결국 구원은 없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은 없으며, 행위도 없다.’ 그리하여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수동적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이러한 입장이 옳다는 것을 그들은 성경(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의 통찰)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의 안일했던 태도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있다’에 대한 가능성과 인간 행위에 대한 가능성,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 등의 전제는 성경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제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실존적으로, 주관적으로 증명했다 뿐이었다.
현대의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살펴보는 것 중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바로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어떠한 논리로 신학을 전개해 나갔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논의과정으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서만 그 전통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결정된 이념은 교회의 권력과 편승하여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이것과 차이가 있는 이념들은 이단이 되어버린다. 이 이념은 이제 교회 자본 충당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들의 내세운 이념적 결과로부터 전제를 추적하여 들어가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이다. 그들은 시대적 상황과 실존적 고뇌의 주관성으로부터 전제를 세웠으며, 이념적 결과를 산출했다. 현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전제까지도 계승하려 한다면 반천년이 지난 오늘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실존에까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필연적이었는가? 그들의 전제를 현실을 무시한 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며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제외하는 배타성만 낳게 될 것이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이념적 결과만을 흐르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계승하게 될 때, 그들이 전개했던 논의과정을 간과하기 쉬우며 또 다른 사회병리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절하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념만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 존재했던 논의들까지도 창조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이 나오게 된 상황적 배경과 사상적 전제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긴장하게 될 때, 하나의 교리가 독점하여 지배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고뇌를 거듭한 끝에, 결국 고뇌를 포기한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그러나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한다.’ ‘결국 구원은 없다.’ 그들에게 있어 ‘인간은 없으며, 행위도 없다.’ 그리하여 결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수동적이며, 또 그래야만 한다.’ 이러한 입장이 옳다는 것을 그들은 성경(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의 통찰)에서 발견한다. 그러나 그들의 안일했던 태도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있다’에 대한 가능성과 인간 행위에 대한 가능성,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격 등의 전제는 성경에서 찾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제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다만 실존적으로, 주관적으로 증명했다 뿐이었다.
현대의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살펴보는 것 중에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바로 그때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어떠한 논리로 신학을 전개해 나갔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논의과정으로 도출된 결론을 가지고서만 그 전통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결정된 이념은 교회의 권력과 편승하여 이데올로기가 되어 버렸다. 이것과 차이가 있는 이념들은 이단이 되어버린다. 이 이념은 이제 교회 자본 충당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들의 내세운 이념적 결과로부터 전제를 추적하여 들어가는 것 또한 시대착오적이다. 그들은 시대적 상황과 실존적 고뇌의 주관성으로부터 전제를 세웠으며, 이념적 결과를 산출했다. 현대의 입장에서 그들의 전제까지도 계승하려 한다면 반천년이 지난 오늘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및 실존에까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필연적이었는가? 그들의 전제를 현실을 무시한 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며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제외하는 배타성만 낳게 될 것이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이념적 결과만을 흐르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계승하게 될 때, 그들이 전개했던 논의과정을 간과하기 쉬우며 또 다른 사회병리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종교개혁의 가치를 절하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이념만이 아니라, 그 과정상에 존재했던 논의들까지도 창조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으며, 사상이 나오게 된 상황적 배경과 사상적 전제의 긴밀한 관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입장에서 서로 긴장하게 될 때, 하나의 교리가 독점하여 지배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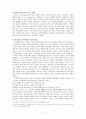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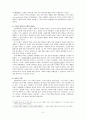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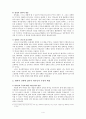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