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무인집권기 문사들의 성격
3. 무인집권기 문사들의 활동
4. 이규보의 정치사상과 문학사상
5. 맺음말
<참고문헌>
2. 무인집권기 문사들의 성격
3. 무인집권기 문사들의 활동
4. 이규보의 정치사상과 문학사상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규보도 정치적 진출을 위해 문학적 능력을 함양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의 문학과 정치의 관련성과 그에 대한 이규보의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정치에는 文翰官 등과 같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학적 능력을 필요로 했던 정치영역도 있지만, 정치의 긍극적인 목적이 王道를 구현하는 經世濟民에 있다고 본다면 문학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권력의 주체는 문학적 능력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었고, 과거급제가 정치적 진출을 반드시 보장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보의 개인적인 관심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아 문한관으로 진출하는 것에 두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상적 관심은 당시 다수의 문인·유학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문학과 문학자의 정치적 역할을 높이는 데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규보는 과거급제를 중시하는 인식을 유지하였고, 문한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문학적 능력에 대하여 반드시 언급하였으며,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는 인재의 중심에 문학자를 두고자 하였다. 불우했던 문인 유학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글을 통해 무신집권체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당시 문학자와 그들의 문학활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학과 정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규보는 문학이 가지는 정치적 효용성과 사회교화를 위한 실용성을 중시하면서도, 문학과 도덕 , 그리고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어느 편에서도 치우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현실적 처지와 문학으로서의 一家를 이루고 나아가 그를 통해 세상을 경륜하고자 했던 이상 사이를 오갔던 정신적 방황이 문학론에도 보여진다. 한정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公用文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代作 및 書翰的 글보다는 자유롭게 작성된 詩文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규보의 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변해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문학적 교류를 나누고 사상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동료문인들의 정치적 처지나 입장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공용적 문장은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거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지만, 이규보의 문학활동의 중요 부분이 동료 지식인들과의 교류에 바쳐지고 있었던 사실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이규보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문인지식인들의 상호 문학적 교류과정에서 작성된 사적인 시문이 공문서에 버금가는 위치를 가지게 된 사실이 이 시가 사상의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 중의 일부는 관료로 진출하여 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일부는 재야 지식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순정유학자로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출가했던 이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규보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상적 종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종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保身과 회의적 모색이 시대상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무신집권체제가 아우를 수 없었던 문치적 전통과 유학자들의 잠재적인 정치역량은 체제안에 갇히지 않은 채 새로운 문학활동을 통해 자신을 역사무대에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서 이규보가 문학을 통해 그를 극복코자 했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고려 중기이후의 문신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유교적 가치로서의 왕도정치의 이념에 앞서 특정 집권자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보인 것이 이 시기의 현실이었다. 이는 정치적 주도권의 상실과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왕의 권한의 약화가 야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앞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12세기 중반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또 다른 혼란으로 나타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무인집권기의 문신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된 과거제도와 천거 등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문신들의 자주성을 잃게 된 원인으로도 보여 진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 문신들의 경우 고위관직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지위의 정당성을 그들 스스로가 아닌 무인집권자에게 일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당시 문신들의 권한은 지위의 고하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규보의 경우 오랜 시간을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나 최충헌의 눈에 들어 관직에 진출하게 된 사례이다. 실질적인 관직의 수행 능력이 아닌 문장실력으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문신으로서의 평가보다 문장가로서의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무신집권기 문학의 발전은 어쩌면 특정 집권자에 의해 억압된 현실에 대한 이들 욕망의 표출의 성과가 아닌가도 싶다.
무신집권기의 문신들의 모습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당시의 정치 및 사회구조가 특정한 소수에 집단에 의해 운영되었기에 다른 집단들에 대한 모습을 비교 내지는 유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의 비교가 아닌 집권자와 그 아래에 위치한 하위 집단이라는 상하관계가 적용되기에 당시 문신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알아보는 것에 있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참고자료〉
-단행본-
황병성, 2008,「고려 무인정권기 문사 연구」,『경인문화사』.
김호동, 2003,「고려 무신정권시대 문인지식층의 현실대응」,『경인문화사』.
趙東一, 1978,「李奎報」,『韓國文學思想史試論』지식산업사.
-논문-
김인호, 1995,「무인집권기 문신관료의 정치이념과 정책」,『역사와 현실』17.
장숙경, 1981,「고려 무인정권하의 문사의 동태와 성격」, 『한국사연구』34.
강지언, 1986,「고려 고종조 과거급제자의 정치적 성격」, 『백산학보』33.
무인집권기연구반, 1994,「무인집권기 연구동향과 과제」,『역사와현실』vol-11.
남인국, 1983,「최씨정권하 문신 지위의 변화」,『대구사학』권22.
유현숙, 2010,「최씨 무인집권기 문사의 등용과 정치적 역할」,『충북대학교대학원』.
당시 정치에는 文翰官 등과 같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학적 능력을 필요로 했던 정치영역도 있지만, 정치의 긍극적인 목적이 王道를 구현하는 經世濟民에 있다고 본다면 문학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권력의 주체는 문학적 능력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었고, 과거급제가 정치적 진출을 반드시 보장했던 것도 아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보의 개인적인 관심은 일차적으로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아 문한관으로 진출하는 것에 두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상적 관심은 당시 다수의 문인·유학자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문학과 문학자의 정치적 역할을 높이는 데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규보는 과거급제를 중시하는 인식을 유지하였고, 문한관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문학적 능력에 대하여 반드시 언급하였으며, 국가의 성쇠를 좌우하는 인재의 중심에 문학자를 두고자 하였다. 불우했던 문인 유학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글을 통해 무신집권체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당시 문학자와 그들의 문학활동을 비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문학과 정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규보는 문학이 가지는 정치적 효용성과 사회교화를 위한 실용성을 중시하면서도, 문학과 도덕 , 그리고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어느 편에서도 치우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현실적 처지와 문학으로서의 一家를 이루고 나아가 그를 통해 세상을 경륜하고자 했던 이상 사이를 오갔던 정신적 방황이 문학론에도 보여진다. 한정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작성된 公用文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代作 및 書翰的 글보다는 자유롭게 작성된 詩文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규보의 글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변해 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문학적 교류를 나누고 사상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던 동료문인들의 정치적 처지나 입장이 다양했기 때문이다. 공용적 문장은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거나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지만, 이규보의 문학활동의 중요 부분이 동료 지식인들과의 교류에 바쳐지고 있었던 사실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비단 이규보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문인지식인들의 상호 문학적 교류과정에서 작성된 사적인 시문이 공문서에 버금가는 위치를 가지게 된 사실이 이 시가 사상의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들 중의 일부는 관료로 진출하여 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일부는 재야 지식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순정유학자로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출가했던 이도 있었다. 상대적으로 이규보는 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상적 종합에 대한 관심은 크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종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保身과 회의적 모색이 시대상의 흐름이었다. 그러나 무신집권체제가 아우를 수 없었던 문치적 전통과 유학자들의 잠재적인 정치역량은 체제안에 갇히지 않은 채 새로운 문학활동을 통해 자신을 역사무대에 드러내고 있었다. 여기서 이규보가 문학을 통해 그를 극복코자 했던 열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고려 중기이후의 문신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이 유교적 가치로서의 왕도정치의 이념에 앞서 특정 집권자에 대한 종속적 태도를 보인 것이 이 시기의 현실이었다. 이는 정치적 주도권의 상실과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왕의 권한의 약화가 야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앞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12세기 중반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또 다른 혼란으로 나타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무인집권기의 문신들은 이전보다 오히려 확대된 과거제도와 천거 등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문신들의 자주성을 잃게 된 원인으로도 보여 진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 문신들의 경우 고위관직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지위의 정당성을 그들 스스로가 아닌 무인집권자에게 일임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당시 문신들의 권한은 지위의 고하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규보의 경우 오랜 시간을 관직에 오르지 못했으나 최충헌의 눈에 들어 관직에 진출하게 된 사례이다. 실질적인 관직의 수행 능력이 아닌 문장실력으로 관직에 진출한 인물인 만큼 그에 대한 평가 역시 문신으로서의 평가보다 문장가로서의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무신집권기 문학의 발전은 어쩌면 특정 집권자에 의해 억압된 현실에 대한 이들 욕망의 표출의 성과가 아닌가도 싶다.
무신집권기의 문신들의 모습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당시의 정치 및 사회구조가 특정한 소수에 집단에 의해 운영되었기에 다른 집단들에 대한 모습을 비교 내지는 유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의 비교가 아닌 집권자와 그 아래에 위치한 하위 집단이라는 상하관계가 적용되기에 당시 문신들의 실질적인 모습을 알아보는 것에 있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
<참고자료〉
-단행본-
황병성, 2008,「고려 무인정권기 문사 연구」,『경인문화사』.
김호동, 2003,「고려 무신정권시대 문인지식층의 현실대응」,『경인문화사』.
趙東一, 1978,「李奎報」,『韓國文學思想史試論』지식산업사.
-논문-
김인호, 1995,「무인집권기 문신관료의 정치이념과 정책」,『역사와 현실』17.
장숙경, 1981,「고려 무인정권하의 문사의 동태와 성격」, 『한국사연구』34.
강지언, 1986,「고려 고종조 과거급제자의 정치적 성격」, 『백산학보』33.
무인집권기연구반, 1994,「무인집권기 연구동향과 과제」,『역사와현실』vol-11.
남인국, 1983,「최씨정권하 문신 지위의 변화」,『대구사학』권22.
유현숙, 2010,「최씨 무인집권기 문사의 등용과 정치적 역할」,『충북대학교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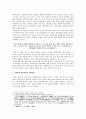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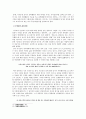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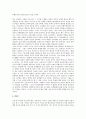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