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부활에 대한 질문은 역사적으로 진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사상을 모든 인간의 경험이 닿을 수 없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초자연적 앎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 사건을 인간 경험의 연관에 끼여 있는 일종의 이물질로 여기게 된다. 메타포적인특징 가운데서만 이 부활은 자기를 이해해 가는 인간 상황의 표현으로 파악될 수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현존재에 대한 궁극적 질문을 그림과 메타포 형식에서 인식하게 되며, 또한 어떠한 그림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의 의미나 무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가는 문제가 중요하다.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말하는 자에게 현실성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활의 그 낯설음 때문에 일단 비유적 언급을 통해서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성이 중요하다. *판넨베르크는 예수 부활 사건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는, 이미 결정 되어져 버린 사실적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런 역사적 판단과 논쟁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실제로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부활체험은 역사적 사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들의 부활 신앙에 터해 있는 오늘의 기독교는 끊임없이 진리와 현실성과 계시 논쟁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방된 미래와 역사 가운데 진리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판넨베르크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은 종말에 발생하게 될 ‘죽은 자의 보편적 부활’이 선취된 사건이다. 오늘의 기독교 신학은 이를 역사적으로 논증해 나가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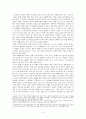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