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I. 問題의 提起
_ II. 不法意識의 對象
_ III. 禁止錯誤의 回避可能性
_ IV. 責任의 有無와 그 範圍
_ V. 結 語
_ II. 不法意識의 對象
_ III. 禁止錯誤의 回避可能性
_ IV. 責任의 有無와 그 範圍
_ V. 結 語
본문내용
지적하고 있지만 어떠한 비난은 반드시 그[403] 비난을 가능하게 하는 사태를 전제로 하며 사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비난 평가는 어색하다.주33) Welzel도 責任非難(評價)의 對象과 對象에 대한 評價는 총체적으로 책임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는 했으나 그의 책임론의 초점이 비난가능성에 맞춰짐으로써 균형잡힌 책임론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법한 행위의사(구성요건적 고의)야말로 비난가능성의 관계사항이라고 보면서도 그는 범죄체계론을 전개하면서 구성요건적 고의는 애초부터 행위-구성요건-불법의 내적 측면으로 자리잡아야한다고 보아 사실상 책임에서는 책임을 묻는 대상이 빠져 버린 셈이 되었다. Welzel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인간행위의 내외요소를 범죄체계에서 어디에 비치했던 그 자신은 행위 범죄의 불법성은 언제나 책임에 관계된다고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의의무, 조회의무, 윤리적으로 성숙한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책임비난의 요건으로 그가 거론하는 의무들인데 이러한 의무야말로 구체적이며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행위사태 이외에서는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질서 일반이나 법개념에 대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판단, 평가, 소신이야말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보장에 따라 전혀 형벌권력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유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요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기수범, 미수범, 고의범, 과실범, 작위범, 부작위범을 구분하지 않는다)과 분리된 의식, 의사를 근거로 비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의 이치에 따르거나 국가권력행사의 비례성, 과잉금지성을 감안하여 Welzel의 논의가 「비난」과 「비난의 대상」을 완전히 분리했다고 읽을 수는 없다. 이러한 생각이 1966년 대안 제20조에 나와 있다. 비난의 的은 책임이나 의무가 아니라 책임이나 의무를 읽게 해 주는 풍부한 소재이며 질료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다음으로 불법의식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해도 주의의무, 조회의무, 인식의무에 위배된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의무의 내용이나 의무성립의 기준이 무엇이냐이다. 바로 이러한 본질문제 때문에 의무의 범죄체계적 지위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선 의무와 가능성의 관계가 문제이다. Mayer의 책임비난의 三分法에서 이미[404] 가능성이라는 범주가 자리잡고 있다. 또한 Lange는 책임은 결코 개인적 가능의 척도로 다루어 질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의무와 가능성은 상호배척하거나 택일적인 범주는 아니라고 하겠다. 가능성은 의무의 전제요건이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의무로써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는 사회의 부분생활영역과 국가적 통합영역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며 소멸되는 행동규칙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제생활영역에서의 삶가운데에서 시민들은 적어도 공동체에서의 책임있는 결정을 학습하게 되며 재판은 사회학습의 좋은 예라고 하겠다. 학습은 인간의 능력을 啓發하고 변화시키며 기존의 의무-기존의 능력, 가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의 水位를 변화 시킨다. 한마디로 가능을 전제로 하는 당위는 너무나 당연하되 당위는 끊임없이 가능의 범위를 변화시킨다. 본고에서는 위법의 의식이 단순히 개별조문에 내재된 각 규범-구성요건적 관련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총체적 위법성의식에로 나아가며 그 이유를 각 개별조문이 법익침해나 법익보호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에서 찾아 보았다. 불법의 질, 불법의 범위, 각 조문이 법익침해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보호차일을 설치하느냐를 고려하며 자연범처벌법규와 법정범처벌법규를 고려하는 등 불법의식과 위법성의 의식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려해 보았다. 이는 결국 획일적인 이론이나 추상적인 원칙선언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능성 자체에 있어서도 그 판단기준을 하나로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의 반복이기는 하지만 가능성의 판단기준도 사회일반과 구체적인 행위자 개인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책임비난을 위한 주의의무는 부주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행위자는 광범위하게 책임비난에서 빠져 나아가게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판단의 기준은 분명히 구체적인 행위자이다. 그러나 행위자로 들어가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다. 행위자가 지닌 지적 능력, 윤리적 성숙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도의 지적 능력, 윤리적 성숙성을 지닌 자를 범죄시 그 장소에 代入하여 가능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행위자의 개별성을 100% 그대로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겠지만 우리는 행위자가 지닌 여러 능력과 개별인자 가운데에서 일부를[405] 빼내는 작업을 통하여 개별화의 한계를 설정하고 객관화, 사회화, 규범화, 사회적 동기화의 의미로서의 책임비난여부를 결정한다. 이론상으로도 행위자와 완전히 똑같은 자는 생각할 수 없고 또 가능하다고 해도 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극도의 흥분에 빠져 범죄를 범한 대부분의 흉악범죄자들의 방어 논리가 너무나 용이해지므로 수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책임비난은 책임사태와 책임비난의 동시적 수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태는 구체적인 행위자의 중요요소와 인자를 지니는 인간형을 상정하여 회피가능성여부를 판단 받게 되는 자료가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행위자의 지적능력과 윤리적 성숙성을 지니는 어떠한 자라면 그와 같은 사태의 유발을 막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성립되지 않게 된다. 과연 인간이 지니는 판단능력과 윤리적 성숙성이 어느 정도로 객관화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인접학문의 성과에 주시하면서 끊임없는 성찰로 언제나 更新되는 그러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주34) Maihofer, Der Unrechtsvorwurf, Gedanken zu einer personalen Unrechtslehre, in: FS fur T.Rittler, 1957, S.141 163ff.
주34) Maihofer, Der Unrechtsvorwurf, Gedanken zu einer personalen Unrechtslehre, in: FS fur T.Rittler, 1957, S.141 163ff.
키워드
추천자료
 캠퍼스 성폭력, 성희롱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캠퍼스 성폭력, 성희롱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재판소의 통제
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헌법재판소의 통제 형법정리 <총론>
형법정리 <총론> 민사소송법 정리/요약자료(소송물부터 소송절차정지의 효과까지)
민사소송법 정리/요약자료(소송물부터 소송절차정지의 효과까지) 성폭력에 대해 조사해보자
성폭력에 대해 조사해보자 [행정학A+]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분석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이론...
[행정학A+] 우리나라 경찰제도 발전과정과 조직구조 분석 및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과 이론... 헌법의 기본권
헌법의 기본권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사례][직장내 성희롱 대책방안]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직장내 성희롱][직장내 성희롱 사례][직장내 성희롱 대책방안]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남녀고용평등][합리적 차등][시장논리][명예고용평등감독관]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남...
[남녀고용평등][합리적 차등][시장논리][명예고용평등감독관]남녀고용평등과 합리적 차등, 남... [긴급금융조치법, 긴급지원복지법, 긴급피난 관련법, 긴급보호제도, 국가긴급권]긴급금융조치...
[긴급금융조치법, 긴급지원복지법, 긴급피난 관련법, 긴급보호제도, 국가긴급권]긴급금융조치...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분쟁사례]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사회복지개론] 다문화자녀 [정의 개념 현황 증가원인 문제점]
[사회복지개론] 다문화자녀 [정의 개념 현황 증가원인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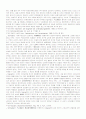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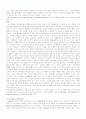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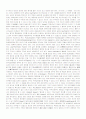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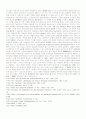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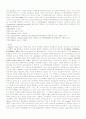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