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문석굴 등지에서도 다양한 예가 나타난다. 정면에서 이 반가사유상을 보면 허리가 가늘며 여성적인 느낌이 들지만 측면에서 보면 상승하는 힘이 넘쳐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탄력 넘치는 신체의 곡선이 강조되었으며 양쪽 어깨로부터 끝이 위로 올라가서 날카로움의 매력을 더해주는 천 자락은 유려한 선을 그리며 몸체를 감싸고 있다. 또한 양 무릎과 뒷면의 의자 덮개에 새겨진 주름은 타원과 S자형의 곡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다양한 흐름을 보여준다. 반가좌의 자세도 지극히 자연스러운데, 이는 허리를 약간 굽히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팔을 길게 늘인 비사실적인 비례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유의 모습을 창출해낸 조각가의 예술적 창의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뺨 위에 살짝 댄 오른손 손가락은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오묘하게 표현되었다. 한마디로 이 불상의 조형미는 비사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자연스러운 종교적 아름다움, 다시 말해서 이상적인 사실미로 정의할 수 있다. 은은한 미소와 자연스러운 반가좌 자세, 신체 각 부분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해서 천의 자락과 허리띠의 유려한 흐름, 완벽한 주조 기법 등이 금동불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반가사유상의 모습을 만들어 냈다. 이 불상은 내부가 흙으로 채워진 중공식 주조 기법을 사용해 만들어졌는데, 크기가 1m에 가까워서 금동불로는 비교적 크기가 큰 불상임에도 구리의 두께가 2-4mm로 매우 얇다. 이렇게 얇은 두께를 고르게 유지하기 위해 머리까지 관통하는 수직의 철심과 어깨를 가로지르는 수평의 철심을 교차시키고 머리 부분에는 철못을 사용했다. 고도의 주조 기술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불상의 제작이 가능했던 것이라 여겨진다. 제작국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출토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관계로 백제 혹은 신라의 것이라는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신체와 천의의 힘찬 기세, 고구려에서 특히 중국의 북위와 동위시대 양식의 불상이 크게 유행한 점, 그리고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 양식과 흡사한 점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고구려 불상일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로는 하나의 특정 국가를 지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 반가사유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범용적 예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반가사유상은 원래 반만 가부좌를 틀고 한쪽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는 독특한 자세로 인해서 인체 비례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반가사유상의 자세가 왠지 불편해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국보 반가사유상은 다소 얇게 표현된 허리선에도 불구하고 그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체의 비율이 안정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세를 제외하고도 반가사유상이 다른 불상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바로 생동감인데 반가사유상의 풍만한 얼굴에서는 볼륨감이 느껴지며 눈은 가늘고 길면서 눈매는 도톰하게 튀어나와서 때로는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볼에 살짝 가져다 댄 작고 통통한 손가락은 마치 무용수의 유려한 손놀림을 보는 것같이 섬세하게 표현되었으며 무릎 위에 올린 오른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보면 살짝 위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든 자세와 동작이 매우 세심하고 자세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옷 주름의 표현도 눈길을 끄는데, 다른 불상들의 옷 주름은 형식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 반가사유상의 옷 주름은 자연스럽게 무릎과 다리의 볼륨을 그대로 살리며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식적인 요소들의 제거를 통해서 얻어낸 단순함, 사실적 표현에서 오는 생동감, 신체 각 부분의 조화로운 비례가 불러온 안정감이 바로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의 젊은 시절,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태자였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행차를 나갔을 때 거리에서 밭을 가는 장면을 목격한다. 태자의 눈에 들어온 건 밭일에 찌들어 여윈 농부, 밭을 가는 소의 헐떡이는 모습, 흙을 뒤질 때 죽는 벌레들의 모습이었다. 지극히 가엾은 측은지심의 마음이 든 싯다르타 태자는 말에서 내려 땅에 앉아 고통을 관찰하며 사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내 태어나고 죽는 법에 대한 본질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태자는 오묘한 기쁨과 즐거움이 차올라 미소 짓는데 반가사유상은 바로 싯다르타 태자가 처음 깨달음을 얻고 출가를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반가사유상이 처음 박물관에 넘겨질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국보 반가사유상은 1912년, 이왕가박물관이 일본인 골동품상 카지야마 요시히데로부터 구입한 보물이다. 구입 당시 기록을 보면 반가사유상은 표면에 두꺼운 호분이 칠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먹으로 꼬불꼬불한 수염과 처진 눈꼬리가 그려져 있었으며,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있어 그야말로 더럽혀진 흰 벽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더운물로 표면을 닦아내고 젖은 거적으로 싼 후에야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원래 불상에 호분을 바르고 먹과 물감으로 이목구비를 그리는 것은 불상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보존기법 중의 하나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권강미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66
반가사유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륜성왕,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08.20.
무드라, 두산백과 두피디아
반가사유상, 황수영, 대원사, 2010.12.18.
http://www.daewonsa.co.kr/product/view.php?id=142&sword=%B9%DD%B0%A1%BB%E7%C0%AF%BB%F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KBS 천상의 컬렉션
통일 신라, 연표로 보는 한국사사전, 책과 함께 어린이, 2015.02.10
통일신라시대 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반가사유상은 원래 반만 가부좌를 틀고 한쪽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는 독특한 자세로 인해서 인체 비례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다른 반가사유상의 자세가 왠지 불편해 보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국보 반가사유상은 다소 얇게 표현된 허리선에도 불구하고 그 어색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체의 비율이 안정적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세를 제외하고도 반가사유상이 다른 불상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바로 생동감인데 반가사유상의 풍만한 얼굴에서는 볼륨감이 느껴지며 눈은 가늘고 길면서 눈매는 도톰하게 튀어나와서 때로는 날카로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볼에 살짝 가져다 댄 작고 통통한 손가락은 마치 무용수의 유려한 손놀림을 보는 것같이 섬세하게 표현되었으며 무릎 위에 올린 오른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보면 살짝 위로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발가락에 힘이 들어간 것을 표현한 것으로 모든 자세와 동작이 매우 세심하고 자세하게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옷 주름의 표현도 눈길을 끄는데, 다른 불상들의 옷 주름은 형식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반면, 반가사유상의 옷 주름은 자연스럽게 무릎과 다리의 볼륨을 그대로 살리며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장식적인 요소들의 제거를 통해서 얻어낸 단순함, 사실적 표현에서 오는 생동감, 신체 각 부분의 조화로운 비례가 불러온 안정감이 바로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가사유상은 석가모니의 젊은 시절,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이름을 가진 태자였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싯다르타 태자가 행차를 나갔을 때 거리에서 밭을 가는 장면을 목격한다. 태자의 눈에 들어온 건 밭일에 찌들어 여윈 농부, 밭을 가는 소의 헐떡이는 모습, 흙을 뒤질 때 죽는 벌레들의 모습이었다. 지극히 가엾은 측은지심의 마음이 든 싯다르타 태자는 말에서 내려 땅에 앉아 고통을 관찰하며 사유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내 태어나고 죽는 법에 대한 본질이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태자는 오묘한 기쁨과 즐거움이 차올라 미소 짓는데 반가사유상은 바로 싯다르타 태자가 처음 깨달음을 얻고 출가를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다.
반가사유상이 처음 박물관에 넘겨질 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국보 반가사유상은 1912년, 이왕가박물관이 일본인 골동품상 카지야마 요시히데로부터 구입한 보물이다. 구입 당시 기록을 보면 반가사유상은 표면에 두꺼운 호분이 칠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먹으로 꼬불꼬불한 수염과 처진 눈꼬리가 그려져 있었으며, 입술은 빨갛게 칠해져 있어 그야말로 더럽혀진 흰 벽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더운물로 표면을 닦아내고 젖은 거적으로 싼 후에야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원래 불상에 호분을 바르고 먹과 물감으로 이목구비를 그리는 것은 불상을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한 보존기법 중의 하나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권강미
https://www.museum.go.kr/site/main/relic/recommend/view?relicRecommendId=16866
반가사유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륜성왕, 종교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08.20.
무드라, 두산백과 두피디아
반가사유상, 황수영, 대원사, 2010.12.18.
http://www.daewonsa.co.kr/product/view.php?id=142&sword=%B9%DD%B0%A1%BB%E7%C0%AF%BB%F3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KBS 천상의 컬렉션
통일 신라, 연표로 보는 한국사사전, 책과 함께 어린이, 2015.02.10
통일신라시대 미술,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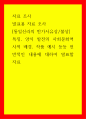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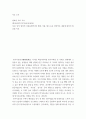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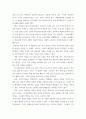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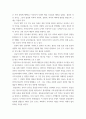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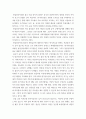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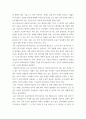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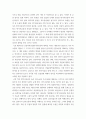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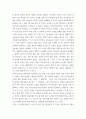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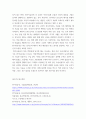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