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 제1장, 제2장, 제3장 중 한 장을 참조하여, 전통사회의 경제생활 양상에 관한 나의 가상 이야기를 서술해주세요. (20점)
※아래의 내용(①~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제1장 ‘조선시대의 농경생활’의 주요 내용 정리
2) 전통사회의 경제생활 양상에 관한 나의 가상 이야기
2.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해주세요. (30점)
※아래의 내용(①~③)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출산, 관례, 혼인
① 출산 ② 관례 ③ 혼인
2) 상장례와 제례
①상장례 ②제례
3. 참고문헌
※아래의 내용(①~②)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제1장 ‘조선시대의 농경생활’의 주요 내용 정리
2) 전통사회의 경제생활 양상에 관한 나의 가상 이야기
2.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해주세요. (30점)
※아래의 내용(①~③)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1) 출산, 관례, 혼인
① 출산 ② 관례 ③ 혼인
2) 상장례와 제례
①상장례 ②제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부집에 일정 기간 머무는 방식이 주자가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조선 왕조는 지속적으로 친영을 중심으로 한 주자가례를 모든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고자 하였다.
우리 가문에서는 16세기경 새롭게 변화된 신전통혼례 방식으로 혼례를 준비해 왔다. 신전통혼례 방식은 의혼(선보기), 납채(청혼서와 사주 보내기), 연길(택일과 허혼서 보내기), 납폐(혼서지와 채단 보내기), 초행, 혼례식, 신방, 신방 엿보기, 신행, 폐백, 근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혼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탐문이다. 나는 신부 측 집안에 대한 평판과 함께 신부의 성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별 문제는 없어 보여 신부 측과 납채와 혼례 시기를 상의한 후, 납채 단계에서 청혼서와 함께 사주를 보냈다. 납폐 단계에서는 함을 보내는데, 함에는 혼서지와 예물, 목화씨, 숯, 고추 등이 들어갔다. 그 후에 대례를 치렀다. 우리는 명문 유학자 가문인 만큼,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집으로 돌아와 혼례를 치르는 친영의 절차를 따랐다. 물론 아직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혼례는 아닌 것이다.
친영은 혼례 당일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 하는 방식이다. 친영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하는 대례와 그 이후에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지를 만나는 의례로 구분된다. 대례에는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禮)가 있고 그 이후에 행해지는 의례에는 시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의례와 사당에 인사하는 의례, 마지막으로 신부의 부모를 만나는 절차가 포함된다. 친지와 지인들이 많아 찾아와 축하를 해주니 문득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올라 눈물이 나오려했다.
2) 상장례와 제례
①상장례
우리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정착하면서 상장례 또한 성리학적 규범을 따르게 되었다. 임종 직후의 초종으로부터 담제에 이르는 동안에 상주가 죄인으로 처신하는 3년상의 전통이 그것이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아버님은 정침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다. 편안한 모습으로 떠나셨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장례를 치러야했다. 성리학적 상례는 임종에 따른 초종부터 담제까지이며, 3년상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적장자이므로 상주를 맡았다. 아버님 임종 후 초혼 또는 복을 하고, 시신을 시상판 위에 모신 후, 상제들이 지키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마당에 차일을 치고 밤샘을 했다. 초종을 마친 후습·소렴·대렴과 성복 절차를 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치장, 천구, 발인 절차를 거쳐 매장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치장(治葬)은 장지와 장일을 정하고, 광중(壙中)을 파고, 신주(神主)를 만드는 절차를 말한다.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발인(發靷)일에 상여 뒤를 따르면서 생전 효를 다하지 못해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에 상여꾼의 노랫소리가 더욱 슬펐다.
매장을 마치고 나서 신주를 영여(靈轝)에 모시고 돌아와 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위안하는 초우제·재우제·삼우제를 지낸 후 수시로 곡을 하다가 졸곡(卒哭) 절차를 행했다. 다음날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시는 부제(祭)를 행한다. 상례는 초상 이후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祭)까지다. 소상은 망자의 1주기 제사이며, 대상은 2주기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제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되는 달의 정일 또는 해일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며, 담제를 지낸 다음 달 길제를 지냈다.
3년이라는 상례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번거롭다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수시로 곡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므로, 아침과 저녁에만 곡을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곡의 많고 적음이 망자에 대한 슬픔과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상장례는 예를 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일 것이다.
②제례
제례는 친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의례이다. 당내에서는 기제와 설·한식·단오·추석에 절사(節祀)를 행하며, 시조를 구심점으로 부계 남자 후손으로 구성된 문중은 시제를 행한다. 종법에 따라 적장자로서 나는 선친의 상속자가 되었다. 종손이 아니므로 문중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선친과 조상에 대한 제례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제와 절사의 참석범위는 고조를 같이하는 당내의 후손들이고, 그 이상의 선조에 대한 기제는 중단된다. 기제를 중단한 선조의 제사는 시제(時祭)의 대상이 된다.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에 행하는 절사(節祀)는 직계조상에 대하여 당내가 함께 사당이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문중의 대표적인 의례인 시제(時祭)는 지역사회 전체가 들썩이는 행사이다. 시제는 본래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 하여, 4계절의 중간달(仲月)에 해당하는 음력 2·5·8·11 월에 길일을 택하여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제가 기제의 차이는 후손 중에서 여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중은 당내와는 달리, 부계의 남자 후손들로만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문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재원도 필요하지만, 선조들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외부에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선조의 충절이나 효열(孝烈) 등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분들이 남긴 글을 모아서 편찬하는 사업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아울러 문중의 영향력이 돋보이도록 족보의 편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사실 족보 편찬은 1번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하게 되는 제례는 격식에 맞게 준비하는 데 손이 많이 간다는 문제뿐 아니라, 그 비용이 녹록치 않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안이라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종손 집안이라면 1년을 제례로 다 보낸다고 할 만큼 부담이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상을 정성껏 모시는 의례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집안의 사정에 따라 제례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참고문헌
송찬섭 외,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과제 스트레스 싹~ 학점 쑥!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에서는 16세기경 새롭게 변화된 신전통혼례 방식으로 혼례를 준비해 왔다. 신전통혼례 방식은 의혼(선보기), 납채(청혼서와 사주 보내기), 연길(택일과 허혼서 보내기), 납폐(혼서지와 채단 보내기), 초행, 혼례식, 신방, 신방 엿보기, 신행, 폐백, 근친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혼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탐문이다. 나는 신부 측 집안에 대한 평판과 함께 신부의 성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별 문제는 없어 보여 신부 측과 납채와 혼례 시기를 상의한 후, 납채 단계에서 청혼서와 함께 사주를 보냈다. 납폐 단계에서는 함을 보내는데, 함에는 혼서지와 예물, 목화씨, 숯, 고추 등이 들어갔다. 그 후에 대례를 치렀다. 우리는 명문 유학자 가문인 만큼,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신랑집으로 돌아와 혼례를 치르는 친영의 절차를 따랐다. 물론 아직 신부집에서 혼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혼례는 아닌 것이다.
친영은 혼례 당일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다가 자신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 하는 방식이다. 친영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행하는 대례와 그 이후에 신부가 신랑의 부모와 친지를 만나는 의례로 구분된다. 대례에는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禮)가 있고 그 이후에 행해지는 의례에는 시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의례와 사당에 인사하는 의례, 마지막으로 신부의 부모를 만나는 절차가 포함된다. 친지와 지인들이 많아 찾아와 축하를 해주니 문득 돌아가신 아버님이 떠올라 눈물이 나오려했다.
2) 상장례와 제례
①상장례
우리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 이념으로 정착하면서 상장례 또한 성리학적 규범을 따르게 되었다. 임종 직후의 초종으로부터 담제에 이르는 동안에 상주가 죄인으로 처신하는 3년상의 전통이 그것이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아버님은 정침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다. 편안한 모습으로 떠나셨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장례를 치러야했다. 성리학적 상례는 임종에 따른 초종부터 담제까지이며, 3년상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적장자이므로 상주를 맡았다. 아버님 임종 후 초혼 또는 복을 하고, 시신을 시상판 위에 모신 후, 상제들이 지키며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마당에 차일을 치고 밤샘을 했다. 초종을 마친 후습·소렴·대렴과 성복 절차를 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치장, 천구, 발인 절차를 거쳐 매장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치장(治葬)은 장지와 장일을 정하고, 광중(壙中)을 파고, 신주(神主)를 만드는 절차를 말한다. 영구가 장지로 떠나는 발인(發靷)일에 상여 뒤를 따르면서 생전 효를 다하지 못해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에 상여꾼의 노랫소리가 더욱 슬펐다.
매장을 마치고 나서 신주를 영여(靈轝)에 모시고 돌아와 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위안하는 초우제·재우제·삼우제를 지낸 후 수시로 곡을 하다가 졸곡(卒哭) 절차를 행했다. 다음날 신주를 조상의 신주 곁에 모시는 부제(祭)를 행한다. 상례는 초상 이후 소상(小祥), 대상(大祥), 담제(祭)까지다. 소상은 망자의 1주기 제사이며, 대상은 2주기에 지내는 제사이다. 담제는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되는 달의 정일 또는 해일에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며, 담제를 지낸 다음 달 길제를 지냈다.
3년이라는 상례의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번거롭다는 생각도 들었다. 특히 수시로 곡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이므로, 아침과 저녁에만 곡을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곡의 많고 적음이 망자에 대한 슬픔과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의 상장례는 예를 아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목일 것이다.
②제례
제례는 친족의 결속을 강화하는 의례이다. 당내에서는 기제와 설·한식·단오·추석에 절사(節祀)를 행하며, 시조를 구심점으로 부계 남자 후손으로 구성된 문중은 시제를 행한다. 종법에 따라 적장자로서 나는 선친의 상속자가 되었다. 종손이 아니므로 문중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선친과 조상에 대한 제례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기제와 절사의 참석범위는 고조를 같이하는 당내의 후손들이고, 그 이상의 선조에 대한 기제는 중단된다. 기제를 중단한 선조의 제사는 시제(時祭)의 대상이 된다. 설·한식·단오·추석 등 사명일(四名日)에 행하는 절사(節祀)는 직계조상에 대하여 당내가 함께 사당이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문중의 대표적인 의례인 시제(時祭)는 지역사회 전체가 들썩이는 행사이다. 시제는 본래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 하여, 4계절의 중간달(仲月)에 해당하는 음력 2·5·8·11 월에 길일을 택하여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시제가 기제의 차이는 후손 중에서 여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중은 당내와는 달리, 부계의 남자 후손들로만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문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재원도 필요하지만, 선조들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외부에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선조의 충절이나 효열(孝烈) 등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 분들이 남긴 글을 모아서 편찬하는 사업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 아울러 문중의 영향력이 돋보이도록 족보의 편찬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사실 족보 편찬은 1번 하게 되면 상당 기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매년 하게 되는 제례는 격식에 맞게 준비하는 데 손이 많이 간다는 문제뿐 아니라, 그 비용이 녹록치 않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안이라면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종손 집안이라면 1년을 제례로 다 보낸다고 할 만큼 부담이 엄청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조상을 정성껏 모시는 의례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집안의 사정에 따라 제례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참고문헌
송찬섭 외, 전통사회와 생활문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과제 스트레스 싹~ 학점 쑥!
감사합니다.
추천자료
 [전통사회와생활문화 2022년]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
[전통사회와생활문화 2022년]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2022]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2022]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하...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하...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하...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하...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하...
1. 교재 제13장, 제14장, 제15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 시대 여러 의례 생활을 서술하...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2023] 1.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양반의 일생...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2023] 1.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양반의 일생... [전통사회와생활문화 2023년 기말] 1.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양반의 일...
[전통사회와생활문화 2023년 기말] 1.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이를 바탕으로 양반의 일...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2023년 2학기)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2023년 2학기)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2023학년도 2학기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2023학년도 2학기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기말 ) 전통사회와생활문화 교재 제9장, 제10장을 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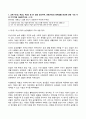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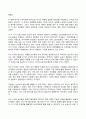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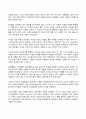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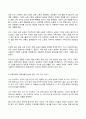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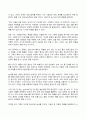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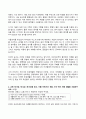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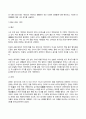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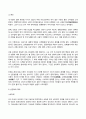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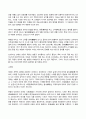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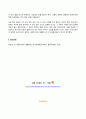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