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현대 조각은 쟝르가 해체된 *미술*의 과정과 상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순수함과 간결함을 아직 간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다. 특히 부산의 조각은 근래에 들어 국제적인 성향을 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리적 여건에 힘입어 비약적인 변화와 도약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많은 가능태의 미술 중에서 물질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각의 태도와 오늘의 화두인 *환경*을 상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우리의 20세기는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시작한 세기라 할 수 있다. *환경*은 인간의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이다.
환경은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사회적(생존권적) 가치와 관계 때문에 인간 생활의 공간에서 중요시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 예술 분야에서는 환경예술(環境藝術 Environment Art)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술 분야 뿐 아니라 근대화·산업화 과정 전반에 걸쳐진 인간의 생존에 대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 탐구 작업이기도 하다.
20세기 한국미술에서 조각의 위상은 회화에 비하여 미약하고 개념이 불분명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 확대된 조각과 환경미술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21세기에는 환경과 조각의 의미 문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는 예견 가운데 한 세기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부산 조각의 현황을 통하여 환경과 미술의 관계 항을 찾아 보는 것은 분명 유 의미 할 것이다.
이 전시는 20세기의 한국미술을 총정리하거나, 역사를 나열하거나, 결론을 지으려는 의도를 지니지는 않았다. 단지 20세기 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동안의 현상과 지식을 토대로 지혜롭게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생존에 관한 키워드를 찾자는 결심이다.
특별한 요건을 지니고 짧지만 명쾌하게 진행되어온 부산의 조각을 전시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20세기 한국미술 전반의 키워드를 연상하는 것이 지역미술의 정체성 뿐 아니라 한국미술의 총체성을 비추는데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환경과 미술*이란 키워드로 인간의 생존을 문제시할 21세기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이다는 점에서 미술인 각자와 미술을 대상화하는 모든 인간의 실천적 모색은 당위성이 있다.
만일 *환경*에 대하여 진정한 애정과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고의 전제가 있다면 미술은 사회적 기능의 합리적 수행에 기여할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미술*의 존속에 대한 의심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20세기 미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리를 가지는 동시에 20세기 후반의 키워드로 설정한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이 전시의 출발점이었다. 이 전시는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갈채나 자랑을 염두에 두지 않기에 출품 작가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명철한 시각으로 시대 현상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리고 20세기 미술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생존*의 자세, 역시 이번 전시에서 얻어지는 다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수많은 가능태의 미술 중에서 물질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각의 태도와 오늘의 화두인 *환경*을 상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최적의 선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우리의 20세기는 *환경*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시작한 세기라 할 수 있다. *환경*은 인간의 생활체를 둘러싸고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또는 사회의 조건이나 형편이다.
환경은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인간의 사회적(생존권적) 가치와 관계 때문에 인간 생활의 공간에서 중요시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세기 예술 분야에서는 환경예술(環境藝術 Environment Art)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는 미술 분야 뿐 아니라 근대화·산업화 과정 전반에 걸쳐진 인간의 생존에 대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 탐구 작업이기도 하다.
20세기 한국미술에서 조각의 위상은 회화에 비하여 미약하고 개념이 불분명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 들어서 확대된 조각과 환경미술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21세기에는 환경과 조각의 의미 문맥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는 예견 가운데 한 세기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부산 조각의 현황을 통하여 환경과 미술의 관계 항을 찾아 보는 것은 분명 유 의미 할 것이다.
이 전시는 20세기의 한국미술을 총정리하거나, 역사를 나열하거나, 결론을 지으려는 의도를 지니지는 않았다. 단지 20세기 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동안의 현상과 지식을 토대로 지혜롭게 화두를 던지는 것이고, 생존에 관한 키워드를 찾자는 결심이다.
특별한 요건을 지니고 짧지만 명쾌하게 진행되어온 부산의 조각을 전시를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20세기 한국미술 전반의 키워드를 연상하는 것이 지역미술의 정체성 뿐 아니라 한국미술의 총체성을 비추는데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환경과 미술*이란 키워드로 인간의 생존을 문제시할 21세기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이다는 점에서 미술인 각자와 미술을 대상화하는 모든 인간의 실천적 모색은 당위성이 있다.
만일 *환경*에 대하여 진정한 애정과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고의 전제가 있다면 미술은 사회적 기능의 합리적 수행에 기여할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미술*의 존속에 대한 의심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20세기 미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리를 가지는 동시에 20세기 후반의 키워드로 설정한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이 전시의 출발점이었다. 이 전시는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갈채나 자랑을 염두에 두지 않기에 출품 작가의 솔직한 자기반성과 명철한 시각으로 시대 현상을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그리고 20세기 미술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통하여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생존*의 자세, 역시 이번 전시에서 얻어지는 다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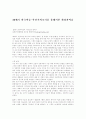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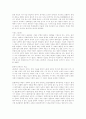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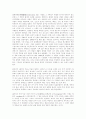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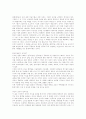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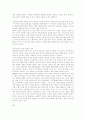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