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진 것도 아니며 주어질 수도 없는 것. 분기한 \'전체\'의 현실적 부분들은 서로의 바깥에 남아 있고 결코 하나로 모을 수 없다. 현실성 속에서 \'전체\'는 결코 주어지지 않고 현실성 속에는 환원 불가능한 다원론이 군림한다. 만약 전체가 주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체가 열린 것이기 때문이고, 전체의 본성이 항상 변화하는 것, 또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발생시키는 것, 간단히 말해서 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지속은 그러므로 그 안에서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창조의 폭을 갖춘 것임에 틀림없다.\"(C; CE) 전체는 닫힌 \'체계\'이 아니다. 반대로 전체는 그것으로 인해 체계 혹은 개체가 결코 절대로 닫혀질 수 없고 결코 완전히 엄폐되지 않게 되는 원인.
cf. 세르(M. Serres)의 국소적 전체성(local totalite). heterotopia의 이질적 지대들 사이에 만들어진 \"좁은 통행로\".
* 결국 현실성의 수준에서 현실화는 \'항상 이미\' 대항-현실화다.
- 현실화된 개체는 현실화된 자신의 모습, 가시적인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선 안된다. 그 현실성 밖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현실성 \'사이\'에서 비가시적인 것,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성,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그것을 봄으로써만 제한이나 부정으로만 작동하는 실현과는 다른 창조 혹은 분기 - 분기는 더 적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것, 즉 증식[multiplicite] - 인 현실화로 존재할 수 있다.
- 잠재성이냐 현실성이냐? -> 어떤 현실화냐? 현실화된 상태에만 머무름으로써 상태에서 상태로 혹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의 재편에만 머무르는 현실화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의 외부를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변화의 흐름 - 지속 - 에 참여하는 현실화인가?
5. 느낌(sentiment)의 정치화
* \"낯선 요인\" 혹은 외부
- 베르그송은 대항-현실화를 가능케 하는 잠재성과 현실성의 고리를 \"낯선 요인\"이라고 부른다. \"\'살아진\' 것에 대립되고 살아진 것을 배제하는 요인.\" 낯선 요인=볼 수 없는 것=말할 수 없는 것.(EI)
그러면서도 이 낯선 요인은 현실화된 것들 위에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낯선 요인은 사물을 포함하고 사물을 관통하고 있으며 사물에 그 빛, 기억, 공상을 부여하는 엽맥 같은 것. 낯선 요인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주체화의 양태에, 그 다양한 장치에 휘감겨 있다. 낯선 요인=외-존재(extra-being). 그것은 사물을 그 내부로부터 흐트리는 분해 - 재구성 -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분기, 진전경로, 분류, 결국은 들어보지 못한 세계를 여는 것이다.(LS)
ex) 마술적 자연관에서 나온 뉴턴의 중력 개념은 근대과학의 \'내부의 외부\'. 이것이 결국 근대과학을 해체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아가는 지점이 됨.
* 낯선 요인과의 마주침 - 느낌
- 따라서 이 낯선 요인과 현실성의 마주침이 중요. 이 마주침은 개체에 대한 촉발(affection)로서, 낯선 것에 대한 느낌으로서 나타난다. 즉, 촉발 혹은 느낌은 두 선의 교차에 의존한다. \"이는 현실성에 대립되는 순수 잠재성 현존은 아니며, 오히려 현실성을 교란시키는 \"불순함\"이다.(MM)
- 이러한 촉발의 영역에서야말로 본질적인 것이 일어난다. 거기서는 현재화와 증식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다양한 잠재성이 나타난다. 다양한 표현, 특이화, 자기생산성. 그것은 개체에 있어서 스스로의 탄생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 사물 사이에 있는 진정한 출발점. 바로 이 촉발이 직관의 발생을 작동시키고 직관과 지성 사이의 전환 방식을 결정한다. 느낌=현실의 \'부름\'과 도약.
ex) 동아시아 레즈비언 대회에서의 문제. 패그해그(fag-hag)의 등장으로 \'누가 동성애자인가\'라는 질문이 궁지에 빠짐.
* 직관 - 느낌의 \'대항-현실화\'.
\"우리에게 두 선의 교차를 표시해주는 작은 미광의 경험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었을 때, 경험 너머로까지 그것을 연장시키는 일이 남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수학자들이 실제 곡선에서 지각하는 무한히 작은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 요소들 뒤에 있는 불명료함 속으로 펼쳐지는 곡선 그 자체의 형상을 재구성해내는 것과 비슷한다.\" 질적 미적분.
ex) 성정치의 문제를 \'누가 **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규정한 이후 계속 경계짓기를 둘러싸고 공전했던 성정치 ->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메니페스토(cyborg manifesto)\'라는 새로운 사유의 선. 늘 규정의 틈에서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들이 등장. 오히려 성정치는 차이들의 집합적인 힘을 통해서 이들을 동질화하려는 권력을 허물고 \'마음껏\' 증식하는 것.
* 중요한 것은 볼 수 있는 것 - 그 가장 큰 외연이 바로 역사 - 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차이화해내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 될까를 실험하기 위해서 역사로부터 차이화하는 것, 그것은 예술적, 철학적, 과학적인 조작임과 동시에 또한 현저하게 정치적인 조작이다.
<참고 문헌>
- Bergson
Essai sur les donnee immediates de la conscience, 1889. (DI)
Matiere et Memoire, 1896. (MM)
L\'Evolution creatrice, 1907. (EC)
Duree et Simultaneite, 1922. (DS)
La Pensee et le Mouvant, 1941. (PM)
- Deleuze(G) & Guattari(G)
D, Le Bergsonisme, 1968. (B)
D, Logique du sens, 1969. (LS)
D&G, L\'Anti-Oedipe: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1983. (AO)
D, Cinema 1: L\'image-Mouvement, 1983. (C)
D, Dialoues, 1987. (D)
G, \"L\'ecologie de l\'invisible\", 1992 (EI)
cf. 세르(M. Serres)의 국소적 전체성(local totalite). heterotopia의 이질적 지대들 사이에 만들어진 \"좁은 통행로\".
* 결국 현실성의 수준에서 현실화는 \'항상 이미\' 대항-현실화다.
- 현실화된 개체는 현실화된 자신의 모습, 가시적인 자신의 모습에 머물러선 안된다. 그 현실성 밖에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현실성 \'사이\'에서 비가시적인 것,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성,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그것을 봄으로써만 제한이나 부정으로만 작동하는 실현과는 다른 창조 혹은 분기 - 분기는 더 적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것, 즉 증식[multiplicite] - 인 현실화로 존재할 수 있다.
- 잠재성이냐 현실성이냐? -> 어떤 현실화냐? 현실화된 상태에만 머무름으로써 상태에서 상태로 혹은 이미 존재하는 상태의 재편에만 머무르는 현실화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자신의 외부를 참조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근거를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변화의 흐름 - 지속 - 에 참여하는 현실화인가?
5. 느낌(sentiment)의 정치화
* \"낯선 요인\" 혹은 외부
- 베르그송은 대항-현실화를 가능케 하는 잠재성과 현실성의 고리를 \"낯선 요인\"이라고 부른다. \"\'살아진\' 것에 대립되고 살아진 것을 배제하는 요인.\" 낯선 요인=볼 수 없는 것=말할 수 없는 것.(EI)
그러면서도 이 낯선 요인은 현실화된 것들 위에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낯선 요인은 사물을 포함하고 사물을 관통하고 있으며 사물에 그 빛, 기억, 공상을 부여하는 엽맥 같은 것. 낯선 요인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주체화의 양태에, 그 다양한 장치에 휘감겨 있다. 낯선 요인=외-존재(extra-being). 그것은 사물을 그 내부로부터 흐트리는 분해 - 재구성 -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분기, 진전경로, 분류, 결국은 들어보지 못한 세계를 여는 것이다.(LS)
ex) 마술적 자연관에서 나온 뉴턴의 중력 개념은 근대과학의 \'내부의 외부\'. 이것이 결국 근대과학을 해체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아가는 지점이 됨.
* 낯선 요인과의 마주침 - 느낌
- 따라서 이 낯선 요인과 현실성의 마주침이 중요. 이 마주침은 개체에 대한 촉발(affection)로서, 낯선 것에 대한 느낌으로서 나타난다. 즉, 촉발 혹은 느낌은 두 선의 교차에 의존한다. \"이는 현실성에 대립되는 순수 잠재성 현존은 아니며, 오히려 현실성을 교란시키는 \"불순함\"이다.(MM)
- 이러한 촉발의 영역에서야말로 본질적인 것이 일어난다. 거기서는 현재화와 증식의 대상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다양한 잠재성이 나타난다. 다양한 표현, 특이화, 자기생산성. 그것은 개체에 있어서 스스로의 탄생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발점. 사물 사이에 있는 진정한 출발점. 바로 이 촉발이 직관의 발생을 작동시키고 직관과 지성 사이의 전환 방식을 결정한다. 느낌=현실의 \'부름\'과 도약.
ex) 동아시아 레즈비언 대회에서의 문제. 패그해그(fag-hag)의 등장으로 \'누가 동성애자인가\'라는 질문이 궁지에 빠짐.
* 직관 - 느낌의 \'대항-현실화\'.
\"우리에게 두 선의 교차를 표시해주는 작은 미광의 경험에서 우리가 이득을 얻었을 때, 경험 너머로까지 그것을 연장시키는 일이 남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수학자들이 실제 곡선에서 지각하는 무한히 작은 요소들을 가지고서 그 요소들 뒤에 있는 불명료함 속으로 펼쳐지는 곡선 그 자체의 형상을 재구성해내는 것과 비슷한다.\" 질적 미적분.
ex) 성정치의 문제를 \'누가 **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로 규정한 이후 계속 경계짓기를 둘러싸고 공전했던 성정치 -> 다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메니페스토(cyborg manifesto)\'라는 새로운 사유의 선. 늘 규정의 틈에서 규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행위들이 등장. 오히려 성정치는 차이들의 집합적인 힘을 통해서 이들을 동질화하려는 권력을 허물고 \'마음껏\' 증식하는 것.
* 중요한 것은 볼 수 있는 것 - 그 가장 큰 외연이 바로 역사 - 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부터 차이화해내는 것을 말한다.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 될까를 실험하기 위해서 역사로부터 차이화하는 것, 그것은 예술적, 철학적, 과학적인 조작임과 동시에 또한 현저하게 정치적인 조작이다.
<참고 문헌>
- Bergson
Essai sur les donnee immediates de la conscience, 1889. (DI)
Matiere et Memoire, 1896. (MM)
L\'Evolution creatrice, 1907. (EC)
Duree et Simultaneite, 1922. (DS)
La Pensee et le Mouvant, 1941. (PM)
- Deleuze(G) & Guattari(G)
D, Le Bergsonisme, 1968. (B)
D, Logique du sens, 1969. (LS)
D&G, L\'Anti-Oedipe: Capitalisme et schizophrenie, 1983. (AO)
D, Cinema 1: L\'image-Mouvement, 1983. (C)
D, Dialoues, 1987. (D)
G, \"L\'ecologie de l\'invisible\", 1992 (EI)
추천자료
 a+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a+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칸트의 인식론과 윤리학의 한계
칸트의 인식론과 윤리학의 한계 [미학] 칸트미학의 소개
[미학] 칸트미학의 소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데리다 철학][데리다 언어관][데리다와 해체주의][데리다와 맥루한의 비교][데리다의 구조주...
[데리다 철학][데리다 언어관][데리다와 해체주의][데리다와 맥루한의 비교][데리다의 구조주... 도덕교육과 동양윤리,서양윤리 요약
도덕교육과 동양윤리,서양윤리 요약 칸트(kant)의 도덕률 (철학, 사상, 도덕률의 개념과 분류, 정언명법)
칸트(kant)의 도덕률 (철학, 사상, 도덕률의 개념과 분류, 정언명법)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에 관한 조사 레포트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에 관한 조사 레포트 데카르트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수정 보완하여 기존 철학을 종합한 칸트의 주체 철학의 특징
데카르트의 철학을 계승하면서, 수정 보완하여 기존 철학을 종합한 칸트의 주체 철학의 특징 [철학사, 서양, 독일, 중국, 현대, 중국현대철학, 고전철학, 합리론, 경험론, 칸트 비판철학,...
[철학사, 서양, 독일, 중국, 현대, 중국현대철학, 고전철학, 합리론, 경험론, 칸트 비판철학,... 분석 철학
분석 철학 근대건축 실패인가 성공인가
근대건축 실패인가 성공인가 마르크스주의(맑스주의)에 대하여
마르크스주의(맑스주의)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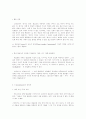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