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식
2. 실태
3. 북한 거주 종군위안부 실태
4. 결론:끝나지 않은 남북한의 종군위안부 문제
2. 실태
3. 북한 거주 종군위안부 실태
4. 결론:끝나지 않은 남북한의 종군위안부 문제
본문내용
전남 나주군 삼도면 출생인 강영숙씨는 1933년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결혼한 기혼자의 몸으로 1942년 일본군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위안소로 끌려갔다. 강씨는 1944년 가을에 도주해 중국 동북지방에서 45년 12월까지 살다가 고향 대신 북한을 택했다. 서울 노남동 태생인 최순환씨는 부모를 여의고 서울시내의 한 식당에서 접대부로 일하다 1942년 6월 한 일본인의 꼬임에 속아 중국으로 갔다가 위안소 생활을 했으며 1947년 중국에서 남편을 만나 1950년 함북 회령으로 들어왔다.
경북 청도군 출신의 황선옥씨는 40명의 증언자 중에서 유일하게 미혼남자와 결혼해 오래 동안 치료를 받아 아들을 낳았으나 1950년 전쟁통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딸로 데리고 키운 시형의 딸의 부양을 받고 있다. 충남 천안군 백이리 출신의 곽금녀씨도 보기 드물게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으나 남편이 징병을 당해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평북 선천군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 분단으로 이북에 눌러앉게 된 기구한 인생역정을 겪었다. 곽씨는 \"일본 놈들은 나의 청춘과 육체를 망쳐놓았을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혈육마저 갈라놓은 철천지원쑤다\"
) 위의 책, 71쪽
고 증언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 금봉면의 한 막벌이 노동자의 6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황소군씨는 뼈가 굳기 전부터 생활전선에 나섰다가 18살 되던 1936년에 \"돈벌이가 잘되는 공장에 알선해주겠다\"는 동네 구장의 꾐에 빠져 한 일본인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를 데려간 곳은 중국 목단강 지역의 군수공장이 아니라 그 군수공장 근처의 \'위안소\'였다. 김씨는 1943년 7월 위안소를 탈출해 한 조선 사람 집에 숨어살다가 해방된 후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또한 \'어지러워진 몸\' 때문에 고향을 등졌다.
\"1945년 8월 조선이 해방된 후 나는 조선으로 나왔지만 일본군 놈들에 의하여 어지러워진 몸인 것으로 하여 고향에는 갈 수 없었다. 나는 강동 땅에서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으로 39살까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날의 생활을 숨기고 아이 4명이 있는 박은홉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 일본놈들은 나의 청춘을 망쳐놓았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들어놓았다…(중략)…내가 70 고령이 되도록 살 수 있는 것은 당과 수령님의 배려 밑에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위의 책, 87-88쪽
(황소군:밑줄은 필자 강조)
황소군씨의 증언대로 북으로 간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데다가 자식을 낳지 못해 노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살거나 병들어 보호시설에 기거하지만 \"당과 국가의 배려로 매달 식량과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출신인 김덕순씨도 \"지금 나는 누구나 다 고르롭게(고르게:필자 주) 잘사는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국가로부터 연로보조금과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식의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다\"
) 위의 책, 84쪽
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곤란한 식량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증언과 달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불문가지의 일이다.
) 필자는 2000년 10월 평양 체류 중에 종군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일정 상의 이유로 피해자 인터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종태위\'의 황호남 서기장과 정남용 상무위원과의 인터뷰만 허용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방에 살고 고령이어서 평양으로 데려올 수 없는 데다가 평양에 사는 몇 안 되는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면담이 어렵다고 사정을 설명했으나, 필자가 대부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면접을 통해 남한 출신 피해자들이 왜 북쪽을 선택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병천·조현연 편, 『20세기 한국의 야 만』(도서출판 일빛, 200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대출판부, 1999)
또하나의문화 통일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또하나의 문화, 1996)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의정활동 자료집, 1997.12)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윤철순 역, 『조선인 여자정신대』(도서출판 정윤, 1992)
윤정옥, \"\'조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의정활동자료집, 1997. 12)
이병천·조현연 편, 『20세기 한국의 야만』(도서출판 일빛, 2001)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종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활동』(정신대자료집 6, 1997)
정진성,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의정활동자료집, 1997. 12)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짓밟힌 인생의 웨침:\'종군위안부\'편』(\'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199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ː역사·사회학적 연구』(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여성부, 2002)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http://www.truetruth.org) 자료실 게시판
『조선신보』 인터넷판(http://www.korea-np.co.jp)
경북 청도군 출신의 황선옥씨는 40명의 증언자 중에서 유일하게 미혼남자와 결혼해 오래 동안 치료를 받아 아들을 낳았으나 1950년 전쟁통에 아들과 남편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는 어릴 때부터 양딸로 데리고 키운 시형의 딸의 부양을 받고 있다. 충남 천안군 백이리 출신의 곽금녀씨도 보기 드물게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았으나 남편이 징병을 당해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찾으러 나섰다가 평북 선천군에서 아이를 낳게 되어 분단으로 이북에 눌러앉게 된 기구한 인생역정을 겪었다. 곽씨는 \"일본 놈들은 나의 청춘과 육체를 망쳐놓았을 뿐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혈육마저 갈라놓은 철천지원쑤다\"
) 위의 책, 71쪽
고 증언하고 있다.
경남 함양군 금봉면의 한 막벌이 노동자의 6자매 중 둘째로 태어난 황소군씨는 뼈가 굳기 전부터 생활전선에 나섰다가 18살 되던 1936년에 \"돈벌이가 잘되는 공장에 알선해주겠다\"는 동네 구장의 꾐에 빠져 한 일본인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그를 데려간 곳은 중국 목단강 지역의 군수공장이 아니라 그 군수공장 근처의 \'위안소\'였다. 김씨는 1943년 7월 위안소를 탈출해 한 조선 사람 집에 숨어살다가 해방된 후에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또한 \'어지러워진 몸\' 때문에 고향을 등졌다.
\"1945년 8월 조선이 해방된 후 나는 조선으로 나왔지만 일본군 놈들에 의하여 어지러워진 몸인 것으로 하여 고향에는 갈 수 없었다. 나는 강동 땅에서 \'위안부\' 생활의 후유증으로 39살까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날의 생활을 숨기고 아이 4명이 있는 박은홉의 후처로 들어가게 되었다. 물론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 일본놈들은 나의 청춘을 망쳐놓았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들어놓았다…(중략)…내가 70 고령이 되도록 살 수 있는 것은 당과 수령님의 배려 밑에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위의 책, 87-88쪽
(황소군:밑줄은 필자 강조)
황소군씨의 증언대로 북으로 간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고가 없는 데다가 자식을 낳지 못해 노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살거나 병들어 보호시설에 기거하지만 \"당과 국가의 배려로 매달 식량과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 남원 출신인 김덕순씨도 \"지금 나는 누구나 다 고르롭게(고르게:필자 주) 잘사는 고마운 사회주의 조국의 품에서 국가로부터 연로보조금과 무상이나 다름없는 헐값으로 식량을 공급받으면서 식의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다\"
) 위의 책, 84쪽
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곤란한 식량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증언과 달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불문가지의 일이다.
) 필자는 2000년 10월 평양 체류 중에 종군위안부 피해자들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일정 상의 이유로 피해자 인터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종태위\'의 황호남 서기장과 정남용 상무위원과의 인터뷰만 허용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방에 살고 고령이어서 평양으로 데려올 수 없는 데다가 평양에 사는 몇 안 되는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면담이 어렵다고 사정을 설명했으나, 필자가 대부분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아쉬운 점은, 면접을 통해 남한 출신 피해자들이 왜 북쪽을 선택했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숙,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병천·조현연 편, 『20세기 한국의 야 만』(도서출판 일빛, 2001)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서울대출판부, 1999)
또하나의문화 통일소모임,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또하나의 문화, 1996)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의정활동 자료집, 1997.12)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 윤철순 역, 『조선인 여자정신대』(도서출판 정윤, 1992)
윤정옥, \"\'조선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의정활동자료집, 1997. 12)
이병천·조현연 편, 『20세기 한국의 야만』(도서출판 일빛, 2001)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종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활동』(정신대자료집 6, 1997)
정진성, \"일본군 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전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의정활동자료집, 1997. 12)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짓밟힌 인생의 웨침:\'종군위안부\'편』(\'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199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의 전망』(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진상규명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묻는다ː역사·사회학적 연구』(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여성부, 2002)
한국정신대연구소 홈페이지(http://www.truetruth.org) 자료실 게시판
『조선신보』 인터넷판(http://www.korea-np.co.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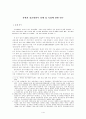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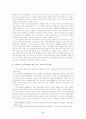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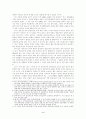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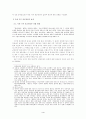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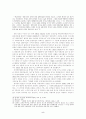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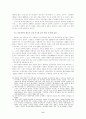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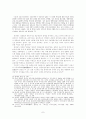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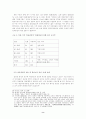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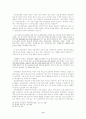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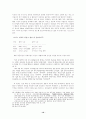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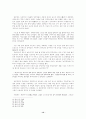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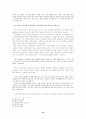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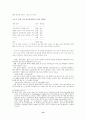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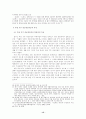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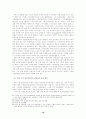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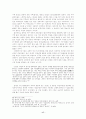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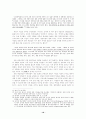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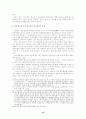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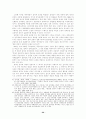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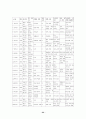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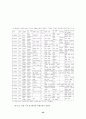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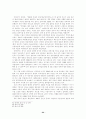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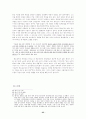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