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입
Ⅱ. 선교의 방법
Ⅲ. 선교의 조직
Ⅳ. 선교의 훈련
Ⅴ. 맺는 말
Ⅱ. 선교의 방법
Ⅲ. 선교의 조직
Ⅳ. 선교의 훈련
Ⅴ. 맺는 말
본문내용
록은 베드로가 최초의 감독으로 등장하고 바울은 기록에서 빠져있다. J. G. Davis, The Making of the Church(London: Skeffington & Son, 1960), 5556. 어거스틴 이전의 교부들은 대체로 “카톨릭(catholic)이란 개념을 신학적으로 “정통적(orthodox)”이란 의미로 이해하였다. 그에게 와서 이는 신앙의 내용상의 “정통성”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리적, 시간적, 연장, 곧 “보편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Cf. 그의 De vera religione 5.9; 7.12.
29) 325년 니케아 회의(the Council of Nicaea)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키르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교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the Council of Constantinople)에서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다음의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 교구뿐만 아니라 로마 교구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이 위상의 변화는 이후의 신학적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
30) 고대교회에서 세례는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는 예전이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세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의 세례(lavacrum sanguinis) 곧, 순교뿐이었다. 13세기 스콜라주의자들(Schoolmen)은 성례전의 효과와 관련하여 성직자의 도덕적인 자질을 중시했던 시프리안의 입장을 인효론(人效論, ex opere operantis)으로 성례전 자체의 객관적 능력을 중시했던 스데반의 입장을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으로 요약하였다.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7 성례전 이외에 구원의 수단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31) 202년 카르타고에서 순교 당한 퍼페투아(Perpetua)와 그녀의 여종 펠리키타스는 세례교육 대상자들이었다.
32) 콘스탄틴에 의해 소집된 알스회의(the Council of Arles, 314)와 니케아 회의는 3위1체의 이름으로 시행된 모든 세례(이단들의 세례와 분리주의자들의 세례를 포함)를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 재세례(rebaptism)를 정죄하였다. 정교회도 재세례를 부인하였으며 트렌트 회의(the Council of Trent, 1547)도 이를 어거스틴은 3위 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는 하나님의 세례이므로 어디에서, 누가, 언제 베풀지라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리주의자들의 세례와 배교한 적이 있는 보편적 교회의 감독의 세례도 항상 유효하다. 3위 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는 인간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례이기 때문에 인간 대리인의 죄가 그 성례의 존재 자체를 해치지는 못하였다. Cf. 그의 De baptismo contra Donatistas 4.15.24; Epistola 8889. 교회는 초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으나 얼마 후에는 3위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다.
33) 고대교회의 세례교육의 절차는 217년 저술된 로마의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the Apostolic Tradition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동시대 사람이었던 터툴리안과 마찬가지로 엄격주의자(rigorist)였다. 따라서 그의 책에 기술된 내용 그대로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에 로마교회가 시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4) 안디옥의 감독 데오빌로(Theophilus)는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할 죄의 목록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그의 To Autolycus 2.34.
35) 서방교부들은 대체로 세례를 죄의 용서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저스틴 이래 동방교부들은 이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 주는 지성의 회복(illumination 혹은 enlightenment)의 과정으로 보았다. Cf. 저스틴, I Apology 61. 12f. 65.1.
36) 어거스틴에 따르면 교회는 “훈련의 집(disciplinae domus)”인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bene vivere)를 배운다. 그의 Sermo de disciplina Christiana 1.1.
37) 허마스의 the Shepherd는 빛과 구원의 길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길을 이야기 하였다. 이 두 길들은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윤리관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38) 이그나시우스, Ephesus 20.2.
39) 고대교회의 성례전 이해는 상징이론(sign theory), 구체적으로 성례전적 상징주의(sacramental symbolism)에 기초하고 있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는 가시적 성례전(sacramentum)이 성례전의 효과(res sacrmenti) 곧 구원 혹은 은총을 가져온다. Edward J. Kilmartin, Christian Liturgy: Theology and Practice, vol. 1, Systematic Theology of Liturgy (Kansas City, Mo: Sheed and Ward, 1988), 3. 거룩한 것(구원 혹은 은총)을 상징하는 것은 모두 사크라멘툼이므로 교부들에 따르면 성례전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
40) 교부들은 화체설(transubstantiation) 보다도 요소변화설(transelementization)을 믿었다. 집례자의 기도와 말씀이 가해진 후 떡과 포도주는 변화된 떡과 포두주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성례전의 효과와 관련하여 3위 1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verbum fidei)이 중요하였다. 곧 교부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없이 떡과 포도주는 성례전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어거스틴은 “Accedit verbum ad elementum, et fit sacramentum, etiam ipsum tamquam visible verbum”이라고 하였다. 그의 Tractatus in Joannis Evangelium 80.3. 칼빈과 루터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29) 325년 니케아 회의(the Council of Nicaea)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키르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교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the Council of Constantinople)에서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이 로마 다음의 위상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알렉산드리아 교구뿐만 아니라 로마 교구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이 위상의 변화는 이후의 신학적 논쟁에 영향을 미쳤다.
30) 고대교회에서 세례는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는 예전이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 세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피의 세례(lavacrum sanguinis) 곧, 순교뿐이었다. 13세기 스콜라주의자들(Schoolmen)은 성례전의 효과와 관련하여 성직자의 도덕적인 자질을 중시했던 시프리안의 입장을 인효론(人效論, ex opere operantis)으로 성례전 자체의 객관적 능력을 중시했던 스데반의 입장을 사효론(事效論, ex opere operato)으로 요약하였다. 그렇게 구분한 이유는 7 성례전 이외에 구원의 수단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31) 202년 카르타고에서 순교 당한 퍼페투아(Perpetua)와 그녀의 여종 펠리키타스는 세례교육 대상자들이었다.
32) 콘스탄틴에 의해 소집된 알스회의(the Council of Arles, 314)와 니케아 회의는 3위1체의 이름으로 시행된 모든 세례(이단들의 세례와 분리주의자들의 세례를 포함)를 인정하였다. 다시 말해 재세례(rebaptism)를 정죄하였다. 정교회도 재세례를 부인하였으며 트렌트 회의(the Council of Trent, 1547)도 이를 어거스틴은 3위 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는 하나님의 세례이므로 어디에서, 누가, 언제 베풀지라도 유효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분리주의자들의 세례와 배교한 적이 있는 보편적 교회의 감독의 세례도 항상 유효하다. 3위 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는 인간의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례이기 때문에 인간 대리인의 죄가 그 성례의 존재 자체를 해치지는 못하였다. Cf. 그의 De baptismo contra Donatistas 4.15.24; Epistola 8889. 교회는 초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으나 얼마 후에는 3위1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였다.
33) 고대교회의 세례교육의 절차는 217년 저술된 로마의 히폴리투스(Hippolytus)의 the Apostolic Tradition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동시대 사람이었던 터툴리안과 마찬가지로 엄격주의자(rigorist)였다. 따라서 그의 책에 기술된 내용 그대로 2세기 말 혹은 3세기 초에 로마교회가 시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34) 안디옥의 감독 데오빌로(Theophilus)는 기독교인들이 피해야 할 죄의 목록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그의 To Autolycus 2.34.
35) 서방교부들은 대체로 세례를 죄의 용서를 위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저스틴 이래 동방교부들은 이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 주는 지성의 회복(illumination 혹은 enlightenment)의 과정으로 보았다. Cf. 저스틴, I Apology 61. 12f. 65.1.
36) 어거스틴에 따르면 교회는 “훈련의 집(disciplinae domus)”인데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바로 살 것인가(bene vivere)를 배운다. 그의 Sermo de disciplina Christiana 1.1.
37) 허마스의 the Shepherd는 빛과 구원의 길 그리고 어둠과 죽음의 길을 이야기 하였다. 이 두 길들은 이방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윤리관의 차이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보았다.
38) 이그나시우스, Ephesus 20.2.
39) 고대교회의 성례전 이해는 상징이론(sign theory), 구체적으로 성례전적 상징주의(sacramental symbolism)에 기초하고 있었다.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감각에 의해 인지되는 가시적 성례전(sacramentum)이 성례전의 효과(res sacrmenti) 곧 구원 혹은 은총을 가져온다. Edward J. Kilmartin, Christian Liturgy: Theology and Practice, vol. 1, Systematic Theology of Liturgy (Kansas City, Mo: Sheed and Ward, 1988), 3. 거룩한 것(구원 혹은 은총)을 상징하는 것은 모두 사크라멘툼이므로 교부들에 따르면 성례전이 무수히 많을 수 있다.
40) 교부들은 화체설(transubstantiation) 보다도 요소변화설(transelementization)을 믿었다. 집례자의 기도와 말씀이 가해진 후 떡과 포도주는 변화된 떡과 포두주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성례전의 효과와 관련하여 3위 1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verbum fidei)이 중요하였다. 곧 교부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없이 떡과 포도주는 성례전이 되지 못한다. 예컨대 어거스틴은 “Accedit verbum ad elementum, et fit sacramentum, etiam ipsum tamquam visible verbum”이라고 하였다. 그의 Tractatus in Joannis Evangelium 80.3. 칼빈과 루터도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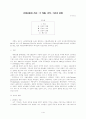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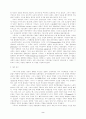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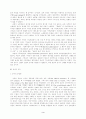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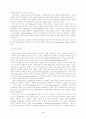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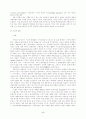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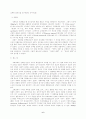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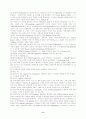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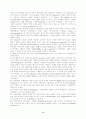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