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중국 법제 발저의 시대적 구분
3. 중국의 형법 발달
4. 결론: 법제의 본질
2. 중국 법제 발저의 시대적 구분
3. 중국의 형법 발달
4. 결론: 법제의 본질
본문내용
人其代之]라고 한다). 그러나 그 [대법]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째로 중국의 사회(家집단 또는 村집단 등)와의 구조적 관련을 보아둘 필요가 있다. 또 둘째로 [천의 대법]에 기인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에서는 반드시 영구불변한 법은 아니었다. 중국에서 법의 변동-법의 역사-을 성립시킨 요인으로서는 민중의 현실적 실력 저항-때로는 무언의 저항-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법은 궁극적으로는 지배자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지배자도 그 지배수단인 법의 변경을 부득불 행하게 된다. 힘의 대항, 모순대립이 법의 역사를 밀고 나아가는 원동력이다. 법을 움직이는 역관계-사회내면에서의 적대모순의 충격-는 농노법의 형성과 변질의 장면에서 특히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농노제에 나타나는 법의 변혁은 중국의 새로운 혁명의 역사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유럽인 방식의 권리사상의 유무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는 정치적 권위의 확립이 오래되고, 형법의 발달시기도 오래되었으나, 중국 주변 여러 민족의 법이나 한족을 제외한 중국내부의 여러 민족법은 지금까지의 진도를(지금까지 발달한?)보여준 것은 적었다. 그 중에는 정치적 권위의 확립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족간의 복수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 또한 복수주의의 단계를 넘어 재화로써 하는 배상주의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라는 원칙은 한족이외의 많은 민족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민족에는 인명금의 액은 피해자의 인종이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주어진 일도 있었다. 盜犯은 盜品의 몇 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배상을 지불할 수 없는 자는 지불대신 그 몸을 피해자에게 인도당한 일도 있었다(가해자위부). 배상은 피해자에게 지불될 뿐 아니라 공적권위에 대해서 지불되는 제도도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게르만부족법 등에서의 속죄금(Busse)이나 인명금(Wergeld)의 제도와 마찬가지의 것이었다. 단 중국의 경우에도 훨씬 옛날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周代의 고동기인 銘은 그 검토를 위한 단서를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에 모이는 외국인 사이, 또는 중국영역내의 이민족 사이, 혹은 그들과 중국인(한족) 사이처럼 법을 달리하는 자 사이에는 법의 저촉은 피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은 저촉을 해결하는 방법이 속인법주의(그 사람이 어디에 가더라도 그 사람의 고향의 법을 적용한다)이고, 속지법주의(우리 경계내에 들어오면 우리 법에 따른다)였다. 그리고 중국인의 무리를 하지 않는 태도는 외국인이나 이민족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북방민족이 남하하여 중국의 영역에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그 갖고 온 고향의 법과 중국법과의 대립항쟁은 피할 수 없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로는 그 경우, 여진민족은 혼인법 등에 대해서는 별개이지만 그 고유법인 배상제를 결국 버리고 중국법에 우위를 양보하게 되었다. 몽고민족남하의 경우는 중국법과 몽고법은 서로 타협하여 중국법은 몽고법이 갖고 있었던 배상제도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었다. 중국법과 15세기 베트남법과의 관계에는 이상의 양자와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고유법이 접촉한 경우 三者三樣의 태도가 취해졌다.
4. 結論 : 法制의 本質
중국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禮制로부터 法制로 진화하였고 儒家에서 法家가 분화하였다. 무릇 예란 인간행위의 규범으로 종교·도덕·법률이 분화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사회속에서 통제력을 가져 집단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회에서이던 예치의 존재가 법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는 예의 형성이 비교적 빨랐고 그것이 유지된 시간이 길어 그의 잠재력이 사회 각 계층에 뿌리깊게 미쳤기 때문에 역대에 있어서의 통치는 모두 禮를 主로 하고 刑罰을 輔助로 삼았으며 역대에 편찬된 법전 또한 형사 및 행정규범적인 공법에 한정되었으며 민사적인 사법은 대체적으로 예에 의해 규율되었다. 다시말해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으로부터 형성된 관습의 유지보호가 모두 공공생활의 구속력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 법제의 본질은 곧 중국법제의 특질로써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1)法律과 道德의 混同 : 유가의 중심사상은 \"仁\"을 기본으로 \"道\"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論語에서 \"군자는 근본을 세워야 하고 근본을 세우면 도가 생기며 그것이 곧 孝悌인 것으로 그것이 곧 인의 근본이다\"라 하여 효제는 인의 표상이며 인이 곧 도의 근원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도덕의 이상상에 있어서의 실현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표로서의 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克己復禮--家興仁--天下歸仁--達道를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도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근본으로 삼아 예로써 교육\"해야 하며 이의 구체화를 위하여 \"德禮는 政敎의 根本이며 刑罰은 政敎의 作用\"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다. 그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한 대 이후 \"春秋決獄(春秋折獄)\"이 행해졌던 것이다.
(2)公法과 私法의 合一 : 중국은 李 가 법전을 최초로 편찬한 이래 당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대부분이 형사법적인 것이었고 일부분이 행정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당에 이르러 비로소 戶婚錢債田土 등 민사적인 것들이 율에 편입되어 청대에 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또한 형률에 의해 민사적인 규율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02년에 修訂法律館에 의하여 民律草案이 만들어지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청이전에는 완전한 민사법규는 없었으며 더더욱 독립된 민사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의 인민이 예의를 중시하고 戶婚錢債田土 등을 사인의 사소한 일로써 중시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예교에 의해 형성된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3)法律과 命令의 對等 : 秦始皇이 전국을 통일하고 전제정치를 행하면서 행정과 입법의 모든 결정권은 황제에 귀속되었으며 이것은 청말에까지 계속되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혼동함으로써 법률과 명령은 효력면에 있어서 뚜렷한 구별이 없었다. 다시말해서 현대 입법에 있어서의 \"명령이 법률에 저촉하면 무효\"라는 기본관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정치적 권위의 확립이 오래되고, 형법의 발달시기도 오래되었으나, 중국 주변 여러 민족의 법이나 한족을 제외한 중국내부의 여러 민족법은 지금까지의 진도를(지금까지 발달한?)보여준 것은 적었다. 그 중에는 정치적 권위의 확립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족간의 복수주의를 보여주는 것이 있다. 또한 복수주의의 단계를 넘어 재화로써 하는 배상주의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라는 원칙은 한족이외의 많은 민족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민족에는 인명금의 액은 피해자의 인종이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주어진 일도 있었다. 盜犯은 盜品의 몇 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배상을 지불할 수 없는 자는 지불대신 그 몸을 피해자에게 인도당한 일도 있었다(가해자위부). 배상은 피해자에게 지불될 뿐 아니라 공적권위에 대해서 지불되는 제도도 나타나 있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게르만부족법 등에서의 속죄금(Busse)이나 인명금(Wergeld)의 제도와 마찬가지의 것이었다. 단 중국의 경우에도 훨씬 옛날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周代의 고동기인 銘은 그 검토를 위한 단서를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중국에 모이는 외국인 사이, 또는 중국영역내의 이민족 사이, 혹은 그들과 중국인(한족) 사이처럼 법을 달리하는 자 사이에는 법의 저촉은 피하기 어려웠다. 이와같은 저촉을 해결하는 방법이 속인법주의(그 사람이 어디에 가더라도 그 사람의 고향의 법을 적용한다)이고, 속지법주의(우리 경계내에 들어오면 우리 법에 따른다)였다. 그리고 중국인의 무리를 하지 않는 태도는 외국인이나 이민족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북방민족이 남하하여 중국의 영역에 나라를 세웠을 때에는 그 갖고 온 고향의 법과 중국법과의 대립항쟁은 피할 수 없었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로는 그 경우, 여진민족은 혼인법 등에 대해서는 별개이지만 그 고유법인 배상제를 결국 버리고 중국법에 우위를 양보하게 되었다. 몽고민족남하의 경우는 중국법과 몽고법은 서로 타협하여 중국법은 몽고법이 갖고 있었던 배상제도를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되었다. 중국법과 15세기 베트남법과의 관계에는 이상의 양자와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고유법이 접촉한 경우 三者三樣의 태도가 취해졌다.
4. 結論 : 法制의 本質
중국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禮制로부터 法制로 진화하였고 儒家에서 法家가 분화하였다. 무릇 예란 인간행위의 규범으로 종교·도덕·법률이 분화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것은 사회속에서 통제력을 가져 집단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회에서이던 예치의 존재가 법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에 있어서는 예의 형성이 비교적 빨랐고 그것이 유지된 시간이 길어 그의 잠재력이 사회 각 계층에 뿌리깊게 미쳤기 때문에 역대에 있어서의 통치는 모두 禮를 主로 하고 刑罰을 輔助로 삼았으며 역대에 편찬된 법전 또한 형사 및 행정규범적인 공법에 한정되었으며 민사적인 사법은 대체적으로 예에 의해 규율되었다. 다시말해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으로부터 형성된 관습의 유지보호가 모두 공공생활의 구속력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 법제의 본질은 곧 중국법제의 특질로써 다음의 몇가지를 들 수 있다.
(1)法律과 道德의 混同 : 유가의 중심사상은 \"仁\"을 기본으로 \"道\"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論語에서 \"군자는 근본을 세워야 하고 근본을 세우면 도가 생기며 그것이 곧 孝悌인 것으로 그것이 곧 인의 근본이다\"라 하여 효제는 인의 표상이며 인이 곧 도의 근원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도덕의 이상상에 있어서의 실현을 의미하며 이러한 목표로서의 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克己復禮--家興仁--天下歸仁--達道를 주장했던 것이다. 따라서 도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근본으로 삼아 예로써 교육\"해야 하며 이의 구체화를 위하여 \"德禮는 政敎의 根本이며 刑罰은 政敎의 作用\"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다. 그의 구체적인 실행으로 한 대 이후 \"春秋決獄(春秋折獄)\"이 행해졌던 것이다.
(2)公法과 私法의 合一 : 중국은 李 가 법전을 최초로 편찬한 이래 당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대부분이 형사법적인 것이었고 일부분이 행정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당에 이르러 비로소 戶婚錢債田土 등 민사적인 것들이 율에 편입되어 청대에 까지 계속되었으나 그 또한 형률에 의해 민사적인 규율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1902년에 修訂法律館에 의하여 民律草案이 만들어지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청이전에는 완전한 민사법규는 없었으며 더더욱 독립된 민사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의 인민이 예의를 중시하고 戶婚錢債田土 등을 사인의 사소한 일로써 중시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함으로써 예교에 의해 형성된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기 때문이다.
(3)法律과 命令의 對等 : 秦始皇이 전국을 통일하고 전제정치를 행하면서 행정과 입법의 모든 결정권은 황제에 귀속되었으며 이것은 청말에까지 계속되어 입법권과 행정권을 혼동함으로써 법률과 명령은 효력면에 있어서 뚜렷한 구별이 없었다. 다시말해서 현대 입법에 있어서의 \"명령이 법률에 저촉하면 무효\"라는 기본관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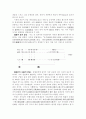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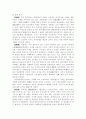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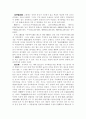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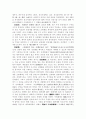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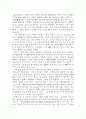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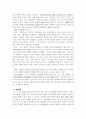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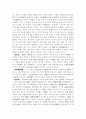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