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 1
제1부 폴 틸리히 신학 개관 ------------------------- 2
1. 틸리히의 생애 ---------------------------------- 2
2. 틸리히의 신학적 전제들 ------------------------- 4
3. 상관성의 방법 ---------------------------------- 6
4. 프로테스탄트의 원리 ---------------------------- 9
5. 전반적인 신학 개요 ----------------------------- 10
제2부 폴 틸리히의 신관 ---------------------------- 13
1. 틸리히의 신관 ---------------------------------- 13
2. 틸리히의 신관에 대한 개혁신학적 비판 ----------- 16
결론 ---------------------------------------------- 19
침고문헌 ------------------------------------------ 21
제1부 폴 틸리히 신학 개관 ------------------------- 2
1. 틸리히의 생애 ---------------------------------- 2
2. 틸리히의 신학적 전제들 ------------------------- 4
3. 상관성의 방법 ---------------------------------- 6
4. 프로테스탄트의 원리 ---------------------------- 9
5. 전반적인 신학 개요 ----------------------------- 10
제2부 폴 틸리히의 신관 ---------------------------- 13
1. 틸리히의 신관 ---------------------------------- 13
2. 틸리히의 신관에 대한 개혁신학적 비판 ----------- 16
결론 ---------------------------------------------- 19
침고문헌 ------------------------------------------ 21
본문내용
비판가로서 독일 신하계에 명성을 떨쳤으며, 라인홀드 니버의 동료요 친구로서 미국 신학의 흐름을 주도했다.
그의 탁월성은 분명 현대의 역사적 관점과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학을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에 있다. 그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했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틸리히는 인간, 역사 및 문화에서의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상황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정통신학에 대해 늘 도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성경의 비문자화를 주장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단지 상징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전통적인 신관, 그리스도관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틸리히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독교를 상징에 근거한 기독교로 전락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토대를 손상시켰다.
특히 틸리히는 그의 신관을 전개함에 있어서 범신론으로 기울어져, 극단적인 내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알타이저(Thomas J.J. Altizer) 등으로부터 사신신학(死神神學)의 스승으로 불리움을 받기에 이르렀다. 알타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20세기의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참으로 현대적 신학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신학자는 틸리히였다.
Thomas Altizer, The Gospel of Christian Atheism, p.10. 박아론, 「현대신학연
구」, 114쪽.
1967년 10월 13일자 Christianity Today의 표지는 이를 단명적으로 잘 보여준다. 거기에는 한 무더기의 책이 그려져 있었다. 그 가운데는 바하니안(Gabriel Vahanian)의 No other God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하밀톤(William Hamilton)의 The New Essenc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새로운 본질), 알타이저의 Twoards a New Christianity (새로운 기독교를 향하여)와 The Gospel of Christian Atheism (기독교적 무신론의 복음)와 Radical Theology and the Death of God (급진신학과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반뷰렌의 The Secular Meaing of the Gospel(복음의 세속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저자들은 오늘날 사신신학으로, 좀더 학술적으로는 급진(혹은 세속) 신학으로 알려진 현대 신학운동의 지도자들이다. 이 한더미의 책 밑바닥에는 세권으로 된 틸리히의 조직신학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현대신학에서 틸리히가 차지하는 위치를 암시한 것이었다.
케넷 하밀톤, 상게서, 84쪽. 틸리히가 자신이 죽기 전날 밤 알타이저와의 열띈 논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급진신학의 사실상의 지도자는 틸리히 자신이라는 주장을 그가 완강히 부
인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타이저 자기는 틸리히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떠밀려
가기만 했을 뿐이라고 고백한 것도 역시 꼭 같은 진실이다. 상게서, 84쪽.
물론 틸리히는 분명 기독교적 무신론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케넷 하밀톤이 말했듯이 초자연주의의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서 사신의 요단강가로 인도한 모세와 같은 인물 이었다. 그의 이러한 운명은 역사적 기독교에서 멀리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실존의 옷을 입혀 존재의 지반이란 밑창으로 내려 보내는
김의환, 상게서, 134쪽. 또한 그의 책, 「도전받는 보수신학」, 33쪽.
인간의 철학적 허구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철학적 고민 속에서 신학적 해답을 주고자 하고 그의 변증적 동기는 매우 중요하고 값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실존주의의 옷을 입힌 철학적 범신론의 하나님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틸리히의 신학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기 보다 역(逆)으로 자기의 조직적 사상 체계 속에 성경적 진리를 부합시키려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현대인의 고뇌의 해결책으로 기독교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일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새삼 인식하면서 최선의 전진을 다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Pua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s, I,II,III.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1967.
, The Protestant Era.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1973.
, The Courage to be. Yale University Press, 1952.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Century Theology, Downers
Grove:IVP, 1992.
A.C.Thiselton, Tillich, Paul, New Dictionary of The Theology
Downers Grove:IVP, 1988.
박아론, 「현대신학연구」.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김의환, 「현대신학개설」.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도전받는 보수신학」. 서울:생명의말씀사, 1982.
간하배, 「현대신학해설」.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김경재, 「폴 틸리히 신학 연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케넷 하밀톤, 「폴 틸리히」.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91.
박아론, The Question of all-inclusiveness in the Theology of
Paul Tillich, 「신학지남」 1988년 가을호.
데이비드 프리만, 「폴 틸리히의 철학의 하나님」. 서울:성광문화사, 1981.
목창균, 폴 틸리히 신학 논쟁, 「목회와 신학」. 1993년 11월호.
로버트 존슨, 폴 틸리히, 「현대신학자 20人」.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그의 탁월성은 분명 현대의 역사적 관점과 인간의 실존적 상황에 근거하여 기독교 신학을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재해석한 것에 있다. 그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했다. 바르트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성경의 메시지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 틸리히는 인간, 역사 및 문화에서의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상황을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정통신학에 대해 늘 도전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성경의 비문자화를 주장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같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단지 상징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전통적인 신관, 그리스도관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틸리히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기독교를 상징에 근거한 기독교로 전락시키고 기독교 신앙의 역사적 토대를 손상시켰다.
특히 틸리히는 그의 신관을 전개함에 있어서 범신론으로 기울어져, 극단적인 내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말았는데, 이로 인해 그는 알타이저(Thomas J.J. Altizer) 등으로부터 사신신학(死神神學)의 스승으로 불리움을 받기에 이르렀다. 알타이저는 이렇게 말했다. 20세기의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참으로 현대적 신학을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신학자는 틸리히였다.
Thomas Altizer, The Gospel of Christian Atheism, p.10. 박아론, 「현대신학연
구」, 114쪽.
1967년 10월 13일자 Christianity Today의 표지는 이를 단명적으로 잘 보여준다. 거기에는 한 무더기의 책이 그려져 있었다. 그 가운데는 바하니안(Gabriel Vahanian)의 No other God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하밀톤(William Hamilton)의 The New Essenc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새로운 본질), 알타이저의 Twoards a New Christianity (새로운 기독교를 향하여)와 The Gospel of Christian Atheism (기독교적 무신론의 복음)와 Radical Theology and the Death of God (급진신학과 하나님의 죽음), 그리고 반뷰렌의 The Secular Meaing of the Gospel(복음의 세속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저자들은 오늘날 사신신학으로, 좀더 학술적으로는 급진(혹은 세속) 신학으로 알려진 현대 신학운동의 지도자들이다. 이 한더미의 책 밑바닥에는 세권으로 된 틸리히의 조직신학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현대신학에서 틸리히가 차지하는 위치를 암시한 것이었다.
케넷 하밀톤, 상게서, 84쪽. 틸리히가 자신이 죽기 전날 밤 알타이저와의 열띈 논쟁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급진신학의 사실상의 지도자는 틸리히 자신이라는 주장을 그가 완강히 부
인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알타이저 자기는 틸리히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떠밀려
가기만 했을 뿐이라고 고백한 것도 역시 꼭 같은 진실이다. 상게서, 84쪽.
물론 틸리히는 분명 기독교적 무신론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케넷 하밀톤이 말했듯이 초자연주의의 애굽에서 백성을 이끌어내서 사신의 요단강가로 인도한 모세와 같은 인물 이었다. 그의 이러한 운명은 역사적 기독교에서 멀리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 실존의 옷을 입혀 존재의 지반이란 밑창으로 내려 보내는
김의환, 상게서, 134쪽. 또한 그의 책, 「도전받는 보수신학」, 33쪽.
인간의 철학적 허구를 추구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철학적 고민 속에서 신학적 해답을 주고자 하고 그의 변증적 동기는 매우 중요하고 값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실존주의의 옷을 입힌 철학적 범신론의 하나님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틸리히의 신학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기 보다 역(逆)으로 자기의 조직적 사상 체계 속에 성경적 진리를 부합시키려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개혁신학은 현대인의 고뇌의 해결책으로 기독교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일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새삼 인식하면서 최선의 전진을 다해야 하겠다.
<참고 문헌>
Pua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s, I,II,III.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1967.
, The Protestant Era.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1973.
, The Courage to be. Yale University Press, 1952.
Stanley J. Grenz & Roger E. Olson, 20th-Century Theology, Downers
Grove:IVP, 1992.
A.C.Thiselton, Tillich, Paul, New Dictionary of The Theology
Downers Grove:IVP, 1988.
박아론, 「현대신학연구」.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김의환, 「현대신학개설」.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92.
, 「도전받는 보수신학」. 서울:생명의말씀사, 1982.
간하배, 「현대신학해설」.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김경재, 「폴 틸리히 신학 연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케넷 하밀톤, 「폴 틸리히」.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91.
박아론, The Question of all-inclusiveness in the Theology of
Paul Tillich, 「신학지남」 1988년 가을호.
데이비드 프리만, 「폴 틸리히의 철학의 하나님」. 서울:성광문화사, 1981.
목창균, 폴 틸리히 신학 논쟁, 「목회와 신학」. 1993년 11월호.
로버트 존슨, 폴 틸리히, 「현대신학자 20人」.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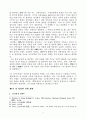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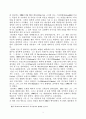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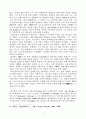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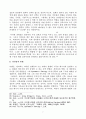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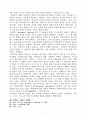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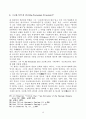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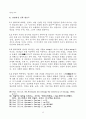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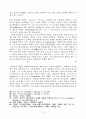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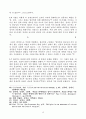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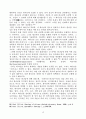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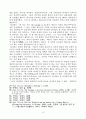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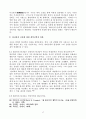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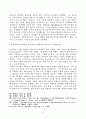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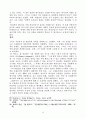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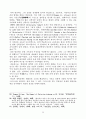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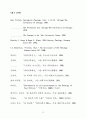









소개글